동양(중국) 제자백가의 사상 6 – 병가의 사상
[목차]
– 병가의 사상
.육도 서
.손자 서
.오자 서
– 병가의 사상(兵家-思想)
춘추전국시대 열국간의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군사에 관한 사상·지식·기술에 관련된 서적이 차츰 나타났다. 그런 저술을 한데 묶어 병가(兵家)라고 칭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기재되어 있는 <오손자 병법(吳孫子兵法)> 82편과 <제손자(齊孫子)> 89편이다. <오손자(吳孫子)>는 춘추시대의 군사 사상가 손무(孫武)의 저작이라 하고, <제손자(齊孫子)>는 전국시대의 손빈(孫 )의 저작이라 한다. 현재는 다만 <손자(孫子)>13편이 남아 있을 뿐인데 13편의 <손자(孫子)>가 <오손자(吳孫子)>인지 <제손자(齊孫子)>인지는 예로부터 이론(異論)이 있다. 그러나 <손자(孫子)> 13편 중에는 병거이천승(兵車二千乘)이라든가, 10만의 병사를 규모로 하는 용병법(用兵法)을 설명한 것과 그 속에 나오는 장군이 춘추시대 사람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현존의 <손자(孫子)>는 대규모 전쟁이 행해졌던 전국기(戰國期)의 것으로서, 아마도 <제손자>의 작품일 가능성이 짙다. 다만 일부에는 <오손자>의 기록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까닭으로 현존하는 13편의 <손자>는 예로부터 <손자>라는 명칭하에 전래된 두 종류의 책 중 <제손자>를 주재료로 한 발췌본(拔萃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병가는 본래부터 군사사상·군사지식·군사기술을 논하는 것이지만, 그 사고방식의 기저에는 법가적인 것이 강하게 내재한다. 예컨대 현존의 <손자>에 있어서 전쟁에 승리를 얻기 위한 5개 조건을 <5사(五事)>로서 기술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도의에 부합해야 하는 것, 둘째 천(天)의 시(時)에 좇을 것, 셋째 땅의 이(利)에 좇아야 할 것, 넷째 우수한 장군을 얻는 것, 다섯째 엄정한 조직·규율을 가질 것이라고 하였다(計篇). 이 다섯째의 설명은 법가의 사상에 통하는 것이다. <손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다음 말은 유명하다. “적(彼)을 알고 나(己)를 알면 백전(百戰)이 위태하지 않고 저를 모르고 나만 알 뿐이면 일승일패(一勝一敗)한다. 저를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백전이 다 위태롭다.”(謀攻篇) 이것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과 나의 내부 모순을 변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됨을 말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무릇 용병의 법은 나라를 온전히 함을 상으로 삼고, 다른 나라를 격파함은 이에 다음 간다. 또 군사를 온전히 함을 상으로 삼고, 타국의 군사를 격파함은 이에 다음 간다.(中略) 따라서 백전백승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서도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善)이다.”(謀攻篇) 이 사고방식 속에는 도가적 발상도 있으나 단지 군사상의 관점에서만 용병(用兵)을 말하지 않고 정치의 연장선에서 ‘용병’을 말하는 곳에 <손자>의 군사사상의 본질이다. 이외에 병가의 현존하는 주요한 책으로는 <육도(六韜)>와 <오자(吳子)>가 있다.
○ 육도(六韜) 서
주나라 태공망(강상)이 쓴 것처럼 구성되어 있으나, 전국시대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게 정설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위서(僞書)라고 할 수 있으나, 무명의 지은이가 자신의 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옛사람의 이름을 빌렸다고 보면 될 것이다.
주(周)의 강태공 여망(呂望=太公望)의 저서라고 하나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만들어진 책인 것 같다.
육도(六韜)는 중국의 대표적인 병법서로, 무경칠서 중의 하나이다. 《삼략》과 같이 병칭된다. ‘도’(韜)는 검이나 활등을 넣는 봉투의 의미이다. 〈문도〉(文韜), 〈무도〉(武韜), 〈용도〉(龍韜), 〈호도〉(虎韜), 〈표도〉(豹韜), 〈견도〉(犬韜) 등 6권 60편으로 완성되어, 모든 편목이 태공망 강상(太公望姜尙)이 주 문왕, 무왕에 병법을 전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先秦)의 고서(古書) 《육도》는 송나라 시대에 간행된 송간행본이 통용으로 보급되었지만,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 〈병서략(〉兵書略)에 육도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수서경적지》(隋書經籍志) 〈병가〉(兵家)에 그 《육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때문에 요제항(姚際恒)은 고금위서고(古今偽書攷)에서 진한 이후의 위작이라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1972년 발굴된 은작산 한나라 무덤에 출토된 죽간에 〈문도〉, 〈무도〉, 〈호도〉 등 일부가 남아 있는 편목이 발견되어 전한 전반기 기원전 2세기에는 이미 유포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육도는 전국시대에 저작되었다는 설이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 건국 공신인 참모 장량이 황석공에게 양도했다고 하는 서적이기도 하다.
○ 손자(孫子) 서
13편.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손빈의 저작을 주로 하면서 춘추시대의 손무(孫武)의 설도 채택한 병법서의 다이제스트판이다. 손빈의 빈은 이름이 아니다. 발을 잘리는 형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빈이라고 했다. 병가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다.
– 손자병법(孫子兵法, The Art of War)
손자병법은 고대 중국의 병법서(兵法書)이다. 원본은 춘추 시대 오나라왕 합려를 섬기던 손무(孫武)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손자병법은 조조가 원본을 요약하고 해석을 붙인 위무주손자(魏武註孫子) 13편이다.
*원본
현존하는 판본인 손자병법 즉 위무주손자는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국 은작산에서 죽간손자병법의 발굴로 죽간손자병법이 전통적으로 전래오는 다른 판본과 다르게 손무가 생존시에 저술한 손자병법 원본과 가깝게 여겨진 판본으로 생각되었다. 또 「죽간손자병법」과 다른 전래되어 전해진 판본에는 용간편과 화공편이 순서가 틀리게 구성되었다. 한서 예문지(漢書藝文志)에는 82편과 그림 9권등 내용이 더 있다고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없다.
손무의 손자로서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전략가 손빈(孫臏)이 저자라는 설도 있었으나 1972년 4월, 은작산 한나라 무덤에서 엄청난 양의 죽간이 발견되어 《손자병법》과 《손빈병법》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이후의 연구결과, 손무의 기록이 손자병법의 원본이고, 손빈의 것은 제나라의 손빈 병법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주류 학계의 추정이다. 한편 손무(孫武)가 지었으나 그의 후손인 손빈(孫殯)에 이르러 완성했다는 설도 있다.
*구성편집
손자병법은 다음과 같이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계편(始計篇) On assessment : 전쟁에 앞서 승산을 파악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전략(또는 전력)의 다섯가지 요소(오사)와 서로의 전략 요소를 비교하는 일곱 가지 기준(칠계),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적을 속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작전편(作戰篇) On waging battle : 전쟁을 치르는데 있어서의 경제성에 대해 논한다. 전쟁의 속전속결을 강조하며, 물자를 절약하기 위해 적의 것을 빼앗아 사용하는 등의 방식을 언급한다.
.모공편(謀攻篇) Planning the attack : 손실이 없는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리고 지피지기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군형편(軍形篇) Strategic positions : 군의 형세를 보고 승패를 논함. 먼저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고 전쟁을 추구하는 만전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병세편(兵勢篇) Strategic Advantages : 공격과 방어, 세의 활용을 논함. 용벙에서 정병과 기병의 원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허실편(虛實篇) The weak points and the strong points : 주도권과 집중을 논함. 적의 강점을 피하고 허점을 강조하고 있다.
.군쟁편(軍爭篇) Armed contest : 실제 전투의 방법을 서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문제(군쟁)와 이를 위한 우회기동(우직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변편(九變篇) Adapting to the Nine Contingencies : 변칙에 대한 임기응변(구변),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오리), 장수가 경계해야 할 위험(오위) 및 만전의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행군편(行軍篇) Deploying the army : 행군과 주둔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지형편(地形篇) The terrain : 지형의 이해 득실과 장수의 책임을 논하고 있다.
.구지편(九地篇) The nine terrains : 지형의 이용, 적의 취약점 조성과 주도권 쟁취, 기동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공편(火攻篇) Attack by Fire : 화공의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전쟁과 전투를 신중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용간편(用間篇) Use of espionage : 정보의 중요성과 그를 위해 간첩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내용
.전체적 특징
비호전적 – 전쟁을 간단하게 일으키는 것이나, 장기전에 의한 국력 소모를 경고한다. 이 점에 대해 도가 사상의 연관성을 있다고 하여서 그 점에 대한 연구도 있다.(모공편)
현실주의 – 치밀하게 관찰한 모습에 근거하여, 전쟁의 여러 가지 양상을 구별하여, 그 상황에 대응한 전술을 시행하였다.(모공편)
주도권의 중시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다.(허실편)
부전승 사상 – 실질적인 전쟁을 벌이지 않고 정치, 외교 차원에서 적을 이기거나 적 군사력을 와해시키므로서 승리하는 것을 최상으로 보았다. 벌모, 벌교, 벌병, 벌성이라 하였는데, 벌모는 적의 전략을 와해시키는 것이고 벌교는 적의 동맹관계, 벌병은 적의 군사력, 그리고 벌성은 적의 성을 공략하는 것이다. (모공편)
정보의 중요성 – 용간편에서 강조되듯 정보는 대전략 차원에서든 전술차원에서든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유명한 내용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는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로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 부분의 원문은 知彼知己 百戰不殆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과 패를 각각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해설서
.현재 전하는 손자병법은 조조가 주석 및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관례이다.
.중국 한나라 조조,당나라의 두목(杜牧),이전(李筌), 진호(陳皥), 孟氏, 賈林, 두우(杜佑), 송나라시대의 장예(張預), 매효신(梅堯臣),왕석(王晢),하씨(何氏)등으로 알려지거나 추측되는 열한명 이상의 주석가를 거론하여 송대에 길천보(吉天保)편찬으로 유래하는 십가주(十家注) 손자병법 및 이후에 이를 추가하여 편찬한 십일가주(十一家注) 손자병법
.중국 명나라 유인(劉寅)의 무경칠서 중 손자병법
.조선 수양대군이 주석을 단 무경칠서주해중 손자병법
*오해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를 지피지기 백전백승 혹은 지피지기 백전불패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의미는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해 서로 다르다. 그리고 불태(不殆)라는 단어는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36계를 손자병법의 내용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제 1계인 만천과해(瞞天過海)를 시작으로 마지막 36번째 계략인 주위상(走爲上)으로 끝나는 36계는 손자병법의 내용이 아니고, 36계라는 책에 나온 말이다.
*손자병법의 애독자
.소설 삼국지의 등장인물 조조가 있다. (특히 조조는 손자병법의 화공계략의 요점만을 엮어 맹덕신서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일본 센고쿠 시대의 명장 다케다 신겐이 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역시 손자병법을 애독했다고 하나 명확한 증거는 없다.
.조선의 명장 이순신 역시 손자병법을 애독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명확한 증거는 없다.(다만 손자병법은 당시 무과시험 기본서에 해당되어 무관이라면 반드시 읽어야만 했다.)
*일본에서의 손자병법 유파(流派)들
.이가류(伊賀流)
.고가류(甲賀流)
.야마가류(山鹿流)
– 손빈병법(孫臏兵法, Sun Bin’s Art of War)
손빈병법은 기원전 4세기 무렵 중국 전국시대의 제나라 장수 손빈(孫臏)이 저술한 병법서이다. 또 다른 명칭으로 제손자병법(齊孫子兵法)으로도 불린다. 덧붙여 1972년 발견 이전에 이른바 손자(孫子)의 병법서에 대해서, 손무(孫武)가 저술 했다는 설과 손빈(孫臏)이 저술 했다는 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손빈병법(孫臏兵法)이 발견되어, 손자병법은 손무가 저술했고, 손빈이 따로 손빈병법을 저술한것이 확인되었다.
*발견 경위
1972년 4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산둥성(山東省)에서 한나라 시대의 무덤이 두 개가 발굴되었다. 즉시 산둥성 박물관(山東省博物館)으로부터 온 전문가가 검증하였다. 후에 은작산 한나라무덤(銀雀山漢墓)라고 칭해지게 되는 이 장소에서 발견된, 죽간으로 된 다수의 서적 중에서 죽간중에 손빈병법이 발견되었다. 서적과 동시에 발굴된 고전(古銭)의 모습과 및 동시에 발굴된 한 무제 원광 원년 역보(漢武帝元光元年歷譜)있었고, 연대가 대체로 기원전 134년에서 기원전 118년으로 추정되었다.
*손빈 병법의 구성
손빈병법은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에는 8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이 있지만, 그 후에 한나라시대 이후부터 수당시대 사이에서 실전되었고, 그 뒤에 손빈병법의 실존여부를 의심하다가, 그 이후에 은작산에서 손빈병법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죽간본 손빈병법에는 죽간(竹簡)이 440매, 전3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견된 원문에는 21편의 편명이 남아 있지만, 9편의 편명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59편이 발견되지 않아 나머지 편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다.
.손빈병법 상권
금방연(擒龐涓)
[견위왕](見威王) – 편명이 남아 있지 않아서 앞문장단어로 편명으로 임시로 정했다.
위왕문(威王問)
진기문루(陳忌問壘)
찬졸(簒卒)
월전(月戰)
팔진(八陣)
지보
세비(勢備)
[병정](兵情) – 편명이 남아 있지 않아서 임시로 정한 편명이다.
행찬(行簒)
살사(殺士)
연기(延氣)
관일(官一)
[강병](強兵) – 편명이 남아 있지 않아서 임시로 정한 편명이다.
.손빈병법 하권
십진(十陣)
십문(十問)
약갑(略甲)
객주인분(客主人分)
선자(善者)
오명오공(五明五恭)
[병실](兵失)
장의(將義)
[장덕](將德)
장패(將敗)
[장실](將失)
[웅빈성](雄牝城)
[오도구탈](五度九奪)
[적소](積疏)
기정(奇正)
○ 오자(吳子) 서
6편. 전국시대의 오기(吳起)의 저서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그 병법을 전하는 문인에 의하여 후대에 저작된 것이다.
오자병법(吳子兵法) 또는 단순히 오자(吳子)는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저술했다고 추정되는 병법서로, 무경칠서(武經七書) 중의 하나이다. 도교 철학에 기초한 ‘속임수'(트릭) 전술의 손자병법(孫子兵法)과는 대비되어, 오자병법은 유교 철학에 기초한 정공법전략의 병법서이다. 저자는 오기(吳起) 또는 오기의 문인이 저자로 전해지지만, 확실하지 않다.
오기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현존하고 있는 오자병법은 6편이지만, 한서 예문지(漢書 芸文志)에는 “오자 48편”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오자병법에는 부대 편제의 방법, 상황과 지형에 따라 싸우는 방법, 군사의 사기를 올리는 방법, 기병, 전차, 노, 궁의 운용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변칙변술로서 단기전에 유용한 손자병법과 달리 사전준비를 강조하는 오자병법은 주로 중장기전에 유용하다. 전략이나 정략을 중시하고 있으며 근대전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보편성 때문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손자병법 만큼의 인지도를 가지지 못했으나, 정치, 경제, 군사 등 융합적 사고가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는 21세기 이후 점차적으로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 내용
서장(序章) – 오기와 무후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다.
도국(圖國) – 정치와 전쟁에 대한 내용이다. 치국의 원칙을 논하고 있으며 나라를 잘 다스린 뒤에 출병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전쟁의 원인과 성격, 인재 등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요적(料敵) – 적정 분석의 방법을 기술하였다. 즉 적의 강약과 허실을 판단하고 승리할 수 있는 계흭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도국편이 자기를 알기 위한 것이라면 요적편은 적을 알기 위한 것이다.
치병(治兵) – 통솔의 원칙을 기술하였다. 치병은 군대를 다스림을 뜻한다. 즉, 장병의 교육, 훈련, 편성 및 장비 등을 완전히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운용하는 것이 승리의 요건임을 밝히고 있다.
논장(論將) – 지도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응변(應變) – 임기응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여사(勵士) – 병사를 격려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 오자병법의 애독자
조선의 명장 이순신이 있다.명량해전 직전 그가 부하들에게 남긴 말중 “필사즉생 필생즉사 (必死則生 必生則死)”은 본래 이순신이 남긴말이 아닌, 오자병법에서 나온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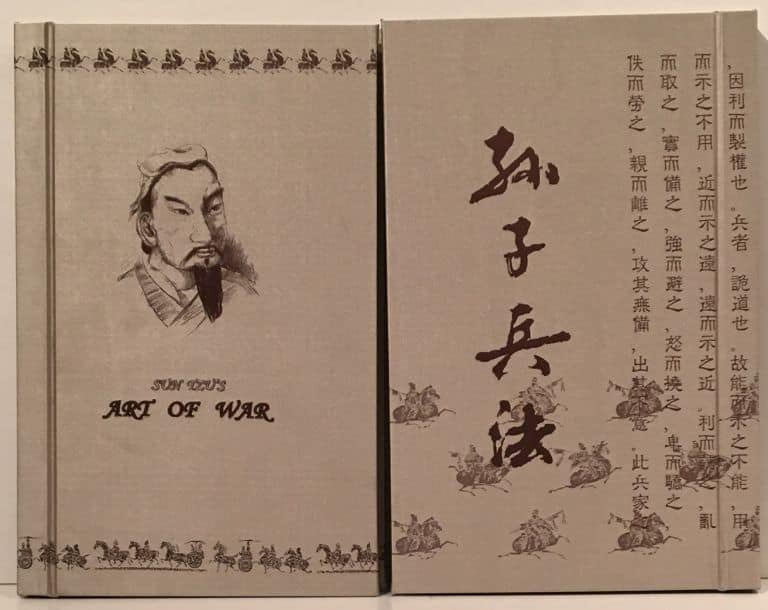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