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천의 사기 – 서(書)
사마천 사기의 서(書)
당시의 생활상이나 제도, 풍속 등을 기록한 사회사 기록. 후대 역사서들의 지(志)에 해당된다. 내용 손실이 극심하였는지, 사마천이 쓴 목록과 현재 남은 목록이 비율상 가장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남은 부분은 후대에 자료를 수집해서 채우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새로 쓴 것들이다.
원래는 예서, 악서, 병서, 율력서, 천관서, 하거서, 봉선서, 평준서의 순서대로 있었는데, 예서, 악서, 병서는 망실된 뒤 예서와 악서는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다시 만들어졌으나 병서는 끝내 복원되지 못했다. 또한 율력서가 율서와 역서로 쪼개져 8서 체제를 갖춘다.
○ 서(書)의 구성
총 8편으로 역대의 정책과 제도, 문물의 발달사 및 전망을 다룬다.
예서(禮書)
악서(樂書)
률서(律書)
역서(暦書)
천관서(天官書)
봉선서(封禪書)
하거서(河渠書)
평준서(平準書)
1. 예서(禮書)
사마천 사기-서(書)의 첫 번째 기록, 예의범절이나 이와 관련한 풍속 기록을 담고 있다.
하, 은, 주 3대의 예는 감손(减损)하기도 하고 증익(增益)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각각 힘쓰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인간의 본성에 가깝게하고 왕도를 통하게 한 점은 다를바가 없다. 그래서 예를 인간의 성질에 따라 절도와 문식을 하게하고 고금의 변통에 맞도록 한 것이다.
한편 ‘사기지의'(史記志疑)에서 ‘예서’는 순자의 ‘예론’과 ‘의병’편의 내용을 참조하여 후대에 새로 쓴 것으로 본다.
– 예서(禮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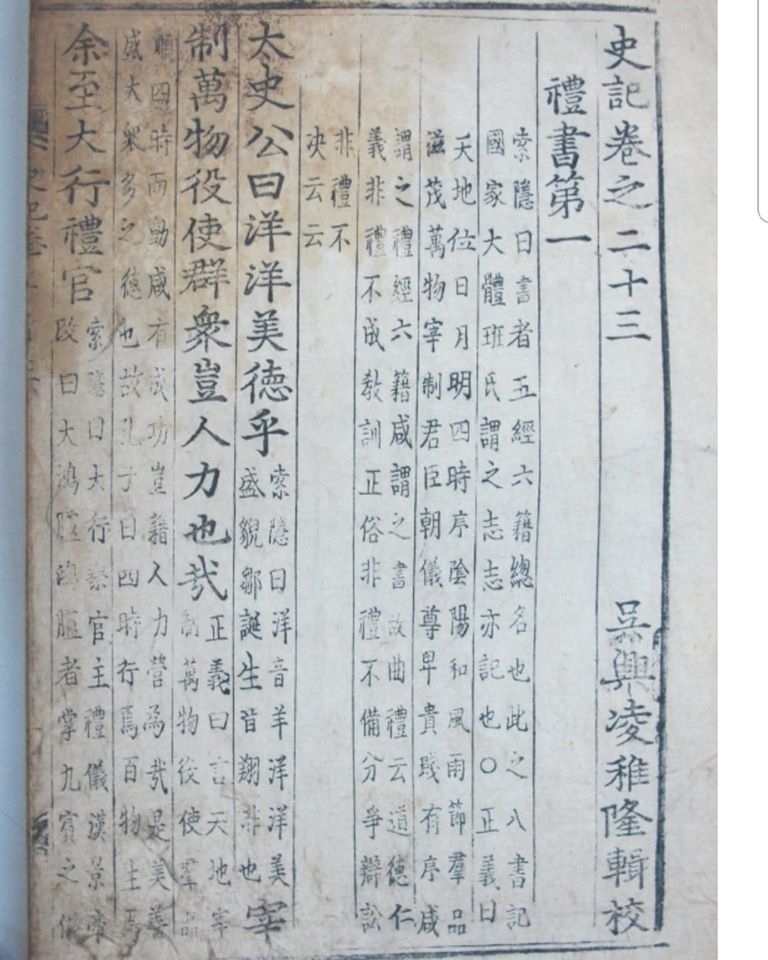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이 얼마나 넓고도 성대한 미덕인가! 만물을 주재하고 군중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어찌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겠는가? 나는 대행(大行)의 예관(禮官)에 가서 삼대(三代)에 걸친 예제(禮制)의 손실과 이익을 관찰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의 성정(性情)에 따라 예의가 제정되고 인간의 습성에 의거해 예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 유래된 바는 오래되었다.
인간의 길은 씨줄과 날줄처럼 만 가지로 얽혀 있어도 법도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인의(仁義)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속박하면서 덕(德)이 두터운 사람은 지위가 존귀해지고 봉록이 많아져 은총을 받고 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천하의 인심을 하나로 모으고 만민을 정돈하여 가지런히 할 수 있다.
사람의 몸은 수레를 타면 편안해지는데 이를 위해 수레 위에 황금으로 장식하는 횡목에다 이런저런 문양을 놓는다. 눈은 오색(五色)을 좋아하는데 이를 위해 화려한 무늬를 수놓고 문채를 내서 더욱 화려하게 드러낸다. 귀는 악기 소리에 즐거워하는데 그를 위해 팔음(八音)을 섞어 사람의 마음속을 넓고 편하게 만든다. 입은 다섯 가지 맛을 보는데 이를 위해 또 여러 맛을 더하여 맛을 더 좋게 한다. 감정은 진귀한 물건으로 흡족해지는데 이를 위해 다시 규(圭)와 벽(璧)을 쪼고 갊으로써 그 마음을 더욱 흡족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로(大路)에 부들자리를 깔고, 피변(皮弁)에 베로 짠 치마를 더하고, 거문고의 붉은 줄에 구멍을 더하고, 태갱(太羹)에 현주(玄酒)를 쓰는 것이다. 이로써 음란하고 사치함을 방지하고 피폐해짐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로써 조정에서 군신의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함의 순서가 생기고, 아래로 백성의 수레와 의복, 집, 음식, 혼례, 상례(喪禮), 제례의 명분이 생겨 일이 적당해지고. 물건마다 그에 맞는 장식이 생기는 것이다. 중니(仲尼, 공자)는 “체(禘) 제사에서 강신주를 따른 뒤로부터는 내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주(周)나라가 쇠한 이후 예악이 황폐해지고 무너져 위아래가 서로 멀어지니, 관중(管仲)의 집에서는 삼귀(三歸)를 함께 갖출 정도였다. 법을 따르고 정도를 지키는 자는 세간에서 모욕을 당하는 반면에 사치스럽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고 상하의 구분을 두지 않는 자는 잘 나가고 영광을 얻는다고 했다.
자하(子夏)로부터 (공자의) 문인들 중 높은 제자들도 “밖에 나가서는 번화하고 화려한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들어와서는 부자의 도를 듣고 즐거워하여,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서로 싸워서 스스로 결단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 하물며 평범한 자들은 점점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세간의 풍속에 감화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자는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겠다.”고 했으나 위(衛)나라에 있을 때는 마음 같지 않았다. 공자가 죽은 후에 그의 도를 이어받은 무리들은 묻혀 사라져 쓰이지 않거나 제(齊)나라, 초(楚)나라로 가거나 강이나 바다로 가버렸으니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는가?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육국의 예제 가운데 좋은 것을 채택하니 비록 성군이 만든 예제와는 맞지 않았으나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추어 조정의 질서를 가지런히 한 것은 옛날과 같았다.
고조(高祖)에 이르러 사해를 영토로 삼고, 예제는 숙손통(叔孫通)이 더 하고 덜어 낸 바가 있었으나 대체로 진나라의 옛 제도를 이어받았다. 천자의 칭호부터 아래로 모든 관료와 궁실과 관명에 이르기까지 바꾼 것이 적었다. 효문제(孝文帝)가 즉위하고 담당 예관이 상소를 올려 의례를 정하려 했다. 효문제는 도가(道家)의 학문을 좋아하여, 예를 번다하고 모양을 꾸미는 것이 다스림에 도움이 되지 않고 몸소 교화하면 어떠냐고 여겨 파기해버렸다.
효경제(孝景帝) 때에는 어사대부(御史大夫) 조조(晁錯)가 세상의 일과 형명(刑名)에 밝아, 여러 번 효경제에게 “제후국이 병풍처럼 조정을 보필하며 신하가 되는 예는 고금의 제도였습니다. 지금의 제후국 가운데 큰 나라는 자기 멋대로 정치를 행하고, 조정에 고하지도 않으니 후세에 법도가 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라고 아뢰었다. 효경제가 그의 계책을 쓰자 육국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조조를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삼았다. 천자가 조조를 죽여 난국을 해결하였다. 이 사건은 <원앙조조열전>에 기록되어 있다. 이후 관리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녹봉(祿俸)에 안주하면서 감히 다시 논의하지 못했다.
지금의 주상이 즉위하여 유학자들을 초청해 함께 의례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10여 년이 되도록 완성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태평하여 만민이 화합하고 기뻐하여 상서로운 감응이 두루 이르러서 풍속을 모아 예제를 정했다.’고 했다. 주상이 듣고는 어사(御史)에게 조서를 내려 말했다. ‘대개 하늘의 명을 받아 왕 노릇을 함에는 각기 흥기한 까닭이 있으니 저마다 길은 다르지만 그 귀결은 같은데, 이를테면 백성의 뜻과 풍속을 따라 예제(禮制)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의논하는 자들은 모두 태고의 예제를 말하는데, 이는 과연 백성들이 바라는 것인가? 한나라 또한 한 집안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인데, 전장(典章)과 법도(法度)가 전해지지 않으면 자손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교화가 창륭하면 크고도 넓어지나, 다스림에 깊이가 없어 편협해지고 말 것이니 열심히 장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태초(太初) 원년에 정삭(正朔)과 복색(服色)을 바꾸고, 태산(太山)에서 봉선을 하고, 종묘(宗廟) 백관(百官)의 의례를 정해 통상적인 법으로 삼아 후세에 전하기로 하였다.
예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다. 하고자 했으나 얻을 수 없으면 분통함을 참을 수가 없게 된다. 분통함이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다투게 되고, 다투게 되면 분란이 일어난다.
선왕은 그 분란을 미워하여 예의를 제정하여 사람의 욕구를 기르면서 만족시켜, 욕망으로 하여금 사물에 대해서 궁핍 되지 않도록 하고, 사물로 하여금 욕망에 의해서 굴복됨이 없도록 하여 두 가지가 서로 기대어 성장하게 하였으니 이것에서 예가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는 기른다는 것이다. 벼와 기장 등의 오곡의 다섯 가지 맛은 입의 욕구를 기른다는 것이며, 호초(胡椒)와 난초 등의 향기는 코의 욕구를 기른다는 것이며, 종, 북과 관(管), 현(弦) 악기는 귀의 욕구를 기른다는 것이며, 조각과 문장은 눈의 욕구를 길러주는 것이며, 탁 트인 방과 침상의 자리 및 책상과 자리는 몸의 욕구를 길러주는 것이니, 그러므로 예는 욕구를 정당하게 길러주는 것이다.
군자가 이미 그 기르는 것을 얻고, 또 분별을 좋아한다. 이른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귀천에 등급이 있고, 연장자와 연소자의 차별이 있고, 빈부의 경중 등을 모두 일컫는다.
그러므로 천자의 대로(大路)에 풀로 자리를 만드는 까닭은 몸을 봉양하기 위한 것이며, 곁에 향기로운 향초를 두는 것은 코의 욕구를 기르는 것이며, 앞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긴 횡목(橫木)을 두는 것은 눈의 욕구를 기르는 것이며, 화란(和鸞) 소리와 천천히 걸을 때 “무(武)”와 “상(象)”의 절주(節奏)에 맞추고, 빨리 달릴 때 “소(昭)”와 “호(濩)”의 절주에 맞추는 것은 귀의 욕구를 기르는 것이며, 용을 수놓은 기(旂)와 아홉 개의 유(斿)는 믿음을 길러주는 것이며, 무소와 웅크린 호랑이, 상어가죽으로 만든 말의 복대와 황금색 용은 위엄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대로의 말은 반드시 길들여 유순해지고 난 후에 타나니, 이는 천자의 안전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누가 죽음에 처해서도 이름과 절개를 지키는 것이 양생(養生)하는 것임을 알고, 누가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재물을 기르는 것임을 알며, 누가 공경하고 사양하는 것이 편안함을 길러주는 것임을 알겠으며, 누가 예의와 문리(文理)가 정을 길러주는 것임을 알겠는가?
인간이 구차하게 살기만 바란다면,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구차하게 이익만을 얻길 바란다면, 이런 자는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다. 게으름을 편안하여 여기는데, 이런 자는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이다. 욕정이 이기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한결 같이 예의로 두 가지를 모두 얻었다. 정성(情性) 하나만을 추구하면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된다. 그러므로 유학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모두 얻게 하고, 묵가(墨家)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모두 잃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유학과 묵가의 차이이다.
[예는] 나라를 다스리고 분별하는 지극한 것이며, 나라를 강성하고 견고하게 하는 근본이다. 권위를 행하는 도리이며, 공명을 세우는 것을 총괄한다.
왕공(王公)은 이를 말미암아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를 신하로 삼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하지 않는다면 사직을 버리게 된다. 때문에 튼튼히 만든 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로써 승리를 이루기에는 부족하며, 높은 성과 깊은 연못으로도 견고하게 지키기가 부족하며, 엄격한 명령과 번다한 형벌로도 위엄을 세우기에는 부족하다. 그 도[예]를 따르면 행해지고 그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폐하게 된다.
초(楚)나라 사람들이 상어의 가죽과 무소의 가죽으로써 갑옷을 만드는데, 그 견고함은 쇠나 돌 같았다. 완(宛)의 땅에서 나오는 거대한 강철로 만든 창은 벌이나 전갈의 침과 같고 가볍고 날카로우며 민첩하기가 질풍과 같았다. 그러나 그 군대가 수섭(垂涉)에서 위태롭게 패하고, 당매(唐昧)가 죽고 말았다. 장교(莊蹻)가 일어나 초나라는 서넛으로 분열되었다. 이 어찌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가 없었기 때문인가? 그것은 통치자가 그 도의로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나라는] 여(汝)와 영(嶺)으로써 험준한 요새로 삼고, 강(江)과 한(漢)을 못[池]으로 삼고, 등림(鄧林)으로써 방어하고 방성(方城)으로써 변경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진(秦)나라의 군대가 이르자 언영(鄢郢)은 마치 마른 고목에 시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이것이 어찌 견고하고 험준한 요새가 없어서였겠는가? 그 통치자가 도를 따르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주(紂)나라가 비간(比干)의 심장을 도려내고, 기자(箕子)를 감옥에 가두었으며, 포락형(炮珞刑)을 만들어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한 형벌로 살육했다. 이때에 신하들은 모두 벌벌 떨며 목숨을 보존하기에 장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나라의 군대가 도착하자 [주(紂)의] 명령을 내려도 아래로 전해져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동원할 수가 없었다. 이 어찌 왕명이 엄격하지 못하고 형벌이 준엄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그것은 통치자가 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대의 병기는 창, 활, 화살일 뿐이었으나 적국은 그것을 사용하기도 않고 굴복했다. 성벽을 높이 쌓지도 않고, 해자(垓字)과 못을 파지도 않고 견고한 요새를 세우지도 않으며 기변(機變)을 펼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라가 평안해 외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견고했다. 그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를 밝혀 균등하게 나누고 시기에 맞게 백성을 부리고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니, 아랫사람들이 마치 그림자가 따르고 메아리가 응하는 듯 했던 것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은 다음에 그를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알게 했다. 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림으로써 온 천하가 복종하게 된 것이다. 죄인은 윗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죄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게 하였다.
이 때문에 형벌은 줄어들었는데, 위엄은 물이 흐르는 듯했으니,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그 도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도를 따르면 행해지고 그 도를 따르지 않으면 폐한다.
고대 요(堯)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대개 한 사람을 죽이고 두 사람에게 형벌을 내렸을 뿐이지만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 전(傳)에서 말했다. ‘위엄은 엄격했으나 시험하지 않았고, 형벌은 두었으나 사용하지 않았다.’
천지는 생명의 근본이고, 선조는 인류의 근본이며, 임금과 스승은 다스림의 근본이다. 천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고, 선조가 없으며 어떻게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며, 임금과 스승이 없으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사람은 편안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예는 위로 하늘로 섬기고 아래로 땅을 섬기며 선조를 존숭하고 임금과 스승을 높이는 것이니, 이것은 예의 세 가지 근본이다.
그러므로 왕이 된 사람은 태조(太祖)을 하늘에 제사 지낼 때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제후라도 감히 무너뜨릴 수가 없다. 대부(大夫)와 사(士)는 통상적인 조종(祖宗)이 있는데, 이는 귀천을 구분하는 것이고, 귀천을 잘 다스리는 것이 덕의 근본이 된다.
교(郊)에서 지내는 제사는 천자만이 행할 수 있고, 사(社)에서 지내는 제사는 제후가 행할 수 있다. 사(士)와 대부을 포함하여 각기 정해진 제도에 따라 분별을 하여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귀신을 섬기고 비천한 사람은 비천한 귀신을 섬기고, 예를 성대하게 할 것은 성대하게 하고 조촐하게 할 것은 조촐하게 하는 것이다.
고로 천하를 가진 사람은 7세(七世)를 섬기고, 한 나라를 가진 사람은 5세(五世)를 섬기며, 5승(五乘)의 땅을 가진 사람은 3세(三世)를 섬기고, 3승의 땅을 가진 사람은 2세(二世)를 섬기며, 희생(犧牲)을 하나 가진 자는 종묘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덕을 두텁게 쌓은 자는 그 흐르는 은택이 넓어질 것이고, 덕을 적게 쌓은 사람은 그 흐르는 은택이 좁을 것이다.
태향(太饗)에서 현준(玄尊, 맑은 물을 담은 그릇)을 올리고 조(俎)에 날 생선을 올리며 먼저 태갱(太羹)을 올린다. 이는 음식의 근본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태향에서 현준을 올리고 박주(薄酒)를 쓰며, 밥으로 메기장과 피를 먼저 올린 다음에 벼와 기장을 놓는다. 제사를 올릴 때 태갱을 먼저 해 입에 대고, 여러 제수 음식으로 배를 채우니, 이는 근본을 귀히 여기고 실용을 가까이하기 위함이다.
근본을 귀하게 하는 것을 일러 문(文)이라고 하고 실용을 가까이하는 것을 이(理)라고 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문식을 이룸으로써 태일(太一)로 귀결 되는데, 이를 대륭(大隆)이라고 한다.
고로 술병 준(尊)에 백주(白酒)를 올리고, 조에 날 생선을 올리며, 두(豆)에 태갱을 먼저 올리는 것은 한 가지 이치이다. 이작(利爵, 제사를 마치기 전에 고인에게 다시 한 번 헌주할 때)에 쓰는 제물을 맛보지 않고, 제사를 마친 뒤 조(俎)의 제물을 먹지 않으며, 삼유(三侑, 사자를 대신해 세운 시위 세 번 음식을 권함)를 먹지 않는 것, 대혼(大昏)에서 재계(齋戒)를 아직 폐하지 않는 것, 태묘(太廟)에서 아직 시(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사람이 금방 절명했을 때 소렴(小斂)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모두 한 가지 이치이다.
대로(大路)의 흰 장막을 하고 교(郊)를 지낼 때 삼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는 것, 상복은 먼저 산마(散麻)를 입는 것, 이것들은 모두 한 가지 이치이다. 삼년에 곡함에 소리를 꾸미지 않는 일, “청묘(淸廟)”의 노래에서 한 사람이 창(唱)하면 세 사람이 화답하여 응하는 것, 종을 하나 걸어놓고 격을 치는 것, 붉은 현(弦) 아래에 구멍을 내는 것들이 모두 한 가지 이치이다.
무릇 예는 벗어남에서 시작해 문(文)에서 이루어지고, 기뻐함에서 끝맺는다. 그래서 지극히 갖추어지면 정(情)과 문(文)을 모두 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정과 문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정(情)을 회복해 태일(太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지가 합하고 일월이 밝으며, 사시가 순서대로 돌아오고, 별들이 운행하며, 강물이 흐르고 만물이 번창하며 좋고 나쁨에 절도가 있고, 기뻐하고 노여워함에 합당함을 얻게 되는데, 아래에 있는 자는 유순해지고, 위에 있는 자는 현명해지는 것이다.
태사공은 말한다.
“지극하도다! 위대한 예(禮)를 세워 궁극의 법도로 삼으니, 천하가 덜거나 더할 수가 없구나. 본말(本末)이 서로 따르고 시작과 끝이 서로 호응하며, 지극한 문(文)으로써 분별을 가지고, 지극한 살핌으로 시비와 선악을 구분한다. 천하가 예를 따르면 다스려지고, 따르지 않으면 어지러워지니, 예를 따르는 자는 편안해지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 위태롭게 될 것이니 소인은 본받기가 어렵다.
예의 모양은 실로 깊어서 견백동이(堅白同異)의 설과 같은 성찰도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약해진다. 그 모습이 실로 원대하여 함부로 전장(典章)을 짓는 편협하고 비루한 설은 들어가면 바라만 볼 뿐이고, 그 모습이 실로 높아 난폭하고 오만하며 방자하여 습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고고하다고 여기는 무리들은 예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추락하고 말 것이다.
고로 실로 먹줄을 펼치면 그 굽거나 바른 것을 속일 수가 없고, 저울에 메달기만 하면 그 가볍고 무거움을 속일 수 없으며, 규구(規矩, 곱자와 그림쇠)를 놓기만 하면 모남과 둥근 것을 속일 수 없고, 군자가 예로 살피게 되면 거짓과 허위로써 속일 수가 없다. 고로 먹줄은 곧음의 지극함이요, 저울은 평평함의 지극함이요, 규구는 모난 것과 둥근 것의 지극함이요, 예는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의 지극함이다.
그러나 예를 법도로 삼지 않으면 예라 하기가 부족하니 이런 것을 말하여 단정함이 없는 백성이라 하고, 예를 법도로 삼으면 예라고 하기에 족하니, 그것을 말하여 단정함이 있는 선비라고 한다. 예에 들어가면 사색을 능해지는데, 이를 일러 능려(能慮)라고 하고, 능려는 바꾸지 않으니, 이를 일러 능고(能固)라고 한다. 능려와 능고를 더하게 좋아하는 경지가 되면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다. 하늘은 높은 것의 극치이고, 땅은 낮은 것의 극치이다. 해와 달은 밝음의 극치고, 무궁함은 광대함의 극치이며, 성인이란 도의 극치이다.
예는, 재물로써 쓰임을 삼고 귀천으로써 문(文)을 삼고 다소로써 차이를 삼고, 융성함과 간략한 것으로써 요체로 삼는다. 문(文)의 모양은 번다하나 정욕(情慾)은 간략한 것이 예의 융성함이다. 문의 모양이 간략하고 정욕은 번다한 것이 예가 쇠한 것이다. 문의 모습과 정욕이 서로 안과 밖으로 표리를 이루고, 병행하여 뒤섞이는 것, 이것이 예의 마땅한 흐름이다. 군자는 위로 융성함에 이루고, 아래로 그 간략함을 다해 그 마땅한 곳을 처하는 것이다. 천천히 걷거나 빨리 달리거나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군자의 성(性)은 마치 궁정(宮庭)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이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야할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니 이곳에 사는 사람은 선비와 군자요, 그 밖에 사는 사람은 평민이다. 이 가운데에 처하여 두루 들고 나고 언행거지가 그 차례를 곡진히 하는 것은 성인이다. 그러므로 후덕한 것은 예의 쌓임 때문이며, 원대한 것은 예의 넓음 때문이며, 숭고한 것은 예의 융성함 때문이며, 고명한 것은 예의 곡진함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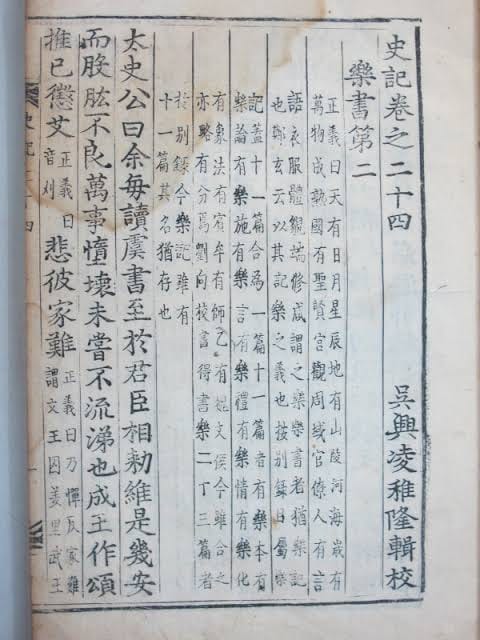
2. 악서(樂書)
사마천 사기-서(書)의 두 번째 기록으로 악서(樂書)는 음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기지의'(史記志疑)에서는 현전 ‘악서’를 ‘예기’의 ‘악기’ 편을 참조해 후대에 새로 쓴 것으로 본다.
– 악서(樂書)
태사공은 말한다.
“나는 매번 『서경(書經)』 「우서(虞書)」를 읽을 때마다 군주와 신하가 서로 경계하고 격려하는 대목에 이르면 오직 그 안위를 생각했고, 자신이 팔 다리처럼 믿고 중히 여기는 신하들이 불량하여 만사가 허무하게 무너졌을 때에 일찍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주(周)나라 성왕(成王)은 관채(管叔)와 채숙(蔡叔)의 난으로 인해 『주송(周頌)』 「소비(小毖)」편을 지어 스스로 환난을 다스리지 못한 책임을 자책했고, 나라에 재난을 가져오게 한 것을 슬퍼했다. 이는 전전긍긍하는 자세로 두려워하며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하고 했던 것이 아닌가?
군자는 빈궁하다고 하여 덕(德)을 닦지 않거나 부유하다고 하여 예(禮)를 버리지 않으며 몸이 편안할 때에는 처음의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며, 안락할 때는 처음에 힘겹게 시작했던 것을 생각한다. 기름진 연못에서 목욕을 하더라도 근면함과 지난날의 고초를 노래로 만들어 읊었으니, 큰 덕(德)을 지니지 아니하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시경』 「모씨전(毛氏傳)」에 이르기를 ‘정치가 안정되고 공적을 성취하면 예(禮)와 악(樂)이 저절로 흥하게 된다.’라 했다. 천하 사람들의 도(道)가 더욱 깊어지면 그 덕이 더욱 지극해져서 음악 또한 더욱 달라지게 된다. 가득 찼을 때 덜어내지 않으면 넘치고, 넘칠 때 붙잡아주지 않으면 뒤집어지게 된다. 무릇 음악을 만든 까닭은 음악으로써 사람들의 쾌락을 절제하기 위한 것이다.
군자는 겸손하게 물러나는 것으로써 예를 삼으며, 스스로 사욕을 덜어내고 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으니 음악이란 이런 것이다.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특수하여 인정과 습속이 같지 않다. 때문에 널리 풍속을 채집하고 지방마다의 성률을 비교하여 음악을 만들어야지 시대의 폐단을 보충하고 풍속을 바꾸어 정치와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천자가 몸소 명당(明堂)에 나아가 감상할 뿐 아니라 만백성들이 사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고, 포만한 여부를 헤아리면서 본성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고로 『시경(詩經)』의 「아(雅)」, 「송(頌)」같은 음악을 들으면 백성들이 바르게 되고, 우렁차 격앙된 소리는 선비들의 마음을 격분하게 만들고, 정(鄭)나라와 위(衛)나라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음란해진다. 음악이 조화를 이루어 화합하는 경지에 이르면 날짐승이나 길짐승도 모두 감화를 받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가슴에 속에 오상(五常)을 품고, 좋고 싫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다.
다스리는 도가 어지러워지자 정나라 음악이 흥기했고, 정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땅에 분봉을 받거나 세습 받은 명망(名望)있는 군주들도 서로 앞을 다투어 정나라의 음악을 서로 높이게 되었다. 공자(孔子)는 제(齊)나라에서 바친 여악(女樂)을 노(魯)나라에서 받아들인 일을 못 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비록 물러나서 음악을 바로잡고 세인들을 계도하고 오장(五章)의 악가를 지어 시정을 풍자했지만 결국 당시의 사람들을 감화시키지 못했다. 이처럼 점차 음락이 쇠락해져 6국 시대가 되자 군왕들은 가무와 성색(聲色)에 깊이 미혹되어 스스로 헤어나지 못한 나머지 결국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몸은 죽어 없어지고 종묘사직은 소멸되어 진(秦)나라에 병탄되고 말았다.
진나라 2세 황제는 특히 노래를 오락으로 삼았는데, 승상 이사(李斯)가 진언하여 간했다. “『시경』과 『상서』를 버리고 성색(聲色)에 탐닉하는 행위는 옛날 상나라 때 조이(祖伊)가 두려워했던 바입니다. [주왕(紂王)은] 작은 잘못이라도 쌓이면 재앙이 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방자한 마음으로 날을 지새우며 향락에 젖었기 때문에 주왕은 망했던 것입니다.”
이에 조고(趙高)가 말했다. “오제(五帝)와 삼왕(三王)의 음악은 각기 그 명칭이 다른데, 이는 피차간에 음악을 서로 계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위로는 조정에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음악으로 환희를 느끼고 은근한 뜻을 융합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았더라면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마음이 서로 통하지 못하고, 은택은 아래의 백성들에까지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한 시대의 풍습으로 그 시기에 알맞은 음악일 뿐인데, 무엇 때문에 화산(華山)의 녹이(騄耳)를 얻은 후에야 먼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까?” 2세 황제는 그 말이 옳다고 여겼다.
고조(高祖)가 고향 패현(沛縣)을 지나다가 ‘삼후지장(三侯之章)’이라는 시를 지어 동자들에게 따라 부르게 했다. 한 고조가 붕어하자 패현에서는 사시(四時)로 종묘에 제사를 올리고 노래와 함께 춤을 추게 하였다. 혜제(惠帝), 문제(文帝), 경제(景帝) 동안 아무것도 바꾸거나 더하지 않았고, 다만 악부(樂府)의 악공들로 항상 연습하여 옛 것을 익히게 했을 따름이었다.
지금의 황상(한 무제)께서 즉위하자 19장의 악곡을 지어 시중(侍中) 이연년(李延年)으로 하여금 차례대로 곡조를 붙이게 하고, 그를 협률도위(協律都尉)에 임명했다. 한 가지 경전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그 가사를 해석할 수 없었기에 오경(五經)의 전문가를 모두 소집해 서로 같이 강독을 통하여 익히게 한 뒤에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가사의 대부분은 참으로 전아(典雅)한 문장이었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정월 상순(上旬) 신일(辛日)에 감천궁(甘泉宮)에서 태일신(太一神)에게 제서를 자냈는데, 날이 저물 무렵부터 시작해서 밤을 지세우고 날이 밝을 때에야 마쳤다. 이때는 통상적으로 유성(流星)이 제단 위를 지나갔다. 그래서 동남동녀(童男童女) 70명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봄에는 ‘청양(靑陽)’, 여름에는 ‘주명(朱明)’, 가을에는 ‘서호(西皞)’, 겨울에는 ‘현명(玄冥)’을 부르게 했다. 이 노래들은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까닭에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또 황상께서는 일찍이 악규수(渥洼水)에서 신마(神馬)를 얻자 다시 그 일을 위해서 태일지가(太一)의 노래는 지었다. 그 가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태일신이 보내주셔서 천마(天馬)가 내려왔다네. 붉은 땀에 젖어서 그 땀방울로 땅까지 붉게 물들었구나! 거침없이 내달려 만 리를 뛰어넘으니, 오늘 누구와 짝을 할까? 용이라면 벗이 될 수 있겠지.”
후에 대원(大宛)을 정벌해 천리마를 얻었는데 말 이름을 포초(蒲梢)라고 짓고 다시 노래를 지었다. “천마가 왔도다, 서쪽 끝에서! 만리를 달려와 덕(德)이 있는 자에게 돌아왔다네. 신령스런 위엄을 계승하여 외국을 항복시키고, 사막을 넘어서 사방의 오랑캐가 복종시켰다네.”
그러자 중위(中尉) 급암(汲黯)이 진언했다. ‘무릇 제왕이 음악을 짓는 것은 위로는 조종을 뜻을 계승하고 아래로는 억조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함인데, 지금 폐하께서 말을 얻으셨다 하여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종묘에서 연주하게 하시니, 선제(先帝)와 백성들이 어찌 그 음악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황상은 아무 말도 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승상 공손홍(公孫弘)이 말했다. “급암은 성상의 만든 뜻을 비방했습니다. 멸족의 죄에 해당합니다.”
무릇 음(音)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외물(外物)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물의 감응을 받아 마음이 움직이면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그 소리에 서로 상응함으로써 변화가 생기게 되고, 변화가 일정한 방법과 규칙을 갖추게 되면 음(音)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다.
음을 박자에 맞추어 악기를 연주하고, 간척(干戚)과 우모(羽旄) 등을 듣고 춤을 추면 이를 악(樂)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다. 악이란 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니, 그 근본은 사람의 마음이 외물에 의해 감동을 받아서 그리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슬픈 마음에 감응하면 그 소리가 다급하며 슬프고, 즐거운 감정에 감응하면 그 소리가 기꺼워하며 느리고, 희열의 감정에 감응하면 그 소리가 탁 트이고 경쾌하다. 분노하는 감정에 감응하면 그 소리가 거칠고 사나우며, 경애하는 감정에 감응하면 그 소리가 곧고 장중하며, 사랑의 감정에 감응하면 그 소리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 여섯 가지는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외물로부터 감동을 느낀 후에 움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옛날의 선왕(先王)들은 그 감정을 일으키는 까닭을 중하게 여겼다. 고로 예절로써 사람들의 뜻을 이끌었고, 악(樂)으로써 사람들의 소리를 조화시켰으며, 정치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로 만들었으며, 형벌로써 사람들이 간사해지지 않게 방비했다.
예절과 음악, 형벌과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이니, 이것으로써 민심을 하나로 만들어 올바른 도리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릇 음(音)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사람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움직이면 소리로 나타나며, 그 소리에 일정한 문식을 가하게 되면 이를 음(音)이라 한다. 고로 치세의 음악은 편안하고 즐거우니, 그 정치가 조화롭기 때문이다.
난세의 음악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분노에 차 있으니, 그 정치가 어그러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망국의 음악은 슬픔과 근심에 가득 차 있으니, 그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하다는 것이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성음(聲音)의 도는 정치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궁(宮)은 군자를 위한 것이고, 상(商)은 신하를 위한 것이며, 각(角)은 백성을 위한 것이요, 치(緻)는 일을 위한 것이요, 우(羽)는 외물(外物)를 위한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음이 어지럽게 되지 않으면 조화되지 않는 음이란 없을 것이다.
궁음(宮音)이 어지러워지면 황폐하지니 그 군주는 교만을 드러낼 것이고, 상음(商音)이 어지러워지면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니 신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요, 각음(角音)이 어지러워지면 근심스러워져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될 것이며, 치음(徵音)이 어지러워지면 슬픔에 젖으니 부역이 너무 고되기 때문이요, 우음(羽音)이 어지러워지면 그 소리가 위태로워지니 재화가 부족하게 된다. 오음(五音)이 모두 어지럽게 되면 서로 번갈아 가며 침범하고 짓밟게 되니, 이를 만(慢, 방종)이라고 이른다.
이와 같으면 조만간 나라의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정(鄭)나라와 위(衛)나라의 음악은 난세의 음악이니 곧 방종에 가깝다. 상간(桑間)과 복상(濮上)의 음악은 망국의 음악이니, 그 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은 유랑하게 되며 신하가 윗사람을 속이고 각기 사사로운 이득만 생각해 멈출 수 없게 된다.
무릇 음(音)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악(樂)이란 윤리에 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리를 알고서 음을 모르는 것은 금수이고, 음을 알고서 악(樂)을 모르는 것은 대부분 서민들이다. 오직 군자만이 악(樂)을 알 것이다. 이 때문에 소리를 살핌으로써 음을 알고, 음을 살핌으로써 악(樂)을 알고, 악을 살핌으로써 정치를 알게 되니,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구비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리를 모르는 자와는 더불어 음을 말할 수 없고, 음을 모르는 자와는 더불어 악(樂)을 말할 수 없다.
악(樂)을 알면 예(禮)를 안다고 할 수 있고, 예(禮)와 악(樂)을 모두 터득한 사람을 일러 덕(德)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덕이란 터득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악이 성대하더라도 반드시 가장 좋은 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종묘제례인 식향(食饗)의 예가 가장 맛있는 음식만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청묘(淸廟)에 쓰이는 거문고는 붉은 줄에 구멍이 성성할 뿐이고, 연주할 때는 한 사람이 앞서 선창하면 세 사람이 따라 부를 뿐이지만 그 여음(餘音)은 끝이 없다. 태향(大饗)의 예는 현주(玄酒)를 올리고 비린 생선을 제기에 담아두며, 태갱(大羹)은 특별한 간을 하지 않았으나 그 뒷맛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때문에 선왕이 예악을 제정한 목적은 사람들의 입과 배, 이목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백성들에게 좋고 싫은 감정을 조절하도록 가르쳐주어서 사람들을 정도(正道)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정적(靜的)인 것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다. 외물에 감동을 받아 마음이 움직이면 천성적으로 칭송하게 된다.
외물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게 된 후에는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형성된다. 좋고 싫은 감정을 마음속에서 절제되지 못하면 외물로부터 유혹을 당하여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없고, 하늘의 이치도 없어지고 말 것이다.
외물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끝이 없으므로 사람의 좋고 싫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외물이 지극하게 되어 사람은 외물에 동화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하늘의 도리는 없어지고 사람의 욕망도 끝나고 만다. 그래서 순리에 거슬리고, 속일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음란하고 안락한 생활에 빠져 난을 일으키려는 일이 생긴다. 이 때문에 강자는 약자를 협박하고 다수는 소수를 폭압하며 지식이 있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고, 용맹한 자는 나약한 사람을 못살게 굴고, 병든 자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노인, 어린이, 고아 과부들이 몸 붙일 곳이 없게 되니 이것은 큰 혼란으로 가는 길이 된다.
이 때문에 선왕이 예악을 제정한 것은 사람들을 절제시키기 위함이었다. 마로 지은 상복(喪服)을 입고 곡읍(哭泣)을 하는 것은 상사(喪事)의 규모를 절제하기 위한 것이고, 종(鐘)과 북의 음과 방패와 도끼 등의 춤을 추는 것은 조화와 안락을 위한 것이다. 혼인과 관계(冠笄)의 제도를 행하는 것은 남녀를 구별하기 위함이며, 사향(射鄕)이나 술과 음식으로 빈객을 상대하는 것은 교제와 접대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禮)는 백성들의 마음을 절제하게 하는 데에 있고, 악(樂)은 백성들의 소리를 조화롭게 하는 데에 있으며, 정치(政治)는 정령을 시행하게 하는 데에 있고, 형벌(刑罰)은 나쁜 일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예와 악과 형벌과 정치, 이 네 가지에 통달하면 어그러짐이 없을 것이며, 왕도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음악(音樂)은 사람들을 동화시키고, 예는 사람들을 유별하게 만든다. 동화되면 서로 친하게 되고, 유별하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음악이 지나치면 방종하게 할 수 있고, 예가 지나치면 소원해진다. 감정을 화합하게 하고, 외모를 단정하게 꾸미는 것은 예와 악이 하는 일이다.
예의가 확립되면 귀천 간에 등급이 있게 되고, 음악의 문채가 같게 되면 상하가 화합할 수가 있다. 좋고 싫음이 드러나면 현명한 자와 불초한 자가 분명히 구별된다. 형벌로써 포악한 일을 금지시키고 작위로 현명한 자를 천거하면 정치는 고르게 될 것이다.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의로써 바르게 세울 수 있다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악(樂)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禮)는 겉모습에서 일어난다. 악은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요하며, 예는 겉모습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꾸미게 된다. 대악(大樂)은 반드시 평이하고, 대례(大禮)는 반드시 간소하다. 악이 지극하면 원한이 없어지고, 예가 지극하면 위아래가 서로 다투지 않는다.
읍하고 겸양하여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예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포악한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고 제후들이 공손히 복종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오형(五刑)을 쓸모가 없게 되면 백성들은 근심이 없어지고 천자는 노여워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이 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여 화합하고, 장유의 질서가 분명해지고 천하의 백성들이 서로 존경하게 된다. 천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에 예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대악(大樂)은 천지와 더불어 같이 화합하게 하고, 대례(大禮)는 천지와 더불어 같이 절도를 지키게 한다. 화합하게 되므로 만물이 본성을 잃지 않고, 절도를 지키게 하기 때문에 천지에 제사를 올릴 수 있다.
이승에는 예악이 있고, 저승에서는 귀신이 있으니, 이와 같아야 천하의 백성들이 화합하고 공경하며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예라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경하는 것이다. 악(樂)이란 다른 문식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는 것이다.
예악에 대한 사람들의 성정이 같기 때문에 현명한 왕들은 서로 전례를 쫓았다. 그러므로 당시 예악은 시대와 서로 부합되며, 명성은 이룩한 공덕과 상응했다. 고로 종(鐘), 고(鼓), 관(管), 경(磬), 우(羽), 약(籥), 간(干), 척(戚)은 악을 연주하는 악기이다.
몸을 굽히고 펴고, 하늘을 우러러 보다가 땅을 내려다보며, 잇고 끊으며 빠르고 느린 것은 악의 문식(형식)이다. 보궤(簠簋, 중국 고대의 예기(禮器). 보(簠)는 외방내원(外方內圓), 궤(簋)는 외원내방의 용기), 조두(俎豆, 제기), 제도나 문장은 예를 행할 때 쓰는 도구요, 당(堂)에 오르내리고 윗옷을 벗어 어깨를 들어내 놓고, 겉옷을 걸치는 등의 행위는 예의 형식이다. 고로 예악의 감정을 아는 자는 능히 예악을 만들 수 있고, 예악의 형식을 아는 자는 능히 예악을 서술할 수 있다.
(예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성(聖)스럽다고 말하고, (예악을) 서술할 수 있는 사람은 사리에 밝다고 말한다. 사리에 밝거나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예악을) 서술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악(樂)이란 천지의 조화이며, 예(禮)는 천지의 질서이다. 서로 화합하므로 만물이 융화되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만물이 구별된다. 악(樂)은 하늘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예(禮)는 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 예악이 잘못 만들어지면 어지러워지고 흉폭하게 된다.
천지의 이치에 밝아야 예악을 일으킬 수 있다. 윤리를 논하면서 해가 없게 하는 것이 음악의 정서이고, 기쁨을 느끼고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악(樂)의 작용이다.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고 바라서 사악함이 없는 것이 예(禮)의 본질이고, 장중하고 공경하며 공손하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禮)를 제정했다. 만약 예악을 시행하는데, 금석으로 만든 악기를 쓰고 성음(聲音)으로 표현되고, 종묘사직에서 산천과 귀신을 섬긴다면 이것은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하는 것 된다.
제왕이 공을 이루고 나면 악(樂)을 만들고, 다스림이 안정되고 나면 예의를 제정한다. 그 공적이 크면 악(樂)도 완비되고, 그 다스림이 분명하면 예(禮)도 구체적이다. 방패와 도끼를 들고 춤춘다고 해서 악(樂)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희생을 끓이고 익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예(禮)가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오제(五帝)는 각기 다른 시대로서 서로의 악(樂)을 서로 따르지 않았으며, 삼왕(三王) 시대는 세상사가 달랐으므로 서로의 예제(禮制)를 계승하지 않았다.
악(樂)이 극단에 이르면 우환이 생기고, 예(禮)가 너무 조악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악(樂)은 돈독해야 우환이 생기지 않고, 예(禮)는 두루 갖추어져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니, 이를 성취한 자는 오직 대성(大聖)뿐일 것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만물은 흩어져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禮)가 만들어져 행해지는 것이다. (음과 양의 두 기운이) 교류하며 쉼이 없으면서 합해져 동화되어 악(樂)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봄에 생겨나고 여름에 성장하는 것을 인(仁)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의(義)가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
인은 악(樂)에 가깝고, 의는 예(禮)에 가깝다. 음악은 화합을 돈독하여 신을 거느리고 하늘의 뜻을 따르며, 예제는 분별을 의당한 것으로 삼았으니, 귀신을 함께하여 땅의 뜻에 따른다. 고로 성인은 악(樂)을 만들어 하늘의 뜻에 응했고, 예(禮)를 제정해 땅의 뜻에 짝지우니, 예악이 밝게 갖추어짐으로써 천지가 제자리를 찾아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비천하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도 하늘의 존귀와 땅의 비천과 같이 정해진다. 높고 낮은 것이 이미 드러나 있듯이 귀천의 지위도 정해진 것이다.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상규(常規)이고 작고 큰 것마다 다름이 있다.
사람은 같은 무리끼리 모이고 사물은 같은 부류끼리 나뉘는데, 각기 성명(性命)이 다르다. 하늘에는 [일월성신 등의] 상(象)을 이루고, 땅에는 [산천초목과 인물들이] 형상으로 이루니, 이것은 바로 예(禮)란 천지의 구별과 같은 것이다.
땅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하늘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와 음양이 서로 어울리고, 하늘과 땅이 서로 움직이고 부딪치면 우레와 천둥이 치고, 떨치면 비와 바람이 되며, 움직임에 따라 사시(四時)가 생긴다. 해와 달은 따뜻하게 해주고 만물을 변화 성정시킨다. 이와 같이 악(樂)은 천지의 화합을 본받은 것이다.
만물은 때에 맞지 않게 변화하면 생육을 멈추고, 남녀 간의 구별이 없으면 큰 혼란을 야기된다. 이것은 천지의 정서인 것이다.
예악이 극에 달하여 하늘에 이르고 땅에 두루 서려지고, 음양에 따라 행해지면 귀신과 통함이 있으니, 지극히 높고도 먼 곳은 물론이고 심후한 곳까지 헤아릴 수 있다. 악(樂)은 천지개벽 이전의 혼돈(混沌)의 시대에서부터 나왔고, 예(禮)는 만물이 성립된 뒤에 생겨났다. 드러났으나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고, 드러났으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땅이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정지하는 것이 천지사이의 만물이다. 고로 성인은 “악(樂)은 종고(鐘鼓)를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예(禮)는 옥백(玉帛)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한 것이다.
상고시대 순(舜)임금은 오현금(五弦琴)을 제작하여 ‘남풍(南風)’을 노래했고, 기(夔)는 처음 악(樂)을 만들어 제후들로 하여금 감상하도록 했다. 고로 천자는 악(樂)을 만들어 제후들 가운데 덕 있는 자에게 감상하게 하였다.
덕행이 성대하고 교화를 존엄 있게 잘 시키며 오곡이 때맞추어 무르익은 연후에야 천자는 그 제후에게 악(樂)을 감상하도록 했다. 고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수고롭게 하는 자는 춤추는 사람들의 행렬이 길었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안일한 자는 춤추는 사람들의 행렬이 짧았다. 고로 춤추는 것을 그 제후의 덕을 알 수 있었고, 시호(諡號)를 들으면 그 행실을 알 수 있었다. ‘대장(大章)’은 요(堯)임금을 밝히는 뜻이 있고, ‘함지(咸池)’는 황제(黃帝)의 덕이 완미(完美)했음을 뜻한다. ‘소(韶)’는 순임금이 요(堯)임금의 미덕을 계승했다는 뜻이고, ‘하(夏)’는 우(禹)임금이 요임금과 순임금의 공덕을 크게 높인 것을 뜻한다. 은나라와 주나라의 악(樂) 당시의 실상을 모두 드러낸 것이다.
하늘과 땅의 도리는 추위와 더위가 때에 맞지 아니하면 질병이 생기고, 비바람이 절기에 맞지 아니하면 굶주리게 된다. 음악으로 교화시킨다는 것은 백성에게는 추위나 더위와 같아서 가르침이 시세(時勢)에 맞지 않으면 세상이 상(傷)하게 된다. 예법의 일이란 백성에게는 비바람과 같다. 예법의 일에 절도가 없으면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한다. 고로 선왕은 천지의 도를 본받아 악(樂)을 만들고, 예(禮)로 다스는 법으로 삼았는데, 잘 시행하면 모두 그 덕을 본받아 행했다.
대개 돼지를 길러서 술안주로 삼는 것은 화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송이 더욱 번잡해진 것은 술을 잘못 마셔서 생긴 화이다. 때문에 선왕은 주례(酒禮)를 만들어서 한번 술을 마실 때마다 빈객과 주인이 자주 예(禮)를 행하게 하여 하루 종일 술을 마셔도 술에 취하지 않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선왕이 술에 취해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대비한 것이다.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은 기쁨을 더불어 나누는 것이 되었다.
악(樂)은 덕을 본받기 위함이고, 예(禮)는 음란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선왕은 대사(大事), 즉 상(喪)을 당하면 반드시 상례로써 애도를 표했으며, 큰 복(福)이 있을 때도 반드시 예(禮)로써 그 기쁨을 표현했다. 애도와 기쁨은 구분이 되나 모두 예(禮)로써 마무리를 했다.
악(樂)이란 베푸는 것이고, 예(禮)는 보답하는 것이다. 악(樂)은 즐거움이 생기는 바를 표현한 것이고, 예(禮)란 처음 시작한 바로 돌아가는 것이다. 악(樂)은 공덕을 표창하기 위함이고, 예(禮)는 은정에 대한 보답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른바 대로(大路)란 천자가 타는 수레이고, 용기(龍旂)와 구류(九旒)는 천자의 기치요, 청색과 흑색 가선을 두른 것은 천자의 보귀(葆龜, 점복(占卜)의 용구)요, 소나 양이 무리를 이끄는 것은 모두 천자가 제후에게 보낼 하사품이다.
악(樂)이란 감정이 드러낸 것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예(禮)란 윤리를 표현된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악(樂)은 (사람들의 감정을) 동일하게 통일시킨 것이고, 예(禮)는 (사람들의 존비에 따라) 분별과 차이를 두는 것이니, 예악의 학설은 사람들의 감정을 관통하는 것이다. 근본을 궁구하여 변화되는 것을 아는 것이 악(樂)의 본뜻이다. 진실을 드러내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 예의 이치이다. 예악은 하늘과 땅의 정성에 순응하고, 신명(神明)의 덕에 통달해 위아래의 신을 흥기시켜 강림하게 만들고, 은미하고 쉬운 이치가 응결되어 군신부자가 각자 예절에 정성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다.
고로 대인(大人, 성인)이 예악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장차 천지에 밝아지는 것이다. 천지가 기쁘게 결합하고, 음양이 서로 얻는 것이 있으면 마치 따뜻한 할미 같은 천지가 만물을 덮어 키우게 된다. 그런 후에 초목이 무성해지고 작물이 싹을 틔우며, 날짐승은 힘껏 하늘을 날고, 가축은 쑥쑥 뿔이 자란다. 동면하던 곤충이 깨어나며, 날짐승들은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르며 털 짐승들은 잉태하여 새끼를 품는다. 태생동물이 사산하지 않고 난생동물은 알을 터드려 죽는 일이 없게 되니, 곧 이 모든 것은 악(樂)의 도(道)로 귀결된다.
악(樂)이란 황종(黃鐘)과 대려(大呂),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하고 간양(干揚)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악(樂)이 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자들로 하여금 춤추게 한 것이다.
주연(酒筵)을 베풀면서 술과 안주를 차려놓고 변두(籩豆) 위에 과일과 국을 쌓아놓고 당 위로 올리고 섬돌 아래로 내리고 하면서 예의로 삼는 것도 예(禮)의 말단에 불과하다. 이런 일은 유사(有司)에게 맡기면 된다.
악사는 악곡과 가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군주의 아랫자리에 앉아 현악기를 연주하고, 종축(宗祝)은 종묘의 예(禮)를 잘 분별하기 때문에 후시(後尸)의 일을 도왔고, 상축(商祝)은 상례를 잘 분별했기 때문에 후주인(後主人)이 되어 상주를 도왔다. 이 때문에 덕을 성취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禮)를 성취하는 것은 그 뒤의 일이다. 또 덕행을 성취하는 것이 우선이고, 일이 처리는 그 뒷일이다.
고로 선왕은 상하(上下), 선후(先後)를 분명히 한 후에 천하에 예악을 제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악(樂)은 성인(聖人)이 즐기는 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을 감동시켜 깊은 데에 이르게 하고 풍속을 옮기어 바꿀 수도 있다. 고로 선왕은 드러내놓고 가르침을 펼쳤다.
대개 사람에게는 혈기와 심지(心知)의 본성이 있으나 희로애락에 대한 일정한 모습을 보기 어렵다. 외물에 감응해 움직인 연후에 심술(心術)이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뜻이 미약하고 초췌하며 쇠한 음을 만들면 백성들이 근심스럽게 생각하고, 느슨하고 부드럽고 완만하고 평온하여 문채가 많으면서 가락이 간략한 음악이 만들어지면 백성은 편안하고 즐거워한다. 거칠고 사납게 일어나 격분하는 듯하고 끝에 가서 광대하면 분격하는 음이 만들어지면 백성은 강하고 굳세어진다.
청렴하고 곧고 올바르며, 장중하고 성실한 음이 만들어지면 백성은 엄숙하고 공경해진다. 너그럽고 여유가 있으며, 유순하고 조화로우며 활동적인 음이 만들어지면 백성들은 자애로워진다. 편벽되고 사악하며 산만하여서 빠르고 들떠 있으며 마치 물로 물건을 씻어서 물이 물에 스며들듯 한계가 분명치 않은 음악이 만들어지면 백성들은 음란(淫亂)해진다.
이 때문에 선왕은 성정(性情)에 바탕을 두고 도수(度數)를 상고하며, 예의를 만들어서 생기(生氣)의 조화를 모으고 오상(五常)의 행실을 이끌면서 양기(陽氣)는 흩어지지 않게 하고 음기(陰氣)는 밀폐되지 않게 하며, 강한 기운을 노하지 않게 하고 유순한 기운은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
[음양강유의] 네 가지 기운이 소통하여 마음속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타나 모두 그 자리에 안정되어 서로 빼앗지 않게 된다. 그런 후에야 학등(學等, 학습자의 등급)을 세우고 그 절주를 넓히며 그 문채(文采)를 살피고 후덕함을 법도로 삼았다. 음률의 크고 작은 명칭을 규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차례를 정했으며 일과 행실의 본이 되게 하고 친밀한 자와 소원한 자, 귀한 자와 천한 자,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의 도리가 모두 악(樂)에 표현되게 하였으니, 고로 악(樂)은 사람이 관찰할 때에 그 깊이가 더욱 깊어진다고 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토양의 힘이 다하면 초목이 자라지 못하고, 물이 시끄러우면 고기가 크지 않으며, 기가 쇠하면 생물이 자라지 못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예(禮)가 사특해지고 악(樂)이 음란해진다. 이 때문에 그 소리가 애달프면서 장중하지 못하고 즐거워하나 편안하지 못하다. 거만하고 가벼워서 절도를 범하고, 방종하여 그 근본을 잊는다. 넓으면 간사함을 용납하게 되고, 좁으면 탐욕을 생각하게 되어, 유려하고 조리 있는 기운을 상하고 평화의 덕을 소멸시킨다. 그래서 군자는 이를 천시하는 것이다.
무릇 간사한 소리가 사람을 감응시키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기운이 호응해 나타나고, 거슬리는 기운이 형상을 이루면 음란한 음악이 일어난다. 바른 소리가 사람을 감응케 하면 순한 기운이 이에 응하고, 순한 기운이 형상을 이루면 온화한 음악이 일어난다. 부르고 화답하는 것이 응함이 있어 굽고 사특한 것과 곧은 것 간에 각기 구분이 생기니, 만물의 이치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바른 감성으로 돌아가서 그 뜻을 조화시키고, 부류와 자신을 비교하고 행실을 이룬다. 간사한 소리나 음란한 색채가 자신의 총명을 가리지 않게 하고, 음란한 음악과 사특한 예가 마음에 접하게 않게 하고, 게으르거나 사악한 기운이 몸에 물들지 않게 하며, 귀·눈·입·코와 마음 및 몸으로 하여금 모두 순정함을 따르게 하며 그 의(義)를 행하게 한다.
그런 후에 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거문고와 비파로 연주하고 방패와 도끼를 가지고 춤을 추며 새의 깃으로 꾸미고 퉁소와 피리로 반주하여 지극한 덕의 빛을 떨치게 하고, 사기(四氣)의 조화로움을 움직여 만물의 이치를 드러낸다.
이 때문에 격조가 청명한 것은 하늘을 상징한 것이고, 넓고 큰 것은 땅을 상징한 것이다. 끝나고 시작하는 것은 사시(四時)를 상징한 것이고, 빙글빙글 회전하는 바람과 비를 상징한 것이다.
오색(五色)의 무늬(또는 곡조)를 이루면서 어지럽지 않고, 팔풍(八風, 팔음(八音))이 성률을 따르면서도 간사하지 않으며, 백가지 절도의 수를 얻어 항상 일정함이 있다.
작고 큰 것이 서로 이루어주고, 마침과 시작이 서로 생겨나고, 선창하고 화답하는 것이나 맑고 탁한 것이 번갈아가면서 서로 법칙을 만든다. 고로 음악이 행해지면 인륜의 도리가 맑아지고, 귀와 눈이 총명해지고 혈기가 조화롭고 평탄해 지고 풍속이 바뀌어져 천하가 모두 평안해진다.
그러므로 ‘음악이란 즐거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군자는 그 도를 얻기에 즐거워하고 소인은 그 욕망을 얻기에 즐거워한다. 도로써 그 욕망을 억제하면 즐겁되 어지럽지 않고, 욕망으로써 그 도를 망각하면 의혹되어 즐겁지 않다. 이 때문에 군자는 정(情)으로 돌아가서 그 뜻을 조화시키고, 악(樂)을 넓혀서 그 교화를 이룬다. 악(樂)이 행해져서 백성은 지향할 바를 알게 되니 이로써 그 덕(德)의 실체를 볼 수 있다.
덕(德)이란 것은 성품의 단서이고, 악(樂)은 덕의 빛이다. 금석사죽(金石絲竹)은 악(樂)의 기구이다. 시(詩)는 그 뜻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는 그 소리를 읊조리는 것이며, 춤은 그 용모와 자태를 움직이는 것으로, 이 셋이 마음에 바탕으로 둔 연후에 악기(樂器)가 이를 따른다. 이런 까닭에 정(情)이 깊으면 그 문장이 밝아지고, 기(氣)가 성대하여 감화가 신묘해진다. 온화하고 양순한 덕이 안에 쌓이면 뛰어난 재능이 겉으로 나타난다. 오직 악(樂)은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악(樂)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소리는 악(樂)의 형상이다. 문채(文采), 절주는 소리를 수식한 것이다. 군자는 그 근본을 움직이고, 그 형상을 즐거워한 연후에 그 수식으로 다스렸다. 이 때문에 우선 북을 울려서 경계하고 세 번 걸음을 하여 방향을 보여 준다. 다시 시작하면 또 가는 바를 드러나고, 다시 어지러우면 물러나서 돌아오는 것을 정비한다. 동작이 지나치게 빠르지 않고 극히 그윽하나 숨기지 않는다. 홀로 그 뜻을 즐거워해서 그 도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 도를 갖추어 들어서 그 욕심을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정(情)이 들어나고 의(義)가 서고 악(樂)이 끝나고서 덕이 존중된다. 군자는 선을 좋아하고, 소인은 허물을 종식시킨다. 고로 말하길 “민생의 길에 악(樂)은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군자가 말했다. ‘예악은 잠시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 했다. 악(樂)을 극진히 해서 마음을 다스리면, 평온하고 정직하고 자애롭고 선량한 마음이 뭉클뭉클 생겨난다. 평온하고 정직하고 자애롭고 선량한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 즐거운 것이고, 즐거우면 편안하고, 편안하면 오래되고, 오래되면 하늘이고, 하늘이면 신이다. 하늘은 말은 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고, 신은 노하지 아니해도 위엄이 있다.
악(樂)에 이른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며, 예(禮)에 이르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신을 다스리면 장엄하고 공경하면 엄숙하고 위엄이 있게 된다. 마음속이 잠시라도 화평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비루하고 거짓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 외모가 잠시라도 장엄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안일하고 태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
악(樂)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며 예(禮)라는 것은 몸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악(樂)은 화(和)를 극진히 하고 예(禮)는 순(順)을 극진히 한다. 안을 화(和)하게 하고 밖을 순(順)하게 하면 백성들은 그 안색[임금이나 성인]을 우러러보고서 서로 다투지 못하고, 그 용모를 바라보면서 안일하고 태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덕이 안에서 움직여서 백성들은 듣고 따르지 않음이 없고, 이치가 겉으로 드러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말하길 ‘예악의 도리를 알고 이를 천하에 시행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악(樂)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며, 예(禮)라는 것은 바깥에서 움직이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禮)는 겸손한 것을 위주로 하고 악(樂)은 그 풍요로움을 것을 위주로 한다. 예(禮)는 겸손하여 진취적이고, 진취적인 것을 가지고 꾸밈으로 삼는다. 악(樂)은 풍요로움으로써 자신을 반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꾸밈으로 삼는다. 예(禮)가 겸손하지만 진취적이 아니면 쇠약해지고, 악(樂)이 풍요롭지만 반성하지 아니하면 방탕해진다. 그러므로 예(禮)에는 보응이 있고 악(樂)에는 반성함이 있는 것이다. 예(禮)가 그 보응을 얻으면 즐겁고 악(樂)은 그 반성하면 편안해진다. 예(禮)의 보응과 악(樂)의 반성함 그 뜻이 매한가지이다.
무릇 음악이란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정(人情)에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즐거움이란 반드시 소리로 표출되고 동정(動靜)으로 드러나니,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소리와 동정, 성정(性情)의 변화가 여기에서 다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악(樂)이 없을 수 없고 악(樂)은 형태가 없을 수 없다. 형상화되어도 도리에 맞지 않으면 혼란이 없을 수 없다.
선왕은 그 혼란을 미워하여 『아(雅)』와 『송(頌)』의 소리를 제정해 이끌었으니, 그 소리로 하여금 즐거워하되 방탕하지 못하게 했고, 그 문리(文理)로 하여금 강론하기에 족하여 그만두는 일이 없게 했으며, 그 곡절의 굽고 바름과 복잡함과 간단함, 청렴함과 풍요함, 절주(節奏)로 하여금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감동케 할 뿐, 방종한 마음과 사특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곧 선왕이 악(樂)을 세운 방침이다.
그러므로 종묘에서 임금과 신하 아래위 모두가 함께 악(樂)을 듣게 되면 어울려 화합하고 공경하지 않음이 없게 되고, 지방의 족장 향리 안에서 나이가 많고 적은 사람이 모두 함께 듣게 되면 화합하고 따르지 않음이 없게 되며, 가정 안에서 부자 및 형제들이 함께 듣게 되면 화합하고 친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악(樂)이란 하나를 살펴서 조화를 안정되게 하고, 여러 악기로 배합하여 그 절주를 표현해내고, 그 절주를 조합해 하나의 문리(文理)를 구성한 것이니, 아비와 아들 및 임금과 신하를 화합케 하고 만백성을 친근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왕이 악(樂)를 세운 방침이다.
고로 『아(雅)』와 『송(頌)』의 소리를 들으면 뜻이 넓어지고, 도끼와 방패를 손에 잡고 올려 보고 내려 보며 몸을 굽히고 펴고 하는 춤의 형태를 습득하면 용모가 장엄해진다. 춤추는 자들의 줄과 자리가 서로 연이어 있으면서 절주에 맞추면 행렬의 바름을 얻고, 진퇴가 가지런함을 얻는다. 고로 악(樂)이란 것은 천지를 가지런히 한 것이요, 중화(中和)의 기강으로 인정(人情)에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대저 악(樂)이란 선왕이 즐거움을 나타낸 것이고, 군대와 작은 도끼와 큰 도끼는 선왕의 노여움을 나타낸 것이다. 고로 선왕의 즐거움과 노여움은 모두 그 동등한 표현을 얻은 것이다. [선왕이] 즐거워하면 천하 역시 기뻐해 이에 화락(和樂)했다. 노하면 난을 일으킨 난폭한 사람이 두려워했다. 선왕의 도(道)는 예악으로 융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위문후(魏文侯)가 자하(子夏)에게 물었다. “내가 현단복과 면관을 하고 옛날 음악을 들으면 오로지 눕게 될 것 같아 두려워하고, 정(鄭)나라와 위(魏)나라의 음을 들으면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옛날 음악이 그와 같은 것이 무슨 까닭이고? 새로운 음악이 이와 같은 것은 무엇 까닭인가?”
자하가 대답했다. “지금 저 옛날 음악은 나아감을 함께 했고, 물러나는 동작도 격식에 맞게 바르게 하였으며 온화하면서 정대했으며 그 의미가 넓습니다. 현(弦), 포(匏), 생황(笙篁) 등의 악기는 부(拊), 고(鼓)를 준비하고 연주를 하는데, 처음 연주를 시작할 때에는 문(文)으로써 하고, 어지러운 것을 멈출 때에는 무(武)로써 하며, 어지러운 것을 다스릴 때에는 상(相), 즉(拊)으로써 하고, 빠르고 급한 것은 아(雅)로써 조절합니다. 군자는 이때에 말하고 옛날을 논하며, 몸을 닦아서 집안으로 다스리고 천하를 고르게 합니다. 이것이 고대 음악의 발현(發現)입니다.
지금 저 새로운 음악은 나아갈 때도 몸을 굽히고, 물러설 때도 구부리고 소리가 간사하고 음란해 탐닉하여 멈추지 못하고, 배우나 난쟁이가 남녀 사이에 뒤섞이고 부자(父子) 간의 지켜야할 예절도 알지 못합니다. 악(樂)이 끝나도 나서도 이야기할 것이 없고, 옛 것에 대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악(樂)의 발현입니다. 지금 군주께서 물으신 것은 악(樂)이고, 좋아하시는 것은 그 음(音)입니다. 무릇 악(樂)과 음(音)은 서로 가깝지만 다른 것입니다.” 문후가 말했다. “감히 묻노니, 어찌 그런 것인가?”
자하가 대답했다. “대체로 옛날에는 천지가 화순하고 사시(四時)가 그 차례를 잃지 않았으며, 백성들은 덕이 있고 오곡이 번창했으며, 질병이 일어나지 않고 흉조가 없었습니다. 이를 일러 대당(大當, 합당한 태평성세)라고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성인께서 부자와 군신을 위한 기강을 만들었습니다. 기강이 바르게 서자 천하가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천하가 크게 안정된 연후에 육율(六律)을 바르게 하고 오성(五聲)을 조화되게 하여 현(弦)을 뜯으며 시(詩)와 송(頌)을 노래하니 이것을 덕음(德音)이라 했고, 이 덕음을 악(樂)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경』에 ‘덕음을 고요히 해서 덕이 더욱 밝아졌네. 사물을 밝게 분별하시니 백성의 어른이 되었고 군주가 되셨네. 이 큰 나라의 왕이 되니 하늘에 순응하고 백성을 친애하셨네. 문왕(文王)에 와서 그 덕에 잘못됨이 없었네. 하늘에서 내리신 큰 복 받아 자손에게 베풀었다네.’라고 했으니 이를 말한 것입니다. 지금 군주가 좋아하시는 것은 익음(溺音, 탐닉한 음)이 아닌가요?”
문후가 말했다. “감히 묻노니, 익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자하가 대답했다. “정(鄭)나라 음은 방탕을 좋아하여 뜻을 음란하게 만들고, 송(宋)나라 음은 가무에 능한 연나라 미인 같아서 뜻을 탐닉하게 하며, 위(衛)나라 음은 촉박하고 빨라서 뜻을 번거롭게 하고, 제(齊)나라 음은 오만하고 편벽되어 뜻을 교만하게 하니, 이 네 가지는 모두 색정에 빠져 음란하고 덕에 해를 끼치는 때문에 제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엄숙하고 조화되게 울려 퍼지니, 선조의 신령들이 들으신다.”라고 했으니, 숙(肅)은 엄숙한 것으로 공경하는 것이요, 옹(雍)은 조화로운 것입니다. 무릇 공경함으로써 화합하면 무슨 일이든 행하지 못하겠습니까?
군주가 된 자는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삼갈 따름입니다. 군주가 좋아하면 신하도 이를 하고, 위에서 행하면 백성들이 이것을 따르는 마련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백성을 이끌기가 매우 쉬다.’이라고 한 것이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 후에 성인은 도(鞉), 고(鼓), 강(椌), 갈(楬), 훈(壎), 지(篪)를 만들었으니 이 여섯 가지가 덕음을 내는 음입니다. 그런 후에 종(鐘), 경(磬), 우(竽), 슬(瑟)을 가지고 이에 화응하고, 간척(干戚)과 모(旄), 적(狄)으로 춤추었습니다. 이것으로 선왕의 묘에 제사 지내는 것이며, 술자리에서 주인과 빈객이 서로 술을 권하고 따라 올리면서 입에 갖다 대는 예(禮)를 행하는 것이며, 관직에 의해서 귀천의 서열에 그 마땅한 바를 얻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후세에 신분이 높고 낮음과 어른과 아이의 차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소리는 갱하고 울립니다. 갱 소리로써 호령을 세우고, 호령으로써 사기를 올리고, 사기를 올림으로써 무위(武威)를 세웁니다.
군자는 종소리를 들으면 무신(武臣)을 생각합니다. 돌 소리는 ‘경(硜)’하고 울립니다. 경소리는 사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함으로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군자는 경쇠의 소리를 들으면 변방에서 죽은 신하를 생각합니다. 현의 소리는 애달프다. 애달프기 때문에 염절함으로 뜻을 세운다. 군자는 거문고와 비파 소리를 들으면 지조 있고 의리 있는 신하를 생각합니다.
대(竹) 소리는 넘친다. 넘치면 취합할 수 있고, 취합함으로써 대중을 모을 수 있습니다. 군자가 대나무로 만든 악기인 피리, 생황 퉁소 등의 소리를 들으면 힘써 모은 신하를 생각합니다. 큰 북과 작은 북 소리는 시끄러우니, 시끄럽기 때문에 충동질할 수 있고, 충동질하므로 대중을 나아가게 합니다. 군자가 큰 북과 작은 북 소리를 들으면 장수를 생각합니다. 군자는 음률을 듣는 것으로 쇳소리와 종소리를 들을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군자의 마음속에 맞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빈모고(賓牟賈)가 공자(孔子)를 모시고 앉아 있었다. 공자가 그와 더불어 말하다가 악(樂)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공자가 말하기를 “대체로 무악(武樂)에서 먼저 북을 치고 대중을 경계함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는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빈모고가 대답했다.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할까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길게 탄식하고 그 소리 늘이어서 노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빈모고가 대답했다. “일이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무왕이 주(紂)왕을 정벌할 만들어진 춤은 처음 춤을 출 때 손과 발을 세차게 놀리고 발로 땅을 밟는 기세가 사나운데, 무엇 때문인가?”
빈모고가 대답했다. “때가 이르러 일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왕의 춤을 추는 자가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왼쪽 무릎을 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빈모고가 대답했다. “무왕의 춤을 추는 자가 반드시 무릎을 끓어 앉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음탕해서 상(商)나라를 정벌하기에 이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빈모고가 대답했다. “무왕 악(樂)의 음률이 아닙니다.”
“무왕 악의 음률이 아니면 무슨 음률인가?”
빈모고가 대답했다. “담당 관리가 전해 내려오는 것을 잃은 탓입니다. 만약 담당 관리가 전해 내려오는 것을 잃은 탓이 아니라면 무왕의 뜻이 허황된 것이 됩니다.”
공자가 말했다. “옳다. 내가 장홍(萇弘)에게 들은 것도 그대의 말과 같았다.”
빈모고가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물러나오면서 청해 말했다. “대저 무왕의 춤에서 먼저 북을 치고 대중을 경계함이 오래된 것임을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감히 여쭙건대 더디고 더디면서 또 오래 끄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앉자. 내가 너에게 들려주겠다. 대저 악(樂)이란 성공을 상징하는 것이다. 방패를 잡고 산처럼 서 있는 것은 무왕의 일이고, 손발을 놀리고 땅을 밟음이 사나운 것은 태공의 뜻이다.
무왕의 춤이 끌날 때 모두 끓어앉는 것은 주공과 소공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무왕의 춤이 시작하면서 북쪽으로 옮겨가니, 이는 무왕이 북쪽으로 출병했던 것을 상징하고, 두 번째 악곡은 북쪽으로 더더욱 옮겨가니 이는 상나라를 멸한 것을 상징하고, 세 번째 악곡은 남쪽으로 돌아오니, 이는 무왕이 상나라를 멸한 후에 남쪽으로 돌아온 것을 상징하고, 네 번째 악곡은 남방을 복속시켜 주나라의 강토에 삼은 것을 상징하고, 다섯 번째 악곡은 섬(陝)지역을 나누어 주공은 왼쪽(동쪽)을 소공은 오른쪽(서쪽)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상징하며, 여섯 번째 악곡은 처음 위치로 돌아와니, 이는 천자를 존숭한다는 뜻을 상징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춤추는 열에 끼어들어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 춤추는 자들이 창을 들고 사방을 정벌하는 흉내를 내는데, 이는 중국의 위엄을 성대하게 떨쳤음을 알리는 것이다. 춤추는 열을 나누어 나아가는 것은 일을 빨리 성공했음을 상징한 것이다. 오랫동안 춤추는 대열에 서 있는 것은 제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또 너는 홀로 목야(牧野)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가?
무왕은 은나라를 이기고 상으로 돌아와서 수레에서 미처 내리기도 전에 황제(黃帝)의 후예를 계(薊)에 봉하고, 요임금의 후예는 축(祝)에 봉하고, 순임금의 후예를 진(陳)에 봉했다. 수레에서 내려서는 하후씨(夏后氏)의 후예를 기(杞) 봉하고, 은나라의 후예를 송(宋)에 봉하였으며, 왕자 비간(比干)의 무덤을 봉하고, 기자(箕子)를 감옥에서 석방시켜주고 그로 하여금 상용(商容)에게 가서 그 지위를 회복하게 하였다.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치를 너그럽게 하였고, 일반 관원들에게는 녹봉을 배로 올려주었다. 황하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서 말을 화산(華山)의 남쪽에 풀어주고 다시는 타지 않았다. 소를 도림(桃林)의 들판에 풀어놓아 다시는 부리지 않았다. 전차와 갑옷을 잘 싸서 창고에 보관하여 다시 쓰지 않았으며, 창과 방패를 거꾸로 쌓아 재어서 호랑이 가죽으로 쌌다. 그리고 장수되는 인사들을 제후로 삼아 건고(建櫜, 무기를 봉함한다는 뜻이니, 전쟁을 영구히 종식하는 것을 비유함)라 명명하였다.
그런 연후에 천하 사람들은 무왕이 다시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알았다. 군대를 해산하고 천자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교사(郊射)의 의식을 거했다. 좌사(左射)에서는 ‘이수(貍首)’를, 우사(右射)에서는 ‘추우(騶虞)’의 시를 노래하였으며, 적을 죽이는 활쏘기는 그만두었다. 사대부는 관에 쓰고 홀을 들었으며, 용감한 용사는 검을 풀었다. 명당(明堂)에 제사하니 백성들은 효를 알게 되었다.
제후로 하여금 봄, 가을에 왕을 배알하도록 하니, 신하되는 바를 알게 하였다. 천자가 몸소 일정한 논밭을 경작하니 제후들로 하여금 공경하는 방법을 알게 하였다. 이 다섯 가지는 천하의 큰 가르침이다.
태학에서 삼로오경(三老五更, 주대(周代)에 늙어서 벼슬에서 물러난 신하를 임금이 부형(父兄)의 예(禮)로 대접하던 일로서 삼덕(三德)인 정직(正直)ㆍ강극(剛克)ㆍ유극(柔克)과 오사(五事)인 모(貌)ㆍ언(言)ㆍ시(視)ㆍ청(聽)ㆍ사(思)를 겸비한 늙은이란 뜻이다.)을 접대하며, 천자가 웃통을 벗고 제사를 지낼 때 쓴 고기를 나누고, 장(醬)을 집어서 대접하고, 술잔을 들어 권하였으며,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방패를 잡고 춤을 추었으니 이는 제후들에게 공경하는 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주(周)나라의 도(道)가 사방에 미치고, 예악이 사방에 통하게 되었다. 그러니 무왕의 춤이 더디고 더딘 것 또한 의당하지 않은가?”
자공(子貢)이 사을(師乙)을 보고 물었다. “저는 노래 소리는 각기 의당한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자는 의당 어떤 노래를 해야 합니까?”
사을이 말하였다. “저는 미천한 악공(樂工)에 불과한데, 어찌 저가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청하시니 제가 들은 바를 읊을 테니 그대가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너그럽고 고요하며 부드럽고도 바른 사람은 마땅히『주송(周頌)』을 노래하고, 광대하면서 고요하고 활달하면서 믿음을 주는 사람은 마땅히 『대아(大雅)』를 노래하고, 공손하고 검소해서 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땅히 『소아(小雅)』를 노래하고, 정직하고 청렴하면서 겸손한 사람은 마땅히 『국풍(國風)』을 노래합니다. 거리낌 없이 말하고 곧으며 자애로운 사람은 마땅히 『상송(商頌)』을 노래하고, 온화하고 선량하면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제풍(齊風)』를 노래합니다. 대저 노래란 자기를 바르게 하여 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움직여서 천지가 이에 응하게 하고 사시(四時)가 조화를 이루어 별들이 다스려지고 만물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고로 『상송(商頌)』이란 오제(五帝)가 남긴 소리인데, 상나라 사람들이 이를 기록하였기 때문『상송』이라고 부릅니다. 『제풍(齊風)』는 삼대(三代)가 남긴 소리인데 제나라 사람들이 이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제풍』라 부릅니다. 『상송』의 시음에 밝은 사람은 일에 임하여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제풍』의 시음에 밝은 사람은 이익을 보면 사양합니다. 일에 임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로움을 보면서도 사양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용기가 있고 의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래가 아니면 무엇으로 이를 보존하겠습니까? 고로 노래하는 것은 위로 울려 퍼질 때는 높이 솟는 것 같고, 밑으로 울러 퍼질 때에는 떨어지는 것 같고, 굽을 때는 꺾어지는 것 같고, 멈출 때는 마른 나무 같고, 소리가 가볍게 구부러질 때는 굽은 자에 맞는 것 같고, 심하게 굽을 때는 그림쇠에 맞는 것 같아서, 계속되어 끊어지지 않음이 마치 꿴 구슬과 같습니다. 고로 노래가 일종의 언어가 된 것은 길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연고로 말하게 되고, 말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길게 말하는 겁니다. 길게 말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고, 탄식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절로 손으로 춤추고 발로 뛰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음(音)은 사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것이다. 하늘이 사람과 더불어 서로 통하는 바가 있는 것은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고 메아리가 소리에 호응하는 것과 같다. 고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으로 보답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주니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고로 순 임금은 다섯줄의 거문고를 치며 ‘남풍(南風)’의 시를 노래하니 천하가 다스려졌고, 주왕(紂王)은 ‘조가(朝歌)’와 ‘북비(北鄙)’의 음을 노래하여 자신은 죽고 나라가 망했다. 순 임금의 도는 어째서 드넓고, 주왕(紂王)의 도는 어째서 그토록 좁았던가? 무릇 ‘남풍’의 시는 자라나는 음이다. 순 임금은 그것을 즐겨 좋아하였고, 그 즐거움은 천지와 같은 뜻이었고, 만국(萬國)의 환심을 얻었기 때문에 천하가 다스려진 것이다. 무릇 ‘조가’의 노래는 시기에 맞지 않고, 북(北)은 패배한다는 뜻이고 비(鄙)는 비루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주왕은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니 만국과 마음이 달랐고, 제후가 따르지 않았으며, 백성이 가까이 하지 않고 천하가 그를 배반하였다. 고로 몸은 죽고 나라는 망한 것이다.
위영공(衛靈公) 때에 [영공이] 진(晉)나라로 가는 도중에 복수(濮水)의 상류에서 머물게 되었다. 야밤중에 거문고 타는 소리를 듣고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묻자 모두 대답하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곧 사연(師涓)을 불러 말했다. “내가 거문고 타는 소리를 듣고 좌우 신하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 형상이 귀신과 유사하니 나를 위하여 들어보고 그것을 베껴라.” 사연이 말했다. “네.” 자리에 단정히 앉아 거문고를 끌어당겨서 그 소리를 들으며 베꼈다.
다음날 [사연이] 말했다. “신이 그 소리를 듣고 대충 옮겨 적었으나 아직 손에 익지 않습니다. 청컨대 하룻밤을 더 머무르면서 익히도록 해주십시오.” 영공이 말했다. “좋다.” 그래서 다시 하룻밤으로 더 머물렀다. 다음날 사연은 “익혔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영공은] 곧바로 진(晉)나라로 가서 진 평공(平公)을 알현했다. 평공이 시혜(施惠)의 누대(樓臺)에다 주연(酒宴)을 베풀었다. 술기운이 한창 무르익자 영공이 말했다. “지금 오다가 새로운 음악을 들었는데 청컨대 그것을 연주하도록 해주십시오.” 평공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이에 곧바로 사연으로 하여금 사광(師曠) 곁에 앉도록 하고 거문고를 주며 연주하게 하였다.
다 끝나기도 전에 사광이 줄을 어루만지면서 멈추게 하면서 말했다. “이것은 망국의 소리이니 끝까지 연주하면 안 됩니다.” 평공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라고 물었다. 사광이 말했다. “이 곡은 사연(師延)이 지은 것입니다. 그는 주왕(紂王)을 위해 퇴폐적인 음악을 만들었는데, 무왕이 주왕을 정벌하자 사연은 동쪽으로 도피하여 스스로 복수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고로 이 소리를 들은 곳은 반드시 복수일 것이고, 먼저 이 소리를 듣는 자의 나라는 해칠 것입니다.” 평공이 말했다. “과인이 좋아하는 음(音)이니 끝까지 듣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연이 마지막까지 연주했다.
평공이 “음 가운데 이보다 더 비통한 것은 없는가?”라고 말하자 사광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평공이 “들어 볼 수 있겠는가?”라 말하자 사광은 “군주의 덕과 의가 적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평공이 “과인이 음(音)을 좋아하니 들어보길 원한다.”라고 말하자, 사광은 할 수 없이 거문고를 끌어당겨 연주했다. 첫 번째 곡을 연주하자 검은 학 28마리가 낭문(廊門)에 모여들고, 다시 두 번째 곡을 연주하자 검은 학들이 목을 길게 빼어 울면서 날개를 펴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평공이 크게 기뻐하며 일어나서 사광을 위해서 축수(祝壽)하고는 자리로 돌아와 물어 말했다. “음악 가운데 이보다 더 비통한 것은 없는가?” 이에 사광이 “있습니다. 옛날 황제(黃帝)는 귀신을 크게 모았습니다. 지금 군주의 덕과 의가 적어 그것을 듣기에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들으면 장차 패망할 것입니다.”라 대답했다. 평공이 “과인은 이미 늙었다. 좋아하는 바가 음(音)이니, 끝까지 듣고 원한다.”라 말했다. 사광은 할 수 없이 거문고를 끌어당겨 연주하였다. 첫 번째 곡을 연주하니 흰 구름이 서북쪽에서 일어나고, 다시 두 번째 곡을 연주하자 큰 바람이 몰아치며 비가 따라 내리치고 행랑의 기와를 날라 가자 좌우의 신하들이 혼비백산하여 모두 달아났다. 평공도 두려워서 행랑과 궁전 사이에 엎드려 숨었다. 진나라가 크게 가물어 붉은 땅이 3년이나 지속되었다.
(음악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길하거나 흉하다. 대저 악(樂)은 망령되이 연주해서는 안 된다.
태사공은 말한다.
“대저 상고 시대에 현명한 왕은 악(樂)을 일으킨 것은 즐기는 마음으로 쾌락을 누리거나 쾌감에 뜻을 두거나 욕심을 부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다. 바른 교화라는 것은 모두 음(音)에서 시작되며 음이 바르면 듣는 사람들의 행위도 바르게 된다. 고로 음악이란 혈맥을 굼틀거리고 정신을 통하고 흐르게 하여 마음을 조화롭고 올바르게 잡는 것이다. 고로 궁음(宮音)은 비장(脾臟)을 움직여 성(聖)스러움을, 상음(商音)은 폐를 움직여 의(義)로움을, 각음(角音)은 간을 움직여 어짐(仁)을, 치음(徴音)은 심장을 움직여 예절을, 우음(羽音)은 신장(腎臟)을 움직여 지혜로움을 조화시키고 올바로 한 것이다. 악(樂)은 안으로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을 돕고, 밖으로 귀천을 달리하며, 위로는 종묘를 섬기도록 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교화시킨다.
거문고의 길이는 8척1촌이 올바른 척도가 된다. 현(弦)이 큰 것은 궁(宮)이 되고 중앙에 거하여 군주가 된다. 상(商)은 오른쪽에 펼쳐 있고, 그 나머지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엇갈리면서 그 차례를 잃지 않으면 군신의 지위가 바르게 되는 것이다. 고로 궁음(宮音)을 들으면 사람들이 평화롭고 광대해지며, 상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방정하여 의를 좋아한다.
각음(角音)을 들으면 사람들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치음(徴音)을 들으면 사람은 선한 것을 즐기고 베풀기를 좋아한다. 우음(羽音)을 들으면 사람은 용모와 태도가 단정하고 가지런하게 하여 예(禮)를 좋아하게 된다. 대저 예(禮)는 밖에서 들어오고, 악(樂)은 안에서 나간다. 따라서 군자는 잠시라도 예(禮)를 떠날 수 없다. 잠시라도 예(禮)를 떠나면 포악하고 태만한 행위 때문에 밖이 궁핍하게 된다.
잠시라도 악(樂)을 떠나면 잠시라도 악(樂)을 떠나면 간사하고 행위로 안이 궁핍하게 된다. 고로 음악을 즐기는 것이 곧 군자가 의(義)를 기르는 것이다. 대저 고대에 천자와 제후가 종과 경의 음을 듣고 조정을 떠나지 않았고, 경대부가 금과 슬의 음을 듣고 앞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덕행과 의를 기르고 음탕함과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대저 음탕과 게으름은 무례함에서 생기기 때문에 성왕(聖王)은 사람들로 하여금 귀로는 『아(雅)』, 『송(頌)』의 음을 듣도록 하고, 눈으로는 위엄을 갖춘 예(禮)를 보도록 하고, 발로는 공경의 자태를 행하게 하고, 입으로는 인의(仁義)의 도(道)를 말하도록 한 것이다. 고로 군자는 하루 종일 말을 해도 사악하고 편벽한 기운이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3. 율서(律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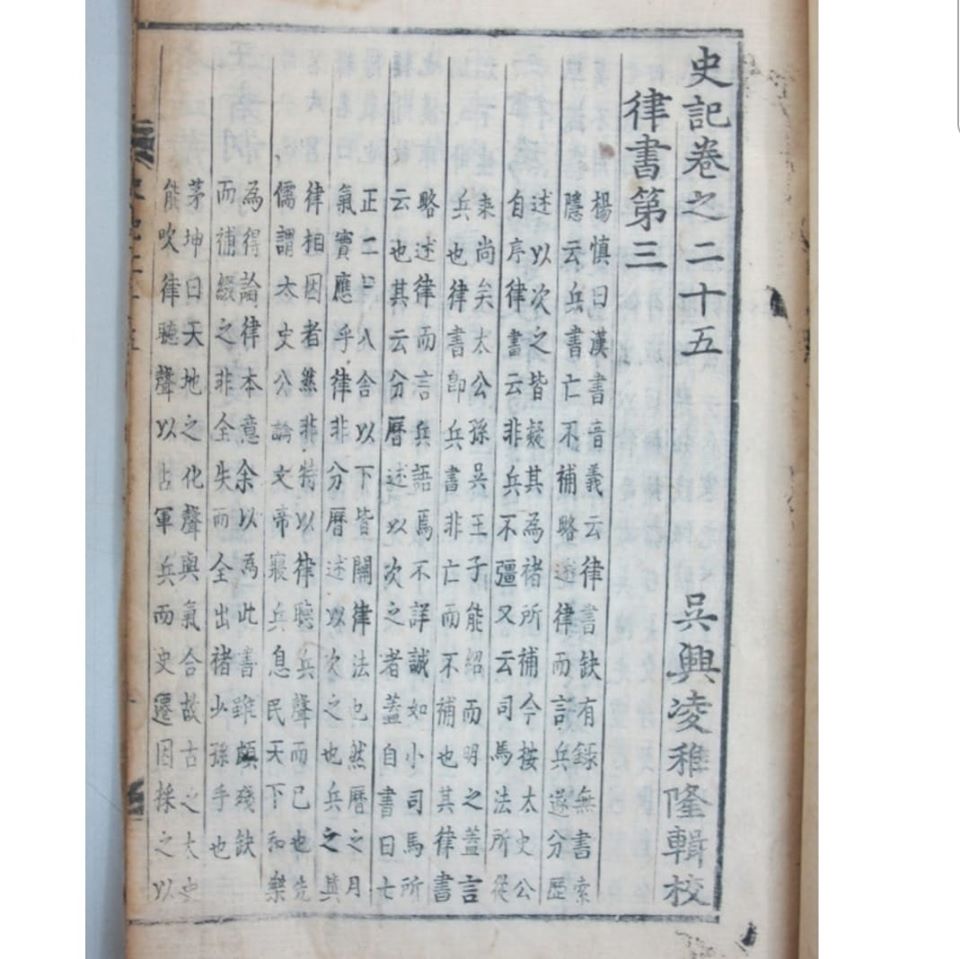
사마천 사기-서(書)의 세 번째 기록으로 율서(律書)는 병법이나 군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사라진 병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후반부는 음률(音律)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후대에 재구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 율서(律書)
왕이 정사를 바로잡고, 법도를 세우며, 사물의 규율과 법칙을 헤아릴 때 모두 육율(六律, 옛날 음악의 12율 가운데 양성(陽聲) 여섯 가지로 황종(黃鍾), 태주(太簇), 고선(姑洗), 유빈(蕤賓), 이칙(夷則), 무역(無射)을 뜻한다.)로부터 받아들였으니, 육율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그것은 전쟁에 있어 특히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 고로, 이르길 “적진의 구름 기운과 햇무리를 보고 길한지 흉한지를 알고, 율성(律聲)을 들으며 이기고 지는 것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했다. 이는 역대 제왕들이 바꾸지 않는 도(道)였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殷)나라 주왕(紂王)을 정벌할 때 율(律)을 불어넣고 소리를 들었다. 맹춘(孟春)부터 계동(季冬)까지를 열두 가지 율성을 듣고, 살기를 서로 드러난다고 하여 궁성(宮聲, 궁성을 들으면 장졸들이 화합을 도모함)을 숭상했다. 같은 소리가 서로 따르는 것은 사물의 자연스러운 바이니, 어찌 괴이할 것이 있으랴?
– 한나라 이전의 전쟁
전쟁이란 성인이 사납고 포악한 자를 토벌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험난함을 없애버리며, 위태로움에서 구하기 위함이다. 날카로운 이빨과 뿔을 가진 짐승은 침범을 당하면 곧 보복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며, 기쁘고 분노하는 기운을 품고 있다. 기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분노하면 악독함이 더해지니 이는 성정(性情)의 도리이다.
옛날 황제(黃帝)는 탁록(涿鹿)의 전투에서 염제(炎帝)의 화공(火攻)으로 인한 재앙을 평정했으며, 전욱(顓頊)은 공공(共工)과의 전투에서 수공(水攻)으로 인한 해(害)를 평정했다. 성탕(成湯)은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을 남소(南巢)로 쫓아버려 하나라의 혼란을 끊고 없애었다. 번갈아 흥(興)하고 폐(廢)하니, 이긴 자가 집정(執政)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이다.
이때 이후로 유명 인사들이 번갈아 일어나서 진(晉)나라는 구범(咎犯)을 등용하고, 제(齊)나라에서는 왕자(王子)를 등용했으며, 오(吳)나라는 손무(孫武)를 등용해서 군기를 거듭 밝히고 상벌을 반드시 믿음성 있게 적용하니, 마침내는 뛰어난 제후는 국토를 겸병, 확장시켰다. 비록 삼대(三代)의 고서(誥誓, 고대 군왕의 훈계 및 민중을 격려하기 위한 포고문)에 미치지 못했지만, 자신은 총애를 받고 군주는 존귀해져서 당대에 이름을 드날렸으니, 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은가?
어찌 세속의 유생(儒生)처럼 큰 정치에 어두워서 일의 경중을 분별하지도 않고 함부로 덕(德)으로 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용병술을 타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크게는 군주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치욕을 주고, 작게는 곧 외적의 침범을 받아 강토가 깎여 쇠약해지는데도 두려워하며 꼼짝하지 않는 것과 같다! 고로 집안에서 가르침을 주기위한 회초리를 금할 수 없으며, 나라에서 형벌을 없앨 수가 없고, 천하에는 주살하고 정벌하는 것을 중지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사용함에 교묘하고 졸렬함이 있고, 그것을 실행함에는 순종과 거역함이 있을 뿐이다.
하(夏)나라의 걸왕(桀王)과 은(殷)나라의 주왕(紂王)은 맨손으로 승냥이와 이리를 때려잡았고, 맨발로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뒤쫓을 수 있었으니, 그 용맹이 결코 자질구레한 것이 아니었다. 전투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어서 제후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했으니, 그 권세가 가볍지 않았다. 진(秦)나라의 2대 황제는 쓸모없는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변방에도 군대를 파견했으니, 그 무력이 약한 것이 아니었다. 흉노(匈奴)와는 원한을 맺었고, 월(越)나라에도 근심거리를 만들었으니 그 세력 또한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위엄과 세력을 다했을 때엔 골목길에 사는 평범한 백성들마저 적국으로 여기었다. 그 잘못은 무력을 다 써도 만족할 줄을 모르며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한 고조의 전쟁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천하를 평정했으나 세 곳의 변방에서 모반이 일어났었다. 큰 나라의 왕들이 비록 천자를 수호하고 거들어주는 제후국 뜻에서 ‘번보(蕃輔)’라 칭했으나 신하로서의 절개를 다하지 못했다. 고조는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싫어했으므로 소하(蕭何), 장량(張良)의 계책으로 전쟁을 잠시 그치게 할 수는 있었으나, 상대방을 완전히 복속시키거나 적당히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회유책을 갖추지는 못했다.
– 한 효문제의 전쟁
한나라 효문제(孝文帝)가 즉위하자 장군 진무(陳武) 등이 간언을 올려 말했다.
“남월(南越)과 조선(朝鮮)은 진(秦)나라 전 시기에 걸쳐 신하로 복속했습니다. 후에 또한 군대를 소유하며 험난한 요새를 의지하여 꿈틀거리며 난을 일으킬 기회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고조(高祖) 때에 천하를 새로 평정하여 백성들이 조금 안정되었으나 다시 전쟁을 일으키기는 못했습니다. 지금 폐하는 어진 혜택을 베풀어 백성들을 어루만지시고 은택을 천하에 늘렸습니다. 때문에 병사와 백성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반역의 무리들을 토벌하여 그들을 제후로 봉할 때 내린 강토를 통일해야 합니다.”
효문제가 대답했다.
“짐은 즉위한 이래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소. 여씨(呂氏) 일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공신과 종친들이 모두 짐을 황제에 추대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아, 짐이 잘못하여 보위를 차지했으나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황제로서 정치를 잘 마무리하지 못할까 두려워했소. 또 병기는 흉한 도구라서 비록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해도, 군대를 동원하면 또한 물자가 소모되는 병폐가 생기고, 백성들을 먼 변방으로 보내야 할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또한 선제(先帝, 고조)도 피로해진 백성들을 번거롭게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정벌할 뜻을 실행하지 않으셨소. 짐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흉노가 내륙으로 침범해 와도 군사와 관리들이 전공을 세울 수 없기에 변방의 백성들은 직접 칼을 들고 살아온 지가 오래 되었소. 짐은 항상 이를 마음이 아프고 슬펐으며, 그것을 잊은 날이 없었다오.
지금 군사를 동원할 상황이 아니니, 변방의 요새를 견고히 하고 적의 정세를 염탐하는 시설을 설치하며, 화친을 맺어 사신을 왕래시키면 북쪽의 변방 부근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여겨서 마음을 놓을 것이므로 성과가 많을 것이오. 또다시는 전쟁에 대한 논의가 없도록 하시오.”
이로써 백성들은 안팎의 부역이 없어져 논밭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천하가 부유해져서 곡식 열 말에 10여 전에 이르렀고,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으며, 밥 짓는 연기가 만 리 까지 피어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화목하고 즐거운 정경이다!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문제(文帝) 때에 천하가 새로워져 도탄의 괴로움이 없어졌으며, 백성들이 즐겁게 일했다. 때문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혼란스럽지 않았고, 백성들이 마침내 안락하게 되었다. 육, 칠십 먹은 노인들이 그때까지 저잣거리에 가보지 않았고, 마음껏 노닐고 즐기는 것이 마치 어린 아이들과 같았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신 덕(德)을 가진 군자라고 일컬음만 하다!”
– 28사(舍)
『서경(書經)』에는 칠정(七正, 칠정(七政)과 같다.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 등 오성(五星)과 해, 달)과 28사(二十八舍, 이십팔성수(二十八星宿), 악률(樂律)과 역법(曆法)), 하늘은 오행(五行, 우주 만물을 이루는 다섯 가지 원소로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이다.)과 팔정(八正, 여덟 가지 절기. 즉 춘분(春分), 추분(秋分), 하지(夏至), 동지(冬至), 입춘(立春), 입하(立夏), 입추(立秋), 입동(立冬)이다. 혹은 동서남북, 동남, 서남, 동북, 서북 등의 방향을 가리키기도 한다.)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만물을 성숙시킨다고 하였다. 사(舍)란 해와 달이 머무는 곳이다. 사(舍)란 완만하게 기운을 펼치는 것이다.
부주풍(不周風, 서북풍)은 서북쪽에 위치하며 살생을 주관한다. 동벽(東壁, 벽수(壁宿)라고도 한다. 28수의 하나로 현무(玄武) 7성(星)의 끝별로 문서(文書)를 맡은 별이다.)는 부주풍의 동쪽의 자리 잡고 있다. 생기를 주관하며 동쪽으로 가서 영실(營室, 28수의 하나인 실수(室宿)이다.)에 도달하게 된다. 영실은 주로 양기(陽氣)를 배양하고 있다가 그것을 태어나게 한다. 영실은 동쪽으로 가서 위수(危宿, 이십팔수의 열두 번째 별)에 도달하게 된다. 위(危)는 무너진다는 뜻이다. 양기가 여기 이르러 무너지는 까닭에 위라고 하는 것이다.
위수는 10월에 해당하고, 십이율(律) 중의 응종(應鍾)에 속한다. 응종이란 양기가 상응하지만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12지지(十二地支) 중의 해(亥)에 해당된다. 해는 갈무리한다는 뜻이다. 양기가 땅 속에 감추고 잠그기 때문에 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광막풍(廣莫風, 팔풍(八風) 중의 하나로 북풍(北風))은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광막이란 양기가 땅 속에 있어 음기(陰氣)는 아득하고 양기는 광대하여 광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광막풍은 동쪽으로 가서 허수(虛宿, 이십팔수 중에 북방 칠수(七宿) 중에 네 번째 별)에 도달하게 된다. 허(虛)란 채울 수도 있고, 비울 수도 있는 것으로, 양기가 겨울에 허공 속에 완연히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동지(冬至)날에는 한번은 음기가 되어 땅 속에 감추어져 있고, 한번은 양기가 되어 위로 올라가니, 고로 허라고 말한다.
광막풍은 동쪽으로 가서 수녀수(須女宿, 28수(宿)의 하나로, 수녀성(須女星), 무녀(婺女)라고도 한다.)에 도달하게 된다. 만물의 변화와 움직임이 그곳에 있으며,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기다리고 있는듯하여 수녀(須女)라고 말했다.
[수녀수는] 11월에 해당하고, 십이율 중에 황종(黃鍾)에 속한다. 황종이란 양기가 황천(黃泉)을 쫓아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십이자(十二子, 십이지지(十二地支))에서 자(子)에 해당된다. 자(子)는 자(滋)를 말하는데, 만물이 땅 속에서 번식한다는 뜻을 지녔다. 그것은 십모(十母, 십간(十干)) 중의 임(壬), 계(癸)에 속한다. 임이란 곧 맡긴다는 뜻이다. 양기가 만물을 땅 밑에서 양육(養育)시키는 것을 뜻한다. 계는 헤아린다는 뜻으로 만물을 추측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계라고 한다.
동쪽으로 가서 견우성(牽牛星)에 도달하게 된다. 견우(牽牛)란 양기가 만물을 끌어당겨 나오게 하는 것이다. 우(牛)란 무릎 쓰다는 뜻이다. 땅이 비록 얼었지만 그대로 참고 견디면서 생장한다는 뜻이다. 우란 만물을 심고 경작한다는 뜻이다. 동쪽으로 건성(建星, 남두육성(南斗六星)과 함께 속한 두수(斗宿))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건성이란 여러 생명을 형성시킨다는 뜻이다. 12월을 뜻하고 십이율 중에서 대려(大呂)에 속한다. 대려는 12지지 중에서 축(丑)에 속한다.
조풍(條風, 동북풍)은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물이 출생시키는 것을 주관한다. 조(條)는 만물을 다스려 그것을 나게 하기 때문에 조풍라고 한 것이다. 조풍은 남쪽으로 가서 기수(箕宿, 28수의 하나로 동방청룡 7수(宿)에 속함.)에 도달하게 된다. 기(箕)란 만물의 근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라고 한다.
[기수는] 정월에 해당하며 율 중에서 태주(泰簇)에 해당된다. 태주는 만물이 무더기로 자란다는 말이며, 고로 태주라고 한다. 그것은 12지지에서 인(寅)에 해당한다. 인이란 만물이 처음 생겨나서 절지동물처럼 꿈틀거리는 것을 이르기 때문에 인이라고 한다. 남쪽으로는 미수(尾宿, 동방 청룡(靑龍) 칠수(七宿) 중에 여섯 번째 별, 청룡의 꼬리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데, 만물이 처음 생겨나는 모양이 마치 꼬리와 같다는 것이다. 또 남쪽으로 심수(心宿, 동방 청룡 칠수 중에 다섯 번째 별자리, 청룡의 허리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데, 만물이 처음 생겨나 꽃술이 되는 것을 이른다. 남쪽으로 방수(房宿, 동방 청룡 칠수 중에 네 번째 별, 청룡의 배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데, 방(房)이란 만물의 문을 말하며, 문에 도달하면 나가게 된다.
명서풍(明庶風, 동풍)은 동방에 자리 잡고 있다. 명서(明庶)라는 것은 뭇 사물이 다 나오는 것을 밝힌다는 뜻이다. 2월에 해당하고, 십이율 중에서 협종(夾鍾, 12율의 하나인 음률. 달로는 음력 2월의 별칭, 방위로는 서북쪽 중간.)에 속하는데, 음기와 양기가 서로 섞여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12지지 중에서 묘(卯)에 해당한다. 묘는 무성하다는 뜻으로 만물이 무성함을 말한 것이다. 이는 10천간에서 갑(甲), 을(乙)에 해당한다. 갑이란 만물의 껍질을 쪼개서 싹을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을이란 만물이 밀치고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명서풍은 남쪽으로 가서 저수(氐宿, 동방 청룡 칠수 중에 세 번째 별, 청룡의 가슴 및 앞 발톱 부분)에 도달하게 된다. 저(氐)란 만물이 모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또 남쪽으로 항수(亢宿, 동방 청룡 칠수 중에 두 번째 별, 청룡의 목 부분)에 도달하게 된다. 항(亢)이란 만물이 성장하여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남쪽으로 가서 각수(角宿, 동방 청룡 칠수 중에 첫 번째 별, 청룡에 뿔 부분)에 도달하게 된다. 각(角)이란 만물이 모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뿔과 같다는 뜻이다. 3월에 해당하고 십이율 중에서 고선(姑洗)에 속한다. 고선이란 만물이 깨끗하게 생겨난다는 뜻이다. 이는 12지지 중에서 진(辰)에 해당한다. 진이란 만물이 움직여 나간다는 뜻이다.
청명풍(淸明風, 동남풍)은 동남쪽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 바람을 일으켜 만물을 서쪽으로 가게 하는 것을 주관하는데, 진수(軫宿, 남방 칠수(七宿) 중에 일곱 번째 별)에 도달하게 된다. 진(軫)이라는 것은 만물을 더욱 크게 번성시키는 것으로, 서쪽으로 익수(翼宿, 남방 칠수 중에 여섯 번째 별)에 도달하게 된다. 익(翼)이라는 것은 만물이 모두 날개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4월에 해당하고, 십이율 중에 중려(中呂, 12율 중에 제 여섯 번째 율)에 속한다. 중려라는 것은 만물을 차례로 서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12지지 중에서 사(巳)에 해당한다. 사라는 것은 양기가 이미 다했음을 말한다.
서쪽으로 칠성(七星, 남방 칠수 중에 네 번째 별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칠성이란 양수(陽數) 7로 이루어져 칠성이라고 하는데, 서쪽으로는 장숙(張宿, 남방 칠수 중에 다섯 번째 별)에 이르게 된다. 장(張)이라는 것은 만물을 모두 확장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서쪽으로 주수(注宿, 유성(柳星)으로도 불린다. 남방칠수 중에 세 번째 별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주라는 것은 만물이 쇠(衰)하기 시작함을 말하는 것이며, 양기가 아래로 쏟아지어 주(注)라 했다. 5월을 뜻하고, 십이율 중에 유빈(蕤賓, 12율 중에 제 칠 율)에 해당한다. 유빈은 음기가 어리고 어린 고로 유라고 한다. 양기가 위축되어 효용 되지 못하여 빈(賓)이라고 한다.
경풍(景風, 남풍)은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경(景)이라는 것은 양기(陽氣)의 작용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경풍이라고 한다. 그것은 12지지 가운데 오(午)에 속한다. 오라는 것은 음양이 서로 교류하기에 때문에 오라고 한다. 그것은 10천간 중에서 병(丙), 정(丁)에 해당한다. 병이란 양기의 작용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병이라고 한다. 정이란 만물이 강성하기 때문에 정이라고 한다. 서쪽으로 호수(弧宿, 호시성(弧矢星), 천궁(天弓)으로도 불린다. 천낭성(天狼星) 동남쪽에 아홉 개 별자리 중 여덟 번째 별로 그 형태가 활 모양이다.)에 도달하게 된다. 호(弧)란 만물이 쇠퇴해서 바로 죽게 된다는 뜻을 지녔다. 서쪽으로 낭성(狼星, 천랑성(天狼星)의 준말. 큰개자리의 별 가운데 가장 밝은 별.)에 도달하게 된다. 낭(狼)이란 만물을 헤아리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낭이라고 부른다.
양풍(凉風, 서남풍)은 서남쪽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고, 땅을 주관한다. 땅은 만물의 기를 빼앗는 것을 역할을 한다. 6월에 해당하며 십이율 중에서 임종(林鍾, 십이율의 여덟 번째 음)에 속한다. 임종은 만물에 사기(死氣)가 번성함을 말한다. 그것은 12지지에서 미(未)에 해당한다. 미는 만물이 모두 성숙해 감칠맛이 있다는 것이다. 북쪽으로 가서 벌수(罰宿, 벌성(伐星)으로도 불리는데, 삼수(參宿)에 속하며 참살과 정벌의 일을 주관한다.)에 도달하게 된다. 벌(罰)은 만물의 기운을 빼앗고 정벌한다는 말이다. 북쪽으로 가서 삼수(參宿, 서방 백호칠수(白虎七宿) 중에 끝 별)에 도달하게 된다.
삼(參)이란 만물을 헤아리고 비교하기 때문에 삼이라고 한다. 7월에 해당하고 십이율 중에서 이칙(夷則, 양율(陽律) 중 다섯 번째, 이십율려에 아홉 번째)에 속한다. 이칙이란 음기가 만물을 해치는 것이다. 그것은 12지지에서 신(申)에 해당된다. 신이란 음기가 사물에 작용한다는 뜻이며, 만물을 해치기 때문에 신이라고 한다. 북쪽으로 가서 탁수(濁宿, 서방 백호칠수 중 다섯 번째 별)에 도달한다. 탁(濁)이란 부딪친다는 뜻이다. 만물은 모두 부딪쳐 죽기 때문에 탁이라고 한다. 북쪽으로 가서 유수(留宿)에 도달하게 된다. 유(留)라는 것은 양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유라고 말하는 것이다. 8월에 해당하며 십이율 중에서 남려(南呂)에 속한다. 남려란 양기가 들어가서 저장된다는 말이다. 그것은 12지지 중에서 유(酉)에 해당한다. 유는 만물이 노쇠했기 때문에 유라고 말한 것이다.
창합풍(閶闔風, 태괘(兌卦)의 바람, 즉 정서풍(正西風)으로 가을바람을 가리킨다.)은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창(閶)은 인도한다는 뜻이고, 합(闔)은 감춘다는 뜻이다. 양기가 만물을 인도해 황천 아래로 감추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10천간으로는 경(庚), 신(辛)에 해당한다. 경이란 음기가 만물을 바꾸기 때문에 경이라고 말한다. 신이란 만물을 새로 생겨나게 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말한다. 북쪽으로 가서 위수(胃宿, 서방칠수(西方七宿) 중에 세 번째 별)에 도달하게 된다. 위(胃)란 양기가 깊이 숨어 있다가 모두 위(胃)로 들어감을 말한다.
북쪽으로 가서 누수(婁宿, 서방칠수 중 두 번째 별)에 도달하게 된다. 누라는 것은 만물을 호라 부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북쪽으로 가서 규수(奎宿, 서방 백호칠수 중 첫 번째 별)에 도달하게 된다. 규(奎)란 독을 주관하고, 독충으로 만물을 쏘아서 죽인다는 뜻이다. 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춘다는 의미이다. 9월에 해당하고 십이율 중에서 무역(無射, 십이율 중 양률로 제십일율)에 해당하며, 무역이라는 것은 음기가 성해져서 일마다 운용되고, 양기가 남음이 없기 때문에 무역이라고 한다. 그것은 12지지로는 술(戌)에 해당한다. 술은 만물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술이라고 말한다.
– 율수(律數)
9에 9를 곱하면 81분(分) 길이의 율관을 궁성(宮聲, 오음(五音)의 하나이다. 나머지 사성인 상성(商聲), 각성(角聲), 치성(徵聲), 우성(羽聲)의 벼리로서 그 성질은 둥글다. 임금을 상징)이 된다. 이 율관의 3분의 1의 길이를 제거하면 54분 길이의 율관인 치성(徵聲, 오음(五音)의 하나이다. 그 성질은 밝고 사물을 분별한다. 일[事]을 상징)이 된다. 이 율관의 3분의 1의 길이를 더하면 72분 길이의 율관인, 상성(商聲, 오음(五音)의 하나이다. 그 성질은 네모 진다. 신하를 상징)이 된다. 이 율관의 3분의 1의 길이를 제거하면 48분 길이의 율관인 우성(羽聲, 오음(五音)의 하나이다. 그 성질은 사물을 윤택하게 한다. 사물을 상징)이 된다. 이 율관의 3분의 1의 길이를 더하면 64분 길이의 율관인 각성(角聲, 오음(五音)의 하나이다. 그 성질이 꼿꼿하다. 백성을 상징)이 된다.
황종(黃鍾)의 길이는 8촌 7분의 1으로 궁성(宮聲)이다. 대려(大呂)의 길이는 7촌 5분과 3분이다. 태주(太簇)의 길이는 7촌 70분의 2로 각성(角聲)이다. 협종(夾鍾)의 길이는 6촌 7분과 3분의 1이다. 고선(姑洗)의 길이는 6촌 70분의 4로 우성(羽聲)이다. 중려(中呂)의 길이는 5촌 9분과 3분의 2로 치성(徵聲)이다. 유빈(蕤賓)의 길이는 5촌 6분과 3분의 2이다. 임종(林鍾)의 길이는 5촌 70분의 4로 각성이다. 이칙(夷則)의 길이는 5촌 3분의 2로 상성이다. 남려(南呂)의 길이는 4촌 10분 8로 치성이다. 무역(無射)의 길이는 4촌 4분과 3분의 2이다. 응종(應鍾)의 길이는 4촌 2분과 3분의 2로 우성이다.
황종률(黃鍾律)에서 일어나는 비례는 다음과 같다.
자(子)는 1분(分, 푼)이다. 축(丑, 임종)은 3분의 2이다. 인(寅, 태주)은 9분의 8이다. 묘(卯, 남려)는 27분의 16이다. 진(辰, 고선)은 81분의 64이다. 사(巳, 응종)는 243분의 128이다. 오(午, 유빈)는 729분의 512이다. 미(未, 대려)는 2,187분의 1,024이다. 신(申, 이칙)은 6561분의 4,096이다. 유(酉, 협종)는 1만 9,683분의 8,192이다. 술(戌, 무역)은 황종의 5만 9,049분의 3만 2,768이다. 해(亥)는 17만 7,141분의 6만 5,536이다.
황종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생(下生, 원래의 숫자에서 3분의 1을 빼 가면서 율관을 만드는 방식)은 실수(實數)에 2를 곱하고 3으로 나눈다. 상생(上生)은 실수에서 4를 곱하고 3으로 나눈다. 가장 높은 배수(配數)는 9이고, 상성은 8이며, 우성은 7, 각성은 6, 궁성은 5, 치성은 9이다. 1을 기수(基數)로 삼아 9제곱한 3을 법(法, 분모)으로 삼는다. 만약 실(實, 분자)과 법(法, 분모)가 같으며 얻어지는 수는 1이다. 무릇 얻어지는 수가 9촌(寸)이면, ‘황종의 궁(宮)’이라고 명명한다. 고로 음(音)은 궁성에서 시작되고, 각성에서 마친다. 수(數)는 1에서 시작되고 10에서 끝나며 3에서 완성된다. 기(氣)는 동지(冬至)에서 시작되어 1년을 주기로 다시 생겨난다.
신(神)은 무(無)에서 생성되고, 유(有)에서 형성(形成)되며, 형성된 후에 수(數)가 있고, 형성되면 성(聲)을 이루는 것이다. 고로 신은 기(氣)를 부리고, 기는 곧 형을 이룬다. 형체와 이치가 같은 종류가 있고 비슷한 경우도 있다. 혹은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류로 나눌 수 없는 것도 있다. 혹은 형체가 같으면 종류도 같은 것이 있고, 종류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종류에 따라 식별할 있다.
성인(聖人)은 천지를 식별할 줄 알기 때문에 있는 것에서부터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미약한 기운을 얻게 되더라도 성율(聲律)같이 미묘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은 신(神)으로 인해 그것을 살피고, 비록 미묘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참된 정(情)을 다하고, 그 빛나는 도를 자세히 대조하여 살펴서 밝힌다.
성스러운 마음이 없고, 단순히 총명함에만 의지한다면, 어떻게 천지의 신(神)과 형체가 이루어지는 정(情)을 살필 수 있겠는가? 신이란 만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고 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고로 성인은 외경하면서도 그것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다. 오직 그것을 살피려고 한다면 신 또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없이 귀한 것으로 여긴다.
– 사마천의 논평
태사공은 말한다.
선기옥형(旋璣玉衡, 고대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으로 칠정(七政, 북두칠성, 또는 해와 달 및 금성ㆍ목성ㆍ수성ㆍ화성ㆍ토성 등을 지칭함)을 가지런히 하니, 즉 천지의 28수(宿)이다. 10모(母, 천간)과 12자(子, 지지), 12율의 조합은 상고(上古) 때부터 비롯되었다. 율을 만들고 역법을 계산하고 태양의 운행과 도수를 만들어서 이를 근거로 법도로 삼았다. 사물의 실제와 부합하고 도덕과 통하게 되는 것이니, 곧 이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4. 역서(暦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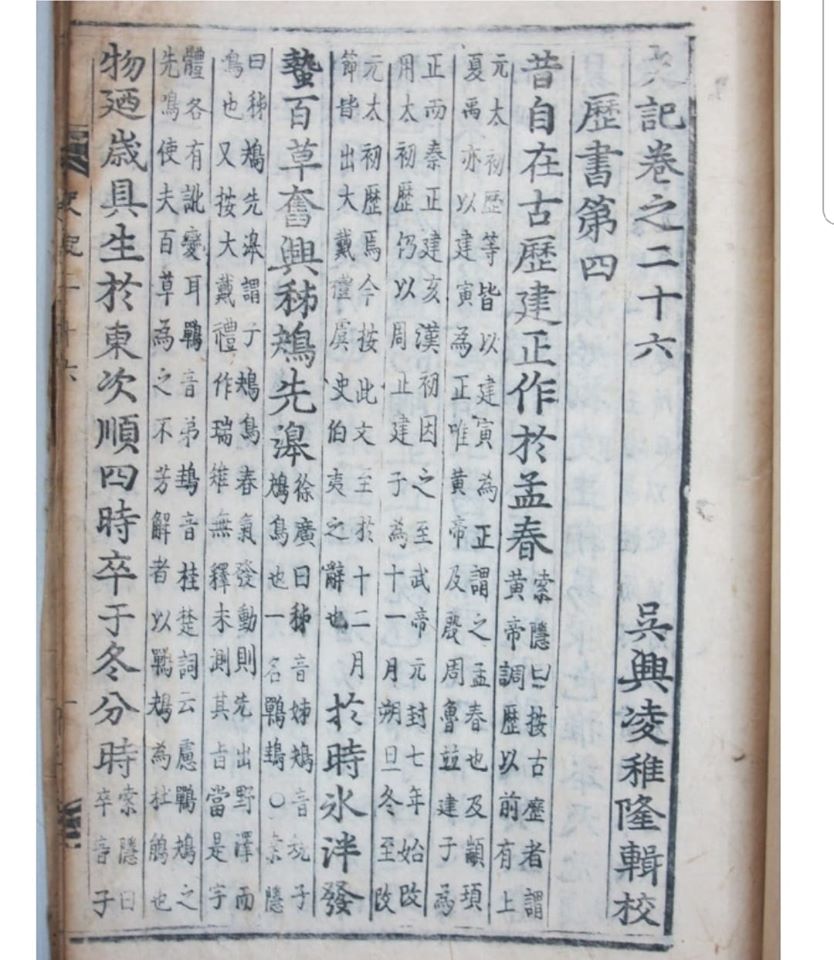
사마천 사기-서(書)의 네 번째 기록으로 역서(暦書)는 역법과 관련된 기록으로, 특히 한무제 연간의 역법 개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 역서(暦書)
옛적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역법(曆法)에서 정월을 세운 것은 이른 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눈과 얼음이 녹고, 동면하던 벌레와 동물들이 활동하며, 온갖 초목들이 힘차게 새싹을 틔우고, 두견새가 먼저 울부짖는다. 만물은 세시(歲時)와 더불어 동쪽에서부터 생장하고, 차례로 네 계절을 거쳐 마침내 겨울이 가고 춘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수탉이 세 번 울면 마침내 새날이 밝아온다. 열두 달의 절기 순서에 따르다가 건축(建丑, 북두칠성의 자루가 하늘의 축 방향을 가리키는 달로 12월을 뜻한다)에 끝난다. 해와 달이 운행하면 밝아진다. 밝음이 어른이고, 어두움은 어린이이다. 어둠과 밝음은 암컷과 수컷의 관계와 같다. 암컷과 수컷이 대를 이어 일어나고 또 맹춘이 정월이 되는 역법과 서로 부합된다. 해는 서쪽으로 지고, 동쪽에서부터 밝아오고, 달은 서쪽에서부터 밝아오기 시작하여 동쪽으로 진다. 정월을 정할 때에 하늘의 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도리를 따르지 않으면 모든 일이 쉽게 무너지고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된다.
제왕이 성(姓)을 바꾸고 하늘의 명(命)을 받아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맨 처음부터 신중해야한다. 정삭(正朔, 정월 초하루. 역성혁명을 이룬 제왕이 새로 제정하여 반포함)의 역법을 고치고, 복식(服飾)의 색깔을 달리하고, 천체 운행의 시작되는 근본을 탐구하여 그 뜻을 순순히 받아들어야 한다.
– 사마천의 논평
태사공은 말했다.
“신농씨(神農氏) 이전의 일은 너무나 오래되어 거론할 필요가 없다. 황제(黃帝) 때에 성력(星曆, 천문역법)을 고찰하고 역법을 제정하고, 오행(五行)의 차례를 세우고, 음양이 소멸되고 생성되는 규율을 확립하였으며, 윤달을 두어 일 년 열두 달의 크고 작은 차이를 바로 잡았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신에게 각기 제사를 올리고, 기타 물류(物類)에 대해서는 적합한 인재에게 관직을 주었는데, 이를 오관(五官, 오행을 맡은 다섯 관원. 즉, 목을 담당하는 장관인 구망, 화를 담당하는 축융, 금을 담당하는 욕수, 수를 담당하는 현명, 토를 담당하는 후토. 혹은 황제 시대에 오색구름 이름으로 다섯 가지 관직명을 삼았는데, 이를 청운씨, 진운씨, 백운씨, 흑운씨, 황운씨로 알려짐)이라고 했다.
각기 맡은 직분에 따라 정무에 힘쓰니 서로 혼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신뢰감을 갖게 되었고, 신도 영명한 덕을 밝힐 수가 있었다. 백성은 신과 직책이 달랐지만 서로 공경하고 번거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 그들에게 곡식을 가꿀 수 있게 했으며,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 제물을 바침으로써 재앙과 화(禍)가 생기지 않았고 다함이 없이 바라는 바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소호씨(少皞氏)가 쇠락한 후에 구려족(九黎族)이 덕정(德政)을 어지럽히자 백성과 신의 관계가 마구 뒤섞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앙과 해악이 거듭 일어났고, 나쁜 기운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었다. 전욱(顓頊)이 제왕의 자리를 이어받자 곧 남정(南正, 상고 시대 관직명으로 목정(木正)이라고도 한다.) 중(重)에게 하늘에 관한 일을 주관하게 하여 신에 올리는 제사를 맡겼고, 화정(火正, 상고 시대 관직명으로 북정(北正)이라고도 한다. 불을 관장함) 여(黎)에게 땅에 관한 일을 주관하게 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다. 다시는 과거의 전통을 회복시키고, 서로 침범하고 모독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 삼묘족(三苗族)이 구려족의 행적을 따라서 난을 일으켜 중(重), 여(黎)의 두 관직을 모두 없애자, 윤달을 계산하고 못하고 혼란이 생겼으며 정월이 소실되었으며 섭제성(攝提星, 절후를 맡은 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역법과 천체의 운행의 질서를 잃게 되었다. 당요(唐堯, 요임금) 때에 다시 중(重)과 여(黎)의 후손을 임용해 그들로 하여금 옛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원래의 직무를 돌아 보도록 하고, 또한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라는 관직을 설립했다.
천시(天時)의 변화가 바른 법도에 맞게 되자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비와 바람이 적절하게 되자 무성한 기운이 이르렀고, 백성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요절하는 일이 없어졌다.
요 임금은 나이가 들어 노쇠해지자 순(舜)에게 선양(禪讓)했다. 그는 문조묘(文祖廟)에서 순에게 훈계하며 말하기를 “하늘의 역수(曆數)을 만드는 중임은 당신 한 몸에 달려있도다.”라 했다. 순도 요임금에게 들은 그 말을 똑같이 하나라 우(禹)에게 전해주었다. 이를 살피어보면 역법이 제왕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 것을 알 수 있다.
하(夏)나라 때에는 정월(正月)을, 은(殷)나라 때에는 12월을, 주(周)나라 때에는 11월을 정삭(正朔, 정월 초하루)로 삼았다. 대개 삼왕(三王) 시대의 정삭은 마치 순환되는 것 같아서 궁극에 다다르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온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절기의 차례도 조화를 잃지 않으며, 도가 없으면, 즉 왕이 반포한 역법도 제후의 나라들이 실행하지 않게 된다.
(주나라의) 유왕(幽王), 여왕(厲王) 이후에는 주나라 왕실의 세력이 미약해져 열국의 경대부들이 정권을 잡자, 사관들은 정확한 시기를 기록하지 않았고, 군주가 고삭(告朔, 천자가 정삭(正朔)을 제후에게 반포하는 것)의 예를 거행하지 않았다. 고로 역법과 천문학자들의 자제가 각지로 분분하게 흩어졌다. 그중에 어떤 이는 중국의 여러 제후국에 흩어져 있었지만 어떤 이는 오랑캐의 땅으로 가버렸다. 이 때문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도가 황폐하지고 통일되지 않았다.
주나라 양왕(襄王) 26년에 윤 3월을 두었는데, 『춘추(春秋)』에는 윤월을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대의 선왕들이 역법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 먼저 역원(曆元, 역서의 근원. 역법 계산의 기점)과 년, 월, 일 등의 개시하는 시각을 정했고, 다시 매달 중순에 열 두 절기에 두었으며, 매달 남는 시간을 모아서 한 해의 마지막으로 돌려 윤달에 귀속시켰다. 일 년의 시작을 사립(四立, 입춘, 입하, 입추, 입동)에서부터 추산하여 절기 차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였고,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은 매달 중순에 절기를 두어 백성들이 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고, 남는 시간을 윤달에 귀속시킴에 따라 일의 어그러짐이 없게 하였다.
그 후 전국(戰國) 시대에는 각국의 목적은 단지 자국을 강성하게 만들고 적에게 승리하는 데에 있었고, 또한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정신을 뺏겼다. 그렇기 때문에 역법을 제정하는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그 시기에는 오로지 추연(鄒衍)만이 오덕지전(五德之傳)에 밝았으며, 음양이 소멸되고 생성되는 이치를 퍼뜨려서 제후들에게 그 명성을 떨쳤다.
그리고 또한 진(秦)나라가 6국(六國)을 멸할 때에는 전쟁이 극심했으며, 뒤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역법 연구에]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또한 오행(五行) 상극(相克)의 이치에 자못 관심을 기울여 스스로 오행(五行) 중에 수덕(水德)의 상서로움을 얻었다고 여겼으며, 황하의 명칭을 고쳐서 ‘덕수(德水)’라고 불렀다. 그리고 10월을 정월로 삼았고, 오색 중에 흑색을 숭상했다. 또한 역법에 윤달을 두었지만 그 정확한 진상을 가릴 정도는 아니었다.
한(漢)나라가 흥기하자 고조(高祖)는 말하길 “북치(北峙)가 나를 기다렸기에 세웠다.(고조가 북치에서 오제의 신위를 갖추어놓고 흑제(黑帝)에게 제사 지낸 것을 일컫는다.)”라고 하고 스스로 수덕(水德)의 상서로움을 얻었다고 여겼다. 당시 일부 역법의 이치에 밝았던 사람들과 장창(張蒼) 등도 모두들 그렇게 여겼다. 이때 천하가 금방 평정되었기에 나라의 기강에 큰 틀을 세울 때였으나, 고후(高后, 여태후)가 여주(女主, 여자 주군)가 되어 정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모두가 역법에 대해 더 이상 연구할 틈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秦)나라의 정삭과 복색을 그대로 답습했다.
효문제(孝文帝) 때에 이르러 노(魯)나라 사람인 공손신(公孫臣)이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 왕조가 오행(五行)의 상승(相勝) 순서에 따라 일정하게 바뀌어 진다는 학설로, 전국 시대 제(齊)나라의 추연(騶衍)이 창안함)’을 근거로 삼아 황제에게 글을 올려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는 토덕(土德)을 얻었으니 마땅히 원년을 고치고, 정삭을 바꾸며, 복색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늘에서 상서로운 조짐을 보일 것이니, 황룡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황제는) 이 일에 대해서 승상 장창에게 하문하니, 장창은 자신이 율력(律曆)을 배운 적이 있는데, 공손신의 학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 했다.
그 후에 황룡이 성기(成紀) 땅에 출현하니 장창은 자신의 허물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장창은 자신이 저술하고 싶었던 역법에 관한 논술 또한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 신원평(新垣平)이란 방사(方士)가 스스로 망기(望氣, 망운(望雲)이라고도 하며, 구름을 보고 길흉을 예언하는 점술)의 기법을 터득했다고 황제에게 자랑하면서 역법과 복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후에 그가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효문제는 그의 주장을 폐기하고 다시 물어보지 않았다.
지금 황상(皇上, 한무제)가 즉위하자 방사인 당도(唐都)를 불러서 천부(天部, 28수(宿))에 대해 측량을 하였다. 그리고 파군(巴郡) 낙하(落下)의 굉(閎)이란 사람에게 해와 달, 별 등의 운행에 대해 계산하도록 했다.
그런 후로 일진(日辰, 지간[支干])이 운행하는 도수와 하(夏)나라 역법을 같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연호를 바꾸고, 관직의 명칭을 고쳤으며, 태산(泰山)에서 봉제(封祭)를 올렸다. 그리고 어사(御史)를 불러 이르기를 “지금까지 역법을 담당하는 관리가 성도(星度, 별이 운행하는 도수)에 대해 측량하지 못했으니, 널리 인재를 모으고 의견을 듣고 어떻게 성도를 측정해야 할 것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어떻게 측정할 것에 대한 만족할 답변을 얻지 못했다. 대략 듣자니 예전에 황제(黃帝)는 성스러운 덕과 신령이 서로 결합하여 죽지 않고 용을 타고 신선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일찍이 천제의 명칭과 운행 규칙을 증험했다고 한다. 또 오음(五音) 청탁(淸濁)의 높낮이를 확정짓고, 사시(四時)와 오부(五部, 오행[五行])의 관계를 확립했으며, 이십사기(二十四氣)와 만물, 천체의 운행에 대해 분수(分數)를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의 연대는 너무 오래되었다! 기록은 완전하지 못하고 예악도 문란해져서 짐은 그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짐은 오직 이전의 역법을 밝혀내어 좇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분(日分, 일수(日數)의 단위)을 역산하고, 수덕(水德)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토덕(土德)을 서로 결합하려고 한다. 지금 태양이 바로 하지(夏至)를 순행하니, 황종(黃鐘)으로 궁성(宮聲)을 삼고, 임종(林鐘)으로 치성(徵聲)를 삼고, 태주(太簇)로 상성(商聲)을 삼고, 남려(南呂)로 우성(羽聲)를 삼고, 고선(姑洗)으로 각성(角聲)을 삼는다. 이후로 24절기가 정상을 회복하고, 우성(羽聲)이 맑은 소리를 회복하며, 율명(律名)도 다시 회복되어 바르게 될 수가 있었으며, 자일(子日)은 동지(冬至)로 삼았다. 이후에 음양이 떨어지고 합치는 도가 실행될 수 있었다.
이미 11월 갑자(甲子) 삭일(朔日) 새벽에 동지가 관측되었으니, 마땅히 원봉(元封) 7년을 태초(太初) 원년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연명(年名)을 ‘언봉섭제격(焉逢攝提格)’이라 하고, 월명(月名)을 ‘필취(畢聚, 정월)’라고 부르고, 일명을 갑자(甲子)라고 하며, 또 야반(夜半) 삭단(朔旦)을 동지로 삼았다.”
– 역술 갑자편(曆術 甲子篇)
태초(太初) 원년에 연명(年名) 언봉섭제격(焉逢攝提格), 월명(月名) 필취(畢聚), 날은 갑자(甲子)이고, 야반(夜半) 삭단(朔旦)을 동지로 삼았다.
.정북(正北)
태초(太初)
원년(BC 104) 갑인(甲寅) 12개월 = 0일, 0분 : 0일, 0분 = 0일, 0분 : 0일, 0분
2년(BC 103) 을묘(乙卯) 12개월 54일, 348분: 5일, 8분
3년(BC l02) 병진(丙辰) 윤년13개월 48일, 696분 10일, 16분
4년(BC 101) 정사(丁巳) 12개월 12일, 603분 15일, 24분
천한(天漢)
원년(BC 100) 무오(戊午) 12개월 7일, 11분 21일, 0분
2년(BC 99) 기미(己未) 윤년13개월 = 1일, 359분 26일, 8분
3년(BC 98) 경신(庚申) 12개월 = 25일, 266분 : 31일, 16분
4년(BC 97) 신유(辛酉) 12개월 19일, 614분 36일, 24분
태시(太始)
원년(BC 96) 임술(壬戌) 윤년13개월 = 14일, 22분 : 42일, 0분
2년(BC 95) 계해(癸亥) 12개월 = 37일, 869분 47일, 8분
3년(BC 94) 갑자(甲子) 윤년13개월 = 32일, 277분 52일, 16분
4년(BC 93) 을축(乙丑) 12개월 56일, 184분 57일, 24분
정화(征和)
원년(BC 92) 병인(丙寅) 12개월 50일, 532분 3일, 0분
2년(BC 91) 정묘(丁卯) 윤년13개월 44일, 880분 8일, 8분
3년(BC 90) 무진(戊辰) 12개월 8일, 787분 13일, 16분
4년(BC 89) 기사(己巳) 12개월 3일, 195분 18일, 24분
후원(后元)
원년(BC 88) 경오(庚午) 윤년13개월 57일, 543분 2일, 8분
2년(BC 87) 신미(辛未) 12개월 21일, 450분 29일, 8분
시원(始元)
원년(BC 86) 임신(壬申) 윤년13개월 15일, 798분 34일, 16분
.정서(正西)
시원(始元)
2년(BC 85) 계유(癸酉) 12개월 39일, 795분 39일, 24분
3년(BC 84) 갑술(甲戌) 12개월 34일, 113분 45일, 0분
4년(BC 83) 을해(乙亥) 윤년13개월 28일, 461분 50일, 8분
5년(BC 82) 병자(丙子) 12개월 52일, 368분 55일, 16분
6년(BC 81) 정축(丁丑) 12개월 46일, 716분 0일, 24분
원봉(元鳳)
원년(BC 80) 무인(戊寅) 윤년13개월 41일, 124분 6일, 0분
2년(BC 79) 기묘(己卯) 12개월 5일, 31분 11일, 8분
3년(BC 78) 경진(庚辰) 12개월 59일, 379분 16일, 16분
4년(BC 77) 신사(辛巳) 윤년13개월 53일, 727분 21일, 24분
5년(BC 76) 임오(壬午) 12개월 17일, 634분 27일, 0분
6년(BC 75) 계미(癸未) 윤년13개월 12일, 42분 32일, 8분
원평(元平)
원년(BC 74) 갑신(甲申) 12개월 35일, 889분 37일, 16분
본시(本始)
원년(BC 73) 을유(乙酉) 12개월 30일, 297분 42일, 24분
2년(BC 72) 병술(丙戌) 윤년13개월 24일, 645분 48일, 0분
3년(BC 71) 정해(丁亥) 12개월 48일, 552분 53일, 8분
4년(BC 70) 무자(戊子) 12개월 42일, 900분 58일, 16분
지절(地節)
원년(BC 69) 기축(己丑) 윤년13개월 37일, 308분 3일, 24분
2년(BC 68) 경인(庚寅) 12개월 1일, 215분 9일, 0분
3년(BC 67) 신묘(辛卯) 윤년13개월 55일, 563분 14일, 8분
.정남(正南)
지절(地節)
4년(BC 66) 임진(壬辰) 12개월, 19일, 470분 19일, 16분
원강(元康)
원년(BC 65) 계사(癸巳) 12개월 13일, 818분 24일, 24분
2년(BC 64) 갑오(甲午) 윤년13개월 8일, 226분 30일, 0분
3년(BC 63) 을미(乙未) 12개월 32일, 133분 35일, 8분
4년(BC 62) 병신(丙申) 12개월 26일, 481분 40일, 16분
신작(神爵)
원년(BC 61) 정유(丁酉) 윤년13개월 20일, 829분 45일, 24분
2년(BC 60) 무술(戊戌) 12개월 44일, 736분 51일, 0분
3년(BC 59) 기해(己亥) 12개월 39일, 144분 56일, 8분
4년(BC 58) 경자(庚子) 윤년13개월 33일, 492분 1일, 16분
오봉(五鳳)
원년(BC 57) 신축(辛丑) 12개월 57일, 399분 6일, 24분
2년(BC 56) 임인(壬寅) 윤년13개월 51일, 737분 12일, 0분
3년(BC 55) 계묘(癸卯) 12개월 15일, 654분 17일, 8분
4년(BC 54) 갑진(甲辰) 12개월 10일, 62분 22일, 16분
감로(甘露)
원년(BC 53) 을사(乙巳) 윤년13개월 4일, 410분 27일, 27분
2년(BC 52) 병오(丙午) 12개월 28일, 317분 33일, 0분
3년(BC 51) 정미(丁未) 12개월 22일, 665분 38일, 8분
4년(BC 50) 무신(戊申) 윤년13개월 17일, 73분 43일, 16분
황룡(黃龍)
원년(BC 49) 기유(己酉) 12개월 40일, 920분 48일, 24분
초원(初元)
원년(BC 48) 경술(庚戌) 윤년13개월 35일, 328분 54일, 0분
.정동(正東)
초원(初元)
2년(BC 47) 신해(辛亥) 12개월 59일, 235분 59일, 8분
3년(BC 46) 임자(壬子) 12개월 = 53일, 583분 4일, 16분
4년(BC 45) 계축(癸丑) 윤년13개월=47일, 931분 9일, 24분
5년(BC 44) 갑인(甲寅) 11개월 11일, 838분 15일, 0분
영광(永光)
원년(BC 43) 을묘(乙卯) 12개월 6일, 246분 20일, 8분
2년(BC 42) 병진(丙辰) 윤년13개월 0일, 594분 25일, 16분
3년(BC 41) 정사(丁巳) 12개월 = 24일, 501분 30일, 24분
4년(BC 40) 무오(戊午) 12개월 18일, 849분 36일, 0분
5년(BC 39) 기미(己未) 윤년13개월 13일, 257분 41일, 8분
건소(建昭)
원년(BC 38) 경신(庚申) 12개월=37일, 164분 46일, 16분
2년(BC 37) 신유(辛酉) 윤년13개월=31일, 512분 51일, 24분
3년(BC 36) 임술(壬戌) 12개월 = 55일, 419분 57일, 0분
4년(BC 35) 계해(癸亥) 12개월 = 49일, 767분 2일, 8분
5년(BC 34) 갑자(甲子) 윤년13개월 = 44일, 175분 7일, 16분
경녕(竟寧)
원년(BC 33) 을축(乙丑) 12개월 = 8일, 82분 :2일, 24분
건시(建始)
원년(BC 32) 병인(丙寅) 22개월 2일, 430분 18일, 0분
2년(BC 31) 정묘(丁卯) 윤년13개월 56일, 778분 13일, 8분
3년(BC 30) 무진(戊辰) 12개월 = 20일, 685분 28일, 16분
4년(BC 29) 기사(己巳) 윤년13개월 = 15일, 93분 33일, 24분
이상이 「역서」이다. 대여(大餘)는 남은 일의 수를 지칭하고, 소여(小餘)는 남은 분의 수를 지칭한다. 단몽(端蒙)은 연명(年名)이다. 지지(地支): 축(丑)은 적분약(赤奮若)이라고 하고, 인(寅)은 섭제격(攝提格)이라 한다. 천간(天干): 병(丙)은 유조(游兆)라고 한다. 정북(正北)에서는 동지가 자시(子時)에, 정서(正西)에서는 동지가 유시(酉時)에, 정남(正南)에서는 동지가 오시(午時)에, 정동(正東)에서는 동지가 묘시(卯時)에 있다.
5. 천관서(天官書)

사마천 사기-서(書)의 다섯 번째 기록으로 천관서(天官書)는 천문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당시 천문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은 물론, 당시 성행하던 ‘천인감응(天人感應)’의 개념과 맞물려,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사상적으로 규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천관서(天官書)
– 별자리
중관(中官, 별자리 및 별자리의 위치)의 천극성(天極星, 북극성) 중 가장 밝은 별에는 천신(天神) 태일[太一, 천일(天一)로도 불리며, 북극신(北極神)의 별명. 천신 중에 존귀한 존재]이 상주한다. 그 주변에 세 별은 삼공(三公, 고대 중국 조정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관직의 합칭)을 상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일신의 아들들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천극성의 뒤에는 갈고리 형상에 굽은 네 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후미에 있는 큰 별은 정비(正妃)이고, 그 나머지 세 별은 후궁(后宮)들이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12별은 중궁 천신의 별을 수호하는 여러 번신(藩臣)이다. 이상 모두를 자궁[紫宮, 북두칠성의 북쪽에 있는 별로, 천제(天帝)가 거처하는 대궐]이라고 일컫는다.
자궁 앞부분에 북두칠성의 자루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는 세 개의 별은 타원형으로 그 끝이 북쪽을 향해 드리워져 있는데, 별빛이 선명하지 않고 보일 듯 말 듯 하여 그 이름을 음덕(陰德) 혹은 천일(天一)이라고 부른다. 자궁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세 별을 천창(天槍)이라 하고, 오른쪽의 다섯별을 천부(天棓), 그 뒤에 여섯별은 은하수를 가로질러 실수[室宿, 28수의 하나로 현무(玄武)의 별자리]까지 도달하는데, 이를 각도[閣道, 규수(奎宿)에 달린 별자리. 규성(奎星)의 위에 6개의 붉은 별로 이루어져 있고, 천자가 별궁으로 가는 길을 의미함]라고 한다.
북두성은 일곱별은 『상서(尙書)』에서 말하는 ‘선기옥형[璿璣玉衡, 천문 관측기구인 혼천의(渾天儀)으로 칠정(七政,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 오성(五星)과 해, 달의 운행]을 가지런히 하는 별이다. 북두의 자루에 해당하는 다섯 째 별에서 일곱 째 별은 표(杓)와 동궁칠수(東宮七宿)의 각수(角宿)은 서로 이어져 있고, 북두의 중앙에 있는 별인 형(衡)과 남두수(南斗宿)은 서로 간절한 듯이 마주하고 있다. 북두의 첫째별인 괴(魁)는 서방칠수(西方七宿) 중에 삼수(參宿)의 머리를 베개 삼고 있다. 황혼 때에 인(寅)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북두의 표(杓)로 화산(華山) 서남쪽 방향의 길흉화복을 주관하고 있다.
한밤중에 인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북두의 형(衡)으로 황하(黃河), 제수(濟水) 사이인 중원(中原) 일대의 길흉화복을 주관하고 있다. 여명이 밝아올 때 인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북두의 괴(魁)로 동해와 태산 일대인 동북방의 길흉화복을 주관하고 있다. 북두성은 천제의 수레로 하늘의 중앙에서 운행하면서 사방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음양을 분별하고 사시(四時)를 세우며 오행을 고르게 하고 절기를 바꾸고, 십이진(十二辰)의 위치를 확정하는 것 등 모두 북두에 의지한다.
북두 괴(魁) 위에 광주리 형상과 비슷한 여섯별이 있는데, 이를 문창궁(文昌宮)이라 부른다. 문창궁의 각 별 명칭은 첫째는 상장(上將), 둘째는 차장(次將), 셋째는 귀상(貴相), 넷째는 사명(司命), 다섯째는 사중(司中), 여섯째는 사록(司祿)이라 한다.
북두 괴의 네 번째 별 중간에 귀인(貴人)의 감옥이 있다. 괴 아래에서 여섯별이 있는데, 두 별씩 나란히 마주하고 있는데, 이를 삼태[三能, 별이름으로 ‘능(能)’의 음은 태(台)이다. 삼태성은 큰곰자리에 있는 상태(上台)ㆍ중태(中台)ㆍ하태(下台)를 가리킨다. 이는 천자의 삼공(三公)에도 비유됨]이라고 일컫는다. 삼태의 색깔의 밝고 어두운 것이 서로 같으면 군주와 신하가 화목하고, 같지 않으면 군주와 신하가 비뚤어지게 된다.
북두 곁에 보성(輔星)이 밝아지고 가까워지면 보좌하는 대신이 신임을 받고 또한 권한도 엄중해지고, 북두에서 멀어지고 작아지면 신임을 받지 못하고 권한을 더욱 줄어들고 약해진다.
북두 표(杓)의 말단에 두 별이 있는데, 북두에서 가까운 별은 천모(天矛)라고 부르는데, 바로 초요성(招搖星)이다. 북두에서 좀 더 떨어져 있는 별은 순성(盾星)으로 천봉(天鋒星)으로도 불린다. 북두 표에 가까운 곳에 15개의 별이 있는데, 그 형상이 위에는 갈고리 같고, 아래는 고리 모양과 같은데, 천인(賤人)의 감옥이라 일컬어진다. 이 감옥 가운데에 별이 많으면 속세에서 죄인도 많아지고, 별이 적으면 죄인도 적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천일(天一), 천창(天槍), 천부(天棓), 천모(天矛)와 순성(盾星)이 동요하고, 별빛의 뾰족한 끝이 크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시한다.
– 항성
.동궁(東宮)
동궁(東宮)의 외형은 창룡(蒼龍, 청룡, 28수 중 동방 7수의 총칭이기도 함)과 비슷하고, 방수(房宿)와 심수(心宿)를 포괄하고 있다. 심수는 천제(天帝)가 정령(政令)을 선포하는 명당(明堂)이고, 그 중 큰 별은 천왕(天王)을 상징하고 전후에 작은 두 별은 왕의 자손이다. 심수의 세 별이 배열된 형상은 직선으로 늘어서지 말아야 하며, 만약 직선이 되면 천왕의 정령이 잘못된 것임을 표시한다. 방수는 천왕이 머무는 관부(官府)이고 또 천자의 수레인 천사(天駟)로 알려진다. 방수의 북쪽에 있는 별은 우참(右驂)이다.
그 곁에 두 별은 금(衿)이고 북쪽의 한 별은 할(舝)이다. 동북쪽에 굽어져 늘어선 12별은 기(旗)라고 한다. 기 중에 네 별은 천시[天市, 방수(旁宿)ㆍ심수(心宿)의 동북쪽에 있는 별자리. 나라의 시장 교역 및 참륙(斬戮)의 일을 관장함] 여섯별은 시루(市樓)라고 한다. 천시 중에 별의 수가 많아지면 세간이 넉넉하고 부유해지며, 별의 수가 적어지면 나라의 국고가 비고 백성은 가난해진다.
방수 남쪽에 있는 허다한 별들을 기관(騎官)이라고 불린다.
각수(角宿)에는 두 별이 있는데, 좌측은 이(李, 고대 법관)이고, 오른쪽은 장(將, 장군)이다. 대각성(大角星)은 천왕의 조정이다. 그 양 곁에 세별이 있는데, 마치 솥발처럼 굽은 형상으로 섭제(攝提)로 일컬어진다. 섭제는 두표(斗杓)가 가리키는 방향 아래로 두표가 마치 손잡고 돌보는 것처럼 보이며 사계절의 절기를 세워주기 때문에 섭제격[攝提格, 고갑자(古甲子)로는 인(寅)에 해당함]이라고 말한다. 항수(亢宿)은 천신의 외조(外朝, 정사를 처리하는 곳)로 질병을 주관한다. 그 남쪽에 남북으로 두 별이 있는데, 남문(南門)으로 불린다. 저수(氐宿)은 바로 하늘의 본바탕이란 뜻으로 역병을 주관한다.
미수(尾宿)에는 아홉 개의 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별들은 천제(天帝)의 아홉 아들로 불리고, 또는 군주와 신하를 상징한다고도 한다. 각 별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군주와 신하 간의 불화를 표시한다. 기수(箕宿, 28수의 하나로 동방청룡 7수에 속함)은 시비를 거는 오만한 세객(說客)으로, 하늘의 구설(口舌)로 불린다.
화성(火星)이 각수(角宿, 28수의 하나로 동방청룡 7수에 속함)의 부근을 제멋대로 침범하거나 접근하게 되면 전쟁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화성이 방수(房宿), 심숙(心宿) 부근에 접근하면 제왕에게 불리하다.
.남궁(南宮)
남궁의 외형은 주작과 비슷하며 권(權), 형(衡)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은 태미원(太微垣, 별자리 이름으로 임금의 뜰을 상징)을 지칭하는데, 해, 달, 다섯별을 뜻하는 삼광(三光)의 궁정이다. 주위에는 보좌와 시위를 하는 열 두별이 있는데, 번신(藩臣)을 대표한다. 서쪽은 장군이고 동쪽은 재상이다. 남쪽의 네 별 중에 가운데에 있는 두 별은 집법관(執法官)이고, 그 중간은 단문(端門, 궁전의 정문)이며 단문의 좌우는 액문(掖門, 정문 옆에 따로 낸 작은 문)이다. 문 안에 여섯별이 있는데, 모두 제후(諸侯)이다. 그 가운데에 다섯별은 오제좌(五帝座)이다. 제후, 오제좌 뒤에는 15별이 모여 있는데, 무성하게 뒤섞여 있으며 낭위(郎位)라고 한다. 낭위 곁에 큰 별이 하나가 있는데, 장위(將位)이다.
달과 다섯별이 서쪽으로부터 동쪽의 태미원으로 순행하여 들어가고, 정상적인 궤도를 따라 운행한다. 그들이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아무개 별 곁에 머무르거나 침범하면 세간과 그 별에 대응하는 관원들은 천자에 의해서 주살된다. 달과 다섯별이 동쪽으로부터 서쪽의 태미원으로 거슬러 들어가고, 정상적인 궤도를 따라지 않으면, 그들은 천자가 관원에게 죄를 받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만약 중간의 오제좌를 침범하면 이미 재앙이 이뤄져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여러 신하들이 공모하여 난리를 일으킨 결과이다.
금성, 화성이 오제좌를 침범하면 그 재앙이 엄중하다. 태미원을 보좌하는 위성 서쪽으로 드리워진 다섯 별들을 소미(小微)라고 하고, 사대부를 상징한다. 권(權)은 바로 헌원좌(軒轅座)로 그 형상이 황룡과 같다. 앞 쪽의 큰 별은 여주(女主, 황후)를 상징한다. 기타 작은 별은 후궁들이다. 달과 다섯별이 헌원좌를 침범하게 되면 형(衡)을 점칠 때와 같이 하면 된다.
동정수[東井宿, 이십팔수 중에 남방주작(南方朱雀)에 있는 별자리]는 물의 일을 주관한다. 그 서쪽에 한쪽으로 편중되어 굽어진 별이 월성[鉞星, 즉 천창삼성(天槍三星)으로 북두 표(杓)의 동쪽에 위치함. 또 천월(天鉞)로도 일컬어짐]이다. 월성의 북쪽에는 북하(北河)가 있고, 남쪽에는 남하(南河)가 있다. 북하, 남하와 천권성(天闕星)의 사이는 삼광(三光)이 지나가는 관문이다.
여귀수[輿鬼宿, 귀성(鬼星)에 딸린 별로서 오성(五星)이 있음]는 귀신의 제사와 점치는 것을 주관한다. 그 중에 백색별의 이름은 질성(質星)이라고 한다. 화성이 남하와 북하를 지키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날 징조이고, 흉년이 들어 곡식을 거둘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덕정(德政)을 베풀면 형(衡座)에서, 천자가 유람하면 천황(天潢座)에서, 제왕이 일을 망치면 월(鉞星)에서, 재난과 변란은 정(井宿)에서, 주살(誅殺)이 생기게 되면 질성(質星)에 그 조짐이 나타난다.
유수(柳宿)는 주작(朱雀)의 부리 형태로 초목의 일을 주관한다. 칠성수(七星宿)은 주작의 목 줄기에 해당하며, 목구멍과 마찬가지로 긴급한 일을 주관한다.
장수(張宿)는 주작의 모이주머니이자 천정(天庭)의 주방으로 손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을 주관한다. 익수(翼宿)는 주작의 날개로 멀리서 온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주관한다. 진수(軫宿)는 천신의 수레로 바람을 주관한다. 그 곁에 작은 별 하나가 있는데, 장사성(長沙星)으로 불린다. 이 별이 밝게 빛나지 않고, 만약 진수의 네 별과 비슷한 밝기의 빛을 내거나 다섯별이 진수의 가운데에 들어가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진수의 남쪽에 뭇 별들은 천고루(天庫樓)로 불리는데, 천고 곁에 오거성(五車星)이 있다. 이 오거성에서 광망을 내뿜고, 또한 별의 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모두 천하의 거마(車馬)가 소동을 일으키고, 처할 곳이 없게 된다.
.서궁(西宮)
서궁은 함지(咸池)로 불리는데, 그 속에는 천오황(天五潢)이라는 별자리가 있다. 오황(五潢)은 오제(五帝)의 수레와 창고이다. 화성이 그 가운데로 침입하면 하늘에는 가뭄이 들고, 금성이 침입하면 병란이 일어나며, 수성이 침입하면 수재가 생긴다. 그 가운데에 또 삼주성(三柱星)있는데, 하나라도 보이지 않으면 전쟁이 발생한다.
규수(奎宿)는 또 봉시(封豕)라고 부르는데, 도랑(수로)을 주관한다. 누수(婁宿)는 대중을 모으는 일을 주관한다. 위수(胃宿)는 곡물 창고를 주관한다. 위수의 남쪽에는 허다한 별들이 있는데, 괴적(廥積)으로 부른다.
묘수[昴宿, 이십팔수의 하나로 백호칠수(白虎七宿) 중에 네 번째 성수]는 또 모두[髦頭, 환하게 빛나면 홍수가 나고 호병(胡兵)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별자리. 흔히 황제의 의장(儀仗)에서 선두를 맡던 기병(騎兵)을 가리키는 말]라고 하는데, 북방 오랑캐와 흰 옷을 입고 조문하는 상사(喪事)를 주관한다.
필수(畢宿, 이십팔수의 하나로 백호칠수에 속함. 열다섯 개의 별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방을 지키는 장수, 병사의 훈련과 하늘의 비를 맡는 관리를 주관함.)는 한거(罕車)라고도 하는데, 변방의 군대를 상징하며 사냥 등의 일을 주관한다. 필수 중에 가장 큰 별 곁에 있는 작은 별은 부이(附耳)로 불린다. 이 부이가 요동하면 천자 주변에 중상모략하고 난을 일으키는 신하가 있다는 것이다.
묘수와 필수 사이에 두 별은 천가(天街, 해ㆍ달ㆍ별이 다니는 길로 주로 관문과 교량의 동태를 살피는 것을 주관하며 별이 밝으면 왕도가 바로 서고 어두우면 난리가 남.)이다. 가북(街北)은 음[陰, 이적(夷狄)]의 국가를 상징하고, 가남(街南)은 양[陽, 화하(華夏), 중원]이 건립한 국가를 상징한다.
삼수(參宿)의 형상은 백호(白虎)와 같다. 그 중간에 세 별은 직선으로 늘어서 있는데, 저울 역할을 하여 형석(衡石)으로 불린다. 형석 아래의 세 별은 직선으로 늘어서 있는 것이 추(錐)와 같고 벌(罰)이라고 불리며, 참형에 관련된 일을 주관한다. 형석 밖의 네 별은 삼수의 좌우 어깨와 양쪽 넓적다리이다. 삼수의 위쪽 모퉁이에 있는 세 별은 삼각형으로 자휴[觜觿, 자수삼성(觜宿三星)으로 삼군(三軍)의 일을 주관하는데, 명랑하면 군수(軍需)가 풍부해진다고 함]라고 하고, 백호의 머리로 군대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삼수의 남쪽에 있는 네 별은 천측(天厠)으로 불린다. 천측 아래에 한 별이 있는데, 천시(天矢)라고 한다. 천시가 황색이 되면 상서롭고, 청색이나 백색, 흑색이 되면 흉하다. 삼수의 서쪽에 구불구불한 아홉 개의 별이 세 조로 나열되어 있다. 첫째 조는 천기(天旗)라고 하고, 둘째 조는 천원(天苑)이라고 하며, 셋째 조는 구유(九遊)라고 한다.
삼수 동쪽의 큰 별은 낭성[狼星, 천랑성(天狼星)의 준말로, 반란이나 전쟁을 상징하는 불길한 별]이라고 한다. 낭성 모서리의 광망 색깔이 변하면 천하에 도적이 많아진다. 아래쪽의 네 개의 별은 호(弧)라고 하는데, 정면으로 낭성과 마주하고 있다. 낭성의 아래쪽과 지평선이 접하는 곳에 큰 별이 있는데,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 남극성이다. 사람들의 수명을 주관하여 수성(壽星)으로도 불린다]으로 불린다. 노인성이 출현하면 세상이 평안하고, 출현하지 않으면 전쟁이 생긴다. 흔히 추분(秋分) 일 여명이 밝아올 무렵에 남쪽 교외에서 관측된다.
부이성(附耳星)이 필수(畢宿) 속으로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난다.
.북궁(北宮)
북궁은 현무(玄武)의 형상으로 허수(虛宿), 위수(危宿)로 이루어져 있다. 위수는 천부(天府), 천시(天市)와 집을 짓는 등 온갖 공사를 주관하고, 허수는 상사(喪事) 때에 곡읍(哭泣)의 일을 주관하고 있다.
허수, 위수의 남쪽에는 일군의 별들이 있는데 우림천군[羽林天軍, 천군(天軍)을 관장하는 장성(將星)이다]이라 한다. 우림천군의 서쪽에 뭇 별의 명칭은 누(壘)라고 하고, 혹은 월성(鉞星)이라고 한다. 월성 곁에 있는 하나의 큰 별은 북락[北落, 별 이름으로 북(北)은 북방에 있기 때문이고, 낙(落)은 하늘의 울타리라는 뜻이다]이다. 만약 북락이 밝지 않고 숨거나 보이지 않으면 우림천군의 별들이 요동치면 광망이 있고 별 수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다섯 개의 별이 북락을 침범하고 우림천군을 침범하면 전쟁이 발생한다.
화성, 금성, 수성이 우림천군을 침범하면 더욱 엄중하니, 화성이 침범하면 군대에 불리하며, 수성이 침범하면 수재(水災)가 생기고, 목성과 토성이 침범하면 전쟁에서 유리하다.
위수의 동쪽에는 여섯 개의 별이 있는데, 두 개씩 서로 인접하여 마주보고 있으며 사공(司空)이라고 한다.
영실수(營室宿)는 천상의 청묘[淸廟, 종묘(宗廟)로 국가의 정치와 교화를 행하는 곳. 하(夏)나라는 ‘세실(世室)’, 은(殷)나라는 ‘중옥(重屋)’, 주(周)나라는 ‘명당(明堂)’ 또는 ‘청묘(淸廟)’라고 불렀다.]이다. 부근에 이궁(離宮)과 각도(閣道)가 있다. 영실의 북쪽의 은하수 중에는 네 개의 별이 있는데, 천사(天駟, 말과 임금이 타는 수레를 맡은 별)라고 한다. 천사의 곁에 있는 한 별은 왕량(王良)이다. 그 곁에 있는 한 별은 책성[策星, 이십팔수 중에 규수(奎宿)에 속하는 별로, 왕량(王良)이 천사(天駟)를 몰 때 쓰는 채찍을 의미하며 주로 천자의 말을 모는 시종을 관장함.]이다. 왕량이 책성을 몰 때에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하면 온 들판에 전차와 기마병이 가득 차게 된다.
그 곁에는 여덟 개의 별이 은하수를 가로질러 있는데, 천황(天潢)이라고 한다. 천황 곁에 별 하나가 있는데, 강성(江星)이라고 한다. 강성이 요동치면 수재가 일어나 사람들은 물을 건너야 한다.
저구(杵臼)에 있는 네 별은 위수의 남쪽에 있다. 또 포과성(匏瓜星)의 자리에 만약 청색, 흑색의 별이 그 부근에 머물러 있으면 천하의 물고기, 소금 값이 귀해진다.
남두수(南頭宿)는 천묘(天廟)로 그 북쪽에 건성(建星)이 있다. 건성은 천묘 앞에 기(旗)와 같다. 견우수(牽牛宿)은 묘 앞의 제사에서 쓰이는 희생으로 삼는다. 견우성 북쪽에 하고수(河鼓宿)이다. 하고수 중에 큰 별은 상장(上將)을 대표하고 좌우의 작은 별은 좌장(左將)과 우장(右將)을 대표한다. 또 무녀수(婺女宿)가 있는데, 그 북쪽은 직녀성(織女星)이다. 직녀는 천제의 손녀이다.
– 세성(歲星): 목성
해와 달의 운행을 관찰하여 세성(歲星, 목성)의 운행이 정상적인지의 여부를 헤아린다. 오행설에 따르면 세성은 오방(五方) 중에 동방을 주관하고 오행에서 목(木)이 되고 사계절에서 봄을 주관한다. 십천간(十天干)에서 갑을(甲乙)에 해당된다. 의롭지 않는 행동이 많아지면 하늘이 내린 징벌은 세성에서부터 나온다. 세성의 운행에는 진퇴가 있는데, 그것은 천구(天球) 위에 처해있는 자리에 따라 지상의 어떤 나라가 대응하게 된다.
세성은 처해 있는 자리에 대응하는 직접 나라를 정벌할 수 없고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 세성의 운행이 대응하는 지역을 초과하는 것을 영(嬴)이라고 한다. 대응하는 지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축(縮)이라고 한다. 영이 일어나면 대응하는 나라에 병란이 일어나고 사람 쉴 수 없게 된다. 축이 일어나면 대응하는 나라에 우환이 생기고 장군은 사망하고 나라는 기울고 패망하게 된다.
세성이 지나는 자리에 만약 오성도 그 자리에 모여 있으면 밑에 대응하는 나라는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섭제격(攝提格)의 해에는 세음[歲陰, 태세(太歲)]가 인(寅)의 위치에 있으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고, 세성이 축(丑)의 자리에 있으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한다. 정월에 두수(斗宿)와 견우수(牽牛宿)이 함께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는데, 이를 감덕(監德)이라 한다. 별의 색깔이 짙은 푸른색을 띄고 밝게 빛난다. 세성이 성차(星?)를 잃으면 그것이 출현할 때에 유수(柳宿)의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세성이 일찍 나오면 수재가 생기고 늦게 나오면 가뭄이 든다.
세성이 출현 후에 먼저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12도를 운행하여 100일 만에 멈추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8도를 역행하여 100일 만에 다시 동쪽으로 운행한다. 한 해에 30과 16분의 7도를 운행하고 평균 매일 12분의 1도를 운행하다가 12년 만에 하늘을 일주하게 된다. 항상 이른 아침에 동방에서 출현하고, 황혼에 서방으로 진다.
단알(單閼)의 해에는 세음(歲陰)은 묘(卯) 위치에 있고, 세성(歲星)은 자(子) 위치에 있다. 2월에는 세성과 더불어 무녀(婺女), 허수(虛宿), 위수(危宿)가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는데, 이를 강입(降入)이라고 하며, 그 별이 크고 또한 밝다. 세성이 성차를 잃으면 응험이 장수(張宿)의 영역에 보여, 그 해에는 큰 수재가 생긴다.
집서(執徐)의 해에는 세음이 진(辰)의 위치에 있고 세성은 해(亥)의 위치에 있다. 3월에 세성과 더불어 영실(營室), 동벽(東壁)가 함께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는데, 이를 청장(靑章)이라 한다. 별빛이 푸르고 뚜렷하게 드러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만약에 성차를 잃으면 응험이 진수(軫宿)의 영역에 보인다. 세성이 일찍 출현하면 가뭄이 생기고, 늦게 출현하면 수재(水災)가 생긴다.
대황락(大荒駱)의 해에는 세음이 사(巳)의 위치에 있고, 세성은 술(戌)의 위치에 있다. 세성과 더불어 규수(奎宿), 누수(婁宿)가 함께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는데, 이를 변종(跰踵)이라고 한다. 그 별빛이 이글이글하고 적색이고 빛난다. 만약에 성차를 잃으면 응험이 항수(亢宿)의 영역에 드는 지역에 보인다.
돈장(敦牂)의 해에는 세음이 오(午)의 위치에 있고, 세성은 유(酉)의 위치에 있다. 5월에 세성과 더불어 위수(胃宿), 묘수(昴宿), 필수(畢宿)와 함께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는데, 이를 개명(開明)이라고 한다. 별이 이글거리면서 빛이 난다. 이 해에 군사행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제왕에게 유리하나 군대를 다스리는 데는 불리하다. 만약에 성차를 잃으면 응험이 방수(房宿)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세성이 일찍 출현하면 가뭄이 있고, 늦게 출현하면 수재가 난다.
협흡(協洽)의 해에는 세음에 미(未)의 위치에 있고 세성은 신(申)의 위치에 있다. 6월에 세성과 더불어 자휴(觜鑴), 삼수(參宿)가 함께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는데, 이를 장렬(張列)이라고 한다. 성체가 밝고 환한 빛이 난다. 해당하는 해에 용병에 이롭다. 세성이 성차를 잃으면 응험이 기수(箕宿)의 영역에 보인다.
군탄(涒灘)의 해에 세음은 신(申)의 위치에 있고, 세성은 미(未)의 위치에 있다. 7월에 세성과 더불어 동정수(東井宿), 여귀수(輿鬼宿)가 함께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는데, 이를 대음(大音)이라 한다. 밝고 환한 흰빛이 난다. 만약에 성차를 잃으면 응험이 견우수(牽牛宿)의 영역에서 보이게 된다.
작악(作鄂)의 해에는 세음이 유(酉)의 위치에 있고, 세성은 오(午)의 위치에 있다. 8월에 세성과 더불어 유수(柳宿), 칠성(七星), 장수(張宿)가 함께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는데, 이를 장왕(長王)이라 한다. 밝고 환한 빛을 낸다. 이 해에 나라에 길한 일이 생기고 오곡이 풍성하게 무르익는다. 만약에 성차를 잃으면 응험이 위수(危宿)의 영역에 보인다. 이때에 만약에 한발이 있지만 그래도 길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비가 죽고, 민간에 질병이 유행한다.
엄무(閹茂)의 해에는 세음이 술(戌)의 위치에 있고, 세성은 사(巳)의 위치에 있다. 9월에 세성과 더불어 익수(翼宿), 진수(軫宿)가 함께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는데, 이를 천휴(天睢)라고 한다. 별빛이 흰색이 나며 크고 밝다. 만약에 성차를 잃어버리면 응험이 동벽수(東壁宿)의 영역에 보이게 된다. 이런 해에는 수재(水災)가 나거나 후비가 죽는다.
대연헌(大淵獻)의 해에는 세음이 해(亥)의 위치에 있고, 세성은 진(辰)의 위치에 있다. 10월에 세성과 더불어 각수(角宿), 항수(亢宿)가 함께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는데, 이를 대장(大章)이라고 한다. 별빛은 짙은 푸른색으로 마치 도약하듯이 새벽에 희미하게 떠오는데, 이를 정엄(正平)이라고 한다. 이런 해에는 군사를 동원하고 무력을 사용하면 장수는 반드시 무공을 세운다. 나라에 덕이 있으면 장차 천하를 얻어 만인의 군주가 될 수 있다. 성차를 잃게 되면 응험이 누수(婁宿)의 영역에 보인다.
곤돈(困敦)의 해에는 세음이 자(子)의 위치에 있고, 세성은 묘(卯)의 위치에 있다. 11월에 세성과 더불어 저수(氐宿), 방수(房宿), 심수(心宿)가 함께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는데, 이를 천천(天泉)이라고 한다. 별빛은 검푸른 색으로 매우 밝다. 이 해에 강과 연못, 늪에 물이 불어나서 군대를 일으키기에 불리하다. 세성이 성차를 잃게 되면 응험이 묘수(昴宿)의 영역에 보인다.
적분약(赤奮若)의 해에는 세음에 축(丑)의 위치에 있고, 세성은 인(寅)의 위치에 있다. 11월에 세성과 더불어 미수(尾宿), 기수(箕宿)가 함께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는데, 이를 천호(天皓)라고 한다. 별빛이 검붉으며 매우 밝다. 세성이 성차를 잃게 되면 응험이 삼수(參宿)의 영역에 보인다.
세성이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않고, 비록 머물되 또 좌우로 요동치고, 혹은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떠나가고, 다른 별과 만나며 상응하는 나라에 불리하다. 머물러야 할 곳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상응하는 나라에 두터운 덕과 은택이 내린다. 세성의 광망이 요동치고 혹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고 색깔이 자주 변하면 상응하는 나라의 군주에게 우환이 생기는 것을 예시한다.
세성이 성차와 사(舍)를 어기고 앞으로 나아가 동북쪽으로 가면 세 달 뒤에 천봉성(天棓星)이 생긴다. 그 길이는 4장이고, 끝이 뾰족하고 날카롭다. 동남쪽으로 가면 나아가 동남쪽으로 가면 세 달 뒤에 혜성이 나타나는데, 그 길이 2장이고 형상은 빗자루와 유사하다. 물러나와 서북쪽으로 가면 세 달 뒤에 천참성(天欃星)이 생기는데, 이것은 그 길이가 4장이고 끝이 뾰족하고 날카롭다. 물러나와 서남쪽으로 가면 세 달 뒤에 천창성(天槍星)이 생기는데, 그 길은 여러 장이고 양끝이 뾰족하고 날카롭다.
이러한 별들이 출현하는 하늘을 자세히 관찰하여 대응하는 나라에서는 큰일을 거행하거나 병사를 일으켜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세성이 출현할 때에 떠올랐다가 잠긴 듯이 가라앉으면 상응하는 나라에 토목공사가 있고, 잠긴 듯이 가라앉다가 떠오르면 그 분야에 상응하는 나라는 멸망한다. 세성이 색깔이 진홍색이고 광망이 있으면 해당하는 나라는 반드시 창성한다. 이 나라와 전쟁을 하면 승리하지 못한다. 세성의 색깔이 붉은빛을 띠는 누른빛이 짙으면 해당하는 나라에 오곡이 잘 익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
세성의 색깔이 청백색이나 적회색이면 해당하는 나라에 우환이 생긴다. 세성이 달 뒤로 숨으면 해당하는 나라에 재상이 쫓겨난다. 세성과 태백성이 되풀이해서 떨어졌다가 합해지면 해당하는 분야에 군대가 패하게 된다. 세성은 또 섭제(攝提), 중화(重華), 응성(應星), 기성(紀星) 등으로 불린다. 앞서 언급한 영실(營室)은 천상의 밝고 깨끗한 종묘이고, 이것이 바로 세성의 묘당이다.
– 형혹성(熒惑星): 화성
강건한 기상을 관찰하여 형혹성(熒惑星, 화성)의 위치를 판단한다. 오행설에 따르면 형혹은 오방(五方)중에 남방을 상징하고 불에 속하며, 사시(四時) 중에 여름을 주관하고 십간 중에 병정(丙丁)에 해당한다. 군주가 예법을 잃으면 하늘이 형혹성을 통해서 징벌한다. 형혹은 바로 행위에 예법을 잃었다는 뜻이다. 형혹성이 출현하면 전쟁을 생기고, 사라지면 전쟁이 멈춘다.
형혹성의 자리에 해당하는 나라는 여러 가지 길흉의 조짐이 보인다. 형혹성은 모반, 질병, 사상(死喪), 기아, 전쟁 등 재난의 발생을 예시하고 있다.
형혹성이 두 차례 이상 역행하고 머무르면, 머무르는 곳에 상응하는 나라는 석 달 안에 재앙이 생기고, 다섯 달 안에 외침을 받게 된다. 일곱 달 내에는 국토의 과반을 상실하고 아홉 달 내에 대부분을 상실한다. 아홉 달 이후에도 여전히 머물면서 가지 않으면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만다. 형혹성이 머물면서 가지 않는 지방에 재앙이 빨리 오지 않으면 본래 큰 화가 작아진 것이고, 만약 재앙이 천천히 오면 본래 작은 화가 도리어 커지게 된다.
형혹성은 여귀수(輿鬼宿) 남쪽에 머물면 남자가 죽게 되는 것을 예시하고, 여귀성의 북쪽에 있으면 여자가 죽게 되는 것을 예시한다. 만약 형혹성에 광망이 요동치고 선회하면서 전후좌우로 나타났다 사라지면 재앙은 더욱 커진다. 다른 행성과 떨어졌다가 합해져서 빛의 광도가 차이가 나지 않으면 해롭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해롭지 않다. 형혹성과 함께 다섯별이 서로 모여 같은 사(舍)에 있으면 대응하는 나라는 예법으로 천하를 얻을 수 있다.
형혹의 운행 규칙은 출현한 후에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16사(舍)를 경과한 후에 머물고, 서쪽으로 역행하여 2사(舍)를 가고, 대략 60일이 지나면 다시 또 동쪽으로 가서 수십 사(舍)를 갔다가 대략 10개월 후에서 서쪽으로 숨어버린다. 다섯 달을 잠복 운행한 후에 동쪽에서 출현한다. 만약에 서쪽에서 출현하면 반명(反明)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군주에게 불리하다. 동쪽으로 갈 때는 빨라서 하루에 1.5도를 간다.
형혹성이 동서남북으로 급하게 움직이면 상응하는 지역에선 군대가 그 아래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킨다. 형혹성이 가는 쪽으로 순응하여 군대를 쓰면 필승을 거두고 형혹성이 가는 쪽으로 역행하여 군대를 쓰면 패한다.
형혹성은 태백(太白, 금성)을 따라 운행하면 군대에 우환이 생기고, 태백에서 떨어지면 군대는 퇴각한다. 태백의 북쪽으로 출현하면 군대는 나뉘고, 태백이 남쪽으로 출현하면 편장(偏將)이 출전하게 된다. 형혹성이 운행할 때 태백성은 뒤에서 형혹성을 따르게 되면 군대가 패하고, 장군은 피살된다. 형혹성이 머물거나 혹은 태미원(太微垣), 헌원좌(軒轅座), 영실수(營室宿)를 침범하면 군주에게 불리하다. 앞서 말한 심수(心宿)는 명당(明堂)으로 바로 형혹성의 묘당이므로 삼가 잘 살펴서 길흉을 판단해야 한다.
– 전성(塡星): 토성
역법 중에 남두(南斗)가 교차하여 모이는 해에 전성(塡星, 토성)의 위치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오행설에 따르면 전성은 오방 중에 중앙에 속하고, 오행 중에 토(土)에 속하며, 사계절 중에 계하(季夏, 6월)를 주재하고, 십간 중에 무(戊), 기(己)에 배합한다. 오제(五帝) 중에 황제(黃帝)와 배합하고 도덕을 주관하며 왕후를 상징한다.
매년 일수(一宿)씩을 채우는데, 전성이 머물러있는 곳에 상응하는 나라는 유리하다. 응당 머무르지 않아야 하는데 머물거나, 혹은 이미 지나갔는데 또 다시 돌아와서 머물고 있으면 상응하는 나라의 영토가 확장될 징조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녀와 재물을 얻는다.
만약 전성이 응당 머물러야 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이미 머물렀는데 다시 동서(東西)로 가면 상응하는 나라에 영토를 상실할 재앙이 생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미녀와 재물을 잃는다. 이때에 거사를 일으키거나 군대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전성이 오래 머무르면 상응하는 나라에 복(福)은 크고, 잠깐 머물면 복이 적다.
전성은 또 지후(地侯)라고 불리는데, 한 해의 수확을 주관한다. 매년 13과 112분의 5도를 운행하며, 28년만 하늘을 일주한다. 전성이 머무는 지방에 오성(五星) 모두 따라와서 같은 사(舍)에 모이면 지상에 상응하는 나라에 중후한 덕으로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예(禮), 덕(德), 의(義), 살육, 형벌이 모두 그 마땅함을 잃어버리면 전성은 이것 때문에 동요되고 불안정하게 된다.
전성이 일찍 출현하면 왕자는 불안하고 늦게 출현하면 전쟁에서 군대가 되돌아오지 못한다. 전성의 색깔이 누렇고, 아홉 개의 광망이 있으며, 오음과 황종궁(黃鐘宮, 궁조명)이 서로 배합한다. 만약에 전성이 성차를 잃어 2-3수(宿)를 초과하는 것을 영(嬴)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군주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큰 수해가 생기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만약에 성차를 잃어 2-3수(宿) 뒤처지는 것을 축(縮)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군왕에게 근심이 생기고 이 해에 음양이 조화롭지 못해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거나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동요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두수(斗宿)는 우아한 천제의 조묘(祖廟)이고,전성은 묘당이며 천자의 별이다.
.오행성의 움직임
목성과 토성의 만남은 내란과 기아 발생을 상징한다. 군주는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며 전쟁을 벌이면 반드시 패배한다. 목성과 수성의 만남은 도모하는 일을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두게 된다. 화성과 만나게 되면 가뭄이 생기는 것을 상징한다. 금성과 만나면 상사(喪事)와 수재가 일어나는 것을 상징한다. 금성이 남쪽에 있고 목성이 북쪽에 있으면 이를 빈모(牝牡)라고 한다. 오곡이 풍성하게 수확될 것을 상징한다. 금성이 북쪽에 있고 목성이 남쪽에 있으면 흉년이 든다.
화성과 수성이 만나는 것을 쉬(焠)라고 한다. 금성과 만나는 것을 삭(鑠)이라고 하고, 상사(喪事)를 예시하고 있는데, 이때 모두 큰일을 거행할 수 없으며, 적과 싸우면 크게 패배한다. 화성과 토성이 만나는 것을 우(優)라고 하고 서자가 대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상징한다. 또 크게 기근이 들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군대가 패주하며 군대가 고립되어 갇히게 된다. 거사를 하면 크게 실패한다.
토성과 수성이 만나면 오곡이 잘 익지만 유통이 막히고 군대는 뒤집어 지고 상응하는 나라에서는 큰일을 일으키면 안 된다. 토성이 출현하면 국토를 상실하고, 토성이 사라지면 잃었던 국토를 회복한다. 토성과 금성이 만나면 질병이 생기고 내란이 생겨 국토를 상실하게 된다. 오성(五星) 중에 삼성(三星)이 만나는 곳에 상응하는 나라는 내외로 전쟁과 상사(喪事)가 발생하며 왕공(王公)이 바뀐다. 사성(四星)이 만나면 전쟁과 상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군주는 우환이 생기고 백성들은 떠돌아다니는 재난이 있다. 오성이 만나면 세상이 바뀌고 왕조의 교체가 이뤄진다. 덕이 있는 자는 경사가 생기고 군주가 바뀌며 천하를 점유하고 자손들은 번창하게 된다. 덕이 없는 자는 재앙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 오성이 모두 커지면 일도 커지게 되고, 작아지면 일도 작게 되는 것을 예시한다.
오성이 일찍 출현하는 것을 영(嬴)이라고 하고 영은 객성(客星)이다. 늦게 출현하는 것을 축(縮)이라고 하며 축은 주인별이 된다. 오성이 성차를 잃으면 하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는데 북두의 표성(杓星)에 나타나게 된다. 행성이 동시에 사(舍)에 있으면 회합했다고 하고 서로 침범하면 투쟁한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7촌 안에 있으면 재앙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오성의 색깔이 희고 둥글면 상사와 가뭄이 생기는 것을 예시한다. 오성의 색깔이 적색을 띄면서 둥글면 우환과 수재가 생기는 것을 표시한다. 오성의 색깔이 흑색을 띄면서 둥글면 질병이 생기고 사상자가 많은 것을 예시한다. 오성의 색깔이 누렇고 둥글면 길하다. 오성이 적색이고 광망이 생기면 적병이 나의 성을 침범하는 것을 예시한다. 오성이 황색이고 광망이 생기면 토지를 쟁탈하는 전쟁이 생기는 것을 예시한다. 오성이 백색이고 광망이 생기면 상사(喪事)가 생기는 것을 예시한다. 오성이 청색이고 광망이 생기면 군대에 우환이 생기는 것을 표시하고, 오성이 흑색이고 광망이 생기면 수재가 발생한다. 오성이 적색이고 광망이 생기면 굳게 지키며 적의 힘이 다하기 기다리면 군사의 일은 저절로 해결된다.
오성이 같은 색깔을 띠면 천하의 전쟁은 멈추고, 백성들은 안녕하고 창성된다. 봄에 바람이 불고 가을에 비가 내리며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운 것과 같이 계절에 정상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오성이 동요하는 모습에서 표출된다.
전성이 출현한 후에 120일이 지나면 서쪽으로 역행하고, 또 120일이 지나면 다시 또 동쪽으로 간다. 모두 합해 330일 이후에는 사라지고, 사라진 지 30일 만에 다시 동쪽에서 출현한다. 태세(太歲)는 갑인(甲寅)의 위치에 있으면 진성은 동벽수(東壁宿)에 있고,(이하 문구 아래에 빠진 것이 있다.) 고로 영실수(營室宿)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 태백성(太白星): 금성
태양의 운행을 관찰하면 태백성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오행설에 따라면 태백성은 오방중 서방과 배합하고 사계절 중에 가을에 속하며 십천간 중 경(庚), 신(辛)에 해당한다. 주살을 주관한다. 주살이 타당하지 않으면 하늘의 징계는 태백성을 통해서 표출한다. 태백성의 운행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태백성이 지나는 사(舍)에 해당하는 나라의 길흉화복이 정해진다. 무릇 태백성이 출현한 후에 18사(舍)를 240일 동안 운행하다가 사라진다. 만약 동쪽에서 사라졌다가 11사를 130일 동안 운행한다. 서쪽으로 사라지면 3사를 16일 동안 잠복 운행한다. 그런 후에 다시 새롭게 출현한다. 응당 출현해야 하는데 출현하지 않고, 혹은 응당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지 않으면 모두 사(舍)를 잃었다고 한다. 이때에 상응하는 나라에는 군대가 격파되거나 반드시 그 나라의 왕좌가 찬탈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상원(上元) 역법에 따르면 인년(寅年, 섭제격의 해) 때에 태백성과 영실수(營室宿)는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여 각수(角宿)에 이르러 사라진다. 그런 후에 영실수와 함께는 황혼 무렵에 서쪽에서 출현하여 각수에 이르러 사라진다. 다시 각수와 더불어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여 필수(畢宿)에 이르러 사라진다. 다시 필수와 더불어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여 기수(箕宿)에 이르러 사라진다. 그런 다음에 필수와 더불어 황혼 때 동시에 서쪽에서 출현하여 기수에 도달한 후에 사라진다. 다시 기수와 더불어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여 유수(柳宿)에 이르러 사라진다. 그런 다음에 기수와 더불어 황혼 때에 서쪽에서 출현하여 유수에 이르러 사라진다. 다시 유수와 더불어 새벽에 동쪽에서 출현하여 영실수(營室宿)에 이르러 사라진다. 그런 다음에 유수와 더불어 황혼 때에 동시에 서쪽에서 출현하여 영실수에 이르러 사라진다.
무릇 동서로 출입하기를 다섯 차례씩을 하는 것을 일주(一周)로 삼고, 8년 220일이 지나면 다시 영실수와 더불어 새벽에 함께 동쪽에서 출현한다. 평균적으로 대략 1년에 한 차례 하늘을 일주하는 것이다.
태백성이 처음 동쪽에서 출현할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는데, 대략 매일 0.5도를 운행하다가 120일 후에는 반드시 1-2사를 역행한다. 태백성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에 이른 후에 되돌아서 동쪽으로 향하는데 매일에 1.5도를 운행하여 120일이 지난 후에 사라진다. 태백성의 위치가 가장 낮을 때에는 해와 가장 가까이 거리를 유지하는데, 이를 명성(明星)이라고 하고, 그 때 모습이 부드럽다. 태백성이 가장 높을 때에는 해와 가장 먼 거리를 유지하는데, 이를 대효(大囂)라고 하고 그 때 모습이 강하다.
태백성이 처음 서쪽에서 출현할 때에는 비교적 빨리 운행하는데, 대략 매일 1.5도를 운행하다가 120일 지난 후에 가장 높은 곳에 이른 다음에 운행이 늦어져 매일 0.5도를 가다가 120일이 지난 후에 사라지려고 하는데, 반드시 1-2사를 역행한 후에 사라진다.
태백성의 위치가 가장 낮을 때에는 해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데, 이를 대백(大白)이라고 하고 그 모습이 부드럽다. 태백성의 위치가 가장 높을 때에 해와 가장 먼 거리를 유지하는데, 이를 대상(大相)이라 하고 그 모습은 강하다. 진(辰), 술(戌)의 위치 때에 나타나고 축(丑), 미(未)의 위치 때에 사라져서 서로 대응한다.
태백성이 응당 출현할 때에 출현하지 않고 응당 사라지지 않을 때에 사라지면 천하에 전쟁이 그치고 다시는 전쟁이 생기지 않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이때에 만약에 군대가 외부에 있으면 마땅히 본국으로 돌아온다. 응당 출현하지 않을 때에 출현하고, 응당 사라질 때에 사라지지 않으면 장차 천하에 전생이 발생하고 나라가 전쟁에 의해서 격파된다.
태백성이 정상적인 시기에 출현하면 대응하는 나라는 반드시 창성한다. 동쪽에서 출현하면 동쪽의 나라는 서로 대응하고, 서쪽에서 출현하면 서쪽의 나라와 대응한다. 태백성이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대응하는 나라는 길하고 짧게 머무르면 대응하는 나라는 불길하다.
태백성이 서쪽에서 출현하여 동쪽으로 운행할 때는 정서방쪽의 나라는 길하다. 동쪽에서 출현하여 서쪽으로 운행할 때는 정동방쪽의 나라는 길하다. 태백성은 출현한 후에 하루 종일 하늘에 있을 수 없다. 만약에 하루 종일 하늘에 있으면 천하의 왕조가 바뀌게 되는 것을 예시한다.
태백성의 광망이 작고 요동치면 전쟁이 일어난다. 처음에 태백성 출현했을 때에 컸다가 뒤에 작아지면 군대가 약하고, 출현할 때에 작다가 뒤에 커지면 군대가 강해진다. 태백성이 출현할 때에 높은 곳에 있으면 군대를 적국 경내에 깊게 침입할수록 길하고, 얕은 곳에 침입하면 흉하다. 태백성 출현할 때에 낮은 곳에 있으면 군대를 적국 경내 얕은 곳에 침입할수록 길하고, 깊게 침입하면 흉하다.
해가 남쪽으로 운행하는데, 금성이 해의 남쪽에 있거나 혹은 해가 북쪽으로 운행하는데, 금성이 해의 북쪽에 있는 것을 영(嬴)이라고 한다. 이때에 제후와 왕이 안녕하지 못하고, 바로 군대를 동원하여 진격하면 길하고 후퇴하면 흉하다. 해가 남쪽으로 운행하는데, 금성이 해의 북쪽에 있거나 혹은 해가 북쪽으로 운행하는데, 금성이 해의 남쪽에 있을 것을 축(縮)이라고 한다. 이때에 제후나 왕은 우환이 생기는데, 바로 군대를 동원하여 후퇴하면 길하고 진격하면 흉하다.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마땅히 태백성을 모방해야 한다. 태백성이 운행이 빠르면 군대의 동원도 속전속결해야 한다. 태백성의 운행이 늦으면 군대의 동원도 신중하고 느슨하게 행동하면서 조용하게 변화를 기다린다. 태백성이 광망이 있으면 과감하게 전투하고, 요동치면 급하게 군대를 움직여야 한다. 태백성이 둥글고 고요하면 군대도 차분하게 싸운다.
태백성의 광망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르면 길하고, 거슬리면 흉하다. 태백성이 출현할 때에 군대도 출동하고, 태백성이 사라질 때에 군대도 철수해야한다. 태백성의 광망이 적색이면 전쟁발생을 예시하고, 백색이면 상사(喪事)를 예시하며, 흑색이면서 또 둥글면 나라에 우환이 있거나 물에 관한 일이 생긴다. 청색이고 또 작아지며 또 둥글면 나라에 우환이 있거나 혹은 오행 중에 목(木)에 관련된 일이 생긴다. 황색이고 또 둥글면 나라에 오행 중에 토(土)와 관련된 일이 발생하며 풍년이 든다.
태백성이 이미 출현하여 사흘 만에 점차 사라지거나 혹은 사라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출현하면, 이를 연(耎)라고 한다. 이때에 대응하는 나라에 군대는 패전하고 장수는 도망가는 일이 사건이 발생한다. 태백성이 사라진지 사흘 만에 점차 출현하거나, 혹은 출현한 지 사흘 만에 또 다시 사라지면 대응하는 나라에 우환이 생긴다. 군대는 양식과 무기를 적에게 넘겨주어 쓰게 하고, 병사는 비록 많으나 장군은 적군의 포로가 된다. 태백성이 서쪽에서 출현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면 외국이 실패하고, 동쪽에서 출현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면 중국이 실패한다. 태백성이 크고 또 둥글며 황색이고 또 윤택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둥글고 크면 적색일 때에는 군세가 강성하더라도 전쟁을 벌이면 안 된다.
태백성의 색깔이 희면 천랑성(天狼星)과 비슷하고, 적색이면 심성(心星)과 비슷하며, 황색이면 삼수(參宿)의 왼쪽 어깨 위에 있는 별과 비슷하고 푸른색이면 삼수의 오른쪽 어깨 위에 있는 별과 비슷하다. 흑색이면 규수(奎宿) 중에 큰 별과 비슷하다. 오성(五星)이 태백을 따라 모여서 같은 사(舍)에 있으면 더불어 모인 곳에 대응하는 나라는 군대로 천하를 따르게 할 수 있다.
태백성이 정상적으로 제 궤도에 있으면 대응하는 나라에 득이 될 것이고, 비정상적이면 대응하는 나라에 득이 없을 것이다. 태백성으로 길흉을 판단할 때에 운행과 색깔, 자리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운행이 색깔을 이기고, 색깔이 자리를 이기고, 자리가 있는 것은 자리가 없는 것을 이긴다. 색깔이 있는 것은 색깔이 없는 것을 이기고 운행이 제자리를 얻는 것은 다른 것들을 모두 이긴다.
태백성이 출현 후에 뽕나무와 느릅나무 사이에 더디게 머물러 있으면 대응하는 나라에 불리하다. 태백성이 빠르게 상승하여 운행기일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3분의 1일을 초과하여 지나가면 대응하는 나라의 적대국에 불리하다. 태백성이 갑자기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것이 반복되면 대응하는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는 장군이 생기는 것을 예시한다. 태백이 달 뒤로 들어가면 장군이 피살된다. 금성과 목성이 만나 빛이 여전하면 대응하는 나라에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생겨도 서로 싸우지 않는다. 빛을 잃으며 쌍방이 큰 전투가 일어나고, 어느 일방은 크게 패하고 만다. 태백성이 서쪽으로부터 출현하여, 황혼 때 음(陰)에서 나타나니 음병(陰兵)이 강성해진다.
음병은 저녁밥을 먹을 무렵에 출동하면, 음병의 위세는 조금 약하고, 한 밤 중에 출동하면 중간쯤 약해지고, 닭이 울 무렵에 나타나면 가장 약하다. 이것은 ‘음이 양(陽)에게 빠졌다.’라고 한다. 태백성이 동쪽에서 출현하여 여명이 틀 무렵 양병(陽兵)이 강성해진다. 양병이 닭이 울 무렵에 출동하면 양병의 위세가 조금 약하고, 한 밤중에 출동하면 중간쯤 약하고, 황혼 때에 출동하면 크게 약해진다. 이것을 ‘양이 음에게 빠졌다.’고 한다. 태백성이 숨어있을 때에 군대를 출동시키면 군대에 반드시 재앙이 생긴다. 태백성이 묘(卯)의 자리 남쪽에서 출현하면 남쪽이 북쪽을 이기고, 묘의 자리 북쪽에서 출현하면 북쪽이 남쪽을 이긴다. 묘의 정동쪽에서 출현하면 동쪽에 있는 나라에게 유리하다. 태백성이 유(酉)의 자리 북쪽에서 출현하면 북쪽이 남쪽을 이긴다. 유의 자리 남쪽에서 출현하면 서쪽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
태백성과 여러 항성(恒星)들이 서로 침범하면 소규모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시한다. 오성과 서로 침범하면 큰 전쟁이 발생한다. 서로 침범할 때에 태백성이 다른 별의 남쪽에서 출현하면 남쪽에 있는 나라가 패하고, 다른 별의 북쪽에서 출현하면 북쪽나라가 패한다. 빠르게 운행하면 대응하는 나라가 용맹하며 무력이 있고, 멈추어서 운행하지 않으면 대응하는 나라가 정중하며 문채가 있다. 태백성의 색이 희고 다섯 개의 광망이 있으면 일찍 출현하고 반드시 월식이 생기고, 늦게 출현하면 천요성(天夭星)이나 혜성(彗星)이 있어서 화가 장차 대응하는 나라에 발생된다.
태백성이 동쪽에서 출현하면 덕(德)을 베푸는 것이니, 일을 거행할 때 만약 태백성의 좌측에 있거나 혹은 태백성과 마주보고 있으면 길하다. 서쪽에서부터 출현하면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니, 일을 행할 때에 만약에 태백성의 우측에 있거나 등을 지고 있으면 길하다. 이와 반대로 하면 흉하다. 태백성의 빛이 그림자를 드리우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낮에 태백이 나타나 오(午) 자리를 지나가면 쟁명(爭明)이라고 한다. 이때에 강한 국가가 약해지고 약한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예시하며 왕후의 세력이 강성해진다.
항수(亢宿)는 소묘(疏廟, 천제(天帝)의 조정)이자 태백성의 묘당이다. 태백은 또 대신(大臣)을 상징하여 상공(上公)으로 불린다. 다른 이름으로 은성(殷星), 태정(太正), 영성(營星), 관성(觀星), 궁성(宮星), 명성(明星), 대쇠(大衰), 대택(大澤), 종성(終星), 대상(大相), 천호(天浩), 서성(序星), 월위(月緯) 등이 있다. 대사마(大司馬)의 직위에 오르면 자세히 태백성의 운행을 관찰하고 길흉(吉凶)을 예측해야 한다.
– 진성(辰星): 수성
태양과 다른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진성(辰星, 수성)의 위치를 판정해야 한다. 오행설에 따르면 진성은 오방 중에 북방에 속하고, 오행 중에 수(水)에 속하며, 태음의 정령이다. 사계절 중에 겨울을 주관하고 십천간 중에 임(壬), 계(癸)에 해당한다. 형벌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못하면 하늘이 징벌을 진성을 통해서 표출하며 그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나라에 길흉이 결정된다.
진성의 위치에 따라서 사계절을 바로잡는다. 2월 춘분(春分)에는 황혼 때에 서쪽 교외의 규수(奎宿), 누수(婁宿), 위수(胃宿)의 자리에서 출현하여 동쪽으로 5(舍)의 범위 내에서 운행하는데, 대응하는 분야는 제(齊)나라이다. 5월 하지(夏至)에는 황혼 때에 서쪽 교외의 동정수(東井宿), 여귀수(輿鬼宿), 유수(柳宿)의 자리에서 출현하여 동쪽으로 7사의 범위 내에서 운행하는데, 대응하는 분야는 초(楚)나라이다.
8월 추분(秋分)에는 황혼 때에 서쪽 교외의 각수(角宿), 항수(亢宿), 저수(氐宿), 방수(房宿)의 자리에서 출현하여 동쪽으로 4사의 범위 내에서 운행하는데, 대응하는 분야는 한(漢)나라이다. 11월 동지(冬至)에는 새벽에 동쪽 교외에 출현하여 미수(尾宿), 기수(箕宿), 남두수(南斗宿), 견우수(牽牛宿)과 함께 천구를 따라 서쪽으로 운행하는데, 대응하는 분야는 중원(中原)이다. 진성이 출현과 사라짐은 언제나 진(辰), 술(戌), 축(丑), 미(未) 등의 방위 사이에 있다.
진성이 일찍 출현하면 월식이 생기고, 늦게 출현하면 혜성이나 다른 요성(妖星)이 변한다. 진성이 출현해야 하는데 출현하지 않으면 제 궤도를 잃은 것으로 비록 추격하는 병사가 밖에 있어도 싸우지 않는다. 어느 한 계절에 출현하지 않으며 그 계절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계절 내내 출현하지 않으면 천하에 오곡을 수확할 수 없게 되어 큰 기근이 생긴다. 진성에 때에 맞춰 출현하여 별빛이 백색이면 가뭄이 들 징조이고, 황색이면 오곡이 풍성해질 징조이다. 적색이면 전쟁이 생기고, 흑색이면 수재가 난다. 진성이 동쪽에서 출현하여 커 보이고 백색을 띄면 적병이 밖에 있음으로 군대는 철수해야 한다. 진성이 동쪽에 있으면서 적색을 띄면 중국이 승리하고, 서쪽에 있으면서 적색을 띄면 외국이 유리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밖에 적병이 없는데, 적색을 띄면 장차 전쟁이 발생한다.
진성과 태백성은 모두 동쪽에서 출현하여 모두 적색을 띄고 광망이 있으면 외국이 크게 패할 징조이고 중국은 승리를 거둔다. 진성과 태백성이 서쪽에서 출현하여 적색을 띄고 광망이 있으면 외국이 유리하다. 오성(五星)이 하늘의 중앙에 분포하면서 동쪽으로 모이면 중국이 유리하고, 서쪽으로 모이면 외국의 용병이 유리하다. 오성(실제로 진성을 제외한 네 행성)이 모두 진성을 따라 한 사(舍)에서 모이면 상응하는 나라는 법으로 천하를 취할 수 있다. 진성이 제 때에 출현하지 않으면 태백은 객(客)이 되고, 진성과 함께 출현하면 태백은 주(主)가 되며 진성은 객이 된다.
진성이 출현하여 태백성과 같은 방위에 있지 않으면 교외에 비록 적병이 있어도 전투를 벌이면 안 된다. 진성이 동쪽에서 출현하고, 태백성은 서쪽에서 출현하거나, 혹은 진성이 서쪽에서 출현하고 태백성이 동쪽에서 출현하면 이를 격(格)이라고 한다. 이때에 교외에 병사가 있어도 전투를 벌이면 안 된다. 진성이 제 때에 출현하지 않으면 기후가 마땅히 추워야 할 때에 도리어 따뜻하고, 마땅히 따뜻할 때에 도리어 추워진다. 응당 출현해야 할 때에 출현하지 않는 것을 격졸(擊卒)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난다. 진성이 태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위로 떠나가면 군대가 격파되고 장군은 피살되며 객군(客軍)이 승리한다. 진성이 태백성 아래로 나타나면 객군이 패하고 영토를 상실한다.
광망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하면 어떤 군대가 실패할 지를 판정할 수가 있다. 진성이 태백성을 둘러싸고 태백성과 더불어 다투는 형상이면 큰 전쟁이 발생하고, 객군이 승리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진성이 태백성 곁을 지나가는데, 그 거리가 약 칼 한 자루가 들어갈 정도이면 소규모 전쟁이 발생하고 객군이 승리한다. 진성이 태백성 앞(동쪽)에 머물러 있으면 군대를 거두고 전쟁을 그만둔다.
태백성 왼쪽(북쯕)을 지나지면 소규모 전쟁이 발생한다. 태백성과 닿을 정도로 지나가면 수만 명 규모의 전쟁이 발생하고, 주군의 관리가 피살된다. 태백성 우측으로 지나가는데, 그 거리가 3척정도 떨어져 있으면 군대의 정황이 긴급한 것을 상징하고 곧 전투를 한다. 진성에 푸른색의 광망이 있으면 군대에 우환이 생기고, 흑색 광망이 있으면 수재가 있고, 적색 광망이 있으면 외적이 침입하고 세력이 궁한 군대는 마지막장소가 된다.
진성은 일곱 개의 이름이 있는데, 소정(小正星), 진성(辰星), 천참성(天欃星), 안주성(安周星), 세상(細爽星), 능성(能星), 구성(鉤星) 등이다. 진성이 황색을 띄고 또 작아져 출현할 때에 정상적인 방위를 따르지 않으면 천하에 큰 정책변화가 있고 불길한 상징이다. 진성은 다섯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 청색이고 둥글면 우환을 예시하는 것이고, 백색이고 둥글면 상사(喪事)를 예시하고, 적색이고 둥글면 평안하지 못한 것을 예시하고, 흑색이고 둥글면 길하다. 진성이 적색이면서 광망이 있으면 적군이 침입하는 것을 예시하고, 황색이면서 광망이 있으면 토지 쟁탈에 관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시하고, 백색이면서 광망이 있으면 상사(喪事)가 있어 곡소리가 나는 것을 예시한다.
진성이 동쪽에서 출현하여 4사를 48일 동안 운행하고, 약 20일을 간 뒤에 되돌아가서 동쪽에서 사라진다. 진성이 서쪽에서 출현하여 4사를 48일 동안 운행하고, 약 20일을 간 뒤에 되돌아가서 서쪽에서 사라진다.
어떤 때에 진성은 영실(營室), 각수(角宿), 필수(畢宿), 기수(箕宿), 유수(柳宿)의 주변에서 관찰 된다. 진성이 방수(房宿), 심수(心宿)의 사이에서 출현하면 지진이 발생한다.
진성의 색깔을 봄에는 청황색(靑黃色), 여름에는 적백색(赤白色), 가을에는 청백색(靑白色)이면 그 해의 풍년이 들고, 겨울에 황색인데 밝지 못하다. 만약 진성의 색깔이 변하면 그 계절은 순조롭지 못하다. 진성이 봄이 출현하지 않으며 큰 바람이 일고, 가을에 수확을 걷을 수 없다. 여름에 출현하지 않으면 60일 동안 가뭄이 들고, 월식이 발생한다. 가을에 출현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봄에 작물이 싹트지 않는다. 겨울에 출현하지 않으면 장맛비가 60일 동안 내리고, 성읍(城邑)이 유실되며 여름에 곡물이 성장하지 않는다.
– 이십팔수와 분야의 관계
각수(角宿), 항수(亢宿), 저수(氐宿)의 분야는 연주(兗州)이다. 방수(房宿), 심수(心宿)의 분야는 예주(豫州)이다. 미수(尾宿), 기수(箕宿)의 분야는 유주(幽州)이다.
남두수(南斗宿)의 분야는 강(江), 호(湖) 지구이다. 견우수(牵牛宿), 무녀수(婺女宿)의 분야는 양주(揚州),허수(虛宿), 위수(危宿)의 분야는 청주(青州)이다. 영실(營室)에서 동벽(東壁)에까지 분야는 병주(幷州)이다. 규수(奎宿), 누수(婁宿), 위수(胃宿)의 분야는 서주(徐州)이다. 묘수(昴宿), 필수(畢宿)의 분야는 기주(冀州)이다. 자휴(觜觽), 삼수(參宿)의 분야는 익주(益州)이다. 동정수(東井宿), 여귀수(輿鬼宿)의 분야는 옹주(雍州)이다. 유수(柳宿), 칠성(七星), 장수(張宿)의 분야는 삼하(三河, 하동, 하내, 하남) 지구이다. 익수(翼宿), 진수(軫宿)의 분야는 형주(荊州)이다. 칠성은 관원을 상징하고 진성의 묘(廟)이며, 만이(蠻夷)의 길흉을 주관하는 별이다.
– 해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에 햇무리(해의 둘레에 둥글게 나타나는 흰빛의 테)가 고르게 생기면 양군의 세력이 균등하고, 어느 한 쪽의 햇무리가 비대하고 두터우며 길고 크면 그 쪽이 승산이 있다. 어느 한쪽의 햇무리가 얇고 짧고 작으면 그 쪽은 반드시 승리할 수 없으며 햇무리가 해를 겹겹이 에워싸면 크게 격파하나 승리를 거두지는 못한다. 햇무리가 안으로 향하면 두 군대가 강화를 할 조짐이고, 밖으로 향하면 불화가 생기고 서로 분리되어 가버린다. 햇무리가 곧으면 스스로 자립하여 제후와 왕을 세우지만 아군이 패하고 장군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해가 구름을 등지거나 머리에 이고 있으면 기쁜 경사가 생긴다.
햇무리가 바깥쪽에 광망이 있으면 포위한 자가 승리하고, 햇무리의 바깥쪽이 청색이고, 안쪽이 홍색이면, 쌍방이 강화를 맺고 떠나간다. 바깥쪽이 홍색이고, 안쪽이 청색이면 쌍방이 서로 원통해하면서 떠나간다. 해의 기운과 햇무리가 먼저 출현했다가 나중에 소실되면 주둔군이 승리하고, 먼저 출현했다가 일찍 소실되면 처음에는 주둔군이 유리하나 뒤에는 불리하게 된다.
늦게 출현하여 늦게 소실되면 주둔군에게 처음에는 불리하나 뒤에는 유리하게 된다. 늦게 출현했다가 일찍 소실되면 모두 불리하며 주둔군은 승리할 수 없다. 출현한 후에 일찍 소실되면 불리하여 비록 승리는 거두나 공을 세울 수 없다. 출현하는 것이 반나절 이상이여야 큰 공을 세울 수 있다. 햇무리가 흰 무지개처럼 짧고 구불구불하며 위아래 양끝이 날카로우면 상응하는 분야에 큰 유혈사건이 발생한다. 햇무리로 길흉(吉凶)을 판정하는 것은 짧게는 30일 이내이고, 길어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일식은 불길함을 상징한다. 일식 끝난 후에 다시 생겨나면 길조이다. 해가 전부 먹히면 길흉(吉凶)에 대한 책임은 군주가 짊어진다. 해가 완전히 먹히지 않으면 모두 신하가 책임을 진다. 일식의 방위에 근거에 해가 있는 위치, 그리고 일식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더하여 대응하는 분야의 있는 나라의 길흉을 판정한다.
– 달
달이 방성(房星)의 중도에서 운행하면 세상이 안녕하고 평화로운 것을 상징한다. 중도의 북쪽인 음간(陰間, 방수(房宿) 북쪽에 있는 두 별 사이의 중간)에서 운행하면 비가 많이 내리고 은밀한 사건이 생긴다.
음간 북쪽에서 3척정도 되는 곳에 음성(陰星)인데, 음성 남쪽에서 3척 정도 되는 사이가 태음도(太陰道)이다. 달이 태음도를 지나면 큰 물 난리와 전쟁이 생긴다. 중도의 남쪽에는 양간(陽間)이 있는데, 그 밖으로 3척정도 떨어진 곳에 양성(陽星)이 있다. 양성 북쪽에서 3척 정도 되는 사이를 태양도(太陽道)라고 하는데, 달이 태양도를 지나면 군주가 교만 방자하게 된다. 달이 양성 사이를 지나면 나라에 포악하고 잔혹한 형벌이 많아진다. 또 달이 태양도를 지나면 장차 큰 가뭄과 상사(喪事)가 생긴다.
달이 각수(角宿)와 천문(天門) 사이를 지나면, 10월이면 다음해 4월에, 11월이면 다음해 5월, 12월이면 다음해 6월에 큰 물난리가 난다. 이때에 적어도 물의 깊이가 3척이고, 많으면 그 물의 깊이가 5척에 달한다. 달과 방수의 네별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침범하면 보좌하는 신하가 주살 당한다. 달이 남하(南河), 북하(北河) 부근을 지날 때에 그 음양(陰陽)을 잘 판단해야 한다. 남하의 남쪽을 지나면 가뭄과 상사(喪事) 생기고, 북하의 북쪽을 지내면 수재와 전쟁이 일어난다.
달이 세성(歲星)에 가리면 그 대응하는 지구에 기근이 들거나 쇠망하게 된다. 달이 형혹성을 가리면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달이 전성을 가리면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며, 달이 태백성을 가리면 강국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쇠락한다. 달이 진성을 가리면 여자가 난을 일으키고, 달이 대각성[大角星, 동성(棟星) 또는 천동(天棟)으로 불리기도 함. 황제의 궁궐을 상징하는 별]을 가리면 명령을 내리는 군주에게 불리하고, 달이 심수(心宿)을 가리면 내부의 적이 반란을 일으킨다. 기타 여러 별들도 달에게 가리면 상응하는 분야에 우환이 생긴다.
월식이 개시된 날로부터 5개월마다 여섯 번 발생하고, 6개월마다 다섯 번 발생하고 또 다시 5개월마다 여섯 번 발생하고, 여섯 달 만에 한번 발생하고, 5개월 만에 여섯 번 발생하니. 모두 113개월 만에 중복하여 발생한다. 그래서 월식은 매우 평상적인 일이지만 일식은 불길하게 여긴다. 갑(甲)과 을(乙)은 동방을 주관하여 대응하는 지구가 해외이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으로 그 길흉을 점치지 않는다.
병(丙), 정(丁)은 남방을 주관하여 대응하는 지구가 강수(江水, 장강), 회하(淮河, 장강과 황하의 사이에 위치), 해대[海岱, 바다와 태산 일대, 즉 청주(靑州) 일원]이다. 술(戊), 기(己)는 중앙을 주관하여 대응하는 지구가 중주(中州), 하(河), 제(濟) 일대이다. 경(庚), 신(辛)는 서방을 주관하여 대응하는 지구가 화산(華山) 서쪽이다. 임(壬), 계(癸)는 북방을 주관하여 대응하는 지구가 항상(恒山) 이북이다. 일식은 국왕이 그 길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월식은 장군과 재상이 그것에 관한 책임을 진다.
– 그 밖의 별들과 징조
국황성[國皇星, 객성(客星) 중의 두 번째 별]은 별이 크고 붉고, 그 형상이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과 비슷하다. 국황성이 출현하면 대응하는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군대의 위세가 강성하여 대치하는 나라의 군대는 불리하다.
소명성[昭明星, 일명 적혜(赤彗), 대인성(大人星)이라고도 함]은 별이 크고 흰색이며 광망이 없을 때에는 갑자기 상승했다가 갑자기 하강한다. 소명성이 출현하면 대응하는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형세의 변화가 많다.
오잔성[五殘星, 일명 오봉(五鎽)이라 불림]은 정동(正東) 방향에서 출현하여 동방 분야의 상공에 머문다. 그 형상은 진성(辰星)과 유사하고, 지면에서 약 6장정도 떨어져 있다.
대적성(大賊星)은 정남(正南) 방향에서 출현하여 남방 분야의 상공에 머문다. 지면에서 약 6장정도 떨어져 있다. 별이 크고 붉으며 때에 따라 자주 요동치며 광망이 있다.
사위성(司危星)은 정서(正西) 방향에서 출현하여 서방 분야의 상공에 머문다. 지면에서 6장정도 떨어져 있고, 별이 크고 백색이며 태백성과 유사하다.
옥한성[獄漢星, 일명 함한(咸漢)이라고도 함]은 정북(正北) 방향에서 출현하고 북방 분야의 상공에 머문다. 지면에서 6장정도 떨어져 있고, 별이 크고 붉은 색이다. 때에 따라 자주 요동치고 자세히 관찰하면 별 가운데 희미한 푸른색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 오잔성 이하의 네 별은 사방(四方) 분야의 별이고, 별이 출현할 때에 자기 방위가 아닌 곳에서 나오면 대응하는 지구에 모두 전쟁이 생기고 상대방에게 불리하다.
사전성(四塡星)은 천구의 사궁(四宮)과 서로 맞닿은 동북, 서북 등의 네 모서리에서 출현하고, 지면에서 약 4장정도 떨어져 있다.
지유함광성[地維咸光星, 지유장광성(地維藏光星)으로도 불림]은 상술한 하늘의 네 모서리에서 출현하여 지면에서 약 3장정도 떨어져 있다. 별빛이 몽롱하고 달이 막 출현할 때와 같은 형상이다. 대응하는 지구에 만약에 변란을 일으킨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만약에 덕(德)이 있는 자는 반드시 창성하게 된다.
촉성(燭星)은 그 형상이 태백성과 같고, 출현 후에 바로 운행하지 않다가 얼마 후에 소실된다. 대응하는 지구의 성읍(城邑)에 변란이 생긴다.
그 생김새가 별과 유사하나 별이 아니고, 구름과 유사하나 구름도 아닌 것을 귀사성(歸邪星, 두 개의 적색 혜성이 위를 향하고 덮개 아래에 이어진 별)라고 한다. 귀사성이 출현하면 반드시 그 나라로 투항하는 자가 있다.
별은 오행 중에 금기(金氣)가 흩어진 것으로 본질은 불이다. 별이 많으면 대응하는 나라가 길하고 적으면 운세가 좋지 않다.
천한(天漢, 은하)도 금기가 흩어진 것인데 본질은 물이다. 천한에 별이 많으면 지상에 비가 많이 내리고, 별이 적으면 지상에 가뭄이 든다.
천고성(天鼓星, 군대를 주관하여 전란의 징조를 예보하는 별)은 그 소리가 마치 우레 소리 같으면서 아닌 것 같은데, 그 음향은 하늘에 땅 위에까지 전파되고, 그 소리가 가는 방향은 전쟁이 일어난다.
천구성(天狗星)는 그 형상이 마치 큰 유성(流星)과 같고, 소리가 있다. 떨어질 때에 소리가 그치고 그 모습이 개와 같다. 그것이 추락한 곳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불빛이 뜨겁게 타올라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그 둘레가 몇 이랑(頃)의 밭 같고, 위는 뾰족하고 황색을 띄고 있다. 대응하는 분야의 천리 안에 군대는 격파되고 장군은 죽은 사건이 발생한다.
격택성(格澤星)은 그 형상이 마치 타오는 불꽃과 같고, 황백색을 띄며 지상에서부터 솟구쳐 올라가는데, 아래는 크고 위는 뾰족하다. 격택성이 출현하면 파종을 하지 않아도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다. 또 토목공사에서 성취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큰 해가 생긴다.
치우기(蚩尤旗)는 그 형상이 마치 혜성(빗자루 형태)과 같은데, 뒷부분은 굽은 것이 마치 깃발 같다. 치우기가 출현하면 장차 왕이 사방을 정벌하는 것을 암시한다.
순시성(旬始星,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혜성)은 북두성(北斗星)의 곁에서 출현하는데, 그 형상이 마치 수탉과 같다. 별이 분노할 때에는 광망이 내뿜고 청흑색(靑黑色)을 띄며 그 형상이 마치 엎드린 자라와 같다.
왕시성(枉矢星, 쇠뇌처럼 생겨서 붙인 이름)은 마치 큰 유성과 같고, 뱀처럼 구불구불 운행하며 검푸른 색을 띄고, 그것을 바라보면 마치 깃털이 나있는 듯하다.
장경성(長庚星, 금성의 이칭. 저녁에는 해보다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경이라 부른다. 장경은 서쪽 하늘에 오랫동안 보인다는 뜻)은 마치 한 필의 베를 하늘에 걸어 놓은 것과 같고, 이 별이 출현하면 전쟁이 발생할 것을 예시한다.
별이 지상에 떨어지면 돌이 된다. 황하와 제수(濟水) 사이의 자주 별이 떨어진다.
하늘이 맑고 환할 때에 어떤 때에 경성(景星, 대성(大星)으로 불리기도 하고, 경운(慶雲)ㆍ감로(甘露)ㆍ기린(麒麟) 등과 함께 경사스러운 일이나 태평성대를 표시하는 상서로운 별)을 볼 수 있다. 경성은 덕성(德星)으로 그 형상이 일정하지 않으며 언제나 도가 있는 나라에 출현한다.
– 구름
무릇 구름의 기운을 바라볼 때는 우러러 그것을 바라보면 지상에서 300-400리에 불과하고, 수평으로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 구름이 뽕나무와 느릅나무 사이에서 서로 거리는 대략 천 여리에서 이 천 여리가 된다. 만약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면 구름과 땅은 서로 잇닿을 듯 보이고 거리는 약 3천여리가 된다. 구름의 기운이 만약 짐승의 형상과 유사하면 길하다.
화산(華山) 이남의 구름 기운은 아래가 검고 위가 붉다. 숭산과 삼하 일대 교외에 구름은 붉은 색이다. 항산(恒山) 이북의 구름의 기운은 아래는 검고 위는 푸른색이다. 발해(渤海), 갈석산(碣石山), 황해와 태산(泰山) 사이의 구름의 기운은 모두 검은 색이다. 장강과 회하(淮河) 사이의 구름의 기운은 모두 백색이다.
죄수의 무리가 모이는 곳의 구름은 백색이다. 토목공사를 하는 지방의 구름은 황색이다. 수레 행렬이 이어지는 곳의 구름은 갑자기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어떤 때는 함께 모인다. 기병이 내달리는 곳의 구름은 낮게 분포되어 있고 그 면적이 크다. 보병이 행군하는 곳의 구름은 손에 잡힐 듯한데, 앞은 낮고 뒤는 높은 것은 행군 속도가 급한 것을 표시하고, 행군속도가 빠르고 구름의 앞은 네모 형이고, 뒤는 높은 것은 병졸들이 정예롭기 때문이다. 구름 뒤가 날카롭고 낮으면 퇴각하는 것이다.
구름이 평평한 것은 진군 속도가 늦은 것이고, 앞은 높고 뒤는 낮은 것은 퇴각을 멈추지 않은 것을 표시한다. 두 구름의 기운이 만나면 낮은 쪽이 높은 것을 이기고, 날카로운 것이 둥글고 네모란 것을 이긴다. 구름 기운이 낮고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오면 불과 3-4일 만에 도달하고, 아군과의 거리 5-6리 되는 곳에 적의 종적을 찾을 수 있다. 구름의 기운이 7-8척 높아지면 불과 5-6일 만에 도달하고 아군과의 거리는 10여리 되는 곳에서 적의 종적을 찾을 수 있다. 구름의 운기가 1-2장 높아지면 불과 3-4일 만에 도달하고 아군의 거리에서 5-6리 되는 곳에 적의 종적을 찾을 수 있다.
구름의 끝이 밝고 흰 색을 띄면 장군이 용맹스러우나 병졸들이 나약하다. 구름의 아랫부분이 크고 앞부분이 멀리 펼쳐져 있으면 마땅히 싸워야 한다. 구름이 청백색이고 앞부분이 낮으면 전투에서 승리하고 앞부분이 붉고 위로 들려있으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진운[陣雲, 층층으로 두텁게 쌓여서 마치 전진(戰陣)처럼 보이는 구름]은 바로 솟은 성벽과 같고, 저운(杵雲)은 베틀의 북 모양과 같고, 축운(軸雲)은 둥근 구름 덩어리 같은데 , 양끝이 날카롭다. 작운(杓雲)은 가늘고 긴 밧줄과 같고, 앞쪽은 하늘에 걸쳐있고 그 절반은 하늘의 반을 차지한다. 예운(霓雲, 일종의 채색구름)은 전투 깃발과 같다. 구운(鉤雲)은 갈고리처럼 굽어있다. 이러한 구름들이 출현한 후에는 오색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길흉을 점친다.
구름의 기운이 윤택하고 둥글게 뭉쳐 조밀하면 사람들의 주의를 끌며 비로소 점을 친다. 구름의 기운을 보고 전쟁의 조짐을 알 수 있고, 대응하는 지역에도 전쟁이 발생한다.
구름의 기운을 보고 점을 잘 치던 왕삭(王朔, 한나라 때의 천문학자)은 모두 해 주위의 구름의 기운을 보고 길흉을 판단했다. 해 주위의 구름의 기운은 군주의 기상을 상징 하는데, 모두 구름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형상을 보고 판정했다.
그래서 북방의 오랑캐 지역에서 형성된 구름의 기운은 가축과 천막들의 형상이 많고, 남쪽 오랑캐 지역에서 형성된 구름의 기운은 선박과 돛의 형상이 많다. 큰물이 있는 지역은 군대가 패전한 전쟁터, 망국의 폐허, 지하에 묻힌 금은보화가 모두 구름의 기운에 서려있으니,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변에서 형성된 신기루는 마치 누대(樓臺)와 같고, 광야에서 형성된 구름 형상은 궁궐과 같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구름의 기운은 각자 처한 산천과 현지인들의 축적한 기질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구름의 기운을 가지고 어떤 나라의 허실을 살펴보려면 응당 그 나라의 성읍에 가서 영토, 논밭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성곽과 가옥의 문호가 윤택한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는 수레와 복식, 축산 등의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충실하고 번성하면 길하고, 공허하고 낭비가 심하면 흉하다.
연기와 유사한데 연기가 아니고 구름과 유사한데 구름이 아니며 뭉게뭉게 솟아서 흩어졌다가 엉겼다가 하는 것을 경운(卿雲)이라 한다. 경운은 기쁜 기운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밖에 안개와 유사한데 안개가 아니고 옷이나 갓이 젖지도 않는데, 이것이 출현하면 성안에 사람들이 모두 갑옷을 입고 달리게 되는데, 이는 전쟁이 나서 성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번개, 놀빛과 무지개, 벼락, 야명(夜明) 등의 현상은 양기가 움직여서 형성된 것으로 봄, 여름 두 계절에 발생하며, 가을, 겨울에는 숨어버린다. 그래서 기후를 관측하는 사람은 계절의 진행상황을 주시하여 관찰해야 한다.
하늘이 갈라져 사물의 형상이 보이고, 지진이 생겨 균열이 나고, 산이 무너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하천이 막히고 물이 동요하고 넘실거리며, 땅이 갑자기 솟아오르며 못에 물이 고갈하는 현상 등은 모두 길흉을 상징한다. 성곽의 가옥이나 민간의 마을이 윤택하거나 초췌한 지를 관찰하고, 궁궐과 묘당, 관저, 백성들이 사는 곳 등을 관찰해야 한다. 또한 민간에 떠도는 가요, 속어, 풍속, 수레, 의복 등과 백성들의 음식들도 관찰해야 한다.
오곡과 초목이 자라는 곳도 살펴야 한다. 창고, 마구간, 창고의 저장물 및 사방의 교통 도로도 관찰해야 한다. 육축과 금수들이 방목되고 자라 곳과 물고기와 자라, 새와 쥐가 서식하는 곳이 어떠한지를 관찰해야 한다. 귀신의 울음소리가 마치 호출하는 것 같으면 사람이 반드시 놀라기 마련이다. 만물은 모두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름이 있으면 반드시 표출된다. 그래서 구름의 기운을 보고 길흉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비록 민간에서 떠도는 말이지만 진실로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 바람
.1년의 점(해운점)
대체로 기상으로 한해의 길흉(吉凶)을 관측할 때에 삼가 세시(歲始, 한 해의 시작)가 중요하다. 세시는 혹은 동지(冬至)를 가리키는데, 이 날에 비로소 양기(陽氣)가 생겨난다. 혹은 납제[臘祭, 납일(臘日)에, 그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 신에게 알리는 제사]를 올린 다음 날은 한 해가 이미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 한 끼 음식을 먹는데, 양기를 끌어 모아 발산시키기 때문에 초세(初歲, 연초, 원단)라고 한다.
혹자는 정월 초하루의 여명이 틀 때라고 하는데, 이 날은 제왕이 만든 역법에서 첫 머리이다. 혹자는 입춘일(立春日)이 사계절의 첫날이라고 지적한다. 이상 네 가지 시세는 모두 기상으로 한 해의 길흉을 관측하는 주요한 날이다.
한(漢)나라 때 사람인 위선(魏鮮)은 납제 다음날과 정월 초하루 아침에 팔방에서 부른 팔풍(八風, 여덟 종류의 바람)으로 한 해의 길흉을 판단했다. 바람이 남방에서 불어오면 큰 가뭄이 들고, 서남쪽에서 불어오면 작은 가뭄이 들고, 서방에서 불어오면 전쟁이 있고, 서북방에서 불어오면 콩의 수확이 좋고, 가는 비가 잦고 전쟁이 생긴다. 북방에서 불어오면 중급의 수확이 있고, 동북에서 불어오면 풍족한 수확을 거둔다. 동방에서 불어오면 수해가 있고, 동남에서 불어오면 백성들이 많이 질병과 전염병에 걸리며 수확이 좋지 않다.
고로 팔풍의 길흉은 각기 상대 방향의 바람과 서로 비교해서 많은 쪽이 이긴다. 양이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이기고, 시간이 긴 것이 짧을 것을 이기고, 속도가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이간다. 여명이 틀 때에서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의 바람은 보리의 수확에 영향을 주고, 아침밥을 먹은 뒤부터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의 바람은 메기장의 수확에 영향을 준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부터 저녁밥 먹을 때까지의 바람은 기장의 수확에 영향을 주고, 저녁밥을 먹을 때부터 저녁밥을 먹은 뒤까지의 바람은 콩의 수확에 영향을 주고, 저녁밥을 먹은 뒤에서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의 바람은 삼의 수확에 영향을 준다.
가장 좋은 날씨는 종일 비와 구름, 바람과 해가 있을 때로, 그런 날에 작물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많아진다. 구름은 없고, 바람과 해만 있으면 작물은 줄기가 약하나 열매는 많다. 구름과 바람은 있고, 해가 없으면 작물은 줄기는 우거지나 열매가 적다. 해만 있고, 구름과 바람이 없으면 작물은 시들어서 수확을 거둘 수 없다. 바람과 구름이 없는 시간이 만약에 한 끼 밥 먹을 정도의 시간이라면 조금 손상을 보지만 만약 쌀 다섯 말을 익힐 만한 긴 시간이라면 손상이 크다.
하지만 다시 또 구름과 바람이 생겨나면 손상된 작물이 살아날 수 있다. 각기 그 시간에 따라 구름의 색에 적합한 작물을 점친다. 만약에 세수에 비와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추우면 그 해에 수확은 좋지 못하다.
세시에 만약 날씨가 쾌청하면 도시와 고을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길흉을 점칠 수 있다. 만약에 궁성(宮聲)이 들리면 그 해의 수확이 좋아 길하고, 상성(商聲)이면 전쟁이 있고, 치성(徵聲)이면 가뭄이 들어 비가 적게 내리고, 우성(羽聲)이면 수재가 나고, 각성(角聲)이면 수확이 최악으로 흉년이 든다.
또 어떤 자는 정월 초하루부터 비가 오는 날을 계산하여 그 해의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초하루에 비가 내리면 그 해 백성들은 개인마다 매일 한 되의 양식을 얻고, 초이튿날 비가 내리면 두 되의 양식을 얻고, 이런 식으로 최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점치지 않는다. 만약에 초하루부터 12일까지 점을 치는데, 날마다 그에 해당하는 달과 서로 대응하여 수해나 가뭄의 정황을 점친다.
이상은 영토가 1천 리 안팎의 작은 나라에서 점치는 것이다. 만약에 영토가 광대하면 마땅히 천하를 점치는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정월 한 달을 보고 점을 친다. 정월 중에 달이 어떤 별자리를 지나는지의 여부와 해와 바람, 구름의 유무에 따라 해당 나라의 수확여부와 길흉을 예측한다.
그러나 반드시 동시에 태세(太歲)의 위치를 관찰해야 한다. 태세가 금(金, 서쪽)의 자리에 있으면 풍년이 들고, 수(水, 북쪽)의 자리에 있으면 흉년이 들며, 목(木, 동쪽)의 자리에 있으면 기근이 들고, 화(火, 남쪽)의 자리에 있으면 가뭄이 든다. 이상이 대략의 정황과 형세이다.
정월 상순 갑일(甲日)에 동풍이 불면 양잠에 적합하고, 서풍이 불고 또 초하루 아침에 누런 구름이 있으면 작황이 나빠서 불길하다.
동지에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데, 이 날에 저울 양 끝에 숯과 흙을 걸어둔다. 만약에 숯 쪽으로 기울면 사슴의 뿔이 새로 나고, 난초의 뿌리에서 싹이 나며, 샘이 용솟음친다. 이러면 대략 일지(日至)를 알 수 있는데, 이는 해시계의 그림자 길이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 세성(歲星)이 있는 자리에 해당하는 지역은 오곡이 풍성할 것이고, 그와 상대되는 지역을 충(衝)이라고 하는데, 이 곳은 재앙이 생긴다.
– 사마천의 논평: 천문관측의 역사
태사공은 말한다.
태초에 백성이 태어난 이래로 세간의 군주들은 어찌 일찍이 해, 달, 별들의 운행을 추산하여 역법을 정하지 않았겠는가? 오제와 삼대의 시기부터 이 일을 계승하고 또 밝혀서 안으로는 관을 쓰고 띠를 매는 민족을 살게 하고, 밖으로는 이적(夷狄)을 살게 하며, 내외를 분별하였다. 중국을 12주로 나누어서 위로는 천상에 별들의 현상을 관찰하고 아래로 땅을 본받아 사물에서 법칙을 찾아냈다.
그런 후에 천상의 일월(日月)과 지상의 음양(陰陽)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천상에는 오성(五星)이 있고, 지상에는 오행(五行)이 있고, 천상에는 열수(列宿)가 있고, 지상에는 주군(州郡)있으니, 이는 하나하나씩 서로 대응한다. 천상의 해, 달, 별 등 삼광(三光)은 음양의 정기이고, 그 정기의 근본은 땅에 있다. 때문에 성인(聖人)은 이를 통합하여 다스린다.
주나라의 유왕(幽王), 여왕(厲王) 이전은 너무 오래되었다. 그동안 천상의 변화를 관찰한 바로 각 나라마다 길흉이 모두 서로 달랐다. 각 전문가마다 괴이한 물체로 점을 쳐서 당시의 사정과 부합시켰다. 그러나 그들이 남겨놓은 문자와 각종 도서기록에 보이는 길흉화복의 조짐을 법칙으로 삼을만한 것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자(孔子)가 육경(六經)을 논술하면서 비록 기이한 사건은 기록했지만 기이한 이론은 기록하지 않았고, 천도(天道), 성명(性命) 등에 관해서는 전수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전수할 때에 알려줄 필요가 없었고, 전수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록 알려주어도 그 말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
예전에 천문 역법을 전수한 사람으로 고신씨(高辛氏) 이전에는 중(重)과 여(黎), 당우(唐虞, 요순임금) 시기에는 희씨(羲氏)와 화씨(和氏), 하(夏)나라 때에는 곤오(昆吾), 은(殷, 상(商)이라고 함)나라 때 무함(巫咸), 주(周)나라 때에는 사일(史佚)과 장홍(萇弘), 송(宋)나라에는 자위(子韋), 정(鄭)나라에는 비조(裨竈), 제(齊)나라에는 감공(甘公), 초(楚)나라에는 당매(唐眛), 조(趙)나라에는 윤고(尹皐), 위(魏)나라에는 석신(石申)이 있었다.
천체의 운행은 30년마다 작은 변화가 있고, 1백 년마다 중간 정도의 변화가 있고, 5백 년마다 큰 변화가 있다. 큰 변화를 세 차례 거치면 한 기(紀)라고 하고 삼기(三紀)를 거치면 크게 갖추어지니, 이것이 천체 운행의 대략적인 규율이다. 한 나라의 군주는 반드시 이런 3과 5라는 천체 변화 주기를 귀히 여겨야 한다. 상하로 각 1천여 년이 지난 후에 하늘과 인간 간에 관계가 이어져 완비된다.
태사공이 고대 천문 변화를 추론할 때에 지금과 같이 고증할 자료가 없었다. 대략 춘추 242년간의 역사를 예로 삼았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일식은 36번이 있었고, 혜성은 3차례 출현하였으며, 송양공(宋襄公) 때에 별의 운석이 마치 비가 내리는 듯 떨어졌다. 당시에 천자의 권위가 미약하고, 제후들 중에 힘 있는 자는 무력으로 멋대로 정치를 하여 오패(五覇)가 차례로 일어나 번갈아 가면서 천하의 정사를 장악했다.
이후로 다수가 소수를 멋대로 난폭하게 대했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병합했다. 진(秦), 초(楚), 오(吳)나라는 모두 오랑캐의 나라였는데,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패주(覇主)가 되었다. 전씨(田氏)는 제(齊)나라의 정권을 찬탈하였다. 한(韓), 조(趙), 위(魏) 등 세 가문은 진(晉)나라를 분할시킨 후부터 전국(戰國)시대가 도래되었다.
각국 간에 서로 공격하고 약탈하여 전쟁이 연이어 발생하니, 성읍(城邑)은 여러 차례 도륙되고, 여기에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에 각국의 군신들은 함께 우환으로 여기고, 별과 운기를 관찰하여 길흉의 징조를 예측하는 것이 다급한 일이 되었다.
근세에 열두 제후와 칠국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합종과 연횡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앞사람의 발꿈치가 닿을 정도로 연이어 오는데, 어느 것을 버리고 따를 것인지 판정하게 어렵다. 이러한 정황에서 고(皐), 당(唐), 감(甘), 석(石) 등이 각자 시무(時務)에 따라 천문 관련 서적과 글들을 멋대로 해석하였는데, 그들의 주장은 대체로 뒤섞여 어지럽고. 쌀이나 소금처럼 사소한 것이었다.
28수가 열두 주(州)를 주관하고, 북두가 열두 주를 더불어 주관한 것은 오래 전부터였다. 진(秦)나라 강역 내에 길흉은 태백성(太白星, 금성)을 살피고 천랑성(天狼星)과 천호성(天弧星)으로 점친다. 오(吳), 초(楚)나라 강역 내의 길흉은 형혹성(熒惑星, 화성)을 살피고, 오형성(烏衡星)으로 점친다. 연(燕), 제(齊)나라의 길흉은 진성(辰星)을 살피고 허성(虛星), 위성(危星)으로 점친다. 정(鄭)나라 강역 내의 길흉은 세성(歲星)을 살피고 방성(房星), 심성(心星)으로 점친다. 진(晉)나라 강역내의 길흉은 진성(辰星)을 살피고 삼성(參星)과 벌성(罰星)으로 점친다.
진(秦)나라가 삼진(三晋)과 연(燕), 대(代) 지구를 병탄한 후에 화산(華山)과 황하 이남 지구를 중국이라고 일컬었다. 중국은 사해(四海) 중에 동남방향에 있고 동남방은 양(陽)에 속한다. 양은 즉 일(日), 세성(歲星, 목성), 형혹성(熒惑星, 화성), 전성(塡星, 토성)인데, 서로 대응한다. 천가성(天街星) 이남의 여러 별을 보고 점을 치는데, 필수(畢宿)가 주가 된다.
중국 서북은 호(胡), 맥(貉), 월지(月氏) 등 모피 옷을 입고, 활로 수렵생활을 하는 백성들인데, 서북은 음(陰)이다. 음은 즉 월(月), 태백(太白, 금성), 진성(辰星, 수성)인데, 서로 대응한다. 천가성 이북의 여러 별을 보고 점친다. 묘성(昴星)이 주이다.
그래서 중국의 산맥과 강물은 서남쪽에서 동북방향으로 흐르는데, 산천의 원두(源頭, 발원지)는 농(隴)과 촉(蜀) 지구이고, 말미에는 발해(渤海), 갈석산(碣石山) 일대로 빠져나간다. 진(秦), 진(晋)나라는 용맹한 것을 좋아하고, 이적의 기풍이 있어서 또 태백성(太白星)으로 점을 친다. 진(秦), 진(晉)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에 해와 세성 등으로 점을 칠 뿐만 아니라 또 태백성으로도 점을 친다. 태백성도 중국 역내의 길흉화복을 주관하고 있다.
호(胡), 맥(貉)은 자주 중국을 침략하고, 진성(辰星, 수성)으로 점친다. 왜냐하면 진성은 뜨고 지는 것이 신속하여 이적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적(夷狄) 사람들의 길흉을 주관한다. 이것이 대체적인 정황과 형세이다. 앞서 말했던 진성과 태백성은 번갈아 가면서 서로 주인과 객이 된다. 형혹성(荧惑星)은 이성(李星)이라고도 한다. 이(李)와 다스릴 이(理)는 같은 음으로 밖으로 군사를 다스리고 안으로 정사를 다스린다. 그래서 문헌에는 “비록 영명한 천자가 재위에 있더라도 반드시 항상 형혹성의 위치를 관찰해야 한다.”라고 한다. 제후들이 번갈아 가면서 강대해졌고, 당시의 재앙과 이변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지만 채록할 만한 것은 없다.
진시황의 재위 시절 15년 간 혜성이 네 차례 출현하였는데, 시간이 가장 긴 것은 80일에 달했고, 혜성이 긴 것은 하늘을 가로 지를 정도였다. 그 후에 진나라는 육국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했고, 밖으로는 사방의 오랑캐를 내쫓아는데, 죽은 사람으로 서로 베개를 삼을 정도였으며 엉클어진 삼(麻) 같이 혼란스러웠다. 이 때문에 장초왕(張楚王, 진승) 등이 더불어 봉기했다. 이를 전후로 30여 년간 병사들이 서로 깔리고 밝아 유린하여 죽은 자를 헤아릴 수가 없게 되었다. 치우(蚩尤)이래 이와 같은 잔혹함은 없었다.
항우가 거록을 구원했을 때에 왕시성(枉矢星, 큰 유성과 비슷한데, 뱀처럼 구불구불 운행하며 검푸른 빛을 띠고, 바라보면 마치 깃털이 나있는 듯함)이 서쪽으로 흘러갔다. 이후에 산동에서 여러 제후들이 연합하여 서쪽으로 진격하여 진나라를 격파하고 진나라 항복한 병사를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고 함양성을 도륙했다.
한(漢)나라가 흥기할 때에는 오성(五星)이 동정수(東井宿, 이십팔수의 하나로 한왕(漢王)인 유방이 진나라 관문에 들어갈 때에 오성이 동정수에 모였다고 함)의 가운데로 모였다고 한다. 흉노의 군사들이 한고조(漢高祖)를 평성에서 포위하였을 때에는 삼수(參宿), 필수(畢宿)가 부근에 머물렀고 달무리가 일곱 겹으로 나타났다. 여씨(呂氏, 여태후 일족)이 난을 일으켰을 때에 일식이 발생하여 대낮에도 암흑천지가 되었다. 오(吳), 초(楚)나라 등 칠국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혜성 길이가 여러 장에 달했고, 천구성(天狗星)이 양(梁)나라 교외를 지나갔다. 칠국이 전쟁을 일으킨 후에 양나라 성 아래에는 시체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원광(元光), 원수(元狩) 연간에 치우기성(蚩尤旗星)이 두 차례 출현하였는데, 그 길이가 하늘의 절반을 가로질러 갔다. 이후 경성의 네 곳에서 출정하여 이적(夷狄)과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벌였고, 그 중에서 호인(胡人)과 전쟁이 가장 격렬했다.
월(越)나라 멸망한 징조로 형혹성(熒惑星, 화성)이 남두(南斗)를 지키고 있었고, 조선을 공략할 징조로 혜성이 남하성(南河星), 북하성(北河星)에서 출현했다. 대완(大宛)을 정벌하기 전에는 혜성이 초요성(招搖星) 부근에 출현했다. 이상이 가장 분명한 사례이다. 이 밖에 소소하고 간접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이로부터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천상의 징조가 나타나고, 세간에 그 응험을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다.
한나라 초기에 천문 역법으로 저명한 사람으로 별 점으로 당도(唐都), 구름 점에는 왕삭(王朔), 해(歲) 점으로 위선(魏鮮)이 있었다. 감공(甘公), 석신(石申)의 오성(五星) 역법 중에는 단지 형혹성만이 반대로 운행하는 역행이 있었고, 형혹성이 역행하여 머무는 지방. 그 밖의 별들의 역행과 해와 달이 서로 빛을 막아 일부 또는 전부가 보이지 않게 되는 일 등이 모두 점칠 내용이 되었다.
나는 일찍이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서 역대 왕조에서 발생한 사건을 고찰하였다는데, 근 백년 사이에 오성이 출현한 후에 역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도리어 역행하다가 일찍이 성대해지고 색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서로 빛을 막아 일부 또는 전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과 남북으로 운행하는 것에 일정한 시기가 있었다. 이것이 대체적인 법도이다.
고로 자궁(紫宮), 방심(房心), 권형(權衡), 함지(咸池), 허위(虛危) 등의 별자리에 속한 별들은 천상에 오관(五官)의 자리인데, 경성(經星, 항성)은 이동하지 않고, 크고 작은 것이 각기 차별이 있으며, 넓고 좁음에도 각기 일정한 법도가 있다. 수(水), 화(火), 금(金), 목(木), 전성(塡星, 토성) 등 오성은 천상에서 오관(五官)을 보좌한다. 위성(緯星, 행성)도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타남에 각기 일정한 규율이 있고, 운행할 때에 영(嬴) 혹은 축(縮)하는 현상에도 모두 일정한 법도가 있다.
해에 변화가 있으면 마땅히 덕을 닦고, 달에 변화가 있으면 마땅히 형벌을 줄여야 하며, 다른 별에 변화가 있으면 인화 단결해야 한다. 무릇 하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지나치면 점을 쳐야한다. 나라의 군주가 강대하고 덕이 있으면 창성하고, 군주가 약소하고 또 잘못을 가리고 속이면 망한다. 천상의 이변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은 덕을 닦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정사를 개혁하는 것이며, 다시 그 다음으로는 구제(救濟)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신에게 제사를 올려 재해를 제거하는 것이며, 최하의 대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 경성(經星)의 변화는 매우 적지만 해, 달, 오성 등의 삼광(三光)의 변화에 대한 점은 자주 사용된다.
일식, 월식, 햇무리, 달무리의 이변과 구름과 바람 등은 하늘의 객기(客氣)이다.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또한 대운(大運)일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세간의 정사와 관련이 있어서 하늘이 인간에게 길흉을 예시하는 조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다섯 가지 현상은 모두 하늘이 감응한 바가 있으면 나타나고 변동되는 것이다. 천문 역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운기 변화와 삼, 오의 규율에 통달해고, 고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시세의 변화를 깊이 관찰하며 그것들의 정교함과 조잡한 것을 판별할 줄 알아야 천관(天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동방의 창제(蒼帝)가 덕을 베풀면 천문(天門)이 열리고, 남방의 적제(赤帝)가 덕을 베풀면 천뢰(天牢, 하늘의 감옥)이 텅 빈다. 중앙의 황제(黄帝)가 덕을 베풀면 천요성(天夭星)도 일어난다. <서방 백제(白帝)가 덕을 베풀면> 바람이 서북방에서 불어오고, 또 반드시 경신일(庚辛日)이 온다. 가을 내내 다섯 차례의 바람이 불면 대 사면이 있고, 세 차례 바람이 불면 작은 사면이 있다. <서방 백제(白帝)가 덕을 베풀면> 정월(正月) 20일과 21일에 달무리가 에워쌀 무렵에 대사면이 있다. 이것은 태양이 음기를 내쫓기 때문이다. 다른 설로 서방 백제가 덕을 베풀면 필수(畢宿), 묘수(昴宿)를 달무리가 에워싸고 있을 때에 일어난다.
그러나 사흘 저녁을 에워싸면 덕은 완성되고 부족하면 사흘 저녁을 못 넘기고, 혹은 달무리가 에워싼 것에 결함이 생기면 덕은 이뤄질 수 없다. 또 다른 견해로 달무리가 진성(辰星)을 에워싸고 그 기간이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북방 흑제(黑帝)가 덕을 베풀면 천관(天關)에 변동이 있다. 상술한 오방(五方)의 천제(天帝)가 덕을 베풀면 천자는 장차 연호를 바꿔야 한다. 만약에 덕을 베풀지 않으면 반드시 경계를 보일 것이고 폭풍우가 몰아쳐서 돌을 뽑고 깨뜨리게 될 것이다. 객성(客星)이 하늘의 궁정에 출현하면 반드시 기이한 명령이 있을 것이다.
6. 봉선서(封禪書)

사마천 사기-서(書)의 여섯 번째 기록으로 봉선서(封禪書)은 종묘나 제사 관련 내용으로 무제 시기의 내용은 ‘효무본기’의 내용과 동일하다.
봉선서(封禪書)
– 상고시대부터 춘추전국 시대의 제사
예로부터 천명(天命)을 받고 제왕인 자가 어찌 일찍이 봉선(封禪)을 행하지 않겠는가? 대체로 하늘의 상서로운 감응과 길조가 없으면 서둘러 봉선의 의식을 거행했고, 이미 상서로운 감응과 길조가 나타나면 태산에 가서 봉선의 의식을 거행하지 않는 제왕은 없었다. 비록 천명을 받아 제왕이 되었어도 치세의 성취를 얻지 못했다면 이미 양보(梁父)에 올라갔어도 신명의 덕에 통하기에 흡족하지 못하고, 비록 신명의 덕에 통할 수 있어도 봉선의 의식을 행할 틈이 없었다.
그래서 봉선 의식을 행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전(傳, 논어, 양화)』에서 말하길 “삼 년 동안 예(禮)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반드시 무너지고, 삼 년 동안 음악을 익히지 않으면 음악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했다. 매번 태평성세를 만날 때에는 봉선의식을 거행하여 하늘의 공덕에 보답하고, 쇠락한 세상에서는 봉선의식을 거행하지 못했다. 멀리는 천여 년, 가까이는 수백 년이 되었지만 봉선의 의식은 훼손되고 잊혀져 그 상세한 정황은 얻을 수 없으나 기록으로는 후세에 전해진다.
『상서(尙書)』 에서 말하길 “순(舜)은 선기옥형(璇璣玉衡)으로 칠정(七政, 해와 달, 다섯 별)의 운행을 따른 역법(曆法)을 바로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상제(上帝)에게 제사를 지내시고, 육종(六宗, 고대에 존중히 여겨 제사하는 여섯 신 혹은 자연현상. 즉 천지(天地), 사시(四時), 한서(寒暑), 혹은 일월성신(日月星辰) 및 수한(水旱) 등등 여러 설이 있음)에게 제사를 지내시며,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시는 등 여러 신(神)에게 두루 제사하셨다.
오서(五瑞, 천자가 제후에게 신표로 나누어 준 서옥(瑞玉). 공(公)에게는 환규(桓圭), 후(侯)에게는 신규(信圭), 백(伯)에게는 궁규(躬圭), 자(子)에게는 곡벽(糓璧), 남(男)에게는 포벽(蒲璧)을 하사함)를 거두어 확인하고, 좋은 달과 좋은 날을 골라 사악(四岳, 사방의 제후)과 여러 주목(州牧, 구주(九州)의 우두머리들)을 만나보고는 서옥을 다시 여러 제후들에게 돌려주었다. 이해 2월에 동쪽을 순행하여 대종(岱宗, 태산(泰山))에 이르러 나무를 태워 제사하는 시(柴) 제사를 지냈고, 산천을 바라보며 차례대로 제사한 뒤 마침내 동쪽 제후들을 접견했다.
사시(四時)와 달의 운행에 맞추어 날짜를 바로잡고, 음률과 도량형을 통일시켰으며 오례(五禮,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 등 오등(五等) 제후의 조빙의 예)와 오옥(五玉, 다섯 가지 서옥(瑞玉)), 세 가지 비단(삼공(三公)이 예를 행할 때 지니는 삼종의 비단), 두 가지 산 짐승(경과 대부들이 예를 행할 때 쓰는 양과 기러기나 뀡), 한 가지 죽은 짐승(선비 예를 행할 때 쓰는 야생 닭) 등의 예물들을 정리했다. 5월에는 남쪽으로 순행하여 남악(南岳, 형산(衡山))에 이르렀고, 8월에는 서쪽으로 순행하여 서악(西岳, 화산(華山))에 이르렀고, 11월에는 북쪽으로 순행하여 북악(北岳, 항산(恒山))에 이르렀으며, 이때 모두 대종(岱宗)에서와 같은 예식을 거행했다. 중악은 숭고(崇高, 숭산(崇山))을 말한다. 순임금은 5년마다 한 번씩 순행하였다.
우(禹)는 이러한 순행제도를 따랐다. 그 후에 14세 제왕인 공갑(孔甲)에 이르러 덕이 음란해지고 귀신을 섬기기를 좋아하며 신을 모독하자 이에 신은 두 용을 데리고 떠나갔다. 그 후에 3세가 지나자 탕(湯)이 하나라 걸왕(桀王)을 정벌하고 하나라의 사직을 옮기고 싶었으나 차마 그럴 수 없기에 <하사(夏社, 하나라의 사궁(社宮)을 지칭함)>라는 글을 지었다. 그 후에 8세(世)가 지나 제왕 태무(太戊) 시절에 이르러 뽕나무와 닥나무가 궁정에서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한 아름이나 커져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태무가 매우 두려워했다.
이에 이척(伊陟, 이윤의 아들)이 “요망스런 귀신의 장난은 덕(德)을 이기지 못합니다. 왕의 정사에 허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은 덕을 닦으소서.”라고 간언을 올리고, 무함(巫咸, 고대에 신령한 무당. 북을 만들어서 점치는 법을 창시했다고 전해짐)에게 말하여 태무로 하여금 덕을 닦고 선정을 베풀게 하였다. 그 후에 뽕나무와 닥나무는 말라 죽었다. 그래서 이척은 무함을 칭찬했다. 무함의 일어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에 14세에 이르자 제왕 무정(武丁)은 부열(傅說)을 승상으로 삼으니, 은나라는 다시 흥성하기 시작했고 무정은 고종(高宗)으로 일컬었다. 한번은 제사를 지내는데 꿩이 솥귀에 올라앉아 울자 무정이 두려워하자 조기(祖己)가 “왕은 근심하지 말고 먼저 덕을 닦으십시오.”라고 간언을 올렸다. 무정은 그의 말을 따라 덕을 닦으니 재위 내내 평안 무사했다. 그 후 5세가 지나고 제왕 무을(武乙)이 신령에게 오만하게 굴었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 그 후 3세가 지나고 제왕 주(紂)가 음란하자 무왕(武王)에게 토벌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본다면 처음에는 엄숙하고 신령을 공경하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뒤에 와서 점점 게으르고 오만해졌다.
『주관(周官, 주례(周禮))』에 말하길 “동지(冬至)가 되면, 남쪽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긴 햇살이 떠오는 것을 맞이하고, 하지(夏至)가 되면 땅의 신에게 제사 지냈다. 이때에 모두 음악과 춤을 받쳤으며 신령이 이에 흠향(歆饗)할 수 있다는 예법이었다. 천자는 천하의 명산대천에서 제사 지냈는데, 5악(五嶽, 중국의 다섯 명산으로, 태산, 화산, 형산, 항산, 숭산을 지칭함)은 3공(三公)의 예우로써 제사 지내고, 4독(四瀆)은 제후의 예우로써 제사 지냈으며, 제후들은 각자 영토의 명산대천에 제사 지냈다. 4독이란 강수(江水), 하수(河水), 회수(淮水), 제수(濟水)를 말한다.
천자가 제사 지내는 곳을 명당(明堂) 또는 벽옹(辟雍)이라고 말하며, 제후가 제사 지내는 곳을 반궁(泮宮)이라고 말한다.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보좌하게 되자, 교외제사 때에는 후직(后稷)을 하늘과 배향하였으며, 종묘제사 때에는 명당에서 문왕(文王)을 상제(上帝)와 배향하였다. 하(夏)나라의 우(禹)가 흥기하자 토지신의 제사를 지냈고, 후직(后稷)이 농사를 일으킨 이후부터 후직의 사당이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교외에서 천신에 대한 제사와 천지에서 토신에 대한 제사는 모두 유구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 시황제 이전의 진나라 제사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킨 후부터 14세(世)가 지나자 세상의 도는 더욱 쇠락해져 예악이 폐기되고 제후가 멋대로 행동하여 주나라 유왕(幽王)이 견융(犬戎)에게 패하여 도읍을 낙읍(雒邑)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에 진(秦)나라 양공(襄公)이 견융을 공격하고 주나라를 구원하니 그 공으로 처음으로 제후의 반열에 올랐다. 진나라 양공은 제후가 되어서 서쪽 변경에 거주하고, 스스로 소호신(少皞神)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여 서치(西畤, 치(畤)는 천지와 오제(五帝)에게 제사하는 땅을 의미함)를 만들어 백제(白帝)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희생으로 얼룩말과 누른 소와 숫염소를 각기 한 마리씩을 바쳤다.
16년이 지나자 진(秦)나라 문공(文公)이 동쪽으로 사냥 나갔다가 견수(汧水)와 위수(渭水) 사이에 도달하여 머무를 생각으로 점을 보았는데, 길했다. 문공은 꿈속에서 한 마리의 누런 뱀을 보았는데, 그 몸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드리워져 있었고, 주둥이는 부성(鄜城)의 광활한 들판 가운데까지 뻗어 있었다.
문공이 꿈속의 일을 사돈(史敦)에게 물으니, 사돈이 이렇게 회답했다. “이것은 상제의 상징으로 군주는 그것을 제사지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치(鄜畤, 지금의 섬서성 부현)를 건립하고, 소, 양, 돼지 등 세 가지 희생을 가지고 교외에서 백제(白帝)에게 제사를 드렸다.
부치를 건립하기 이전에 옹성(雍城) 곁에 원래 오양(吳陽)의 무치(武畤)가 있었고 옹성(雍城) 동쪽에는 호치(好畤)가 있었지만 모두 폐기되어 제사지내는 사람이 없었다.
혹자가 말하길 “자고로 옹주(雍州)의 지세가 높아서 신명(神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치(畤)를 세워 교외에서 상제(上帝)에게 제사 지냈으며, 기타 여러 신의 사당도 모두 이곳 운집하게 되었다. 대략 황제(黄帝) 때에 일찍이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주나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제사를 거행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경전에도 보이지 않고, 대신들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다.
부치를 건립한지 9년 후에 진문공은 기이한 돌을 얻었는데, 진창산(陳倉山) 북쪽의 산비탈에 성읍을 만들고 그 돌에게 제사를 지냈다. 돌의 신령은 어떤 해에는 오지 않다가 어떤 해에는 여러 차례 강림했다. 강림할 때는 항상 늦은 밤이었고, 어떤 때에는 유성처럼 찬란한 빛을 냈다. 동남쪽에서 사성(祠城) 가운데로 모여들었고, 그 형상은 수탉과 같았으며 그 소리가 간절하게 들렸는데, 들뀡들도 야밤에 분분이 따라 울었다. 매번 제사를 지낼 때에 (소, 돼지, 양) 한 마리씩 희생으로 바쳤으며, 그 이름을 진보(陳寶)라고 했다.
부치가 건립된 지 78년 후, 진나라 덕공(德公)이 제왕으로 즉위하여 옹성(雍城)으로 도읍을 정하는 것에 점을 보았는데, 이렇게 점괘가 나왔다. “후대의 자손들이 말에게 황하의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옹성을 도읍으로 정했고, 옹성에 허다한 사당은 모두 이 시기부터 흥기했다. 매번 부치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소, 돼지, 양 삼백 마리를 받쳤다. 또 복사(伏祠)를 건립했으며, 사방의 성문에 개의 사지를 찢어 걸어놓고 독충의 재앙을 방지했다.
덕공(德公)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또 4년이 지난 뒤에 진(秦)나라 선왕(宣王)이 위수 남쪽에서 밀치(密畤)를 건립하고 청제(靑帝, 동제(東帝), 청황(靑皇) 등으로 불리기도 하면 봄을 주관하는 천제(天帝)임)에게 제사를 지냈다.
14년이 지난 뒤에 진나라 목공(繆公)이 즉위했으나 병이 들어 5일 동안 인사 불성되었다. 깨어난 후에 스스로 꿈속에서 상제(上帝)를 보았는데, 상제는 목공에게 진(晉)나라의 내란을 평정하라고 명했다고 한다. 사관이 이 말을 기록하여 부(府)에다 소장했다. 후세에 모두 진목공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진목공이 즉위한 지 9년째 되던 해에 제나라 환공(桓公)에 패주(覇主)가 되어 계구(癸丘)에서 제후들과 회맹을 하면서 봉선(封禪) 의식을 거행하려고 했다.
관중(管仲)이 제환공(齊桓公)을 마주하여 천명을 받고 봉선한 자가 72가(家)나 된다고 잘못 말하였고, 세상에 전하는 우(禹)임금의 옥첩사(玉牒辭)에 “축융(祝融)이 남방(南方)을 맡아 그 영기(英氣)를 발하여 햇빛과 달빛에 목욕하매 온갖 보화가 생기도다.” 하였는바,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견강부회한 글이 틀림없는데 세상의 학자들이 그 진위를 살피지 않고 그 말만을 믿었던 것이다.
관중이 말하길 “고대에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양보(梁父)에서 땅에 제사를 지낼 때에 제후 72명이 되었다고 하나, 제가 기억하기는 12명이었습니다. 옛날 무회씨(無懷氏)가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운운산(云云山)에서 땅에 제사를 지냈으며, 복희씨(伏羲氏)는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운운산에서 땅에 제사를 지냈으며, 신농씨(神農氏)은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운운산에서 땅에 제사를 지냈으며, 염제(炎帝)는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정정산(亭亭山)에서 땅에 제사를 지냈으며, 황제(黃帝)는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정정산에서 봉선했으며, 전욱(顓頊)은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운운산에서 땅에 제사를 지냈으며, 제곡(帝嚳)은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운운산에서 땅에 제사를 지냈으며, 요(堯)도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운운산에서 땅에 제사를 지냈으며, 우(虞)의 순(舜)도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운운산에서 땅에 제사를 지냈으며, 하(夏)나라의 우(禹)는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회계산(會稽山)에서 땅에 제사를 지냈으며, 상(商)나라의 탕(湯)은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운운산에서 땅에 제사를 지냈으며, 주(周)나라의 성왕(成王)은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두수산(杜首山)에서 땅에 제사를 지냈으며, 이들은 모두 천명을 받아 제왕이 된 후에서야 봉선(封禪)할 수 있었습니다.”
제환공이 말하길 “과인은 북쪽으로 산융(山戎)을 정벌하고, 고죽(孤竹)을 지났으며, 서쪽으로 대하(大夏)를 정벌하고 멀리 유사(流沙)를 건넜으며, 말의 고삐를 당기고 수레를 멈추게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비이산(卑耳山)에 올랐다. 남쪽으로는 소릉(召陵)을 정벌하고 웅이산(熊耳山)에 올라 장강(長江)과 한수(漢水)를 조망했다. 반란 평정을 위해 군사적 회맹을 세 차례 하였고, 정치나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 회맹을 여섯 차례 하여 모두 9차례 제후들을 소집하여 천하를 바로잡았다. 이때에 제후들은 한 사람도 나를 거역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옛날에 3대가 천명을 받아 제왕이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래서 관중은 말로써 제환공을 설득시킬 수 없음을 알고, 그로 인하여 제단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를 저지하면서 말했다. “고대에 봉선을 거행할 때에는 호상(鄗上)에서 나는 기장과 북리(北里)의 벼로써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곡물로 삼았으며, 장강와 회수 사이에서 자라는 삼척모(三脊茅, 세모난 띠. 띠는 본래 모가 둘 뿐인데 모가 셋이 있으면 매우 희귀한 식물임)로 신령의 자리를 엮었습니다.
동해에서 조공으로 바친 비목어(比目魚)와 서해에서 조공으로 바친 비익조(比翼鳥)가 있었고, 또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바친 상서로운 물건이 15종이나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상서로운 물건도 없고 봉황과 기린도 내려오지 않았으며 좋은 곡식도 생산되지 않고, 들판에는 쑥과 잡초만 무성하며 올빼미 등 흉조만 조당(祖堂)에 출현할 뿐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봉선을 거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공은 봉선의식을 포기했다. 이 해에 진목공은 이오(夷吾)를 귀국시켜 진(晋)나라 군주로 삼았다. 이후 세 차례 진나라 군주를 세워서 내란을 평정했다. 목공은 재위 39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1백여 년이 지난 후에 공자(孔子)가 육예(六藝, 육경)를 논술하였다. 그 경전 중에는 성(姓)을 바꾸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되었는데,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양보에서 땅에게 제사를 지낸 70여 명이었다. 그러나 당시 봉선의식에 쓰였던 제기와 제수 음식 등에 대한 기술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아마도 기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체제(諦祭, 천자가 그 시조(始祖)의 묘에 올리는 제사)에 대해 물으니 공가가 말씀하길 “그 뜻을 잘 모르겠소. 만약 체제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있다면 그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자기의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쉬울 것이오.”라고 했다.
『시경(詩經)』에 이르길 “주왕(紂王)이 재위에 있을 때에 문왕(文王)이 천명을 받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는 태산에 가지 않았다. 무왕이 은나라를 멸한 뒤 2년 만에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을 때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주왕조는 오직 성왕 때에 이르러 덕정(德政)을 펼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성왕의 봉선의식이 그 도리에 가까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제후 각국의 대부들이 멋대로 집권하였고, 노(魯)나라의 계씨(季氏, 계손씨(季孫氏))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공자가 이를 비난했다.”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 장홍(萇弘)은 방술로 주나라 영왕(靈王)을 섬겼는데, 이 때문에 제후들은 영왕에게 조회하러 오지 않았고, 주나라는 점차 미약해져서 장홍의 죄를 다스릴 힘이 없었다. 그래서 장홍은 공개적으로 귀신부리는 활동을 하였고, 이수(狸首, 실전된 시(詩)의 편명, 고대에 활쏘기 예를 행할 때에 제후들이 이수를 노래하며 과녁으로 삼음)로 과녁 표적을 만들었는데, 이수는 조회하지 않는 제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귀신과 괴이한 힘에 의지하여 제후들을 오게 해 보려고 하였으나 제후들이 따라 주지를 않았다. 마침내 장홍은 진(晉)나라 사람에게 붙잡혀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주 나라 사람들이 괴이한 방술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장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백여 년 후에 진(秦)나라 영공(靈公)은 오양(吳陽)에 상치(上畤)을 설치하여 황제(黃帝)에게 제사를 지냈고, 하치(下畤)를 설치하여 염제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로부터 48년 후에 주나라 태사 담(儋)은 진(秦)나라 헌공(獻公)을 알현하면서 말하길 “처음에 진(秦)나라와 주(周)나라가 연합했다가 또 분리되고 5백년 후에 다시 연합하여 17년이 지나면 패왕(覇王)이 출현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역양(櫟陽, 지금의 섬서성 서안시 염양구 무둔진관장(武屯鎭關莊)과 어보촌(御寶村) 사이)에서 비가 내렸는데, 그 속에서 황금이 떨어지니, 진나라 헌공은 스스로 오행(五行) 중에 금(金)의 상서로운 조짐을 얻었다고 여겨 역양에 휴치(畦畤)를 만들어 백제(白帝)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 후에 1백 20년이 지나자 진(秦)나라가 주(周)나라를 멸하고 주나라의 구정(九鼎, 하나라 우 임금이 구주(九州)의 쇠를 거두어들여 주조한 솥으로 중국통일을 상징함)이 진나라로 들어갔다. 혹자가 말하길 송(宋)나라의 태구(太丘, 지금의 하남(河南) 영성(永城) 서북쪽과 하읍(夏邑)의 경계)의 사단(社壇)이 무너질 때에 구정도 팽성(彭城) 아래의 사수(泗水) 속으로 침몰되었다고 한다.
– 진시황의 봉선과 제사
또 115년이 지나자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였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皇帝)라고 일컫자 혹자가 말하길 “황제(黃帝)는 오행 중에 토덕(土德)을 얻어 황룡과 큰 지렁이가 출현했다. 하(夏)나라는 목덕(木德)을 얻어 청룡(靑龍)이 교외에 머물렀고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났다. 은(殷)나라는 금덕(金德)을 얻어 산 속에서 은이 흘러나왔다. 주(周)나라는 화덕(火德)을 얻어 적색 까마귀의 상서로운 조짐이 있었다. 지금 진나라가 주나라의 천하를 개변시켜 수덕(水德)을 얻은 시기이다. 이전에 진문공(秦文公)이 사냥을 나갔다가 일찍이 한 마리의 흑룡(黑龍)을 얻었는데, 이것이 바로 수덕의 상서로움이다.
그래서 진나라는 황하(黄河)의 이름을 덕수(德水)라고 고쳤다. 겨울 10월을 한해의 처음으로 삼았고, 흑색을 숭상하고 척도의 표준을 6척으로 삼았으며 음성은 대려(大呂)을 숭상했고, 정사(政事)는 법령을 숭상했다.
재위 3년 되던 해에 동방의 군현으로 순찰 나가서 추역산(騶嶧山)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며 진나라의 공덕을 칭송했다. 그리고 제(齊), 노(魯) 지역의 유생(儒生), 박사 70여 명을 뽑아 그들을 거느리고 태산 아래에 도착했다. 여러 유생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길 “옛날에 봉선(封禪)은 부들로 짠 수레를 이용했는데, 이는 산에 흙과 돌, 초목이 상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또 깨끗이 땅을 쓸어서 제사를 지내는 마당으로 삼고 자리를 마른 풀과 볏짚으로 짰는데 이는 용이하게 처리하고 쫓아서 행하기 쉽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라고 건의했다.
진시황은 그들의 의론이 각기 서로 다르고 이치에 부합하지 않아서 실행하기 어렵다고 여겨서 유생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수레가 다니는 도로를 말끔하게 수리하도록 하고, 태산의 남쪽부터 정상에까지 등반했으며, 돌비석을 세워서 진시황의 공덕을 칭송하고 봉선하는 도리를 천명하였다. 그런 뒤에 북쪽 길로 하산하여 양보산(梁父山)에서 지신(地神)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때 의례는 태축(太祝, 제사를 주관하는 관리)이 옹성(雍城)에서 상제(上帝)에게 제사를 지낼 때 썼던 의식을 많이 채용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봉선의식은 비밀로 붙였고, 세상 사람들은 그 기록을 남길 수가 없었다.
진시황이 태산에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서 폭풍우를 만나 큰 나무 밑에서 멈추기를 기다리는데, 여러 유생들이 이미 진시황에게 쫓겨나 봉선의식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진시황이 폭우를 만나 피했다는 말을 듣고 조롱했다.
봉선의식을 마치자 진시황은 계속 동쪽으로 가 바닷가에 도착하여 유람하면서 한편으로 명산대천 및 팔신(八神)에게 제사지내고, 신선과 선문(羡門, 고대 선인이었던 선문자고(羨門子高)를 지칭) 같은 무리를 향하여 복을 빌었다. 팔신은 예부터 있었는데, 혹자가 말하길 “제 나라 태공(太公)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제나라의 이름이 제가 된 것은 바로 팔신의 하나인 천제신(天齊神)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천제신의 제사가 끊어져 언제 시작된 때를 알지 못했다.
팔신이란 첫째는 천주(天主)로 천제(天齊)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천제에는 연못의 물이 있고 임치(臨菑) 남쪽 교외 산 아래에 위치한다. 둘째는 지주(地主)로 태산 아래의 양보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천성이 음기를 좋아하여 반드시 높은 산 아래와 작은 산 위에서 제사를 지내야하며 이를 치(畤)라고 일컫는다. 지신은 양기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낮은 웅덩이에 생긴 둥근 언덕 위에서 제사를 지낸다. 셋째는 병주(兵主, 전쟁의 신)로 치우(蚩尤)에게 제사를 지낸다. 치우의 사당은 동평육(東平陸)의 감향(監鄕)에 있는데, 제나라 서쪽 변경이다. 넷째는 음주(陰主)로 삼산(三山)에서 제사를 지낸다. 다섯째는 양주(陽主)로 지부산(之罘山)에서 제사지낸다. 여섯째는 월주(月主)로 내산(萊山)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상 모두 제나라의 북쪽에 있고 발해에 인접해 있다.
일곱째는 일주(日主)로 성산(成山)에서 제사지낸다. 성산은 가파른 절벽을 굽이굽이 돌아 바다로 들어가고, 제나라 동북쪽의 모퉁이에 위치한다. 이곳은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지방이다. 여덟째는 사시주(四時主)로 낭야산(琅邪山)에서 제사를 지낸다. 낭야산은 제나라 동부에 있으며 한 해가 시작되는 곳이다. 팔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모두 한 마리의 희생을 받치고, 제사를 주관하는 무당은 제수용품으로 쓰는 옥과 비단 등의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
제나라의 위왕(威王), 선왕(宣王) 때에 추연(騶衍, 전국시대 말기의 음양가) 등의 사람들이 오덕종시(五德終始, 왕조가 오행의 상승 순서에 따라 일정하게 바뀐다는 학설) 변화에 관해 논술하였는데, 진나라가 황제라고 칭한 후에 제나라 사람들이 이 이론을 진시황에게 상주하자 진시황은 받아들였다. 송무기(宋毋忌), 정백교(正伯僑), 충상(充尙), 선문고(羨門高)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燕)나라 사람으로 신선도가의 법술을 행하였는데, 육체만 남기고 영혼만이 신선이 되어 승천하다는 귀신의 일에 의탁하였다.
추연이 음양주운(陰陽主運)이란 술법으로 제후들에게 명성을 떨치자, 연(燕), 제(齊) 지방의 바닷가에 사는 방사들은 그의 술법을 전하려고 했지만 능히 통한 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는 황당무계하고 아부하여 적당히 영합하려는 무리들이 흥기했는데,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제나라의 위왕(威王)과 선왕(宣王), 연나라의 소왕(昭王) 시절부터 사람들을 바다로 내보내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를 찾도록 하였다.
이 삼신산(三神山)은 전설에 따르면 발해(渤海) 중에 있어 그 거리는 멀지 않으나, 신선들이 배가 도착하는 것을 걱정하여 바로 바람을 일으켜 배를 산에서부터 밀어낸다고 한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이곳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 선인들과 불로장생의 약이 모두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 그곳의 물체와 새, 짐승들은 모두 백색이며, 황금과 백은(白銀)으로 궁전이 지어졌다고 한다. 도달하기 전에 그곳을 바라다보면, 마치 한 자락의 백운과 같으며, 도달하기 직전에서 보면 삼신산은 도리어 바닷물 아래에 있는 듯하다. 그리고 막상 배를 대려고 하면 매번 바람이 밀어내어 결국은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속세의 군주들은 그곳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가 없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해상에 도착하자 이 전설에 관해 말하는 방사들이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
진시황은 친히 해상에 나갔다가 삼신산에 도착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이 타지 않은 동남동녀(童男童女)를 목욕재계시키고 이들을 데리고 해상으로 들어가서 삼신산을 찾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들을 태운 배는 해상에서 모두 바람을 만나 도달할 수 없었지만 삼신산을 확실히 보았다고 말했다.
그 다음해 진시황은 다시 바닷가를 순행하여 낭야산(琅邪山)에 이르렀으며, 항산(恒山)을 지나 상당(上黨)으로부터 되돌아왔다. 3년 후에 갈석산(碣石山)을 순행하여 바다로 삼신산을 찾으러 갔던 방사들을 점검하고 상군(上郡)으로부터 되돌아왔다.
5년 후에 진시황은 남쪽으로 상산(湘山)까지 이르렀고, 마침내 회계산(會稽山)에 올랐다. 더불어 해상으로 나아가 삼신산의 기이한 불로장생약을 얻기를 원했다. 그러나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사구(沙丘)에서 병사했다.
– 진 2세 황제의 제사
2세(二世) 원년, 진이세 황제는 동쪽으로 갈석(碣石)을 순행하였고, 더불어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태산을 거쳐 회계산에 이르렀는데, 모두 예법에 따라 그곳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진시황이 세운 비석 곁에 글을 새겨서, 진시황의 공덕을 밝혔다. 이해 가을, 제후들이 병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배반했고, 3년 후에 2세 황제가 시해되었다.
진시황이 봉선의식을 거행한 지 12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했다. 뭇 유생들은 진시황이 『시(詩)』와 『서(書)』를 불태우고, 문학(文學)을 하는 선비들을 욕보여 살육하고, 백성들은 그가 만든 법률을 원망했으며,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적대시했기에, 모두 와전해서 이렇게 말했다. “진시황이 태산에 올랐으나, 폭풍우의 저지를 받아 봉선의식을 제대로 행할 수 없었다.” 이것은 진시황이 봉선을 거행할 덕이 없으면서 권세로만 믿고 봉선의식을 진행한 탓이 아니겠는가?
– 상고시대 오악과 산천에 대한 제사
옛날의 삼대(三代, 하(夏), 은(殷), 주(周))의 도읍이 모두 황하와 낙수(洛水)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숭고(嵩高, 숭산)를 중악(中嶽)으로 삼았다. 기타 사악(四嶽, 태산, 화산, 형산, 항산)의 명칭도 각자의 방위에 따라 배합되었고, 사독(四瀆, 네 개의 큰물로, 장강(長江), 황하(黃河), 회수(淮水), 제수(濟水)를 지칭)은 모두 효산(崤山, 중국 하남성(河南省)에 있는 산 이름)의 동쪽(산동(山東)) 지역에 있었다. 진(秦)나라가 황제라고 칭하고, 함양(咸陽)을 도성으로 삼자, 오악과 사독은 모두 도성의 동방에 위치하게 되었다.
오제(五帝)로부터 진나라에 이르기까지 흥망성쇠를 거듭하여 명산대천이 혹은 제후의 경내에 있기도 했고, 혹은 천자의 영토 안에 있기도 했는데, 그 제사의 예의는 손익에 따라 대대로 달라서 일일이 모두 기록할 수가 없었다. 진나라가 천하를 병합한 후에 비로소 사관(祠官)에게 명해 통상적으로 천지와 명산대천의 귀신들에게 지내던 제사를 차례로 기술할 수 있었다.
그 당시 효산(崤山) 동쪽에서 명산 다섯 곳과 대천(大川) 두 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태실(太室)이라고 명명한 산은 바로 숭고(嵩高, 숭산(嵩山))이다. 이 밖에 항산(恒山), 태산(泰山), 회계산(會稽山), 상산(湘山)이 있고, 두 곳의 대천은 제수(濟水)와 회수(淮水)이다. 봄에는 포(脯, 말린 고기)와 술로써 그해의 제사를 지냈고, 봄에 얼음이 녹고, 가을에 강물이 얼 때, 겨울에 빙설(氷雪)로 인해 길이 막힐 때 수시로 제사를 지냈다. 제수음식으로 각기 송아지 한 마리를 썼으며, 제수용품은 옥과 비단 등으로 각기 달랐다.
화산(華山) 서쪽으로 명산은 일곱 곳, 대천은 네 곳이다. 명산으로 화산(華山), 박산(薄山)이란 산이 있는데, 박산은 쇠산(衰山)을 말한다. 그리고 악산(嶽山), 기산(岐山), 오악(吳嶽), 홍총(鴻冢), 독산(瀆山)이 있는데, 독산은 촉(蜀)의 민산(汶山)을 말한다. 큰물로 하수(河水)는 임진(臨晉)에서 제사지내며, 면수(沔水)는 한중(漢中)에서 제사지내며, 추연(湫淵)은 조나(朝那)에서 제사지내며, 강수(江水)는 촉군(蜀郡)에서 제사지냈다. 또한 봄과 가을에 얼음이 녹고, 얼 때나 길이 막힐 경우 제사를 지냈는데, 동방의 명산대천에서 제사지내는 것과 같았으나, 제수음식은 송아지를 쓰로 제수용품으로 쓰는 옥, 비단 등은 각기 달랐다. 네 곳의 사직단이 있는 큰 봉우리는 홍총(鴻冢), 기총(岐冢), 오총(吳冢), 악총(嶽冢)으로 모두 햇곡식으로 제사를 지냈다.
진보신(陳寶神)이 계절에 따라 강림하면 제사를 지냈다. 하수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탁주를 추가하여 올렸다. 이러한 산과 하천들은 모두 옹주(雍州) 지역 내에 있고 천자의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제사 때에 수레 한 대와 자류 망아지 네 필을 추가했다. 패수(覇水), 산수(産水), 장수(長水), 예수(澧水), 노수(澇水), 경수(涇水), 위수(渭水)는 모두 큰 하천은 아니나 함양에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명산대천의 제사에 상응하는 제사를 지냈는데, 추가된 제수품은 없었다.
견수(汧水), 낙수(洛水) 같은 큰 못과 명택(鳴澤), 포산(蒲山), 악서산(嶽壻山)의 부류들은 작은 산천들이지만 역시 모두 매년 빙설로 길이 막힐 때, 해빙될 때, 하천이 고갈될 때 기도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례는 반드시 같지 않았다.
옹주(雍州)에는 일신(日), 월신(月), 삼(參), 진(辰), 남북두(南北斗), 형혹성(熒惑星, 화성), 태백성(太白星, 금성), 세성(歲星, 목성), 전성(塡星, 토성), 진성(辰星, 수성), 이십팔수(二十八宿), 풍백(風伯), 우사(雨師), 사해(四海), 구신(九臣, 삼공(三公)과 육경(六卿)), 십사신(十四臣), 제포(諸布), 제엄(諸嚴), 제구(諸逑) 등의 신령을 섬기는 백여 개의 사당이 있었다. 서현(西縣)에도 수십 개의 사당이 있었고, 호현(湖縣)에는 주(周)나라 천자의 사당이 있으며, 하규(下邽)에는 천신의 사당이 있었다.
풍수(澧縣), 호현(滈縣)에는 소명(昭明)의 사당와 천자벽지(天子辟池, 주나라 천자의 학궁)의 사당이 있고, 두현(杜縣)과 박현(毫縣)에는 세 곳의 두주(杜主) 사당과 수성(壽星) 사당이 있으며, 옹성(雍城)의 간묘(菅廟) 중에도 두주 사당이 있었다. 두주는 원래 주나라의 우장군(右將軍)으로, 진중(秦中) 지역의 소묘(小廟) 중 가장 영험이 있는 사당이다. 이상은 각기 한 해 절기나 달, 또는 계절에 따라 사당에서 제사 지낸다.
오직 옹주에 있는 네 치(畤, 제단)에서는 상제를 존귀하게 섬기고, 그 빛을 발하는 것으로 가장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것은 진보신에 대한 제사이다. 때문에 옹주에서 네 제단에서는 봄에 그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 밖에는 얼음이 녹거나 가을에 가뭄이 들어 물이 마르거나 겨울에 한파가 와서 얼음이 얼거나 빙설로 길이 막힐 때 제사 지내며, 5월의 상구(嘗駒) 제사와 사시사철의 중월(仲月, 음력 2, 5, 6, 11월)에 거행하는 월사(月祀)가 있다.
진보신 제사는 단지 진보신이 강림하는 계절에 맞추어 임시로 한 번씩 제사 지낸다. 봄과 여름에는 적색 말을 쓰며, 가을과 겨울에는 자류 망아지를 쓴다. 제사에서는 네 필의 망아지를 쓰는데, 목각으로 만든 용의 방울이 달린 수레 한 대 및 목형의 수레는 말 네 필이 끈다. 각기 그 제왕의 색과 같게 한다.
누런 송아지와 새끼 양은 각기 네 마리이고, 옥과 비단은 각기 정한 수량이 있으며, 소와 양은 산 채로 땅에 매장하며, 조(俎)와 두(豆) 등의 제기는 쓰지 않는다. 3년에 한 번씩 교외 제사를 지낸다. 진나라는 겨울 10월을 그해의 첫 달로 삼았기 때문에 항상 매년 10월에 재계하고 교외에서 상제에게 제사 지낸 후, 제사를 지낸 곳에서 봉화를 궁전까지 이르게 하고 황제는 함양궁 부근에서 절을 올리는데, 의복은 백색을 숭상하며, 다른 용구는 보통의 제사와 같다. 서치(西畤), 휴치(畦畤)에서의 제사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 이전과 같으며, 천자가 친히 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제사들은 태축(太祝)이 주관하여, 매년 기일에 맞추어 제사 지낸다. 그리고 명산대천, 모든 귀신, 팔신 부류에게 드리는 제사는 황제가 해당 지역을 지나갈 때 제사 지내며 떠나면 제사를 그만둔다. 군현(郡縣) 및 멀리 떨어진 지역의 신사(神祠)는 그 지역 백성들이 각기 제사를 지내게 했고, 천자의 축관(祝官, 제사를 주관하는 관리)이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축관 중 비축(袐祝)이 있는데, 만약 재앙을 당하게 되면 제사를 지내 복을 기원하며, 사당에서 제사 중에 일어난 과실은 아랫사람들에게 전가한다.
– 한나라 고조의 제사
한(漢)나라가 흥기했다. 한 고조(漢高祖)가 빈천할 때 일찍이 큰 뱀을 죽인 적이 있다. 어떤 귀신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뱀은 백제(白帝)의 아들로, 그 뱀을 죽인 자는 적제(赤帝)의 아들이다.” 고조가 처음 병사를 일으켰을 때, 풍현(豐縣)의 분유사(枌楡祠)에서 기도를 올렸다. 패현(沛縣)을 공략한 후 패공(沛公)이라고 칭하고서, 곧바로 치우(蚩尤)에게 제사지내고, 희생으로 쓴 가축의 피로 북과 깃발을 붉게 칠했다. 드디어 10월 파상(灞上)에 이르러 제후들과 더불어 함양을 평정하고, 자립하여 한왕(漢王)이 되었다. 이 때문에 10월을 한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았으며, 적색을 숭상했다.
한나라 고조 2년에 동쪽으로 항적(項籍)을 공격하고 다시 병사들을 이끌고 관중(關中)으로 돌아온 후,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옛날 진나라 때 사당에서 제사를 올렸던 상제(上帝)는 어떤 상제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에 좌우 신하들이 대답했다. “사제(四帝)로 백제(白帝), 청제(靑帝), 황제(黃帝), 적제(赤帝)의 사당입니다.”
고조가 말했다. “나는 하늘에 오제(五帝)가 있다고 들었는데, 단지 네 개의 사당이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아무도 회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고조가 말했다. “나는 그 까닭을 알고 있다. 나를 기다려서 오제의 수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흑제(黑帝)의 사당을 건립하고, 북치(北畤)라고 명명했다. 유관 관원에게 제사를 주관시키고, 황제는 친히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나라의 옛 축관(祝官)들을 모두 불러 모아 임용하고, 또 태축(太祝), 태재(太宰)를 설치하고, 의례도 이전과 똑같게 하였다. 그리고 각 현에 공적인 사단(社壇)을 두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 조서에는 이렇게 말했다. “짐은 심히 사당을 중히 여기고, 제사를 정중하게 지내려고 한다. 지금 상제에 대한 제사 및 산천에 뭇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각기 때에 맞는 예법으로 이전처럼 제사 지내도록 하라.”
4년 후에 천하가 이미 평정되자, 어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지금 풍현의 분유사를 신중하게 수리하고, 항상 사계절에 따라 제사를 거행하며, 봄에는 양과 돼지로써 제사 지내도록 하라.”
축관에게 장안(長安)에 치우의 사당을 건립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장안에 사관(祠官), 축관(祝官), 여무(女巫)를 두었다. 그중 양무(梁巫)는 천(天), 지(地), 천사(天社), 천수(天水), 방중(房中), 당상(堂上) 부류의 신령들에게 제사지냈고, 진무(晉巫)는 오제(五帝), 동군(東君), 운중군(雲中君), 사명(司命), 무사(巫社), 무사(巫祠), 족인(族人), 선취(先炊) 부류의 신령들에게 제사지냈다. 진무(秦巫)는 사주(社主), 무보(巫保), 족루(族累) 부류의 신령들에게 제사지냈고, 형무(荊巫)는 당하(堂下), 무선(巫先), 사명(司命), 시미(施糜) 부류의 신령들에게 제사지냈다. 구천무(九天巫)는 구천(九天) 신령들에게 제사지냈는데, 모두 해마다 때에 맞추어 궁중에서 제사지냈다.
그중 하무(河巫)는 임진(臨晉)에서 하신(河神)에게 제사지냈고, 남산무(南山巫)는 남산과 진중(秦中)에서 제사를 지냈다. 진중은 이세 황제를 상징한다. 이상의 모든 제사들은 모두 각기 정해진 시일이 있다.
2년 후에 혹자가 말했다. “주나라가 흥기할 때는 태읍(邰邑)을 건립하고 후직(后稷)의 사당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천하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러자 고조는 어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냈다. “각 군(郡), 제후국과 현(縣)에 영성(靈星, 천전성(天田星)이라고도 하는데 농사를 맡아 보는 별)의 사당을 세우고, 항시 매해 때에 맞추어 소를 제물로 써서 제사를 거행하라.”
고조 10년 봄에 제사를 담당하는 관원들이 황제에게 각 현은 매년 봄 2월과 12월에 양과 돼지로써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 지내며, 민간의 토지신에게는 각기 스스로의 제물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명해 줄 것을 청했다. 이에 황제는 “허락한다.”다는 영을 내렸다.
– 한 효문제의 제사
그리고 18년이 지나자 효문제(孝文帝)가 즉위했다. 즉위한 지 13년 되던 해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냈다. “현재의 비축(袐祝)이 과실을 아랫사람들에게 전가하는데, 짐은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취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이러한 폐단을 없애도록 하라.”
애초, 명산대천이 제후국의 경내에 있는 경우에 제후국의 축관에게 각기 제사를 거행하게 하고, 천자의 축관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齊)나라와 회남국(淮南國)이 제사를 폐지하자 태축(太祝)에게 모두 옛날처럼 매년의 때에 맞추어 제사를 거행하라고 명했다.
이해, 효문제는 다음과 같은 제서(制書)를 반포했다. “짐이 황제에 즉위한 지 금년으로 이미 13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종묘의 신령과 사직의 복에 힘입어, 국내는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 매년 풍년을 맞이했다. 짐이 부덕함에도 어찌 이러한 큰 복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이는 모두 상제와 뭇 신들이 하사한 은덕 덕분이다. 짐이 듣자니 고대로부터 신령의 은덕을 입으면, 반드시 그 공로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 뭇 신들에 대한 제사의례를 늘리고 싶다. 담당 관원들은 옹주(雍州)의 오치(五畤)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각기 수레 한 대와 수레 위의 각종 장식품을 추가하고, 서치(西畤), 휴치(畦畤)에는 나무로 만든 수레 각 한 대, 나무 말 각 네 필 및 그에 걸 맞는 각종 장식품을 추가하고, 하수(河水), 추수(湫水), 한수(漢水)에는 각기 옥 2개씩을 추가하라. 더불어 모든 사당들의 제사장소를 넓히고, 옥, 비단, 제기 등을 등급에 따라 추가 지급하게 하라. 지금까지 축관들이 모두 짐의 복만 빌어 백성들과 더불어 복을 누릴 수 없었다. 지금부터는 축관들이 신령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오직 짐을 위해 기원하지 말라.”고 명했다.
노(魯)나라의 사람 공손신(公孫臣)이 상서를 올려 말했다. “당초 진나라는 수덕(水德)을 얻었고, 지금 한나라는 그것을 계승했습니다. 오덕(五德)이 순환하여 전하는 도리를 미루어보면 한나라는 마땅히 토덕(土德)을 받게 되며, 토덕을 받은 감응으로 바로 황룡이 출현할 것입니다. 마땅히 정삭(正朔, 연시(年始)와 월초(月初)라는 뜻으로, 역성혁명을 이룬 제왕이 새로 반포한 역법을 지칭함)을 개정하고, 복식의 색깔을 바꾸며, 황색을 숭상해야 합니다.”
이때에 승상이었던 장창(張蒼)은 율력(律曆)의 학문을 좋아했는데, 그는 한나라는 바로 수덕(水德)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고, 황하의 제방이 터진 것이 바로 그 징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해의 첫 달을 겨울 10월로 하고, 색깔은 밖은 흑색, 안은 적색을 숭상해야 오행의 덕에 서로 부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장창의 주장은 그릇된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3년 후, 황룡이 성기(成紀)에서 출현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공손신을 불러 박사(博士)로 제수하고, 여러 유생들과 함께 역법과 복식의 색깔을 개정하라고 명했다.
그해 여름에 조서를 내려 말했다. “지금 기이한 신물(神物)이 성기(成紀)에서 출현했으니, 백성들에게는 해가 없을 것이며, 해마다 풍년을 이룰 것이다. 짐은 교외에서 상제와 뭇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 하니, 예관(禮官)들은 논의하여 어기지 말고 짐을 돕도록 해라.”
이에 담당 관리들이 모두 말했다. “옛날의 천자는 여름에 친히 교외에 가서 상제에게 제사 지냈기 때문에, 이를 교사(郊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 여름 4월중에 문제는 처음으로 교외에 가서 옹주의 오치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의복은 모두 적색을 숭상했다.
그 다음해, 조(趙)나라 사람 신원평(新垣平)은 구름의 기운을 보고서, 황제를 알현하며 아뢰었다. “장안의 동북쪽에 신기(神氣)가 나타났는데, 오색찬란하며 마치 사람이 관모를 쓴 형상입니다. 혹자는 동북쪽은 천지신명이 거주하는 곳이며, 서쪽은 천지신명의 묘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동북방에서 상서로운 길조를 내려왔으니, 마땅히 사당을 세워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늘에서 내린 그 상서로운 길조에 서로 부합됩니다.”
그래서 위양(渭陽)에 오제(五帝)의 사당을 만들었는데, 오제를 한 사당에 함께 모셨다. 그리고 상제마다 따로 한 전당에 모셨고, 마주하는 각 다섯 개 문의 색깔은 그 상제의 색깔과 같게 하였다. 제사 용품 및 모든 의례 또한 옹주의 오치와 서로 같게 하였다.
여름 4월에 문제는 친히 패수(覇水)와 위수(渭水)가 만나는 곳에 가서 신에게 참배하고, 위양의 오제에게 제사를 지냈다. 오제 사당의 남쪽은 위수에 접해 있고, 북쪽은 포지(蒲池)를 가로지르는 도랑물이 있었다. 횃불을 켤 때에 제사를 시작하는데, 그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하늘에 비치도록 하였다. 이어 신원평을 상대부(上大夫)로 높이고 상으로 수 천금(千金)을 하사했다. 그리고 박사와 여러 유생들로 하여금 육경(六經) 중에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왕제(王制, 예기의 한 편명으로 주로 반작(班爵), 제록(制祿), 제사, 양로에 관한 것들이 수록됨)를 편찬하게 하고, 순수(巡狩)와 봉선의 일을 의론하라고 명했다.
문제가 장문(長門)에 나갔다가, 마치 다섯 사람이 도로 북쪽에 서있는 듯 것을 보고, 드디어 그 북쪽에 오제의 제단을 세우고, 다섯 마리의 희생과 상응하는 제수용품을 마련하여 제사 지냈다. 그 다음해, 신원평은 은밀히 사람을 시켜 옥잔을 지니고, 천자의 궁궐에 가서 상서를 올려 진헌하라고 했다. 그리고 사전에 문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옥의 기운이 천자의 궁궐 안에 도래했습니다.” 이에 문제는 그런 일이 있는지 조사하였더니 과연 옥잔을 바치려는 자가 있었는데, 그 옥잔 위에 ‘인주연수(人主延壽)’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신원평은 또 말했다. “신이 해의 기운을 살펴보니 하루에 두 번의 정오가 출현할 것입니다.” 얼마 지나서 태양이 정오를 지난 뒤에 동쪽으로 역행하여, 다시 또 한 번의 정오가 출현했다. 그래서 문제 17년을 원년으로 바꾸고, 천하 사람들에게 성대한 연회를 베풀도록 명령을 내렸다.
신원평이 말했다. “주나라의 정(鼎)이 사수(泗水)에 빠진 후, 지금 강물이 범람하여 사수에 통하고 있습니다. 신이 동북쪽의 분음(汾陰)을 바라보니 금보(金寶)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는 주나라의 정이 나오려는 조짐입니다. 조짐이 보이는데 이를 맞이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자를 보내 분음의 남쪽에 사당을 세우고, 하수로 가서 제사를 통하여 주나라 정의 출현하길 희망했다.
어떤 사람이 상서를 올려 신원평이 말한 운기(雲氣)와 신령의 일은 모두 사기라고 고발했다. 이에 신원평을 사법 관리에게 맡겨 그의 죄를 밝혀내게 하고, 신원평과 그 종족을 모두 주살했다. 이로부터 문제는 역법, 복색, 신령의 일을 개정하는 데에 태만했으며, 위양과 장문의 오제의 사당도 사관(祠官)이 관리하게 하고, 때에 맞추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나 친히 가지 않았다. 그 다음해, 흉노(匈奴)가 여러 차례 변경을 침입하자 군사를 일으켜 방어토록 했다. 그 후 몇 년간 수확은 줄어들었고 풍년이 들지 않았다.
– 한 효경제의 제사
몇 년이 후에 효경제(孝景帝)가 즉위했다. 재위 16년에 사관들은 예전처럼 각기 그 해의 때에 맞추어 제사를 지냈고, 어떤 새로운 것을 일으키고 낡은 것을 개혁하는 것이 없이 지금의 천자에 이르렀다.
– 한 효무제의 제사
지금의 천자(한무제)가 즉위 초, 특별히 귀신의 제사를 공경하게 지냈다. 원년에 한나라가 흥기한 지 이미 60여 년이 지나 천하가 안정을 이루자 모든 벼슬아치들은 천자가 봉선의식을 거행하고, 역법, 복색의 도량 등을 바꿀 것을 희망했다.
무제는 유가(儒家)의 학술에 마음을 두고, 현량(賢良, 한 문제 때부터 시작된 과거 제도로, 책문을 통해 직언과 극간(極諫)을 잘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현량문학(賢良文學) 혹은 현량방정(賢良方正)이라고도 칭함)을 뽑았는데 조관(趙綰), 왕장(王藏) 등은 문학으로써 공경(公卿)이 되었다. 그들은 고대의 제도처럼 성의 남쪽에 명당을 세워서 제후들이 조회할 것을 건의했다.
황제의 순수(巡狩)와 봉선제도, 역법의 개정, 복색 등의 일에 대해서 초안을 마련했으나, 미처 완성되지 못했다.
이때에 공교롭게도 두태후(竇太后)가 황로(黃老)의 학설에 심취하고 유가의 학술을 싫어했다. 그래서 은밀하게 사람을 시켜 조관 등이 간사하게 이권을 챙긴 일을 엿보게 하여, 관리를 소집하여 조관과 왕장의 사건을 심리했다. 이에 조관과 양장은 자살했고, 그들이 주관하여 시작하려던 일들은 모두 폐기되었다.
이로부터 6년 후에 두태후가 사망했다. 그 다음해 문학하는 선비인 공손홍(公孫弘) 등을 불러 임용하였다.
다음해에 황제는 처음으로 옹주에 가서, 오치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때 황제는 신군(神君)의 우상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를 상림원(上林園)의 제씨관(蹄氏觀)에 안치했다. 신군이란 원래 장릉현(長陵縣)의 여자로, 아들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다가 죽었는데, 그 신령이 동서인 원약(宛若)에게 나타났다. 이에 원약은 그녀를 자기의 집에서 사당을 짓고 모시자 백성들이 많이 와서 제사를 지냈다. 평원군(平原君)도 일찍이 제사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후 자손들이 존귀해지고 명성이 혁혁해졌다. 지금의 황제가 즉위하자 후한 예로 궁중에 사당을 세우고 공양했는데, 신군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으나, 그 형상은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당시에 이소군(李少君) 역시 조신(竈神, 부엌 신)에 대한 제사, 곡도(穀道, 곡식은 먹지 않고 솔잎이나 대추, 밤 따위를 조금씩 날로 먹는 양생술), 각로(却老, 늙는 것을 물리친다는 장생법) 방술로써 무제를 알현했는데, 무제는 그를 존중했다.
이소군은 원래 심택후(深澤侯)의 측근으로 방술을 주관했다. 이때 그는 자신의 나이와 성장내력을 숨기고, 항상 스스로 70세이며 능히 귀물(鬼物)을 부릴 수 있으며, 노쇠함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방술로써 제후들을 두루 사귀었다. 그러나 처자식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귀물을 부리고, 불로장생의 비책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더욱 선물을 보내주어 항상 금전과 생활이 넉넉했다.
사람들은 그가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생활이 풍족하고, 또한 그가 어느 곳의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더욱 그를 믿게 되었으며, 다투어 그를 섬기었다. 이소군은 천성적으로 방술을 좋아하고, 기교에 능하며 신기하게 잘 알아맞혔다.
그는 일찍이 무안후(武安侯)를 따라 주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좌중에는 90여 세가 되는 한 노인이 있었다. 이소군은 그 노인과 담화를 나누면서 일찍이 그의 조부와 함께 사냥했던 지방을 말했다. 그 노인은 어렸을 적에 조부와 함께 있어서 그 장소를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러자 좌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탄해마지 않았다.
이소군이 무제를 알현했을 때, 무제는 옛 동기(銅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 이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이소군이 말했다. “이 기물은 제환공(齊桓公) 10년에 백침대(柏寢臺)에 진열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뒤에 동기에 새겨진 글귀를 고증하니, 과연 제환공 때의 기물이었다. 이에 온 궁중의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하면서 이소군은 살아있는 신선이며, 그의 나이는 수백 살이나 된 것으로 여겼다.
이소군이 무제에게 상소하여 말했다. “부엌 신에게 제사 지내면 신령한 물건을 얻고, 그 물건으로 단사(丹沙)를 황금을 바꿀 수 있으며, 황금으로 음식을 담는 그릇을 만들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게 되면 바다에 떠 있는 봉래도(蓬萊山)의 신선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신선에게 봉선의 예를 행하면 불로장생할 수 있으니, 황제(黃帝)도 그랬습니다. 신이 일찍이 바다에서 노닐다가, 안기생(安期生)을 만났는데, 안기생은 거대한 대추를 먹고 있었는데, 크기가 참외와 같았습니다.
안기생은 선인으로 봉래산(蓬萊山) 속으로 왕래할 수 있었는데, 만약 황제가 그와 의기투합하면 나타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무제는 친히 부엌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방사들을 바다로 파견하여 봉래의 안기생과 같은 선인의 무리를 찾게 하였으며, 단사 등 여러 약물을 제련하여 황금을 만들게 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소군이 병으로 죽자 무제는 죽지 않고 신선이 되어 승천한 것으로 여겼다. 무제는 황현(黃縣)과 추현(錘縣)의 관리인 관서(寬舒)로 하여금 이소군의 방술을 전수받게 했다. 봉래의 선인 안기생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때부터 연(燕)과 제(齊) 등 연해지방 일대의 기괴하고 허황되며 진부한 방사들이 계속하여 신선의 일을 떠벌리게 되었다.
박현(亳縣) 사람 박유기(薄謬忌)가 태일신(太一神)에게 제사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조정에 다음과 같이 상주했다. “천신 중 태일은 가장 존귀하고, 태일을 보좌하는 것은 오제(五帝)입니다. 고대에 천자는 매년 봄, 가을에 장안 동남쪽 교외에서 태일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물로 태뢰(太牢, 제물로는 소, 양, 돼지를 갖춤)을 쓰고, 7일 동안 제사지내며, 또한 신단(神壇)을 세워 팔방으로 통하는 귀도(鬼道)를 만듭니다.”
그래서 천자는 태축(太祝)에게 장안의 동남쪽 교외에 사당을 세우고, 항상 박유기의 방법으로 제사를 올리라고 명했다.
그 후 또 어떤 사람이 상서를 올려 이렇게 말했다. “고대에 천자는 삼 년마다 한 차례 태뢰로 삼일신(三一神)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바로 천일신(天一神), 지일신(地一神), 태일신(太一神)입니다.” 천자는 그의 상소문을 윤허하고, 태축에게 박무기가 상주하여 세운 태일신 제단 위에서 함께 제사 지내고, 그자가 상소한 방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 후 또 어떤 사람이 상서를 올려 이렇게 말했다. “고대에 천자는 항상 봄에 재앙을 없애는 제사를 지냈는데, 황제(黃帝)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효조(梟鳥, 어미를 잡아먹는 올빼미), 파경(破鏡, 파경(破獍)으로도 불리며, 아비를 잡아먹는 짐승의 이름)을 사용하고, 명양신(冥羊神)에게는 양을, 마행신(馬行神)에게는 푸른색의 수말 한 필을, 태일신과 택산군지장신(澤山君地長神)에게는 소를, 무이군(武夷君, 무이산의 산신)에게는 마른 어물(魚物)을, 음양사자신(陰陽使者神)에게는 소 한 마리를 제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천자는 사관에게 상서를 올린 사람의 방법을 따르되 박유기가 상주하여 세운 태일단 곁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천자의 상림원(上林苑)에 흰 사슴이 있었는데, 그 가죽으로 화폐로 삼았고, 상서로운 감응에 부합하기 위해서 백금(白金)을 제조했다.
그 다음해에 옹주에서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다가 뿔 하나 달린 들짐승을 잡았는데, 마치 고라니와 같았다. 주관 관리가 말했다. “폐하께서 공경스럽고 정성을 드려 제사를 올리니, 상제께서 보답으로 뿔 하나 달린 이 짐승을 하사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기린(麒麟)일 것입니다.” 이에 그것을 오치(五畤)에 바치고, 매 치(畤)마다 제물로 소 한 마리씩을 추가하여 불태워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이것은 백금을 조주하여 하늘이 내린 상스러운 조짐이라 하여 제후들에게는 백금을 하사하고, 하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 했다.
이에 제북왕(濟北王)은 천자가 장차 봉선을 행할 것으로 여기고, 바로 상서를 올려서 태산 및 그 주변의 읍을 자진 헌납했다. 그러자 천자는 다른 현으로 보상해 주었다. 상산왕(常山王)이 죄를 짓자 다른 지방으로 옮기고, 그의 동생을 진정(眞定)에 봉해 선왕의 제사를 계속 잇게 하였고, 상산(常山)을 군(郡)으로 삼았다. 그런 후부터 오악(五嶽)은 모두 천자의 군현 안에 속하게 되었다.
그 다음해에 제나라 사람 소옹(少翁)은 귀신을 부리는 방술로 무제를 알현했다. 무제에게는 총애하는 왕부인(王夫人)이 있었는데, 그녀가 죽자 소옹은 밤에 방술로써 왕부인의 혼령과 부엌 신을 불러들여, 무제에게 휘장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 공으로 소옹은 문성장군(文成將軍)으로 임명하고, 많은 재물을 상으로 하사받았으며, 빈객으로 예우했다. 문성장군이 무제에게 말했다. “황제께선 신선과 소통하고 싶어 하지만, 궁실의 의복과 용구가 신선의 것과 같은 것이 없어서 신선은 강림하지 않습니다.” 이에 구름무늬의 그린 수레를 제작하고, 더불어 각기 좋은 날을 가려 수레를 타게 하여 악귀를 피하게 만들었다.
또한 감천궁(甘泉宮, 섬서성 순화현(淳化縣)의 감천산(甘泉山)에 있는 궁전)을 건립하여 그 가운데 대실(臺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천신, 지신, 태일신 등의 귀신 형상을 그려놓고, 제구(祭具)를 갖추고서 천신을 불러들이고자 했다. 1년여 뒤에, 그의 방술은 갈수록 효력이 떨어져서 신선은 마침내 강림하지 않았다. 이에 소옹은 남몰래 비단에 글을 쓴 다음 그것을 소에게 먹인 후에 거짓으로 모르는 체하며 소의 뱃속에 기이한 것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소의 배를 가르게 하니 과연 비단으로 쓰인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심히 괴기했다. 하지만 무제가 그 필적을 알아보고 소옹을 심문하니, 과연 거짓으로 쓴 글이었다. 그래서 노한 무제는 문성장군을 주살하고, 그 일은 덮어 감추었다.
그 후 무제는 또 백량(柏梁殿), 동주(銅柱, 구리 기둥), 승로선인장(承露仙人掌, 동(銅)으로 선인(仙人)의 손 모양을 만들어 세워서 동반을 떠받치고서 감로를 받게 함) 등을 만들었다.
문성장군이 죽은 그 다음해, 무제는 정호궁(鼎湖宮)에서 심한 병을 얻었는데, 무당과 의원들이 온갖 방법을 다하여 치료했지만 낫지 않았다.
이때에 유수발근(游水發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뢰었다. “상군(上郡)에 무당이 있는데, 병을 앓으면 귀신(鬼神, 신군(神君))과 접신되어 영험하다고 합니다.” 무제는 그 무당을 불러 감천궁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당이 한 차례 병을 얻자, 무제는 사람을 보내어 무당을 통해서 신군에게 물어보게 했다. 그러자 무당의 신군은 이렇게 말했다. “천자는 병으로 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소. 병세가 조금 나아지거든 힘을 내서 감천궁으로 와서 나를 만나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병세가 호전되더니, 마침내 일어나서 감천궁으로 행차하자 병이 완전히 좋아졌다.
이 때문에 대사면령을 반포하고 수궁(壽宮)에 신군(神君)을 모시었다. 수궁의 신군 중에서 가장 존귀한 신이 태일신이며, 그를 보좌하는 대금(大禁), 사명(司命)과 같은 무리들이 있는데, 모두 태일신을 따랐다. 사람들은 신군들의 모습은 볼 수 없고, 그들의 말소리만 들을 수 있었는데 마치 사람들의 말소리와 같았다. 그들은 수시로 왔다가 가는데, 오면 바람소리가 숙연해진다. 그들은 실내의 장막 속에 머물고, 때론 대낮에 말하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밤에 말을 한다.
천자는 재앙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후에 수궁에 들어갔다. 수궁은 무당이 주인역할을 하여 신군의 음식을 받았으며, 신군들이 하고자 하는 말 역시 무당을 통해서 전해졌다. 또한 수궁에 북궁(北宮)을 만들고, 깃털로 장식한 깃발을 내걸었으며, 여러 제사용품을 갖추어 예로써 신군을 섬겼다. 신군이 하는 말은 황제가 사람들에게 시켜 받아 적게 했는데, 이를 ‘화법(畵法)’이라고 한다. 신군들의 말은 모두 속인들도 알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천자는 마음속으로 홀로 즐거워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져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3년이 지난 후에 주관 관원들이 기원(紀元)은 마땅히 하늘에서 내린 상서로운 징조로 명명해야지 일원(一元), 이원(二元) 같이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기원은 ‘건원(建元)’, 두 번째 기원은 혜성의 긴 꼬리가 빛을 발했기에 ‘원광(元光)’, 세 번째의 기원은 교사(郊祠) 중에 뿔이 하나 있는 짐승을 포획했기에 마땅히 ‘원수(元狩)’라고 칭하자고 했다.
그 다음해 겨울, 천자가 옹주에서 교사를 지내고 주관 관리들과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짐이 친히 상제에게 제사를 올렸으나, 후토(后土)에 대한 제사가 없으니, 예법에 부합하지 않소.” 이에 주관 관원과 태사공(太史公, 사마천의 부친인 사마담(司馬談)), 사관인 관서(寬舒) 등이 논의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천지신께 제사 지낼 때 바치는 송아지의 작은 뿔은 누에고치나 밤처럼 작아야 합니다. 지금 폐하께서 친히 후토에게 제사 지내시려면 연못 가운데 있는 둥그렇게 솟아있는 언덕에 다섯 개의 제단을 설치하고, 각 제단마다 누런 송아지를 한 마리씩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모두 땅에 묻고, 제사에 지내는 사람들은 황색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에 천자는 마침내 동쪽으로 행차하여 처음으로 분음수(汾陰脽, 분음현에 있는 작은 토산)의 구릉에 후토의 사당을 건립했다. 제사의례는 관서 등이 의논한 대로 집행하였다. 천자는 친히 멀리서 바라보며 절을 올렸는데, 상제에게 지내는 예법과 같았다.
예법이 끝나자 천자는 형양(滎陽)을 거쳐서 돌아왔는데, 낙양(雒陽)을 지나면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삼대(三代)의 연대가 아득하여 제사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 그들의 제례의식을 보존되기 어렵게 되었구나! 30리의 땅을 주 나라의 후손에게 주고, 주자남군(周子南君)으로 봉해, 선조의 제사 받들도록 하라.” 이해에 천자는 각 군현을 순행하기 시작해서 점차 태산 가까이까지 이르렀다.
그해 봄, 악성후(樂成侯, 정의(丁義))가 상서를 올려 난대(欒大)를 소개했다. 난대는 교동왕(膠東王)의 궁인(宮人)으로 옛날에 일찍이 문성장군과 같은 스승 밑에서 방술을 배웠는데, 뒤에 교동왕의 약을 처방하는 조제사가 되었다.
악성후의 누이는 강왕(康王, 교동왕)의 왕후가 되었으나 아들이 없었다. 강왕이 죽은 후에 다른 후궁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다. 그러나 강왕후는 음행을 일삼아 새로운 왕과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법술로 암투를 벌여 위태롭게 했다. 강왕후는 문성장군이 이미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천자에게 아첨하기 위해 바로 난대를 악성후의 추천을 받게 하여 천자에게 알현해서 방술을 말하게 했다. 천자는 원래 문성장군을 죽인 후에 일찍 죽인 것을 후회하고 있었고, 그의 방술이 다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애석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차에 난대를 보자 매우 기뻐했다. 난대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며, 많은 방책을 발언하며, 또한 과감하게 허풍을 쳐도 상대방이 의심을 가지지 못하게 처신했다.
한번은 난대가 천자에게 이렇게 허풍을 떨면서 말했다. “신은 자주 바다 가운데를 왕래하면서, 안기생(安期生), 선문고(羨門高) 등의 선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이 천하다고 생각하고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왕은 제후일 뿐이라서 방술을 전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은 여러 차례 강왕에게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으나, 강왕도 또한 신을 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스승은 황금을 제련할 수 있고, 황하의 터진 둑도 막을 수 있으며, 불사약도 구할 수 있고, 신선도 불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 문성장군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방사들의 입을 닫아버릴 것이니, 어찌 감히 방술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황제가 말했다. “문성장군은 말의 간을 먹고 죽었을 따름이오, 당신이 참으로 방술을 잘 닦기만 한다면 내 무엇을 아끼겠는가!” 그러자 난대가 이렇게 아뢰었다. “신의 스승은 남들을 찾아가지 않는데, 남들이 스승을 찾아옵니다. 폐하께서 반드시 신선을 초치하고 싶으면, 신선의 사자를 존귀하게 만들고, 그 친족도 빈객의 예우로써 대해야지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종 믿을 만한 인장을 차게 해야만, 비로소 신선과 통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선이 만나줄 지는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신선의 사자를 존중해야만 그제야 신선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황제는 그에게 작은 방술이라도 시범으로 보이라고 하자, 그는 바둑판 위에 바둑알을 놓고 저절로 서로 부딪치며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에 천자는 마침 황하의 범람을 걱정하고, 황금을 제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난대를 오리장군(五利將軍)에 임명했다. 한 달 남짓 지나자 난대는 4개의 관인(官印)을 취득해 오리장군인(五利將軍) 외에 천사장군인(天士將軍), 지사장군인(地士將軍), 대통장군인(大通將軍)의 인장을 꿰찼다. 그리고 어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예전에 우(禹)임금은 구강(九江)을 소통시켰고, 사독(四瀆)을 개통하여 흐르게 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하수가 범람하여 평지까지 잠겼으니 제방축조의 노역을 쉬게 할 수가 없다. 짐이 천하에 28년 동안을 군림하였는데, 하늘이 만약 짐에게 방사를 보내주었나니, 난대는 하늘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역경(易經)』의 「건괘(乾卦)」에서는 ‘나는 용이 하늘에 올랐다.’라고 했고, 「점괘(漸卦)」에서는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점차 나아가(군자가 조정에서 높은 자리로 나아감을 비유) 물가의 높은 언덕으로 서서히 날아간다.’라고 하였는데, 짐의 뜻에 감응하여 난대를 주신 말일 것이다. 그래서 지사장군 난대에게 2천 호의 땅을 봉지를 주고, 악통후(樂通侯)로 삼으라.”
그리고 열후(列侯)에게 주는 저택과 노비 천 명을 하사했다. 황제가 타는 수레와 말, 휘장, 기물 등을 그의 저택에 가득 채워주었다. 또한 위황후(衛皇后)가 낳은 장공주(長公主)를 그에게 시집보내고, 황금 만근을 보내주었으며 아울러 그가 거주하는 읍을 당리공주읍(當利公主邑)으로 개명했다. 천자가 친히 오리장군의 저택을 찾아갔고, 사자에게 안부를 묻고 공급할 물품을 실은 행렬이 길을 따라 끊이지 않았다. 대주(大主, 대장공주로 천자의 고모)와 조정의 장상(將相)으로부터 그 밑의 벼슬아치들까지도 모두 주연을 베풀어 축하하고 예물을 바쳤다.
이어서 천자는 또 옥인(玉印)에 ‘천도장군(天道將軍)’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사자로 하여금 우의(羽衣)를 입고서 밤에 흰 띠풀 위에 서게 하며, 밤에 띠풀 위에서 옥인(玉印)을 받도록 했는데, 이는 오리장군이 천자의 단순한 신하가 아님을 과시하고, ‘천도장군’란 옥인을 꿰찬 자만이 또 천자를 위하여 천신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리장군은 밤마다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내며 신선의 하강하길 빌었는데, 신선은 오지 않고 온갖 귀신만 모여들었다. 그러나 난대는 제법 귀신들을 부릴 수 있었다. 그 후로 난대는 곧 행장을 챙기고 나와, 동해로 들어가 그의 스승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난대는 황제를 접견한지 몇 달 만에 몸에는 6개의 관인을 꿰차고, 그 존귀함을 천하에 떨쳤다. 그리하여 연(燕)과 제(齊)의 연해 일대 방사들은 자기들도 신선을 불러 올 수 있는 방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분해서 손목을 불끈 쥐지 않는 자가 없었다. 더불어 스스로 자신들만의 진귀한 비방이 있어 능히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해 여름 6월에 분음(汾陰)의 무당 금(錦)이 백성들을 위해 위수(魏脽)의 후토(后土) 사당 옆에서 제사를 지낼 때, 땅 아래에 갈고리 같은 기이한 물건을 보고 파보니 정(鼎)이었다. 이 정은 보통 정보다 기이하게 크고, 꽃무늬만 조각되어 있고 문자나 다른 표식은 새겨져 있지 않았다. 무당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 지방 관리에게 말하자, 그 관리는 하동(河東)의 태수 승(勝)에게 알렸고, 승은 또 조정에 보고했다.
천자는 사자를 보내 무당이 정을 얻은 과정을 심문하고 중간 간사하게 속인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바로 예의를 갖추어 제사를 지내고 정을 감천궁으로 맞이하려고 했다. 그리고 황제는 백관들을 거느리고 장차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에 올리려고 했다. 중산(中山)에 도착하니 날씨가 따뜻하고 청명했는데, 갑자기 정의 상공에서 황색 구름이 피어올라 마치 수레의 차양 같았다. 때마침 뛰어지나가던 고라니가 있어, 천자가 몸소 활을 쏘아 잡아서 정을 제사를 지낼 때에 희생으로 썼다.
장안에 도착하자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은 모두 의논을 하여 보정(寶鼎)을 존중하여 봉행할 것을 청했다. 이에 천자가 말했다. “근래에 황하가 범람하고, 수년 동안 흉년이 들었소. 그래서 짐이 군현을 순찰하며 후토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위해 곡식이 풍성해지기를 기원했었소. 그런데 올해의 오곡이 풍성한 것에 대해 아직 신에게 보답도 못 드렸는데, 어찌해서 이 정이 출현했단 말인가?”
유관 관리들이 모두 이렇게 대답했다. “옛날 태제(泰帝, 태호(太昊) 복희씨)께서 신정(神鼎)을 하나 만드셨는데, 하나(一)란 일통(壹統)이란 뜻으로 천지만물이 모두 보정(神鼎)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황제(黃帝)는 보정(寶鼎) 세 개를 만들었는데, 천, 지, 인을 상징했습니다. 하우(夏禹)는 구주(九州)의 동(銅)을 거두어 구정(九鼎)을 주조했으며, 모두 고기 삶은 것을 담아 상제와 귀신에게 제사지낼 때에 사용했습니다. 성덕이 흥성한 사람을 만나서 정(鼎)은 하나라와 상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주나라의 덕이 쇠퇴하고 송(宋)나라의 사직이 망하자, 정은 사라져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경(詩經)』 「주송(周頌)」에 ‘당(堂)에서부터 대문의 터까지 가면서 제사에 받칠 양을 살펴보고 나서 소를 살펴보며, 큰 가마솥과 옹솥까지 살펴보았네. 큰 소리로 웃고 떠들거나 오만하지 않으니, 장수의 경사를 누리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보정이 감천궁에 도착했는데, 보정에서 광채가 나고 매끄러운 것이 용처럼 변화무쌍하니, 조정에는 반드시 무궁무진한 복록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중산에 도착했을 때에 황백색의 구름이 내려와 덮고 또 고라니 같은 짐승이 나타난 것과 부합합니다. 폐하께서 노상에서 큰 활로 화살을 쏘아 제단 아래에서 고라니를 잡았으니, 이 모든 길조가 천지신명께 보답하는 성대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명을 이어받은 황제만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늘의 덕행에 부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정은 마땅히 조상의 묘당에 헌납해야 하며, 제왕의 궁정에 소중히 간직하여 신명(神明)의 상서로운 징조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에 황제는 조서를 내려 말했다. “허락한다.” 바다에 들어가서 봉래를 찾던 자가 돌아와, 봉래는 멀리 있지 않으나 도달하지 못하는 원인은 아마도 그 봉래산의 기운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다. 이에 황제는 하늘의 기운을 잘 살피는 자를 파견해 그들을 도와 구름의 기운을 관찰하게 했다.
이해 가을, 황제는 옹주에 가서 오제(五帝)에게 교사(郊祠)를 지내려고 했다. 이때에 혹자가 이렇게 아뢰었다. “오제는 태일신을 보좌할 뿐인, 마땅히 태일신의 사당을 세워 황제께서 친히 교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에 황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니, 제나라의 공손경(公孫卿)이 이렇게 아뢰었다. “올해 보정을 얻었는데, 겨울 사일(辛巳日)은 11월 초하루로 동지(冬至)인데, 이는 황제(黃帝)께서 보정을 얻을 때와 같습니다.”
공손경이 지닌 목간(木簡)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황제(黃帝)께서 원구(宛朐)에서 보정을 얻으신 후에 귀유구(鬼臾區, 황제 때의 제후로 귀용구(鬼容區)라고도 함)에게 이 일을 물었더니, 귀유구가 대답하길 ‘황제(黃帝)께서 보정과 신책(神策)을 얻으셨을 때가 그해 기유(己酉) 초하룻날 아침 동지로, 이때가 하늘의 벼리에 진입한 것으로 마쳤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를 맞이한 시간을 추산해 보니, 그 뒤로 20년마다 초하룻날 아침에 동지가 순환되고, 20여 차례를 합산하니 380년 만에 황제(黃帝)께서는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공손경은 소충(所忠)을 통해서 이 일을 황상에게 상주하고 싶었으나, 소충은 그 글이 올바르지 못하고 경망스런 것으로 의심하여 사양하면서 말했다. “보정의 일은 이미 끝난 일인데, 다시 어떻게 하겠단 말이오?” 이에 공손경은 다시 황제가 총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아뢰게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공손경을 불러 사정을 물어보았다. 공손경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글은 신공(申功)에게서 받은 것인데, 신공은 이미 죽었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신공은 어떤 사람인가?” 공손경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공은 제나라 사람으로, 신선 안기생과 왕래했고, 황제(黃帝)의 가르침을 이어받았는데, 다른 글은 남기지 않고 오직 이와 같은 정(鼎)에 새긴 글만 있습니다. 그 글에 말하길 ‘한나라의 흥성은 황제(黃帝)가 정을 얻은 때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 또 ‘한나라의 성스러운 군주는 고조의 손자 혹은 증손자 가운데에 있다. 보정이 출현한다는 것은 신과 통한다는 것이니, 봉선의식을 행해야 한다.
예부터 봉선의식을 행한 제왕은 모두 일흔 두명이나 되지만, 오직 황제(黃帝)만이 태산 위에 올라 봉선의식을 행했다.’라고 말했다. 신공은 ‘한나라의 군주도 역시 마땅히 봉선의식을 행해야 하며, 봉선을 하면 능히 신선이 되어 승천할 수 있다. 황제(黃帝) 때는 제후가 만 명이 있었으며,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후국이 7천여 개나 되었다. 천하에 명산은 8개가 있는데, 3개는 만이(蠻夷) 지역에 있으며, 5개가 중국에 있다. 중국에는 화산(華山), 수산(首山), 태실산(太室山), 태산(泰山), 동래산(東萊山)이 있으며, 이 5개의 산은 황제(黃帝)가 항시 유람하며 신선과 회합했던 곳이다.
황제(黃帝)는 한편으로 전쟁하면서 한편으로는 선도(仙道)를 익혔는데, 백성들이 그의 도를 비난할 것을 걱정하여 귀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바로 참살했으며, 이렇게 1백여 년을 수련한 뒤에야 신선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황제는 옹주 교외에서 상제께 제사 지내느라 석 달간 머물렀다. 이 당시에 황제를 섬겼던 귀유구(鬼臾區)란 신하의 호는 대홍(大鴻)인데, 죽은 후 옹주에 장사지냈기 때문에 홍총(鴻冢)이라는 묘가 이 지방에 있게 된 것이다. 이후 황제는 명정(明廷)에서 뭇 신령들을 영접했는데, 명정은 바로 지금의 감천산을 말하며, 황제가 승천한 장소를 한문(寒門)이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의 곡구(谷口)이다.
황제는 수산(首山)에서 동(銅)을 채굴하여 형산(荊山) 아래에서 정을 주조했다. 이윽고 정이 완성되자 구름 속에서 긴 턱수염을 드리운 용이 땅으로 내려와 황제(黃帝)를 영접했으며, 황제가 용의 등에 올라타자 군신, 후궁 등 70여명도 뒤 따랐고, 용은 그들을 태운 채 천상으로 날라가려했다. 그러자 나머지 지위가 낮은 신하들은 올라탈 수 없게 되자 다급하게 모두 용의 수염을 잡았는데, 수염이 뽑히어 떨어졌으며 황제의 활도 떨어졌다. 백성들은 모두 황제가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우러러 보면서, 곧 그의 활과 용의 수염을 끌어안고서 통곡했다. 이 때문에 후세에 그곳을 정호(鼎湖)라고 일컫게 되었고, 그 활을 오호(烏號)라고 불렀다.”
이에 천자가 말했다. “아! 내가 참으로 황제처럼 승천할 수 있다면, 나는 처자와 헤어지는 것을 해진 짚신을 버리듯이 했을 것이다.” 곧 공손경을 낭관(郎官)에 임명하고, 그를 동쪽의 태실산으로 보내어 신선을 기다리게 했다.
황상은 드디어 옹주에 가서 교사를 지내고, 농서군(隴西郡)에 도달하자 서쪽으로 공동산(空桐山)에 오른 뒤 감천궁으로 돌아왔다. 사관 관서(寬舒) 등에게 태일신의 제단을 세우되, 제단은 박유기(薄謬忌)의 의견에 따라 태일단을 3층으로 나누게 했다.
제일층은 태일단이고 그 아래에 오제의 제단을 빙 둘러싸듯 배치했는데, 오제가 각기 주관하는 방위에 맞추었는데, 단지 중앙 방위의 있는 황제(黃帝)의 제단은 서남쪽에 두고 여덟 갈래로 귀신과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태일단에서 지낼 때의 사용하는 것은 옹주의 치(畤)에 올렸던 것과 서로 같게 하였고, 감주, 대추, 말린 고기 등을 추가하고, 또 검정 소 한 마리를 잡아 제물로 바치게 했다. 그러나 오제를 제사 지낼 때는 통상적인 제물과 감주만을 바치게 했다. 제단 아래 사방의 땅은 오제를 수행하는 뭇 신들과 북두칠성을 신위를 늘어놓고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면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를 모두 태웠다. 제사에 제물로 바친 소는 흰색이었고, 사슴은 소의 뱃속에, 돼지는 사슴의 뱃속에 넣은 다음에 물에 담가두고 삶았다. 해에게 제사 지낼 때는 소를 사용하고, 달에게 제사 지낼 때는 숫양 혹은 수퇘지 한 마리를 사용했고, 태일신의 축관(祝官)은 자색과 오색의 수를 놓은 옷을 입었으며, 오제의 축관은 각기 오제가 주관하는 방위의 색에 따랐으며, 해에 제사지내는 축관은 적색의 의복을 입었으며, 달에게 제사지내는 축관은 백색 의복을 입었다.
11월 신사(辛巳) 초하루 아침 동짓날, 해가 뜰 무렵 천자가 교외로 가서 태일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에는 태양신을 맞이했고, 저녁에는 달 신을 맞이했는데, 읍례(揖禮)을 행했으며, 태일신을 제사할 때는 옹주에서 교제를 지낼 때의 의례와 같이했다.
그 제사의식을 진행하는 자가 이렇게 아뢰었다. “천신(天神)께서 처음으로 보정과 신책(神策)을 황제에게 내리시고, 초하루가 지나가면 다시 초하루가 찾아오고,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 황제는 공경스럽게 천신에게 절하고 삼가 뵙도록 하시죠.” 예복은 황색을 입었다. 제사 지낼 때에 제단에 횃불을 가득히 밝히고, 제단 곁에는 제물 기구들을 두었다. 이때 한 주관 관리가 말했다. “제단 위에서 광채가 납니다.” 이에 공경대신들은 말했다. “황제께서 처음 운양궁(雲陽宮)에서 태일신에게 제사를 올릴 때, 주관 관리들이 큰 옥과 크고 훌륭한 희생을 바치자, 그날 밤 하늘에는 아름다운 광채가 나타나 다음날 낮까지 지속되었고, 황기(黃氣, 황색의 기운으로 천자를 지칭하고, 길조를 뜻함)가 치솟아 하늘까지 이어졌습니다.”
태사공과 축관 관서 등이 아뢰었다. “이것은 신령이 아름다운 명령으로 하늘이 보우하여 복을 내릴 길조이니, 마땅히 이 광채가 나타난 곳에 태일신단을 세워 길조에 호응해야 합니다. 황제께서는 태축에게 명령을 내려 매년 가을과 겨울 사이에 제사를 지내고, 3년에 한 차례 천자께서 친히 교외에 가서 제사를 지내셔야 합니다.”
이해 가을, 남월(南越)을 정벌하기 위해, 태일신에게 기도하면서 고했는데, 모형(牡荊, 마편초과에 속한 가시나무의 일종)로 깃대로 삼고 깃발에는 해와 달, 북두칠성과 비룡을 그려놓아 태일삼성(太一三星)을 상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태일봉기(太一鋒旗)로 삼고는 ‘영기(靈旗)’라고 불렀다. 출병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태사(太史)가 이것을 들고 정벌하는 나라를 가리켰다.
그리고 오리장군은 황제의 사자가 되었지만 감히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태산으로 가서 제사를 지냈다. 황상은 사람을 시켜 뒤따라가서 살펴보게 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도 오리장군은 그의 스승을 보았다는 망언을 일삼았고, 그의 방술은 이미 다 써서 대부분 영험이 없게 되자 마침내 황상은 그를 주살해 버렸다.
이해 겨울, 공손경은 하남(河南)에서 신선을 맞이하려고 기다렸다가 구지성(緱氏城) 위에서 선인의 발자국을 보았고, 마치 꿩과 같은 신물이 성위를 왕래한 것 같았다고 아뢰었다.
이에 천자가 친히 구지성 위에 가서 그 발자국을 보고, 공손경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도 문성과 오리장군을 모방한 것인가?” 공손경은 대답했다. “신선은 군주를 찾는 것이 아니니, 군주가 신선을 찾아야 합니다.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지 아니하면 신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신선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마치 현실에 맞지 않고 터무니없는 것 같으나 세월이 지나야만 신선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이에 각 군(郡)과 국(國)은 도로를 말끔하게 정비하고 궁실, 도관, 명산의 신들의 사당 등을 보수하여 황제의 왕림을 기다렸다.
그해 봄, 이미 남월을 멸망시킨 후에 황상이 총애하는 신하인 이연년(李延年)은 좋은 음악을 지어 바치기 위해 천자를 알현했다. 황상은 그의 음악이 좋다고 하면서, 공경들에게 의논하라고 명령을 내리며 말했다. “민간의 제사에도 북을 치고 춤추는 음악이 있는데, 지금의 교사를 지낼 때에는 도리어 음악이 없으니, 이 어찌 걸맞겠소?” 공경대신들은 이렇게 아뢰었다. “고대에 천신과 지신에게 제사 지낼 때 모두 음악이 있어야만 신령이 비로소 제사를 흠향하러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뢰었다. “태제(太帝)가 소녀(素女)에게 50현의 거문고를 타게 했는데, 곡조가 너무 슬퍼서 태제가 중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그 거문고를 갈라서 25현의 거문고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남월을 국경의 요새로 삼고, 태일신과 후토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 악무(樂舞)를 사용하고 노래를 첨가했으며, 더불어 25현의 거문고 외에 공후(箜篌), 금슬(琴瑟) 등이 이때부터 제작되기 시작했다.
이듬해 겨울, 신하들이 상의하여 아뢰었다. “고대에는 먼저 병기를 거둬들이고 군대를 해산시킨 연후에 봉선을 행했습니다.” 이에 황제는 북쪽으로 삭방을 순시하며 10여 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길에 교산(橋山)에 있는 황제(黃帝) 무덤에 제사 지내고, 수여(須如)에서 군대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천자가 이렇게 말했다. “황제(黃帝)가 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무덤이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혹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황제가 이미 신선이 되어 승천하자, 군신들이 그의 의관(衣冠)을 묻었던 것입니다.” 천자는 감천궁에 도착하자 태산에 가서 봉선하기 위해 먼저 태일신에게 유사(類祠, 상제에게 유례(類禮)로 지내는 제사)를 지냈다.
보정을 얻은 후부터, 황상은 공경대부 및 여러 유생들과 봉선을 거행하는 일에 대해서 상의했다. 봉선은 매우 드물게 거행했고, 제사가 끊긴 지 아득하게 멀고 오래되어, 그 예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 유생들은 『상서(尙書)』, 『주관(周官)』, 「왕제(王制)」에 기록되어 있는 망사(望祠, 제사 명칭으로 멀리서 산천에 지내는 제사인데, 주로 오악(五嶽), 사진(四鎭), 사독(四瀆)에 지냄)와 사우(射牛, 고대 제왕, 제후가 천지, 종묘에 드리는 제사)의 고사에 의거해서 봉선할 것을 건의했다.
제나라 사람 정공(丁公)은 이미 나이가 90여 세였는데 이렇게 아뢰었다. “봉선이란 것은 죽지 않는다는 이름과 부합합니다. 진시황은 태산에 오르던 도중에 비를 만나서 하늘에 제대로 봉선을 거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반드시 태산에 올라가신다면, 조금 더 올라가서 폭풍우가 없을 때에 곧 바로 산 위에서 봉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천자는 즉시 유생들에게 사우의 예의를 연습하게 명령하고 봉선 의식에 대한 초고를 작성하게 했다. 몇 년 후, 마침내 봉선을 거행할 때에 이르렀다.
천자는 공손경과 방사들에게서 황제(黃帝) 이전에 봉선을 행할 때, 모두 기이한 신물을 불러와 신과 상통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천자는 황제(黃帝)를 본받고 싶어서 신선, 봉래 방사를 불려와 신선을 맞이하려 했고, 세속을 초월하여 구황(九皇)의 덕에 버금가게 하고자 했다. 그리고 유가의 학술을 채용해 봉선의 글을 짓게 했다. 하지만 유생들은 봉선의식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못했고, 또한 『시경(詩經)』, 『서경(書經)』 등의 고문에 얽매여 자신들의 견해를 풀어내지 못했다.
이에 천자는 봉선을 행할 때 사용하는 제기들을 여러 유생들에게 보여주자, 유생들 중 어떤 사람이 아뢰길 “고대의 것과는 다릅니다.”라고 했고, 서언(徐偃)은 또 아뢰길 “태상(太常)의 생원들이 행하는 예의는 노(魯)나라의 것보다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주패(周覇)가 별도로 봉선의 일에 대한 계획을 꾸미자, 천자는 서언과 주패를 파면하고, 유생들을 모조리 등용하지 않았다.
3월, 드디어 천자는 동쪽으로 행차하여 구지현에 도달하여 중악(中嶽) 태실산(太室山, 숭산)에 올라 제사를 지냈다. 이때 천자의 시종하던 관리들은 산 아래에서 “만세”라고 외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산 위에 사람들에게 물으니, 산 위에서 그런 소리를 외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산 아래 사람들에게 물으니 산 아래에서 그런 소리를 외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천자는 인근의 민가 3백 호(戶)로 하여금 태실산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이 지역을 숭고읍(崇高邑)이라고 명명했다. 이어서 동쪽으로 행차하여 태산에 올랐는데, 그 때에 태산 위에는 아직 초목이 나기 전이라 그 틈을 타서 사람들에게 돌을 운반해 태산의 정상에 세우라고 명했다.
천자는 동쪽으로 순행하여 바닷가에 이르러 팔신(八神)에게 제사를 지냈다. 제나라 사람들이 기괴한 방술로써 상소를 올린 자가 만 명에 이르지만 영험한 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천자는 더욱 많은 배를 내보내고, 바다에 신선이 있다고 말하는 수천 명에게 봉래산의 신인(神人)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공손경은 부절을 지니고서 먼저 가서 명산에서 신선과 천자의 어가를 맞이하려고 했다. 그가 동래(東萊)에 도착해 밤에 이상한 거인을 보았는데, 그는 키가 몇 장이 되었고, 다가가니 곧 사라져 버렸다. 단지 그곳에는 매우 큰 발자국이 남아있었는데, 그 형상이 마치 짐승의 족적처럼 매우 컸다. 이때에 여러 신하들이 한 노인이 개를 데리고 “나는 신공(臣公, 천자)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고 했다.
천자가 큰 발자국을 보고도 믿지 못했으나, 여러 신하들이 노인의 일을 말하자, 비로소 그자가 바로 선인임을 깊게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상에 머물면서 신선을 기다리면서 방사들에게 역참에서 수레를 갈아탈 수 있게 해 주고, 그 사이에 수천 명의 사자를 파견하여 신선을 찾도록 하였다.
4월에 바닷가에서 봉고현(奉高縣)으로 돌아왔다. 천자는 뭇 유생들과 방사들이 말하는 봉선에 대한 견해가 각기 다르고, 이치에 맞지 않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천자는 양보산(梁父山)에 돌아와서 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을묘일(乙卯日)에 시중과 유생들에게 흰 가죽으로 만든 관을 쓰고 띠를 두른 예복을 입고 홀을 들게 하고, 사우(射牛)의 예식을 행하라고 명했다. 천자는 또 태산 아래의 동쪽 산기슭에 봉토를 쌓고 태일신에게 지내는 의식대로 교사를 지냈다. 봉토의 넓이가 1장 2척이며, 높이는 9척이 되었는데, 그 아래에 옥첩서(玉牒書, 봉선서)를 놓았는데, 글의 내용은 비밀로 하여 사람들이 모르게 했다. 제례가 끝나자, 천자는 홀로 시중봉거(侍中奉車) 곽자후(霍子侯)와 태산에 올랐는데, 태산 정상에서 봉토의 예식을 행했으나, 이 일에 대해선 일절 밖으로 전해지는 것을 금하게 했다.
다음날, 산의 뒤쪽인 북쪽 길로 하산했다. 병진일에 태산 기슭 아래 동북쪽의 숙연산(肅然山)에서 지신에게 제사 지냈는데, 그 제례의식은 후토신에게 제사 지낼 때와 같았다. 천자는 모두 친히 제사 지냈는데, 황색 의복을 입었고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또한 강(江), 회(淮) 일대에서 생산되는 세모 띠풀로 신의 멍석을 만들어 사용했다. 봉토는 오색의 흙을 사용해 더욱 단단하게 메웠다. 또 아주 먼 지방에서 조공으로 바친 진귀한 들짐승, 날짐승과 흰 꿩 등을 산림에 풀어놓아, 제례의 신성한 분위기를 더했다.
외뿔소, 야크, 코뿔소, 코끼리 등의 동물들은 산림에 풀어 놓을 수가 없어서 모두 태산으로 가져가서 후토신에게 제사지냈다. 봉선의식을 행하는 곳에는 밤에 광채가 출현했으며, 낮에는 흰 구름이 제단 가운데서 솟아올랐다.
천자가 봉선을 지내고 돌아온 후에 명당(明堂)에 앉자, 군신들은 돌아가면서 천자의 만수무강을 빌었다. 이에 천자는 어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짐은 보잘 것 없는 몸으로 지존의 자리를 계승하여 언제나 소임을 다하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했다. 짐은 덕도 부족하고 예악에도 밝지 못하다. 그래서 태일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도 광채가 나는 징조가 출현하면 초조하게 바라보고, 또 은연중에 기이한 신물을 보면 놀라서 중도에 예식을 멈추고 싶었으나 또 신령에게 죄를 지는 것이 두려워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드디어 태산에 올라 봉선의식을 거행했고, 양보산에 이른 후에 숙연산에서 지신에게 제사 지냈다. 이제부터 스스로 새로운 마음으로 사대부들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려 하니, 특별히 백성들에게는 백 가구당 소 한 마리와 술 10석을 내리고, 나이 80세 이상인 노인과 고아와 과부에게는 베와 비단 두 필씩을 하사하라. 또 박(博), 봉고(奉高), 사구(蛇丘), 역성(歷城) 등 네 현(縣)의 금년 조세를 면제하고, 천하에 대사면을 행하는데, 을묘년의 사면 때와 똑같이 하여라. 짐이 행차했던 지방은 노역시키는 형벌을 집행하지 말고, 2년 이전에 범법한 사람에 대해 형을 판결하지 말라.”
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고대의 천자는 매 5년마다 한 차례 순수를 하면서 태산에 올라 천지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제후들도 모두 조현하면서 머물 숙소가 있었다. 지금부터 제후들은 각기 태산 아래에 머물 숙소를 짓도록 하라.”
천자가 이미 태산에서 봉선을 마친 후에도 비와 바람의 재앙이 없었다. 이 때문에 방사들이 봉래산 등의 신선들을 머지않아 상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뢰자, 천자는 기뻐해 어쩌면 신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바로 다시 동쪽으로 가서 바닷가에 이르러 관망하면서 봉래산의 신선을 만나기를 고대했다.
봉거 곽자후(霍子侯)가 갑자기 병에 얻어 하루 만에 죽었다. 천자는 그곳을 떠나 바닷가를 따라 북상해 갈석산(碣石山)에 이르렀고, 요서(遼西)로부터 순찰하여 북부의 변새 지방을 거쳐 구원(九原)에까지 이르렀다.
5월에는 감천궁으로 돌아왔다. 관리들은 보정이 출토되었던 그해 연호를 원정(元鼎)이라고 삼았으니, 올해는 봉선을 거행했기 때문에 마땅히 원봉(元封) 원년으로 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그해 가을, 혜성이 동정성(東井宿) 가운데서 출현했다. 10일 후에는 다시 삼태성(三能星) 부근에서 출현했다. 기상을 관측했던 왕삭(王朔)이 이렇게 아뢰었다. “신이 혼자 하늘의 기상을 관측하고 있었는데, 그 혜성이 출현했을 때의 형상은 박 같더니, 잠시 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주관 관원들이 모두 아뢰었다. “폐하께서 한 왕조 처음으로 봉선의 의식을 거행하시니, 아마도 하늘이 덕성(德星)을 출현시켜 보답하는 것입니다.”
다음해 겨울, 천자는 옹주에서 오제에게 교사를 지내고, 돌아온 후에 태일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축원을 올렸다. 제사를 주관하는 관리가 축송을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덕성이 찬란하게 빛난 것은 길상이옵니다. 또 수성(壽星)도 함께 출현하여 빛을 널리 비추었습니다. 신성(信星, 토성)도 밝게 출현하였으니, 황제는 태축이 차려놓은 제사에서 신령에게 공경하게 절을 올리도록 하옵나이다.”
그해 봄, 공손경은 동래산에서 신선을 보았는데 은밀하게 그에게 “천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천자는 구지성으로 행차해서 공손경을 중대부(中大夫)로 임명했다. 뒤이어 동래산에 가서 며칠 머물렀지만 어떤 것도 보지 못했고, 단지 거인의 발자국만 보았다는 말만 들었다. 그러자 천자는 다시 방사들을 파견해 신선을 찾고, 영지선약 등을 캐오도록 하였는데, 그 수가 일천여 명에 달했다.
이해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천자는 지방을 순행할 명분이 없게 되자, 만리사(萬里沙)에 가서 기우제를 지낸 다음 명분으로 나와서 태산에 들러 제사를 지냈다. 돌아올 때 호자(瓠子)에 도착해 친히 하수의 터진 곳을 들러, 이틀을 머물면서 하신(河神)에게 침제(沉祭, 제품을 강물 속에 빠뜨려 바치는 제사)를 올리고 떠났다. 그리고 두 명의 상경(上卿)에게 장졸들을 통솔해 하수의 터진 곳을 막게 했고, 하수의 두 개의 지류의 자리를 옮겨 우(禹)임금 시대의 옛 자취를 회복시켰다.
이때에 이미 양월(兩越, 남월(南越)과 동월(東越))을 멸망시켰는데, 월나라 사람 용지(勇之)가 이렇게 말했다. “월나라 사람은 귀신을 믿는 풍속이 있어 그 제사를 지낼 때에 모두 귀신을 볼 수 있고, 자주 효험을 봅니다. 옛적에 동구왕(東甌王)은 귀신을 공경하게 섬겼는데, 16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이 괴신을 섬기는 것이 태만해졌기 때문에 쇠약해진 것입니다.” 이에 천자는 월나라의 무사에게 월축사(越祝祠)를 세우데, 제대(祭臺)는 세우나 제단은 쌓지 말며, 천신(天神), 상제(上帝), 뭇 귀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계복(鷄卜, 닭 뼈로 치는 점)을 사용하여 길흉을 알아보도록 했다. 황제는 이를 믿어 월나라 방식의 제사와 계복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공손경이 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선을 보실 수 있었으나, 천자께서 너무 급하고 분주하게 왕래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천자에서 도관을 건립하시고, 구지성에서처럼 말린 고기와 대추를 차려놓으시면, 신선은 마땅히 나타날 것이며, 또한 신선들도 누대에 거처하길 좋아할 것입니다.”
이에 황상은 장안에 비렴관(蜚廉觀)과 계관(桂觀)을 세우고 감천궁에 익수관(益壽觀)과 연수관(延壽觀)을 건조하여 공손경에게 천자의 부절을 지니고 제사 도구를 갖추어 놓고 신선을 맞이하게 했다. 또 곧 통천경대(通天莖臺)을 세우고, 그 아래에 제사 도구를 갖추고 신선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리고 감천궁에 또 전전(前殿)을 세우고 궁전을 넓히기 시작했다.
여름, 감천궁의 방 중에서 영지(靈芝)가 자랐고, 천자는 이것은 친히 터진 하수를 막고 통천대를 세우자 하늘에서 상서로운 빛이 나타나 이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감천궁의 방 안에 아홉 그루의 영지가 자라났으니, 천하에 대사면을 내리고, 노역을 시키는 형벌을 면제하도록 하라.”
그 다음해, 조선(朝鮮)을 정벌했다. 여름에 가뭄이 들었는데, 공손경이 이렇게 말했다. “황제(黃帝)께서 봉토를 쌓을 때 가뭄이 들었는데, 3년 동안 봉토가 말랐습니다.” 천자는 즉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하늘의 가뭄은 봉토를 마르게 하려는 뜻인가? 이제 천하 사람들은 모두 영성(靈星, 천전성(天田星)으로도 불리는데, 농사를 주관함)에 받들어 제사를 지내게 하라.”
다음해, 천자는 옹주에서 교사를 지내고, 회중(回中)의 도로를 따라 순찰했다. 봄에 명택(嗚澤)에 이르러 서하(西河)로부터 장안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해 겨울, 황상은 남군(南郡)으로 순행하여, 강릉(江陵)에 도착한 후 동쪽으로 행차했다. 심현(灊縣)의 천주산(天柱山)에 올라 제사를 지내고, 그 산을 남악(南嶽)이라고 불렀다. 그런 다음에 배를 타고 장강(長江)을 따라 심양(尋陽)에서 종양(樅陽)으로 가는 도중에 팽려(彭蠡湖)를 경유하다가 연도에서 명산대천에 제사 지냈다. 다시 북쪽으로 낭야(琅邪)에 도착하여 해안을 따라 올라갔다. 4월 중순에 봉고현(奉高縣)에 이르러 태산 위에 봉토를 수리하고 정비했다.
처음에 천자가 태산에서 봉선을 지낼 때, 태산의 동북쪽에는 옛날에 지은 명당의 터가 있었는데, 주변의 지세가 험준하며 또한 좁았다. 황상은 봉고(奉高) 주변에 별도로 명당을 하나 더 짓고 싶었지만 어떤 규정으로 세울지 몰랐다.
제남(濟南) 사람 공옥대(公玉帶)가 황제(黃帝) 시기의 명당의 도면을 바쳤다. 명당의 도면에 따르면 가운데에 하나의 전당(殿堂)이 자리 잡고 있고, 사방에 담장이 없으며 지붕 위에는 띠풀로 덮여 있었다. 물과 통하게 되어 물이 궁의 울타리를 둘러있으며, 또 복도(複道)가 만들어져 있었다. 전당의 위에슨 누각이 있고, 서남쪽의 복도에서 대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를 그 길을 곤륜도(昆侖道)라고 불렀다. 천자는 이 길을 따라 전당으로 들어가서 상제에게 제사 지내게 되어 있었다.
이에 황상은 봉고 문수(汶水)부근에 명당을 짓도록 명했는데, 공옥대가 지닌 명당도와 같도록 했다. 그 5년 후 이곳에서 다사 봉토를 수리하고 정비할 때에, 명당의 윗자리에서 태일신과 오제에게 제사 지냈고, 고황제(高皇帝)의 신주와 마주보게 하였다. 아랫방에서는 스무 마리의 희생물로 후토신에게 제사 지내도록 했다.
천자는 곤륜도를 통해 들어가서 명당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교사를 지내는 예법과 같았다. 제사가 끝나면 당(堂) 아래에서 나뭇더미 위에 옥백과 희생을 올려놓고 이를 태워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황상은 또 태산에 올라 산꼭대기에서 비밀스런 제사를 지냈다. 태산 아래에서는 오제에게 각기 그 해당하는 방위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데, 단지 황제(黃帝)와 적제(赤帝)는 더불어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는 주관 관원이 받들어 모시게 하였다. 산 위에서 횃불을 켜서 들면 산 아래에서 서로 호응하여 횃불을 들게 하였다.
이년 후, 11월 갑자(甲子) 초하룻날 아침이 동지였는데, 역법을 추산하는 자가 이 날을 정통으로 삼았다. 그래서 천자는 친히 태산으로 행차해 명당에서 상제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봉선의 예를 거행하지 않았다. 주관하는 관리가 축원하면서 아뢰었다. “하늘이 황제에게 태초의 역법을 주시어 주기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다함이 없으니, 황제는 태일신에게 경배(敬拜)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천자는 동쪽으로 행차하여 바닷가에 가서 신선을 찾으려던 방사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증거도 얻지 못했지만 더욱 사람을 늘려 신선을 찾으러 보내며, 신선을 만나기를 기대했다.
11월 을유일(乙酉日), 백량대(柏梁臺)에 화재가 발생했다. 12월 갑오(甲午) 초하룻날 천자는 친히 고리(高里) 선제(禪祭)에 가서 후토신에게 제사 지냈다. 이어 발해 연안에 도착해 봉래산의 신들에게 망사(望祠)를 지내고, 신선이 사는 곳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천자는 장안으로 돌아와 감천궁에서 조회를 보면서 백량대에서 화재가 난 까닭을 신하들에게 보고를 받았다. 이에 공손경이 이렇게 아뢰었다. “황제(黃帝)께서는 청령대(靑靈臺)를 지으신 지 겨우 12일 만에 불타버지자 즉시 다시 명정(明庭)을 지으셨는데, 명정이란 바로 감천궁입니다.”
방사들도 고대의 제왕 가운데 감천에 도읍을 정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 후 천자는 감천궁에서 제후들의 알현을 받고, 감천에 제후들의 저택을 지었다. 이때에 용지(勇之)가 이렇게 아뢰었다. “월(越) 지방의 풍속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후에 다시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원래의 것보다 더욱 크게 지어, 재앙의 기운을 승복시킵니다.” 이에 건장궁(建章宮)을 지었는데, 그 규모가 천문(千門) 만호(萬戶)에 달했다.
전전(前殿)의 규모는 미앙궁(未央宮)보다 높았다. 그 동쪽에는 봉궐(鳳闕)이 있었는데, 그 높이가 20여 장(丈)이나 되었으며, 그 서쪽에는 당중지(唐中池)이 있었는데, 그 둘레가 십 리가 되는 호권(虎圈) 있었다. 그 북쪽에는 큰 연못을 파 놓고 그 가운데에 높이가 20여 장에 달하는 점대(漸臺)를 세웠다. 그 연못은 태액지(太液池)라고 불렀는데, 그 안에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 호량(壺梁) 등의 도서와 바다 속의 신선과 거북, 물고기 등의 형상을 배치해 놓았다. 그 남쪽에는 옥당(玉堂), 벽문(璧門), 대조(大鳥) 등의 조각상을 만들어놓았다. 또한 신명대(神明臺), 정간루(井幹樓)를 세웠는데, 그 높이가 50장에 달했으며 천자의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여름에 한나라는 역법을 개정했는데, 매년 정월을 그해의 시작으로 삼았으며, 다섯 가지 색 중 황색을 숭상하며 관명의 인장은 다섯 글자로 새기게 하고, 이해의 연호를 태초(太初) 원년으로 하였다. 이해에 서쪽으로 출병하여 대원(大宛)을 정벌했으며, 황충(蝗蟲, 메뚜기)가 크게 일어났다. 정부인(丁夫人)과 낙양 사람 우초(虞初) 등이 방술로써 흉노와 대원을 저주하는 제사를 지냈다.
다음해, 제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옹주의 오치(五畤)에 익힌 제물이 없고, 제사를 지낼 때에 향기 나는 제물을 갖추지 않았다고 아뢰었다. 이에 천자는 사관에게 명해 오치에 삶은 송아지는 바치도록 하고, 제물의 색깔은 오행이 상승(相勝)하는 원칙에 따라 배치하고, 제사에 사용하는 망아지는 나무로 만든 말로 대체하게 했다. 단지 5월의 상구제(嘗駒祭)나 천자가 친히 행차한 교사를 지낼 때에는 망아지를 희생을 사용하게 했고, 모든 명산대천의 제사에는 모두 나무 말로 대치했다. 천자가 친히 순행했던 곳의 제사에는 망아지를 썼고, 그 외의 의례는 예전과 똑같았다.
그 다음해, 천자는 동쪽으로 가서 바닷가를 순찰하고, 신선을 찾아 나섰던 방사들을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효험을 본 자가 없었다. 어떤 방사가 이렇게 아뢰었다. “황제(黃帝) 때에 5개의 성읍과 12개의 누대를 건축하고, 집기(執期)에서 신선을 맞이하려고 기다렸는데, 이를 ‘영년(迎年)’이라고 부릅니다.” 천자는 그가 말한 대로 누대를 짓고, 이를 ‘명년(明年)’이라 칭하고, 친히 그곳에 가서 상제에 제사를 지냈다.
공옥대가 이렇게 아뢰었다. “황제(黃帝) 때는 태산에만 봉선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풍후(風后), 봉거(封鉅), 기백(岐伯) 등이 모두 황제에게 동태산(東泰山)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범산(凡山)에서 지신에게 제사 지낼 것을 권했는데, 이는 하늘에서 제왕에게 내린 징조와 서로 부합하여 불로장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천자는 제사를 준비를 갖추라는 명을 내리고, 동태산에 왔으나 동태산은 너무 왜소하여 그 명성에 걸맞지 않으므로 사관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고, 그곳에서 봉선은 거행하지 않았다.
그 후 공옥대로 하여금 이곳에서 제사 주관하면서 신선을 기다리게 했다. 여름에 천자는 태산으로 돌아와 이전과 마찬가지로 5년에 한 번 봉선을 지냈고, 별도로 석려산(石閭山)에서 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석려산은 태산 남쪽 기슭에 있었는데, 방사들이 그곳이 신선이 거주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천자는 그곳에 가서 친히 지신에게 추가로 제사를 지냈다.
5년이 지난 후, 다시 태산에 와서 봉선을 거행하고, 돌아가는 길에 항산(恒山)에서 제사를 지냈다.
지금 천자가 시작한 일으킨 제례에는 태일사(泰一祠)와 후토사(后土祠)가 있으며, 매 3년마다 한 차례씩 천자가 친히 교사를 지내고, 한나라에서 시작한 봉선의 제도는 5년에 한 차례 거행했다. 박유기의 제의로 건립된 태일(太一) 및 삼일(三一), 명양(冥羊), 마행(馬行), 적성(赤星) 등의 다섯 사당은 관서(寬舒) 등의 축관이 주관해 매년 때에 맞추어 제사를 지냈다. 여섯 제사는 모두 태축이 주관했다. 그밖에 팔신 가운데 여러 신들과 명년(明年), 범산(凡山) 등의 제사는 천자가 행차할 때 제사 지내고 떠나가면 제사 지내지 않는다. 방사들이 건립한 사당은 각자가 주관했고, 그 사람이 죽으면 곧 그만두고 사관은 주재하지 않았다.
기타 제사는 모두 이전의 관습에 따른다. 지금의 황상이 봉선을 시작한 후부터 12년 동안 오악(五嶽), 사독(四瀆)을 두루 일주하며 제사 지냈다. 방사들은 신선에게 제사 지내며 바다에 들어가서 봉래산을 찾아갔던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검증하지 못했다.
공손경과 같이 신선을 기다린 자는 또 거인의 발자국을 보고 신선을 만나 볼 수 있다고 변명했지만 증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천자는 더욱 방사들의 괴이하고 허황한 말에 권태를 느끼고 싫어했으나, 그들의 농락이 끊이지 않아 진정한 방술을 지닌 신선을 만나기를 고대했던 것이다. 그 후로도 방사들 중에 신선과 제사에 대해 말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으나, 그 효험이 어떠할 지는 눈에 보이는 듯하다.
– 사마천의 논평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황제를 따라 순행하면서 천지의 여러 신과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고 또 봉선에도 참여했었다. 수궁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하고 신께 올리는 축문의 이야기도 들었다. 나는 방사와 사관의 의도를 관찰했고, 물러나서 고대부터 귀신을 섬겼던 역사적인 일을 논술하였으며, 그 안팎의 사정을 모두 밝혀 두었다. 후세의 군자가 살펴보면 그 정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사 지낼 때 제기, 옥, 폐백 등의 상세한 내용과 헌수의 제례의식에 대해서는 주관 관리들이 잘 보존하고 있다.”
7. 하거서(河渠書)

사마천 사기-서(書)의 일곱 번째 기록으로 하거서(河渠書)는 치수(治水) 사업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거서(河渠書)
– 역대 치수의 상황
『서경(書經)』 「하서(夏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하나라의 우(禹)임금은 13년 동안이나 홍수를 막기 위해 자기 집을 지나면서도 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육로를 다닐 때에는 수레를 탔고, 수로를 다닐 때에는 배를 탔으며, 진흙길을 다닐 때에서는 덧신을 신고 걸었고, 산길을 다닐 때에는 가마를 탔었다. 그리하여 구주(九州)의 구획을 정하고, 산세의 지형에 따라 하천을 파서 소통시켰고, 토질의 특산물에 따라 공물을 정했다. 구주로 통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구주에 있는 큰 호수와 연못에 제방을 쌓고, 구주에 있는 산들을 측정했다.”
그럼에도 황하는 넘쳐서 재앙을 불러일으켰고, 그 피해가 중국에 매우 심했다. 이에 우임금은 오직 황하를 다스리는 일을 임무로 삼고, 황하의 물줄기를 끌어와 적석산(積石山在, 청해성 동남부에서 감숙성 남부 변경까지 뻗어있는 산. 황하가 시작되는 산)에서 용문산(龍門山, 산서성 하진현(河津縣) 서북쪽에 위치함. 황하의 중류 지역)을 거쳐 남쪽으로 화음현(華陰縣, 섬서성 위남시에 위치함. 관중평원의 동부)에 도달하게 하고, 거기서 동쪽으로 내려와 지주산(砥柱山, 하남성 섬현(陕縣)의 동북쪽에 위치함)과 맹진(孟津, 하남성 중서부 구릉지구에 위치함. 현재 낙양시에 예속됨)과 낙예(雒汭, 하남성 공현(巩縣) 경계에 위치함)를 거쳐 대비산(大邳山, 하남성 학벽준현(鹤壁浚县) 동쪽에 위치함)에 도달하게 하였다.
우임금은 대비산 위의 황하가 높은 지대에서 흘러와서 물살이 급하고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대비산 동쪽의 평지로 흘러가기 어렵거나 제방을 자주 무너뜨려 여러 차례 범람한 것이라고 여겼다.
이에 황하 물줄기를 두 방향으로 나누어서 물살의 기세를 약화시켜 흐르게 했고, 더불어 물길을 북쪽으로 끌어들여 지세가 높은 기주(冀州, 지금의 하북성 형수시(衡水市) 일대) 지역으로 흐르게 해 강수(降水, 하북성 광종현, 남궁현, 기현, 형수, 무읍현 경내를 흐름)를 거쳐 대륙택(大陸澤, 하북평원 서부)에 도달하게 하고, 거기서 아홉 개의 강줄기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 역하(逆河, 황하의 물길과 바닷물이 만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가 되어 발해(勃海)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9주의 하천들이 모두 소통되고 구주의 큰 못에 제방이 쌓여져 여러 중국의 나라가 편안하게 되었고, 그 공적은 하(夏), 은(殷), 주(周) 3대까지 베풀어졌다.
이후로 사람들은 형양(滎陽)에서 황하의 물을 동남쪽으로 이끌어 홍구(鴻溝, 고대의 운하로 지금의 하남성 형양시(滎陽市)에 위치함)를 완성시켜 송(宋), 정(鄭), 진(陳), 채(蔡), 조(曹), 위(衛) 등의 나라와 연결시키고, 제(齊), 여(汝), 회(淮), 사(泗) 등의 물줄기를 모이게 하였다. 또 초(楚)나라 지방에서는 서쪽으로 한수(漢水)와 운몽(雲夢)의 들판을 개천으로 연결시키고, 동쪽으로 장강(長江)과 회수(淮水) 사이를 운하로 서로 관통시켰다.
오(吳)나라 지방에서는 삼강(三江)과 오호(五湖) 사이를 하천과 도랑으로 연결했고, 제(齊)나라 지방에서는 치수(淄水)와 제수(濟水)를 연결했으며, 촉(蜀)나라에서는 태수 이빙(李氷)이 이대(離碓, 이퇴(離堆)로 불리기도 하고, 사천성 도강언 경내에 위치)를 뚫어서 통하게 하고, 말수(沫水, 사천성 일대를 흐르는 대도하(大渡河)를 지칭)의 수해로부터 벗어나게 했으며, 또 두 강줄기를 뚫어 성도(成都) 일대에 흐르게 하였다. 이런 하천에는 모두 배들이 통행할 수 있었고, 남는 것은 관개용수로 썼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수로들이 지나가는 지역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그 물줄기를 논밭으로 끌어와 그 수는 억만을 헤아렸다. 그런 작은 수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많았기 계산하기 어렵다.
서문표(西門豹, 전국시대 업현의 현령)는 장수(漳水, 두 줄기로 나뉘어져 있고 하북성과 하남성 사이에 위치함)의 물을 끌어와서 업(鄴) 지방의 농토에 관개함으로써 위(魏)나라의 하내(河內) 지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한(韓)나라는 진(秦)나라가 각종 토목과 건축 같은 사업을 일으키기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진나라가 사업으로 국력을 소모시키고, 동쪽으로 자신의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리(水利) 기술자인 정국(鄭國)을 진나라에 간첩으로 보내어 유세하게 했다. 정국은 진나라로 하여금 경수(涇水, 위하(渭河)의 지류로 섬서성 중부를 관통함)를 굴착하여 중산(中山, 섬서성 경양현(涇陽縣) 북쪽에 위치함)의 서쪽으로부터 호구(瓠口, 섬서성 예천(禮泉) 동북쪽에 위치함)에 이르기까지 수로를 만들고, 북쪽의 산들을 따라 동쪽으로 낙수(洛水, 옛 이름은 낙수(雒水)로 하남성 언사(偃師) 경내와 이하(伊河) 지역을 경과함)까지 3백여 리를 흐르게 하고 이로써 농토에 관개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로 공사를 진행하는 중도에 정국의 음모가 발각되어, 진나라에서는 정국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정국은 이렇게 변명했다. “처음에 신은 한나라의 간첩으로 쓸데없이 시작했으나, 수로가 완성되면 확실하게 진나라에 이롭습니다.” 진나라도 그의 말이 옳다고 여겨 최후에는 그로 하여금 수로를 완성시키도록 했다.
수로가 완성되자 진흙이 충적된 경수와 낙수의 물을 끌어와서 염분이 성분이 많은 관중(關中) 지방의 4만여 경(頃, 밭의 넓이로 주나라 때에 약 24,326m2에 해당됨)에 달하는 농토에 관개해, 마침내 매 1무(畝, 면적단위로 240보에 해당함)당 1종(鍾, 용량단위로 6석(石) 4두(斗)에 해당함)의 수확이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관중의 1천리 평야가 비옥한 농토로 변해서 흉년이 없게 되었고, 진나라는 이로 말미암아 부강해졌고, 마침내 제후국들을 병탄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 수로를 ‘정국거(鄭國渠)’으로 명명하였다.
– 한나라의 치수 사업
한(漢)나라가 건립한지 39년이 되던 효문제(孝文帝) 때, 황하의 제방이 산조현(酸棗縣, 지금의 하남성 연진현(延津縣) 북쪽에 위치함)에서 터져 동쪽의 금제(金堤, 일명 천리제(天里隄)로 하남성 골현(滑縣)에 위치함)가 무너졌다. 이에 동군(東郡)에서는 허다한 병졸들을 동원하여 금제를 틀어막았다.
그 후 40여 년이 지난 뒤 지금의 천자(天子, 한무제) 원광(元光) 연간(BC 134 ~ BC 129)에 황하가 호자(瓠子, 하남성 복양현(濮陽縣) 서남쪽 위치함)에서 무너져 동남쪽으로 거야(鉅野, 산동성 거야현(巨野縣) 북쪽에 위치함)로 쏟아져 회수(淮水)와 사수(泗水)까지 통하게 되었다. 이때 천자는 급암(汲黯)과 정당시(鄭當時)로 하여금 일꾼들을 동원하여 터진 제방을 틀어막게 했지만 자주 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이때 무안후(武安侯) 전분(田蚡)이 조정의 승상으로 있었는데, 그의 봉읍(奉邑)은 유현(鄃縣, 산동성 하진현(夏津縣) 동북쪽에 위치함)이었다. 유현은 황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황하의 제방이 남쪽으로 무너졌지만, 유현은 수재를 입지 않았고 수확도 많았다. 이에 전분은 천자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강하(江河)의 제방이 무너진 것은 모두 하늘의 일이라 인력으로 억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틀어막는다면 반드시 하늘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기를 보고 길흉을 예언하는 점술가도 모두 역시 그렇다고 동조하였다. 이 때문에 천자는 오랫동안 제방을 다시 막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때 정당시(鄭當時)가 대사농(大司農, 한나라의 관직명으로 조세나 염철 등의 재정을 주관함)으로 있었는데, 천자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예전에 관동(關東)에서 양식을 배로 운반할 때에는 위수(渭水)를 거슬러 올라와서 장안에까지 이르는데,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 수로의 길이는 9백여 리로 운반하는 도중에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안에서부터 수로를 뚫어 직접 위수의 물을 끌어들이고, 더불어 남산(南山)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 보낸다면 황하까지 곧바로 3백여 리가 되고, 수로가 한 갈래로 곧게 뻗어 운송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삼 개월이면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가 지나는 곳에 백성들의 농토가 1만여 경(頃)이 있는데, 또 여기에도 물을 대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로 양곡을 운반하는 시간과 동원하는 병졸들의 수를 줄일 수 있고, 또 관중(關中) 지방은 더욱 비옥해져 더 많은 곡식을 얻을 것입니다.”
천자도 그렇게 여기고, 제나라의 수리 기술자인 서백(徐伯)에게 명하여 지세를 측량하게 하고, 수만 명의 병졸을 동원하여 수로를 뚫어 3년 만에 완공시켰다. 수로가 개통하자 배로 운반하는 것이 매우 편리해졌다. 이후 수로를 통해 배로 운반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났고, 수로 부근의 백성들도 농토에 넉넉하게 물을 대 줄 수가 있었다.
그 후 하동(河東)의 태수 파계(番系)가 이렇게 아뢰었다.
“산동(山東)에서 서쪽 장안까지 수로로 운송되는 양곡은 매년 1백여만 석인데, 중간에 지주산의 험난한 지역을 지나오려면 배와 인명의 손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운송비용도 많이 듭니다. 만약 지금 수로를 뚫어 분수(汾水)의 물을 끌어다가 피지(皮氏, 산서성 하진시(河津市)에 위치함)와 분음(汾陰, 산서성 만영현(萬榮縣) 경내) 일대의 토지에 물을 대주고, 황하의 물을 끌어다가 분음과 포판(蒲坂, 산서성 영제시(永濟市)) 일대의 토지에 물을 대주면 대략 5천 경(頃)의 농경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5천 경의 농경지는 원래 모두 하수 주변에 방치된 황무지로서 백성들은 단지 거기에서 방목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물을 대어 경작을 할 수 있으면 2백만 석 이상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곡식들은 위수를 따라 장안으로 운송될 것이니, 직접 관중으로부터 곡식이 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며, 다시 지주산 동쪽으로부터 곡식을 배로 운송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천자는 그의 말에 동조하여 수만 명의 병졸을 동원하여 수로를 파고 농지를 개간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황하의 물길이 바뀌어 파놓은 수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곳의 농민들은 임대로 받은 종자마저도 보상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하동의 하천과 농지가 버려져 있었는데, 조정에서 그곳을 월(越) 지구에서 이주한 백성들에게 주어 경작하게 하고, 소부(少府)로 하여금 약간의 조세 수입을 받게 했다.
그 후 어떤 사람이 상소를 올려 포야도(褒斜道, 일명 석우도(石牛道), 금우도(金牛道)로도 불리고, 진령(秦嶺)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통하고, 수로와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자는 어사대부(御史大夫) 장탕(張湯)에게 이 사안을 넘겨 처리하게 했다. 장탕이 이 사안을 상세하게 알아보고 이렇게 아뢰었다. “한중(漢中)에서 촉(蜀)지방으로 가려면 옛 길로 이용해야 하는데, 옛 길은 산비탈이 많고 높을 뿐만 아니라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만약 포야도를 뚫게 되면 산비탈도 적고 여정이 4백 리나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포수(褒水, 섬서성 서남부 한태(漢台)에 위치함)와 면수(沔水, 옛 이름은 한수(漢水)이고, 감숙성 강릉강(嘉陵江) 서쪽의 지류)를 서로 통하게 하고, 야수(斜水)와 위수(渭水)를 서로 통하게 하면, 여기에 모두 배를 띄워 곡식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로 남양(南陽)에서 곡식을 싣고 면수를 거슬러 올라와서 포수로 들어올 수 있고, 포수에서 야수까지 약 1백여 리는 수레로 바꾸어 운반하며, 그 다음은 배를 타고 야수를 거쳐 위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중(漢中)의 곡식을 장안으로 운반해올 수도 있고, 산동의 곡식을 면수까지 올려 보내는 것도 막힘이 없이 소통되어 지주산 일대를 경유하는 수운에 비해 훨씬 편리하게 됩니다. 또한 포야(褒斜) 지역의 목재나 죽전(竹箭) 등의 풍부함도 파촉(巴蜀) 지방과 견줄 만 합니다.” 천자는 그의 말을 옳다고 여기고 장탕의 아들 장앙(張卬)을 한중태수(漢中太守)로 임명하고 수만 명의 동원하여 5백여 리에 달하는 포야도를 만들게 했다. 이 도로가 개통되니, 편리하고도 가까웠지만, 물길은 급류이고 돌도 많아서 조운은 불가능했다.
그 후 장웅파(莊熊罷)가 이렇게 아뢰었다. “임진(臨晉, 산서성 운성시(運城市)의 직할 현인 임의현(臨猗縣)에 소속됨) 지방의 백성들은 낙수(洛水, 하남성 언사(偃師) 경내와 이하(伊河) 지역을 흐름)를 뚫어 그 물로 중천(重泉, 섬서성 포성현(蒲城縣) 일대) 동쪽의 평원(관중평원의 동북부)에 있는 염분이 많이 포함된 땅 만여 경(頃)에 물을 대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 물만 얻을 수 있다면 1무(畝)당 10석(石)은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만여 명의 병졸을 동원하여 수로를 뚫어서 징현(徵縣)으로부터 상안산(商顔山, 지금의 철렴산(鐵鐮山)) 아래까지 낙수의 물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 수로의 언덕이 잘 무너져서 바로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그 깊이가 40여 장(丈)이나 되었다. 이렇게 꾸준히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그 우물이 땅 밑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도랑이 생겼다. 이 도랑의 물은 땅속으로 흘러 상안산(商顔山)을 지나 동쪽으로 산봉우리의 중간쯤인 10여 리 되는 곳까지 이르렀다. 정거(井渠, 우물 도랑)는 바로 이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이 도랑을 뚫다가 용의 뼈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용수거(龍首渠)’라고 했다. 이 도랑을 10여 년 동안 만들어서 제법 일부 지방까지 통하게 하였으나 풍족할 정도는 아니었다.
황하가 호자(瓠子)에서 제방이 무너진 지 20여 년이 되었는데, 매년 이로 말미암아 농토는 물로 잠기어 누차 풍년이 들지 않았는데, 양(梁)나라와 초(楚) 나라지방은 더욱더 엄중했다. 이때 천자는 봉선(封禪)을 거행하고 더불어 천하의 명산대천을 순찰하면서 제사를 지냈지만, 그 이듬해에는 가뭄이 들어 흙으로 쌓은 제단에도 비가 조금씩만 내렸다. 이에 천자는 급인(汲仁)과 곽창(郭昌)으로 하여금 병졸 수만 명을 동원하여 호자의 무너진 제방을 막게 하였다.
이에 천자는 이미 만리사(萬里沙)에서 제사를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친히 황하의 터진 곳에 이르러 백마(白馬)와 옥벽(玉璧)을 황하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군신들과 수종하는 관리들에게 장군 이하는 모두 나무를 운반해 와서 터진 황하를 다시 틀어막게 했다. 이때 동군(東郡)은 초목이 다 불살라졌기 때문에 땔나무가 부족하여 기원(淇園, 고대 위나라 원림으로 대나무가 유명했다. 하남성 기현(淇縣) 서북쪽에 위치함)의 대나무를 베어서 가져와 방죽을 만들었다.
– 호자가(瓠子歌)
천자가 황하의 터진 곳에 친히 왕림해 제방을 막는 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슬퍼하며 다음과 같은 시가를 지었다.
“호자에서 황하 터졌나니, 장치 어찌 하리오? 끝없이 넘실넘실한 하수가, 백성들의 사는 곳마저 다 없애 버렸네! 다 없어지고 온통 하수가 되었으니, 이 지방은 평안하지 못하네. 공사는 그칠 날이 없고, 어산(吾山)은 이미 다 파내 평평해졌다네. 어산이 평평해지니, 거야택(鉅野澤)마저 범람한다네. 사방에 물고기 떼 뛰노는데, 겨울은 다가오네. 황하의 물길이 문란해져, 통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났다네.
교룡(蛟龍)은 날뛰며, 멀리까지 노닌다네. 황하가 옛 물길로 돌아오도록, 수신(水神)이여 은택을 내려주소서! 만일 봉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 범람을 알았겠소? 날 위해 하백(河伯)에게 어찌 그리 어질지 못하냐고 고해주시오. 범람이 그치지 않으니, 백성들은 근심으로 애간장이 탄다네. 설상정(齧桑亭)을 휩쓸어버리고, 회수, 사수는 넘실거린다네. 오래도록 옛 물길은 돌아오지 않고, 마냥 느릿느릿 흘러만 가는구나.”
또 한 수는 다음과 같이 지었다.
“황하의 물결은 세차고, 급하게도 흘러가네. 북쪽으로 가는 물길은 굽이굽이 돌아, 준설하여 소통하기가 어렵도다. 긴 줄 풀을 취해 터진 제방을 막고, 아름다운 옥을 하신에게 바쳤다네. 하백(河伯)은 물길을 잡아주기로 허락하셨는데, 땔나무가 부족하다네. 땔나무가 부족한 것은, 위(衛)나라 사람들의 죄로다. 모두 불태워서 스산하니, 어떻게 범람하는 물을 막을 수 있나! 기원(淇園)에서 대나무를 가져와 방죽과 돌로 막았다네. 선방(宣房)으로 막으면, 만복이 찾아오리라.”
이에 마침내 호자의 터진 곳을 막고, 그 입구에 궁을 건축하여 이름을 ‘선방궁(宣房宮)’이라고 불렀다. 더불어 황하를 두 줄기의 물길로 나누어 흐르도록 하여 하나라 우(禹)임금 때의 옛 수로를 회복되었고, 양(梁)나라와 초(楚)나라 지방도 또 평안해지고 수재가 없어졌다.
이후로부터 하천과 도랑을 책임지는 관리들은 다투어 수리(水利)에 관한 일을 진언했다. 삭방(朔方), 서하(西河), 하서(河西), 주천(酒泉) 등지에서는 모두 황하나 하천, 계곡물을 끌어와서 농경지에 공급했다. 관중 지방에서는 보거(輔渠)와 영지거(靈軹渠)를 만들어 여러 하천의 물을 끌어왔고, 여남(汝南)과 구강(九江)에서는 회수의 물을 끌어왔으며, 동해(東海)에서는 거정택(鉅定澤)의 물을 끌어왔고, 태산(泰山) 밑의 지역은 문수(汶水)의 물을 끌어왔다. 이 모두가 각자가 하천을 파서 농경지에 물을 댄 것으로 그 범위는 각기 1만여 경(頃)에 달했다. 기타 작은 하천이나 또는 산을 허물어 수로를 만든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모든 수리 공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역시 선방(宣房)이었다.
– 사마천의 논평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남쪽으로는 여산(廬山)에 등반하여 우(禹)가 소통시킨 구강(九江)의 유적을 보았고, 또 후에 회계(會稽)의 태황(太湟)에 이르러 고소산(姑蘇山)에 올라 오호(五湖)를 조망했다. 동쪽으로는 낙예(洛汭), 대비(大邳)를 살피고, 하수를 거슬러 올라가서 회수(淮水), 사수(泗水), 제수(濟水), 탑수(漯水), 낙수(洛水) 등을 다녀보았다. 서쪽으로는 촉(蜀)나라의 민산(岷山)과 이대(離碓)를 보았고, 북쪽으로는 용문(龍門)으로부터 삭방(朔方)에까지 섭렵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감탄했다. ‘물이 주는 이로움과 피해란 것은 심대하도다!’ 나는 천자를 따라 직접 땔나무를 지고 선방(宣房)을 막는데 참여했고, 호자(瓠子)에서 지은 시에 비애를 느껴 「하거서(河渠書)」를 짓노라.”
8. 평준서(平準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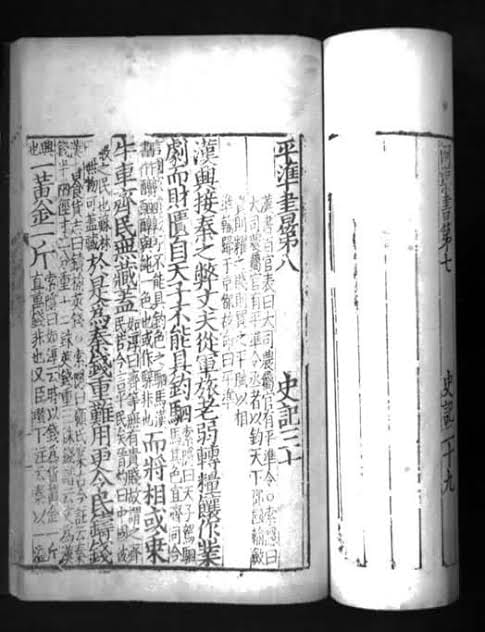
사마천 사기-서(書)의 여덟 번째 기록으로 평준서(平準書)는 재정, 경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한서’ 식화지(食貨志)로 이어져, 이후 정사들이 다루는 식화지의 모범이 되었다.
평준서(平準書)
한(漢)나라가 흥기할 무렵, 진(秦)나라의 피폐된 국면을 계승할 때에 장년의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갔고, 노약자들은 군량을 운송했다. 노동은 번다하게 많아졌으나, 물자는 매우 부족했다. 천자도 털 색깔이 균일한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갖추지 못했고, 장군과 재상들은 겨우 소가 끄는 수레밖에는 탈 수가 없었으며, 백성들은 가축을 기르고 곡식을 쌓아둘 여력이 없었다.
이때에 기존의 진나라의 돈은 무거워 유통하기가 불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별도의 돈인 유협전(楡莢錢)으로 만들 것을 명령했고, 황금 일금을 한 근(斤)으로 정했다. 또 법령은 간소하게 하였고, 금지령을 대폭 줄였다. 그리하자 법령을 지키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도모하는 상인들이 매점매석하여 시장의 물가가 크게 올라 쌀 한 섬은 만 전(錢), 말 한 마리는 백금에 거래되었다.
천하가 평정된 후에 고조(高祖)는 곧바로 명령을 내려 상인들에게 비단옷을 입는 것과 수레 타지 못하게 하고,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곤란은 물론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다. 효혜제(孝惠帝)와 고후(高后) 때에는 천하가 안정되기 시작하여 상인을 억압했던 법령들을 풀어주었으나, 상인의 자손이 관리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 나라에서는 관리의 봉록과 관용의 경비에 산출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산림, 하천, 동산, 연못, 시정(市井)의 조세 수입과 천자로부터 귀족들이 소유한 탕목읍(湯沐邑, 천자가 제후에게 재계하는 비용에 쓰라는 명목으로 내리는 사읍(私邑))에서 나오는 수입은 각기 사적인 비용으로 충당했고, 나라의 경비로 지출하지 않았다. 수로로 산동(山東)에서 운송한 곡식은 수도의 각 관공서에 공급했는데, 매년 수십만 섬에 불과했다.
효문제(孝文帝) 때에 이르러 협전(莢錢, 무게는 3수(銖)이고 한흥(漢興)이란 두 글자가 새겨져 있음)이 더욱 많아지고 가벼워져서 별도로 사수전(四銖錢)을 주조했는데, ‘반량(半兩)’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또 백성들도 스스로 동전을 주조할 수 있게 하였다. 때문에 오왕(吳王, 유비(劉濞))은 제후였지만 자기가 소유한 동산(銅山)에서 마음대로 돈을 주조하여 그 부가 천자에 버금갈 정도가 되었고, 결국은 반역까지 일으켰다.
또한 등통(鄧通)은 대부(大夫)에 불과했지만 스스로 돈을 주조하여 그 재산이 왕을 능가할 정도였다. 그래서 오나라와 등씨가 주조한 돈이 천하에 유포될 정도였다. 그래서 사적으로 돈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다.
흉노(匈奴)가 자주 북쪽의 변경을 침략했는데, 그곳에 주둔하는 병사가 대단히 많아 변경의 양식만으로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국가에 헌납할 수 있는 양식을 가진 백성들과 양식을 변경까지 운반할 수 백성들에게 그 대가로 작위를 주었는데, 최고작위로 대서장(大庶長)까지 이르게 할 수 있었다.
효경제(孝景帝) 때, 상군(上郡) 서쪽으로 가뭄이 들자 또 다시 관직을 매매할 수 있는 명령을 수정해 작위의 가격을 낮추어 백성들을 끌어 모았다. 그리고 형벌을 받은 죄인들 중에 죄를 사면 받는 대가로 형기가 마칠 때까지 노역을 하는 사람들 또한 조정에 양식을 헌납하면 죄를 완전하게 사면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목장을 크게 증축해 군용 말을 대량으로 사육했고, 궁실(宮室), 누관(樓觀) 등을 더욱 증축하고 수레와 말을 잘 갖추게 했다.
지금의 황제(한무제)가 즉위한지 몇 년이 지난 때는 한나라가 건국한지 이미 70여 년이 지난 사이로 국가에 큰 일이 없었고,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집집마다 자급자족하였고, 곡식창고들도 꽉 차게 되었다.
관청의 창고에는 재화가 넘쳐흘렀고, 경사(京師, 수도)의 돈은 억만금이나 되었는데, 돈을 묶은 줄이 썩은 것이 헤아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태창(太倉, 수도의 곡식창고)의 양식은 차고 넘쳐나, 결국에는 노천까지 쌓아두었다가 썩어서 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보통 민가의 거리에서 백성도 말을 타고, 전야마다 말들이 무리를 짓고, 젊은 암말을 탄 사람들은 배척을 받아 모임에 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골목길에 사는 자들도 고량진미를 먹었으며, 관리들에게는 늙을 때까지 인사이동이 없어서 관직명으로써 자신들의 성씨를 삼았다. 이 때문에 사람마다 스스로 아끼고, 범법을 매우 엄중히 다루었으며, 의를 행하는 것을 우선삼고, 치욕스런 행위를 하는 것을 배격했다.
당시의 법망은 느슨하고 백성들은 부유했으나, 재물을 이용하여 사치스럽고 교만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남의 토지를 멋대로 겸병하며, 혹은 지방호족들은 자기 고장에서 무력으로 위세를 부리며 제멋대로 설쳤다. 봉지(封地)가 있는 종실(宗室)과 공경대부(公卿大夫) 이하들도 다투어 사치를 부렸고, 저택과 거마, 의복 등이 모두 과분한 것이 한도가 없었다. 무슨 사물이든 융성하면 반드시 쇠퇴한다고 하는데, 진실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후부터 엄조(嚴助)와 주매신(朱買臣) 등은 동구(東甌)를 불러들여 양월(兩越)을 평정하는 전쟁이 발생하자, 강수(江水)와 회수(淮水) 지역은 엄청난 군비가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서 매우 스산하고 어수선해졌다. 당몽(唐蒙)과 사마상여(司馬相如)는 서남이(西南夷)의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산을 깎고 천여 리에 길을 놓고, 파(巴)와 촉(蜀) 지방까지 연결시키니, 현지의 백성들은 피곤하여 완전히 지쳐버렸다. 팽오(彭吳)는 조선(朝鮮)을 멸망시키기 위해, 창해군(滄海郡)을 설치하니, 연(燕)나라와 제(齊)나라의 지역은 바람에 초목이 쓰러지듯 소동이 일어났다.
왕회(王恢)가 흉노를 격퇴시키기 위해 마읍(馬邑)에 병사를 매복시키자는 계략을 펼치자, 이를 사전에 알아챈 흉노는 한나라와 화친을 끊고 북쪽 변경지방을 침략하니 전쟁은 끊이지 않고,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천하의 백성들은 수고를 무릅쓰고 노역에 시달렸다. 전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전쟁터로 가는 사람들은 군수품을 휴대해야 했고, 남은 사람들은 배웅하기 바빴다. 나라 안과 밖이 소동으로 인해 들썩이고 더욱 군비가 증대되었는데, 백성들은 피폐해져서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나가고, 물자는 점차 소진되어도 보충할 수가 없었다.
재물을 바치면 관리가 되고, 뇌물을 주면 죄도 면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는 파괴되고 염치를 따지지 않으며 힘이 있으면 중용되었다. 법령은 날로 엄격해지고 명령은 더욱 번다해졌으며 자기 이속만을 챙기는 신하들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 위청(衛靑)
그 후에 한나라의 장군들은 매년 수만의 기병을 이끌고 흉노족을 공격했고, 마침내 거기장군(車騎將軍) 위청(衛靑)은 흉노의 하남(河南) 지방을 탈취하여 그곳에 삭방군(朔方郡)을 설치했다. 이 당시에 한나라는 서쪽과 남쪽의 오랑캐와 통하는 도로를 만들었는데, 동원된 인부만도 수만 명에 달했다.
천 리 밖에서 짊어지고 메어서 양식을 운반했는데, 대략 매번 십여 종(鍾)을 보내면 겨우 한 섬 정도만 도착했다. 그리고 장차 돈을 준다고 하면서 공(邛)과 북(僰) 일대의 백성들을 인부로 불러서 모았다. 몇 년 동안 도로가 개통되지 않자, 그곳의 오랑캐들이 기회를 편승하여 여러 차례 공격했다. 이에 관리들은 군사를 파견해 그들을 주살했는데, 파나라와 촉나라 지역의 조세를 다 써버렸는데도 부족했다.
이에 남쪽 오랑캐 지역에서 밭이 있는 호족들을 모아서 그들의 식량을 현지 현관(縣官)에게 보내고, 도성의 내부(內府)에서 그 대금을 받도록 했다. 동쪽으로 창해군까지 도로가 개통될 때에도 그 인건비용은 남쪽 오랑캐 지방에 쓰이는 것과 유사했다.
또 십여 만 명을 동원해 삭방성을 쌓고 지켰는데, 수륙운송의 길이 너무나 멀었다. 이를 위해 산동 지방에서 모두 노역에 나서고, 쓴 비용만도 10억에서 1백 억에 다다라 관청의 창고는 더욱 비어만 갔다. 이에 백성들을 모아 조정에 노비를 바치는 자에게는 종신토록 조세와 요역을 면제해주고, 원래 낭관(郎官)이었다면 품계를 올려주었다. 조정에 양(羊)을 바치고 낭관이 된 것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 후 4년에 한나라는 대장(大將, 위청)을 파견하여 여섯 장군을 통솔하고, 십여만 군사를 이끌고 흉노의 우현왕(右賢王)을 공격했는데, 사살하고 또한 포로로 노획한 자 만 오천 명에 달했다. 다음해 대장군은 여섯 장군을 통솔해 재차 흉노에 출격하여 사살하고 포로로 노획한 자가 만 구천 명이었다. 포로를 잡았거나 사살한 군사들에게 상으로 황금 2십여만 근을 내렸다. 투항한 포로 수만 명에게도 후한 상을 내렸고, 이들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은 모두 현(縣)의 관청에서 지급했다.
그리고 한나라의 군사와 말이 죽은 수는 십여 만에 달했고, 병기와 갑옷 등의 군수품의 비용과 수륙운송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에 대사농(大司農)은 그동안 저축했던 돈과 조세수입도 다 써버려 전사들에게 지급할 비용이 부족할 정도라고 했다. 주관관리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천자께서 말씀하시길 ‘짐은 5제(五帝)의 교화가 서로 중복되지 않았으나 천하를 잘 다스렸고, 우왕(禹王)과 탕왕(湯王)의 법률은 같지 않았으나 왕 노릇을 잘했으며, 노선은 달랐으나, 수립한 공덕은 완전히 일치했다고 들었다. 북방 변경이 안정되지 않아 짐은 이를 애달프게 생각했다. 근래에 대장군이 흉노를 공격해, 참수하고 포로로 잡은 자가 1만 9천 명이나 되었는데, 공을 세운 군사들은 머물면서 밥 먹을 곳도 없다. 백성들에게 작위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속죄금을 내면 금고형(禁錮刑) 등의 죄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의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관(賞官)을 설치하게 청해 ‘무공작(無功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 등급은 17만 전이면 모두 삼십 만 금(金)의 가치가 있습니다. 무릇 무공작 중 관수(官首) 한 등급을 산 자를 시험 삼아 관리로 보충하여 우선 임용하고, 천부(千夫)은 5대부(五大夫)과 같은 대우를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이 작위를 사면 두 등급을 감했고, 무공작의 최고 작위는 악경(樂卿)까지 이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방법으로 돈을 모아 군사들의 공로를 널리 드러냈습니다.”
군공을 세운 자들에게 준 작위는 대부분 등급을 초월했다. 공이 큰 자는 제후나 경(卿), 대부(大夫)로 봉해지고, 공이 작은 자는 낭(郎)이나 리(吏)가 되었다. 관리 제도는 매우 복잡다단해서 관명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직무에 혼란이 생기고 축이 난다.
공손홍(孔孫弘)은 『춘추(春秋)』의 의리로서 신하들을 바로잡고 다스려서 한나라 승상(丞相)이 되었고, 장탕(張湯)은 준엄한 법조문으로 안건을 심리해 정위(廷尉)가 되었다. 이에 견지지법(見知之法, 관리가 범죄를 보고도 묵살하면 그 관리도 똑같이 처벌하는 법) 생겨서 ‘폐격(廢格, 황제의 영을 집행하지 않고 미뤄두는 행위)’이나 ‘저비(沮誹, 황제의 영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등 끝까지 쫓아가서 다스려야할 사건들이 많아졌다.
다음해에 회남왕(淮南王), 형산왕(衡山王), 강도왕(江都王) 등의 모반 음모가 발각되었다. 공경들은 그 단서를 찾아 안건을 심리하다 마침내 그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무리를 찾아냈다. 이 사건에 연좌되어 죽은 자가 수만 명에 달했다. 이때부터 장리(長吏, 지방관)는 더욱 무자비하고 급해졌으며, 법령은 세밀하게 따지게 되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방정(方正), 현량(賢良), 문학(文學)으로써 존경을 받고 있는 선비들을 초치했는데, 어떤 자는 공경대부의 지위에까지 이르렀다. 공손홍은 한나라의 재상으로서 평민처럼 베옷을 입고, 음식도 매우 간소하게 먹으며 천하의 솔선수범을 보였다. 그러나 검소하게 풍속을 바꾸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고, 드리어 사람들은 점차 공리(功利)에만 힘썼다.
다음해 표기장군(驃騎將軍, 곽거병)은 재차 흉노를 공격하여 적 4만 명을 참수했다. 이해 가을, 흉노의 혼야왕(渾邪王)이 수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투항했다. 이에 한나라는 수레 2만 량(輛)을 동원하여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장안에 도착하자 상을 받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도 상을 내렸다. 이해에 쓴 경비는 모두 일백여 억이었다.
애당초, 십여 년 전에 황하의 제방이 관현(觀縣)에서 터져 양(梁)과 초(楚) 일대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곤경에 처했다. 그래서 황하를 접하고 있는 군(郡)들은 제방을 쌓아 범람을 막았으나, 매번 쉽게 제방이 터져 무너지니, 이때에 쓰인 경비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후에 파계(番系)가 저주(底柱)를 지나는 조운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 분수(汾水)와 황하의 물길을 파서 농지로 관개하기 위해 동원된 인부가 수만 명에 달했다.
정당시(鄭當時)는 위수(渭水)의 조운 수로가 구불구불하고 노정이 멀어서 장안에서 화음(華陰)에 이르는 직통 수로를 팠는데, 동원된 인부가 수만 명이었다. 삭방군(朔方郡) 또한 수로를 팠는데, 이때에도 수만 명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각기 2~3년이 지났지만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비용 또한 각기 십 수 억이 들었다.
천자는 흉노를 토벌하기 위해 대량으로 말을 키웠는데, 장안으로 와서 길러진 말이 수만 필이 되었다. 말을 길들이는 병졸이 관중(關中)에 부족해지자, 바로 부근 각 군에서 징발했다. 투항한 흉노인들에게 모두 관부에서 의식(衣食)을 제공해왔으나 재력이 부족하여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천자는 바로 음식비용을 줄이고, 네 필 수레의 말을 풀어 어부(御府, 황실의 창고)와 금장(禁藏, 제왕 궁중의 창고)에서 돈과 재물을 꺼내어 그들을 구휼했다.
다음해에 산동 지방은 수해를 당해 백성들 대부분은 기아로 곤경에 처했다. 이에 천자는 사자(使者)를 파견해 각 군국(郡國)에 있는 창고에서 물자를 꺼내 빈민을 구제했으나 여전히 부족했다. 그래서 또 부호들을 소집하여 빈민들에게 양식을 빌려주게 하였으나 그래도 빈민 모두를 구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곧 빈민들을 관서(關西) 지방으로 이주시켰고, 나머지는 삭방성 이남의 신진(新秦) 지방으로 보냈는데, 모두 칠십 여만 명으로 의식(衣食)은 모두 관부에 의존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관부에서 그들에게 가옥과 토지, 농기구 등을 빌려주고, 사자를 부분별로 파견하여 그들로 보호하게 했다. 이러한 사자들의 수레가 끊이지 않았고, 그 경비는 억을 헤아려 계산할 수 없을 정도여서 관부의 창고가 크게 비었다.
그러나 부유한 상인들 중에 혹자는 재물을 축적하고 빈민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화물을 실은 수레가 수백 량에 이르렀으며, 읍 안에서 매점매석을 하여 물자를 독점했다. 군(君)으로 봉해진 자들도 모두 머리를 숙이고 물자를 빌릴 정도였다.
혹자는 철기를 주조하고 소금을 만들어, 재물을 만금이나 축적했으나, 국가가 위급할 때에 돕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들만 이중삼중으로 괴롭게 되었다. 이에 천자와 공경들이 상의하여 별도로 새로운 동전과 화폐를 만들어서 조정의 재정으로 쓰고, 경박하고 음란하며 불법적으로 토지를 겸병한 자들을 억누르려고 했다.
이때에 황제의 금원(禁苑, 제왕 궁전 정원)에는 흰 사슴이 있었고, 소부(少府)에는 많은 은과 주석이 있었다. 효문제(孝文帝) 때부터 별도의 사수전(四銖錢)을 주조하여 이미 40여 년이 되었다. 그러나 건원(建元) 이래로 용도가 적어져서 조정에서 자주 동(銅)이 많은 산에 가서 동전을 주조했고, 민간에서도 그 기회에 편승하여 역시 몰래 동전을 주조하여 그 수량은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었다. 동전은 더욱 많아졌고 그 가치가 떨어졌고, 물품은 더욱 적어질수록 가격은 올라갔다. 담당관리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고대의 가죽 화폐는 제후들이 빙향(聘享, 외국 방문과 향연)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금에는 삼 등급이 있는데, 황금(黃金)은 상등급, 백금(白金)은 중등급, 적금(赤金)이 하등급으로 삼습니다. 지금의 반량전(半兩錢) 법에 정한 중량은 사수(四銖)인데, 간사한 사람들이 몰래 한쪽 면을 마모시켜서 동(銅) 가루를 취하니, 동전은 더욱 경박해지고 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반량전을 사용함은 번거롭고 비용도 절감되지 않습니다.”
이에 평방 1척의 횐 사슴 가죽 가장자리에 화려한 수를 놓아서 가죽 화폐로 삼았는데, 장당 40만 전이었다. 왕후(王侯) 종실(宗室)이 입조해 천자를 배알하고 빙향할 때에는 반드시 가죽 화폐로 옥벽(玉璧)로 받친 뒤에 비로소 예의를 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은과 주석으로 백금(白金)을 주조했다. 하늘에서는 용만한 것이 없고, 땅에서는 말만한 것이 없으며, 사람에게는 거북만한 것이 없다고 여겨서 백금을 세 품종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품종은 중량이 8량(八兩)으로 둥근 모양에 용무늬를 했기 때문에 백선(白選)이라 명명했는데, 그 가치가 3천전이었다. 두 번째 품종은 중량이 비교적 가볍고, 사각 모양에 말 무늬를 했는데, 그 가치는 5백전이었다. 세 번째 품종은 중량이 더욱 가볍고, 타원 모양에 거북 무늬를 했는데, 그 가치는 3백전이었다.
지방관청에서 반량전을 녹여 다시 삼수전(三銖錢)을 주조하게 하고, 전문(錢文)과 중량이 같도록 명령하였다. 각종 백금이나 사수전을 몰래 주조하는 자는 모두 죽였으나, 그러나 관리나 민간인 중에는 여전히 몰래 백금을 주조하는 자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다.
이에 동곽함양(東郭咸陽)과 공근(孔僅)은 대농승(大農丞)으로 임명하고, 소금과 쇠를 주관하라고 하였다. 상홍양(桑弘羊)은 계산에 밝아 시중으로 임명되었다. 함양(咸陽)은 제(齊)나라 지방에서 크게 소금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고, 공근(孔僅)은 남양(南陽) 지방에서 크게 철을 제조했던 사람이었는데, 모두 사업을 잘해서 천금(千金)을 모았다. 그래서 정당시(鄭當時)가 그들을 조정에 천거했다. 상홍양은 낙양(雒陽)의 상인이었는데, 암산에 능하여 열세 살에 시중(侍中)이 되었다.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이윤에 관한 일은 가을철에 털갈이를 하여 새로 돋아나는 짐승의 가는 털까지도 분석할 정도였다.
법령이 갈수록 엄격해지자 많은 관리들도 죄에 연루되어 면직되거나 파면되었다. 전쟁이 여러 차례 발발하자 백성들은 돈을 내서 요역을 면제 받거나 작위를 사서 오대부(五大夫)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관부에서는 징집할 수 있는 병사는 더욱 적어졌다. 이에 천부(千夫)나 오대부들을 관리로 임명했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말 한 마리를 내게 했다. 원래 파면되거나 면직된 관리들은 그 벌로써 상림원(上林苑)에서 가시나무를 베거나, 곤명지(昆明池)를 파는 작업에 보내졌다.
다음해에 대장군(위청)과 표기장군(곽거병)은 대대적으로 흉노로 출격했는데, 적을 참수하고 포로로 잡은 자가 8~9만 명에 달했다. 이에 상으로 장졸들에게 오십만 금을 하사했다. 하지만 한나라는 군마 십여만 마리가 죽었고, 운송과 전차, 갑옷 등에 든 비용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때에 재정상태는 매우 궁핍하여 전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봉록을 받지 못했다.
– 복식(卜式)
관리들 중에 삼수전의 중량이 너무 가볍고 간사한 자들의 위조가 쉽다고 하면서 각 군에서 오수전(五銖錢)으로 개량하여 주조할 것을 주청했다. 그리고 동전의 사방에 윤곽을 넣어서 주조하여 갈아서 동(銅) 가루를 얻지 못하게 하였다.
대농(大農)은 염철승(鹽鐵丞) 공근, 동곽함양과 다음과 같이 상주했다.
“산과 바다는 천지간에 물자를 보관하는 대창고이니, 모두 마땅히 소부(少府)에 예속시켜야 합니다. 폐하께서는 사유하지 마시고 대농(大農)에 귀속시켜 부세를 보충하게 해 주십시오. 바라옵건대 백성들을 모아 그들이 자비를 들여 관부의 기구로 소금을 굽게 해주고, 이때에 관부에서 지급하는 뇌분(牢盆, 소금 굽는 기구)를 이용하게 해주십시오.
부식(浮食, 덕에 비해 식록이 많은 사람)과 기민(奇民, 친히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제후)들은 산과 바다의 화물(소금과 철)을 멋대로 독점해 치부하고 가난한 백성을 노비처럼 부리고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금과 철을 관부에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의론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감히 사적으로 철기를 주조하여 소금을 끓이는 자들에게는 왼쪽 발목에 차꼬를 채우고, 그 기구도 몰수해야만 합니다. 군(郡)에서 철이 나오지 않으면 소철관(小鐵官)을 두어 군내의 각 현(縣)을 감독시켜야 합니다.”
이에 공근과 동곽 함양로 하여금 수레를 타고 천하를 다니면서 천자의 뜻을 전하고, 소금과 철의 관영화를 실행으로 옮기려 했다. 그리하여 철과 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관부를 세우고, 원래부터 염철을 경영했던 부자들을 관리로 임용했다. 이로 인해 관리제도는 더욱 난잡하게 되었고, 선거제(選擧制)는 통하지 않았고, 관리 중에 상인 출신이 많아졌다.
상인들은 화폐의 주조가 자주 변하자 물건을 축적하여 이윤을 추구했다. 이에 공경대신들은 다음과 같이 상주했다.
“군국(郡國)들이 자주 재해를 입고 빈민들은 산업이 없었으므로 그들을 모집하여 땅이 넓고 풍요한 곳으로 이주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폐하께서는 좋은 음식을 줄이시고 비용도 절약했으며 황궁의 돈을 내서 백성들을 구휼하셨고, 대여와 부세도 관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두 밭으로 나가 경작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상인의 수만 계속 증가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저축한 것이 없어 모두 관부에서 제공하는 의식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초거(軺車, 경쾌하고 빠른 마차)나 상인들의 민전(緡錢, 엽전 꿰미)에 관한 세를 징수할 때, 모두 이미 정해진 등급이 있었으니 청컨대 옛날처럼 그것을 산출해 부과해 주십시오.
여러 상공업자 중에 고리 대금업자, 매매업자, 성 안에 살면서 물건을 매점매석하는 사람, 그리고 행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비록 시적(市籍, 영업등록증)이 없어도 각자 재산에 따라 신고하고, 일률적으로 민전(緡錢) 2천에 1산(算)씩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가 있는 여러 수공업자들과 주조업자들도 일률적으로 민전 4천에 1산씩을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에 버금가는 삼로(三老), 북쪽 변병의 기사(騎士)가 아니면서 초거(軺車)가 있으면 1산을, 상인들의 초거는 2산, 배가 5장(丈) 이상이면 1산을 납부시켜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은닉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신고한 자는 그 죄로 일 년 동안 변방에 보내 수자리를 서게 하고, 민전은 모두 몰수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실을 고발하는 자에게는 몰수한 민전의 반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인으로 영업등록한 자나 그 가족들은 모두 전답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해 농민에게 이익을 주어야만 합니다. 감히 명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전답과 동복(僮僕)을 몰수해야 합니다.”
천자는 곧 복식(卜式)의 말이 생각이 나서, 그를 불러들어 중랑(中郎)으로 삼고, 좌서장(左庶長)의 작위와 전답 10경(頃)을 하사하고, 천하에 포고하여 이 사실을 명백히 알도록 하였다.
애초, 복식은 하남(河南) 사람으로 농사와 목축을 업으로 삼았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갔을 때에 그에게는 어린 동생이 있었다. 동생이 성장하자 복식은 집을 나와 분가하면서 홀로 키우던 양 1백 마리만 취하고, 전답과 재물 등은 모두 동생에게 주었다.
복식은 산에 들어가서 십여 년 동안 방목하여 양을 천여 마리로 늘려서 그것으로 전답과 집과 샀다. 그러나 그의 동생은 완전히 파산하니, 복식은 다시 동생에게 자신의 재산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주었다. 이때에 한나라는 마침 수차례 장수를 파견해 흉노를 공격하고 있었다. 복식은 글을 올려서 자신의 재산 반을 조정에 바쳐 변방 작전의 비용에 보태자고 했다.
이에 천자는 사자를 보내어 복식에게 그 이유를 묻게 했다. “관리가 되고 싶은가?” 복식이 대답했다. “신은 소싯적부터 목축만 해서 관리가 되는 일에 익숙하지 않으니,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자가 물었다. “집안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일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인가?” 복식이 말했다. “신은 평생 남과 분쟁한 적이 없고, 저는 고을 사람들 중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주었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고 순종시켜서 고을 사람들 모두가 저를 따릅니다. 제가 어찌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저는 고발할 말이 없습니다.”
사자가 말했다. “진실로 그렇다면, 그대는 어찌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나라에 기부했는가?” 복식이 대답했다. “천자께서 흉노를 토벌하려면 제 소견으로 현자는 마땅히 변방의 싸움터에서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켜야하고, 재산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조정에 헌납해야 흉노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자는 그의 말을 들은 그대로 천자에게 보고했다.
천자가 이 사실을 승상인 공손홍에게 이야기하니, 공손홍이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인정에 맞지 않습니다.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교화의 모범으로 삼아 법을 어지럽혀서는 아니 되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그의 청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에 황상(皇上)은 오랫동안 복식의 상서에 회답하지 않다가, 몇 년이 지난 후 복식에게 그만 두도록 했다. 복식은 돌아간 후에 예전처럼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다.
한해 남짓이 지난 후에도 한나라 군대는 수차례에 걸쳐 출정에 나섰다. 이에 혼야왕(渾邪王) 등이 투항해 왔고, 조정에서 쓰는 비용이 증가하여 창고가 텅 빌 정도였다. 그 다음해에는 빈민들이 대량으로 이주해 와서 모두 조정에만 의지하니, 그들을 다 구휼할 수 없었다. 이 무렵 복식은 20만 전을 가지고 하남 태수에게 주면서 이민(移民)들을 위한 일에 보태게 하였다. 하남 태수는 빈민들을 도운 부자들의 명부를 상부에 올리니, 천자는 복식의 이름을 보고, 그를 기억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자는 본디 전에도 자기 재산의 반을 변방의 비용으로 헌납했다.” 그리고는 곧 복식에게 4백 명이 변경을 지키는 요역에서 면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복식은 또 그 권한을 다시 조정에게 전부 반납했다. 이때에 부자들 모두 다투어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는데, 오직 복식만은 앞장서서 재산을 조정에 헌납하여 변방의 비용에 보태고자 했다. 천자는 마침내 복식이 덕망이 높은 장자(長者)라고 여기고, 그를 높여서 백성들의 모범으로 삼고자 했다.
애초부터 복식은 낭관(郎官)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자 황상이 이렇게 말했다. “짐의 양들도 상림원에 있는데, 당신이 짐을 대신하여 그것들을 키웠으면 좋겠소.” 이에 복식은 바로 낭관의 직위를 받아들여, 베옷과 짚신 차림으로 양을 키웠다. 1년 남짓이 되자 양은 비대해지고 또 왕성하게 번식했다. 황상이 지나는 길에 복식이 양을 돌보는 것을 보고, 그의 방법이 좋다고 칭찬했다.
복식이 아뢰었다. “비단 양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시간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병든 양이 있으면 바로 제거하여 나머지 양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황상은 그가 뛰어난 인물이라고 여겨, 구지(緱氏) 현령(縣令)으로 발령 내어 그를 시험했다. 구지현 사람들이 그가 편하다고 하자, 다시 성고(成皐) 현령으로 승진시켜 조운(漕運)까지도 맡겼는데, 가장 성적이 좋았다. 이에 황상은 복식이 성실하고 충성스런 사람으로 여겨, 그를 제왕(齊王)의 태부(太傅)로 삼았다.
– 장탕(張湯)
한편 공근(孔僅)은 천하 각지를 다니면서 철기를 주조하는 일을 돌보았는데, 3년째 되던 해에 대농령(大農令)으로 승진해, 구경(九卿)의 반열에 올랐다. 상홍양(桑弘羊)은 대농승(大農丞)이 되어 여러 가지 회계의 일을 관장했는데, 점차 균수제도(均輸, 값이 쌀 때 사들이고 비쌀 때 방출하는 등 물가 안정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을 유통시켰다.
처음으로 관리도 조정에 곡물을 헌납하고 보관(補官)할 수 있게 하고, 낭관으로 6백석까지 오를 수 있었다.
백금과 오수전을 제조한 지 5년째가 되던 해에 아전과 백성들 중에 사사로이 돈을 주조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수십만 명을 사면했다. 하지만 미처 죄가 발각되지도 않았는데, 죽인 자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자수한 자 중에 백여만 명을 사면했으나, 실제 범죄자의 절반도 안 되었다. 이는 천하의 사람들 대개가 거리낌이 없이 몰래 금전을 주조했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관리가 그들을 모두 죽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에 박사(博士) 저대(褚大), 서언(徐偃) 등을 파견해, 여러 조로 나누어 각 군국을 순찰하고, 토지를 겸병하고 있는 무리나 군수와 제후의 재상 중에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관리들을 고발하게 했다. 이때 어사대부(御史大夫) 장탕(張湯)은 바야흐로 존귀한 신분이 되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감선(減宣)과 두주(杜周) 등은 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 임명되었고, 의종(義縱), 윤제(尹齊), 왕온서(王溫舒) 등은 참혹하게 법을 집행하여 구경(九卿)의 반열로 승진해 있었고, 직지(直指) 하란(夏蘭)과 같은 무리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대농령(大農令) 안이(顔異)가 죽임을 당했다. 애초에 안이는 제남(濟南)의 정장(亭長)을 지냈는데, 청렴하고 정직해 거듭 승진하여 구경의 지위에 이르렀다. 황상과 장탕은 그 전에 흰 사슴으로 된 가죽화폐를 만들고는, 안이에게 그 타당성 여부를 물어보았다. 안이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제후들이 폐하께 하례할 때에 창벽(蒼璧, 푸른 옥벽)을 바치는데, 그 값은 수천 전에 불과하나 그것을 감싸는 가죽는 도리어 40만 전이나 되니, 본말이 걸맞지 않습니다.” 황상이 듣고는 매우 언짢게 여겼다.
장탕은 또 안이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안이가 조정을 비방했다고 고발하자, 그 사건을 장탕에게 주어 안이를 심문하게 했다. 안이는 손님과 얘기할 때에 그 손님이 처음에 조령이 반포되었을 때 불편했다고 토로하자, 안이는 대꾸 없이 단지 입술을 약간 삐죽거려 암묵적인 동의를 표시한 적이 있었다.
장탕은 이 사실을 천자에게 알리고 안이가 구경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령(政令)에 불편한 것이 있었으면, 입조해 진언을 하지 않고, 복비(腹誹, 마음속으로 비난함)했으니 죽음으로 논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복비라는 죄명이 생겨서, 공경대부들 대부분이 아첨과 취용(取用, 편 하려고 남의 뜻에 순종함)했다.
천자가 이미 민전령(緡錢令, 일종에 상인들의 재산세)을 반포하고, 복식(卜式)을 존숭하여 따르게 했으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재산을 덜어 조정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고민전령(告緡錢令)을 내리고 양가(楊可)로 하여금 책임지고 집행하라고 하였다.
군국(郡國)에는 간교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주조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분량이 부족하여 가벼웠다. 그래서 공경은 경사(京師, 수도)의 종관(鍾官)들로 하여금 적측전(赤側錢, 적측(赤仄)으로 불리기도 하고 적동(赤銅)으로 테두리를 두른 화폐)을 주조하게 청했는데, 적측전 1전은 오수전 5전에 상당한다고 했고, 조세를 낼 때에 적측전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았다. 백금도 점차 가치가 떨어져서 백성들도 쓸모없다고 여기고 쓰지 않았다. 조정에서 명령을 내려 이러한 상황을 금지시켰으나 여전히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1년 남짓 후에 백금은 마침내 폐기되어 발행되지 않았다. 이해에 장탕이 죽었는데, 백성들은 아무도 그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 후 2년 되던 해, 적측전의 가치가 떨어지자, 백성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시장에서 유통하기 불편하게 되자, 다시 폐기했다. 이에 모든 군국에서 동전을 주전하는 것을 금지되고, 오로지 상림(上林)의 삼관(三官)에게만 동전을 주조할 것을 명령했다. 이미 주조된 동전이 많아서 천하에 삼관전(三官錢) 이외에는 통용을 불허했다. 그리고 여러 군국에서 이미 주조했던 동전은 모두 폐기해 녹여서, 그 동은 삼관(三官)으로 보내게 했다. 백성들도 동전을 주조하는 일이 더욱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동전을 주전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교묘한 기술을 가진 장인과 크게 간교한 상인들만 몰래 주조했다.
복식(卜式)이 제나라 왕의 재상이 되었다. 그리고 양가(楊可)가 주관하는 고민(告緡, 자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고발)이 천하에 두루 퍼져, 중산층 이상의 상인들은 대부분 고발되었다. 두주(杜周)가 고발된 사람들을 다스렸는데, 사건을 뒤집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이에 어사(御史), 정위(廷尉), 정감(正監) 등의 관원들을 조로 나누어 군군에 파견하여 고민사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재산은 억으로 계산할 정도였고, 노비의 수는 천만, 경작지는 큰 현의 경우에는 수백 경(頃), 작은 현의 경우에는 백 수십 경 정도를 얻었고, 주택도 그와 마찬가지였다.
이에 중등 이상의 상인들은 대부분이 파산했고, 백성들은 겨우 달게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에 만족해야지 사업에 종사하면서 재산을 축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조정은 소금과 철을 관영하고 민전을 고발한 연유로 재정이 더욱 풍요로워졌다. 함곡관을 더욱 확장되고, 경성에 좌우보(左右輔)를 설치했다.
처음에 대농령(大農令)은 염철관(鹽鐵官)을 관리하면서 사방에 많이 분포되었고, 이 때문에 수형도위(水衡都尉)를 설치해서 소금과 철을 주관하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가가 민전을 고발한 사건이 발생한 후, 상림원이 재물이 많아지자 곧 명령을 내려서 수형으로 하여금 상림원을 책임지게 했다. 상림원에 재물이 이미 꽉 차자, 상림원의 규모를 더욱 확충했다.
이때 남월(南越)이 한나라와 배를 이용해서 결전을 벌이려고 하자, 바로 곤명지(昆明池)를 크게 수리하고 그 주위에는 누각을 건축했다. 또한 망루가 있는 배를 건조했으니, 그 높이가 십 수장(丈)이나 되었고, 그 위에 깃발을 꽂으니 매우 장관이었다. 이에 천자는 감동하여 백량대(柏梁臺)를 건축하니, 그 높이가 수십 장이나 되었다. 궁실의 건설은 이때부터 나날이 화려해졌다.
그리고 바로 민전(緡錢)을 각 관부에 나누어주고, 수형(水衡), 소부(少府), 대농(大農), 태복(太僕) 등은 각기 농관(農官)을 두고 이따금씩 각 군현(郡縣)이 몰수한 전답으로 내려가 경작하도록 했다.
몰수한 노비는 여러 원(苑)으로 보내어 개와 말 등의 짐승들을 키우도록 했고, 일부는 여러 관부로 나누어 보냈다. 여러 관부가 더욱 잡다하게 늘어나니, 노역에 종사하는 노비가 또한 늘어나서 황하 하류에서 조운으로 올라오는 4백만 석에다 관부에 스스로 산 양식을 보태야만 겨우 충족시킬 수 있었다.
소충(所忠)이 진언을 올려 말했다. “세가(世家)의 자제들과 부자들 중에 혹자는 닭싸움 투기를 하거나 개와 말을 경주시키고, 사냥으로 도박하면서 유희를 벌려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법령을 어긴 자들에게 징벌하도록 하니 상호 연루된 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을 ‘주송도(株送徒)’라고 명명했다. 재물을 바치는 자는 낭관(郎官)에 임명될 수 있어서 낭관을 선발하는 제도는 줄어들었다.
이때 산동 지방은 황하로 인해 재해를 당해서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재해지방은 사방 1, 2천 리에 달했다.
천자는 그들을 가련하게 여겨 조서를 내려 말했다. “강남(江南)은 밭이나 논농사를 짓는 곳으로서, 굶주린 백성들로 하여금 장강과 회수 사이로 옮겨가 먹게 하고, 머물고자 하는 자는 머물 곳을 마련해주어라!” 이에 조정에서 파견한 사자들의 수레의 덮개가 이어질 정도였고, 이재민들을 보했으며, 파와 촉 지방의 양식까지 내려 보내 그들을 구휼했다.
그 다음해 천자가 군국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동쪽으로 황하를 건너오자, 하동 태수(河東太守)는 천자의 어가가 행차할 것으로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제대로 접대하지 못하여 자살했다. 천자의 행렬이 서쪽으로 농산(隴山)을 지나자, 농서(隴西) 태수는 천자의 행렬이 갑자기 맞이하여 천자의 수행원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역시 자살했다.
이에 천자는 북쪽으로 소관(蕭關)을 순찰했는데, 이때에 수만 기병을 수행해 신진(新秦) 지방에서 사냥을 하면서, 변경의 병사들을 점검한 후 돌아왔다. 그러나 신진 지방에 간혹 천리에 이르는 동안 요새지의 병졸들이 보이지 않자, 북지(北地) 태수 이하 담당 관원들을 죽였다. 더불어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변경의 현에서 목축할 있도록 하고, 관청으로부터 암말을 빌려 만 3년 뒤에 돌려줄 때, 10분의 1의 이자를 내도록 하고는, 고민령을 폐지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신진 지방을 충만하게 만들었다.
이미 보정(寶鼎)을 얻은 후에 후토사(后土祠)와 태일사(太一祠)를 건립했고, 공경대신들이 봉선(封禪) 의식을 거행할 것을 논의하자, 천하의 각 군국들은 미리 길과 다리를 수리하고 원래 옛 궁을 고쳤으며, 대로변에 현들은 물품를 비축하고 필요한 용구를 갖추어 천자가 행차하기를 기다렸다.
그 다음해 남월(南越)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서강(西羌)이 변경을 제멋대로 침범해 해악을 끼쳤다. 이에 천자는 산동 지방의 구휼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천하의 죄수들을 모두 사면시키고, 남방의 수군(水軍)과 더불어 20만 명으로 남월을 공격했다. 그리고 삼하(三河) 서쪽의 기병들을 수만 명을 징발해 서강을 공격했고, 또다시 수만 명을 파견해 황하를 건너 영거성(令居城)을 쌓도록 하였다.
처음에 장액군(張掖郡)과 주천군(酒泉郡)을 설치해 상군(上郡), 삭방(朔方), 서하(西河), 하서(河西) 등의 개전관(開田官, 둔전관)과 척새졸(斥塞卒, 변방을 개척한 병사) 60만으로 하여금 변경을 수비하고 한편으로는 농사를 짓게 하였다. 내지에서 도로를 고쳐 식량을 운반했는데, 먼 곳은 삼천리, 가까이 곳은 천여 리에 달했는데, 모두 대농(大農)의 공급에 의존했다. 변경의 병기가 부족하면 무기고나 공관(工官, 수공업을 담당하던 부서)의 병기를 꺼내어 보내주었다.
전차와 전마(戰馬)가 모자라거나 떨어졌는데도 조정에 돈이 적어서 말을 사기가 어려우면, 바로 명령을 내려서 봉군(封君, 작위와 봉지를 가진 신하) 이하 심 백석 이상의 관리들로부터 전국의 정(亭)에서 암말을 차출했다. 정에서 암말을 키우게 하고는, 매년 얼마나 번식하는지를 심사했다.
제나라의 제상 복식이 글을 올려 이렇게 아뢰었다. “신이 듣기로 폐하께서 근심거리가 있는 것은 신하의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남월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 신의 부자(父子)는 제나라 사람 중 배를 익숙하게 다루는 자들과 더불어 전쟁터에 가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천자가 조서를 내려 이렇게 말했다. “복식은 비록 몸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도 이익만을 취하지 않고, 여유분이 생기면 늘 조정의 비용에 보태려고 애썼다. 지금 천하가 불행에 빠져 위급한 일이 발생하니, 복식은 발분하여 자식과 더불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려고 한다. 비록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충의가 안으로부터 드러났다고 이를 수 있다. 관내후(關內侯)의 작위와 황금 60근, 밭 40경(頃)을 하사하노라.”
이 사실을 천하에 포고했으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열후(列侯)에 봉해진 자가 수백에 달했으나, 아무도 종군하여 서강이나 남월을 격퇴시키겠다고 하는 자가 없었다. 9월에 제후들이 입조하여 종묘에 주금(酎金)을 바칠 때가 되자, 소부에서 이를 검사했는데, 열후 중에 주금의 분량이 부족하여 작위를 삭탈당한 자가 백여 명이나 되었다. 복식이 어사대부로 임명되었다.
복식은 어사대부의 자리에 있으면서 군국의 대부분이 조정에서 소금과 철을 직영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까닭은 철기의 순도가 떨어지고, 가격 또한 비싸며, 혹은 백성들에게 강매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배에는 산세(算稅)가 있었는데, 상인은 적고, 물가는 비쌌기 때문에 바로 공근(孔僅)을 통해 황상에게 배에 산세를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 진언했다. 황상은 이때부터 복식을 탐탁찮게 생각했다.
한나라는 3년 동안 연속하여 전쟁을 하여 침입한 강의 군대를 제거하고, 남월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반우(番禺) 서쪽과 촉군(蜀郡) 이남에 처음으로 군(郡) 17개를 설치했는데, 우선 그곳의 옛 풍속대로 다스리게 하면서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 남양(南陽)과 한중(漢中) 사이의 옛 군(郡)은, 각기 그 땅에서 가까운 신설된 군의 관리 및 병졸들의 봉급과 식량, 화폐, 물자 등을 공급했고, 역전에서 파발로 쓰이는 수레와 말에 사용되는 덮개까지도 대주었다. 그러나 신설된 군에서는 때때로 소규모의 반란이 일으켰고, 관리들이 살해되기도 했다.
이에 한나라에서는 남방의 관리와 병졸들을 징발해 그들을 진압하러 나섰는데, 매년 만여 명이 동원되었고, 그 비용은 모두 대농에서 지급되었다. 대농은 균수법으로 각지의 소금과 철의 소득이 있어서 부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겨우 동원된 자들의 비용을 댈 수 있었다. 그러나 군대가 지나가는 각 현에서는 부족한 것을 없도록 공급해야지, 감히 법에 정한대로 부세를 거두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다.
– 균수 평준(均輸 平準)
그 다음해인 원봉(元封) 원년에 복식은 좌천되어 태자태부(太子太傅)가 되었고, 상홍양은 치속도위(治粟都尉)가 되어서 대농까지 겸하여 거느리게 되었다. 완전히 공근을 대신하여 천하의 소금과 철을 관리하게 되었다.
상홍양은 각지의 관원들이 스스로 매매하면서 서로 경쟁을 해서 물가가 올랐고, 천하 각지에서 조세를 운송하는데, 어떤 것은 조운의 운임 비용만도 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대농부승(大農部丞) 수십 명을 배치하여 부서를 나누어 각 군국을 주관하게 하고, 각자 주요한 현에는 균수관과 염철관 등을 배치할 것을 청했다.
그리고 ‘먼 곳에서 바친 물품이 가장 비쌀 때에 상인들이 외지에서 파는 가격에 맞추어 세금을 내게 하고, 각지의 화물이 상호 교류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사에 평준관(平準官)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운반되어 오는 화물을 모두 받아들이고, 공관(工官)을 불러 수레와 여러 기물을 제조하게 하면, 그 비용은 모두 대농이 공급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농에 소속한 관청에는 천하의 화물을 모두 장악해서 비쌀 때는 내다 팔고 쌀 때는 사들이도록 했다.
이와 같으면 돈 많은 장사꾼들은 큰 이익을 취할 도리가 없어져서 곧 본업인 농업에 힘쓰게 될 것이고, 만물의 가격은 오를 수가 없게 되며, 천하의 물가를 억제할 수 있으니, 이름 하여 ‘평준(平準, 물가를 공평하게 조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천자는 도리가 있다고 여겨 그의 주청을 허가했다. 이해에 천자는 북으로는 삭방, 동으로는 태산, 또 해상을 순찰하고, 아울러 북방의 변경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지나간 곳마다 모두 상을 내려서, 비단 백여 만 필, 금전은 거만(巨萬)에 헤아렸는데, 이것은 모두 대농에게서 지출한 것이다.
상홍양은 또 관리들이 조정에 양식을 바치면 승진시키고, 죄인들이 양식을 내면 속죄가 될 수 있도록 청했다. 백성들 중에 감천궁의 창고에 양식을 내는 자는 각기 차등을 두어 종신토록 요역을 면제해주었고, 고민(告緡)에서도 제외시켜 주었다. 기타 각 군도 긴급한 곳에 양식을 보내주었고, 여러 농가도 수확한 양식을 바치니, 산동 지방의 조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6백만 석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일 년 내내 태창과 감천궁의 창고는 양식으로 가득 찼고, 변경에도 남는 곡식과 물품이 있었는데, 균수(均輸, 물건 값이 싸면 나라에서 사들이고 비싸면 이를 내다 팔음)의 방법을 통해 옮겨서 파니, 비단 5백만 필의 이익이 생겼다.
이 덕분에 백성들은 더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국가의 재정은 풍요로워졌다. 그리하여 상홍양은 좌서장(左庶張)의 작위를 받았고, 황금을 2백 근을 받았다.
이해에 작은 가뭄이 있어, 천자는 관리들로 하여금 기우제를 지내게 했다. 복식이 진언하여 말했다. “조정은 마땅히 조세로써 입는 것과 먹는 것을 충당할 뿐입니다. 지금 상홍양은 관리를 저자거리의 줄지은 상점에 앉게 하여 이윤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홍양을 삶아 죽이면 하늘은 곧바로 비를 내릴 것입니다.”
– 사마천의 논평
태사공은 말한다.
“농업, 공업, 상업 간의 상호 교역이 통하게 되면 귀(龜), 패(貝), 금(金), 전(錢), 도(刀), 포(布) 등과 같은 화폐가 바로 흥기한다. 그 유래는 아주 오래되었다. 고신씨(高辛氏) 이전의 일은 오래되어 기록을 얻기 어렵다. 고로 『상서(尙書)』에서 말하는 당우(唐虞, 요순(堯舜)) 세대와 『시경(詩經)』에서 기술하는 은주(殷周) 세대는, 세상이 평안하고 학교를 세우고, 농업을 근본으로 삼고, 상업을 말단으로 삼아 억제했으며, 예의로써 이익을 탐하는 것을 방지했다.
세상에 변란이 많이 일이나면 이와 정반대이다. 사물이 흥성하면 쇠락하기 마련이고, 시대가 극에 달하면 곧 전환하기 마련이다. 한번 질박하면 한번 화려해지는 것도 끝에 이르면 처음으로 돌아오는 변화인 것이다.
「우공(禹貢)」에서는 천하를 아홉 개의 주(州)로 나누고, 각자 그 토지에 적당한 작물을 심어 백성의 다소에 따라 걸맞은 공물을 바쳤다고 한다. 상나라의 탕왕(湯王)과 주나라의 무왕(武王)은 전 왕조의 폐단을 승계했으나, 때에 맞게 변통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하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각자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으나 결국 점차 쇠락해졌다. 제 환공(齊桓公)은 관중(管仲)의 계략을 채용하여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며 산과 바다에서 산업을 일으켜 부유했다. 또 제후들로 하여금 천자에게 조회하도록 했고, 보잘 것 없는 제나라가 패주(覇主)의 명성을 천하에 드러내게 하였다.
위나라에서는 이극(李克)을 등용하여 땅의 힘을 이용하여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강국의 임금이 되었다. 이후 천하는 상호 다투게 되었고, 교활한 무력을 중시하고 인의(仁義) 도덕(道德)을 경시했으며, 부유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겸양함은 뒤로 미뤘다. 그래서 백성들 중 부자는 혹은 억만금을 모았고, 가난한 자는 지게미와 쌀겨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다. 강대한 제후국은 군소국을 병탄하여 제후들을 신하로 만들었고, 약한 나라는 간혹 제사마저 단절되어 세상에서 소멸되었다. 진(秦)나라에 이르러 마침내 천하는 통일되었다.
우하(虞夏, 순임금과 탕임금) 시대의 화폐는 금을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혹은 황(黃), 혹은 백(白), 혹은 적(赤)이었다. 이 밖에 혹은 전(錢), 혹은 포(布), 혹은 도(刀), 혹은 귀갑(龜貝)을 화폐로 썼다.
진나라에 이르러 일국의 화폐는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황금은 ‘일(溢)’을 단위로 명칭으로 하고 상등 화폐로 삼았고, 동전에 ‘반량(半兩)’이라고 문자를 새긴 것을 하등 화폐로 삼았다. 그리고 주옥(珠玉), 귀패(龜貝), 은석(銀錫)과 같은 종류는 단지 기물(器物)이나 장식품으로 진귀한 보물로 여겼지 화폐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는 시간에 따라 달라 그 가치가 일정하지 않았다. 이때에는 밖으로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안으로는 공업을 일으켰다. 전국의 남성들은 힘써 농사를 지었으나 양식으로는 부족했고, 여자들이 베를 짰으나 의복으로 입기에 부족했다. 고대에는 일찍이 천하의 재물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었으나, 오히려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다. 여기에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물의 추세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서로 부딪치게 마련이니, 어찌 괴이할 것이 뭐가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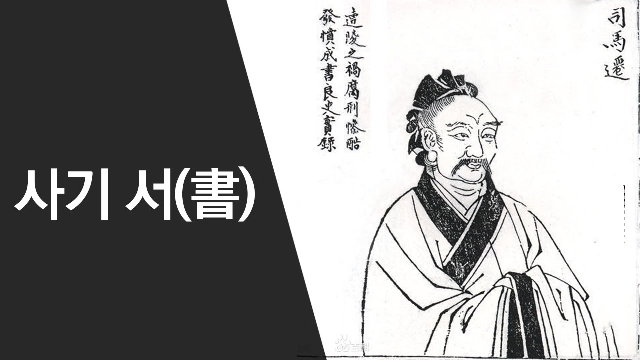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