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예술의 죽음과 부활 : 헤겔의 ‘예술의 종언’ 명제와 관련하여
김문환, 권대중 편 / 지식산업사 / 2004.10.20
이 책은 헤겔의 악명 높은 ‘예술의 종언’이라는 명제를 현대적 맥락에서 검토해본다. 헤겔 미학에 대한 해석이나 비판이 적절하고 성공적인 것인가의 여부는 헤겔 미학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인 “예술의 종언 das ende der kunst” 명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여러 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헤겔의 미학을 분석하고 ‘예술의 종언’ 명제에 대해 나름의 고찰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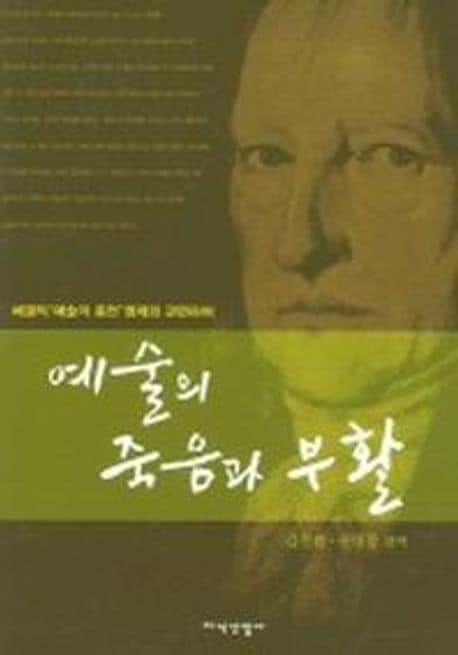
○ 목차
머리말
헤겔 미학의 관점에서 본 예술의 미래 문제 / K.미첼스
예술의 미래 / E.피셔
헤겔의 미학강의에 따라서 본 예술의 현재성 / H.쿤
예술의 죽음과 변용 / A.호프슈타터
쿤과 호프슈타터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논고 / B.륍
헤겔 미학의 현실성에 대하여 / D.헨리히
‘예술과 죽음’에 대한 재검토 / C.L.카터
예술의 종언? / H.-G.가다머
‘예술의 종언’ 명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 S.벙기
예술은 진정 종언을 고했는가? / V.회슬레
헤겔의 ‘예술의 종언’ 명제는 어떻게 읽혀야 하는가 / 권대중
해제 / 권대중
찾아보기
○ 편저자소개 : 김문환, 권대중
– 편자 김문환
미학자, 연극 평론가, 문화 이론가, 신학자인 김문환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철학과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교수 및 공연예술학 협동 과정 초대 주임교수를 역임했고, 한국미학회장 및 세계미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 한국연극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미학과 예술론, 공연이론 및 평론, 문화론 등의 분야에 걸쳐 방대한 저·역서를 남겼으며, 주요 저작으로『미학의 중심』(2001), 『예술과 윤리의식』(2003), 『연극평론의 기초』(1991), 『문화교육론』(1999), 『문화외교론』(2004), 『서울에서 가장 거룩한 곳』(2007) 등이 있다.
– 편자: 권대중
서울대학교 미학과 학사 및 석사, 독일 RWTH Aachen 대학교 박사, 현재 계명대학교 철학윤리학과 교수
저서로 <헤겔: 세계 속의 이성을 인식하라>, <헤겔의 미학강의 읽기>(근간) 등이 있으며, 역서로 <헤겔의 체계 1>(V. 회슬레), <예술의 죽음과 부활>(D. 헨리히 외) 등 논문: <3의 변증법과 4의 변증법>, <미학적 칸트와 연대한 철학적 헤겔>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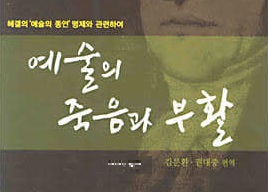
○ 출판사 서평
헤겔은 예술이 종교와 철학과 함께 절대정신의 반영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의 형식이 직관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종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헤겔은 자신의 철학 체계에서 한편으로는 예술을 종교 및 철학과 함께 절대 정신에 자리 매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지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는 ‘예술의 종언’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그 중 한 가지는 체계적인 관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역사적인 관점이다.
본서는 헤겔이 주장했던 ‘예술의 종말’이란 명제의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에 있다. 최고 규정으로서의 정신이 헤겔의 시대에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헤겔은 예술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것’으로 규정한다. 헤겔은 ‘사유의 사유’의 형태를 띤 철학만이 오로지 진리를 추구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주장한다. 헤겔은 예술이 종교와 철학과 함께 절대정신의 반영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의 형식이 직관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종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술의 종말’의 명제의 이면을 살펴보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이성의 진보’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사유의 생성’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같은 이유는 헤겔의 ‘현실’ (Wirklichkeit)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실’은 단순한 현재성을 넘어서 자기실현태의 절대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그 같은 ‘현실’은 인간의 자기의식에 대한 자각과 그에 따른 역사성을 통해서 구현된다. 이와 같은 이성 진보의 결과가 ‘예술의 종말’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개념은 헤겔 철학에서 이성의 능동적 활동에 기인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헤겔은 예술과 예술에 대한 수용관계
를 주관적 판단에 따른 내감의 형식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능동적 의미 추구로 나
아갔다는 점이다. 그 결과의 산물이 ‘예술의 종말’인 것이다. ‘예술의 종말’이란 다
소 논쟁적인 명제의 이면에는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둔 헤겔의 신중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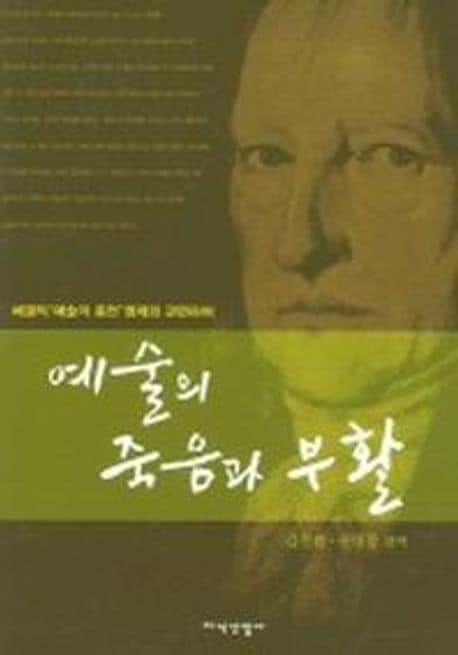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