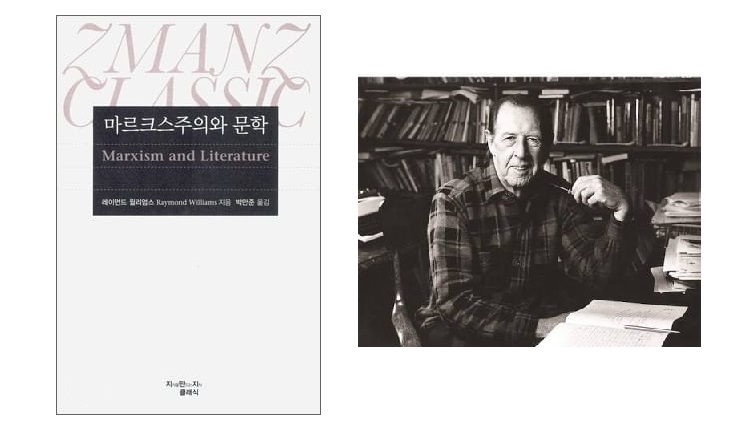서적소개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레이먼드 윌리엄스 / 지만지 / 2009.10.10
이 책은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마르크스주의와 문학’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하였다. ‘마르크스주의와 문학’은 사회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에 쓴 책으로 마르크스주의와 문학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변화의 시기를 소개하는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한낱 요약이 아니라 비평가 논증이며 또한 마르크스주의자건 아니건 간에 이전의 입장들에 대한 검토도 포함하고 있다.
1970년대 윌리엄스는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북아메리카, 독일 등에서. 그리고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구 소련 등지에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가졌는데 ‘마르크스주의와 문학’은 그가 생애 처음으로 마음편한 작업의 영역과 차원에 속한다는 느낌을 가졌던, 그야말로 국제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토론의 산물이다. 본 번역은 ‘마르크스주의와 문학’의 제 1장을 발췌한 것으로 전체 분량의 약 30%정도가 된다.
영국 마르크스주의의 지백적 경향이란 문학을 평가하는 일보다는 문학 창작에 더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능동적인 문학을 대다수 민중의 삶과 연결시키는 데 더 관심을 쏟는 참여적이고 민중적인 것이었다.이 책은 윌리엄스가 이러한 시기에 대한 그 나름의 문화적, 문학적인 탐구의 결과물이다.

○ 목차
해설
지은이에 대해
서론
제1장 기본개념
1. 문화
2. 언어
3. 문학
4. 이데올로기
제2장 문화이론
1. 토대와 상부구조
2. 결정
3. 생산력
4. 반영에서 매개로
5. 전형화와 상동관계
6. 헤게모니
7. 전통, 제도, 그리고 형성물
8. 지배적인것, 잔여적인 것, 부상하는 것
9. 감정의 구조
10.문화사회학
제3장 문학이론
1. 글쓰기의 다양성
2. 미적 상황과 그밖의 상황
3. 매체에서 사회적 행위로
4. 기호와 표기법
5. 규약
6. 장르
7. 형식
8. 저자
9. 제휴와 참여
10.창조행위
참고문헌
옮긴이에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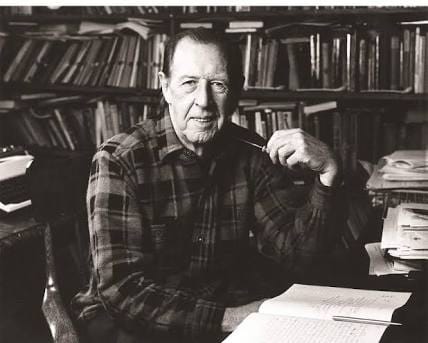
○ 저자소개 : 레이먼드 윌리엄스 (Raymond Williams)
1921년에 태어나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1974년부터 1983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극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1988년 1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문화 연구에 끼친 윌리엄스의 영향은 엄청나다. 그는 문화 이론, 문화사, 텔레비전, 언론, 라디오와 광고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앨런 오코너(Alan O’Connor)의 책의 참고문헌에 나오는 인쇄된 윌리엄스의 저작 목록만도 39쪽에 이른다.
그의 기여는 그가 웨일스 노동계급 출신(그의 아버지는 철도 신호수였다)이라는 것과 또 학자로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극과 교수였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더욱 놀랍다.
저서로는 『드라마와 공연 (Drama in Performance)』(1954), 『문화와 사회 (Culture and Society) 1780 ∼ 1950』 (1958), 『장구한 혁명 (The Long Revolution)』 (1961), 『입센에서 브레히트까지의 희곡 (Drama from Ibsen to Brecht)』 (1968), 『시골과 도시 (Country and City)』 (1973), 『주요 어휘들 (Key Words)』 (1976),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Marxism and Literature)』 (1977) 등이 있다.
– 역자 : 박만준
부산대학교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욕망과 자유의 변증법」이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동의대학교 철학문화윤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중문화와 문화 연구』, 『대중문화의 이해』,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등을 번역하였으며, 저서로는 『욕망과 자유』, 『늦잠 잔 토끼는 다시 뛰어야 한다』, 『사회생물학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공저) 등이 있다.

○ 출판사 서평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1970년대 들어 마르크스주의자 혹은 유물론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마르크스주의적 문화이론의 가능성을 본격 탐색해 간다. 그 구체적 성과가 ‘마르크스주의와 문학’이다. 이는 권력 구조의 문제를 소홀히 다룬 초기 문화 분석에 대한 수정이며, 문화의 사회적ㆍ정치적 문맥을 읽어 내고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 세력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통해 문화를 분석하는 그의 마르크스주의적 문화유물론의 탄생이기도 하다. 윌리엄스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직접적이면서도 다양한 접촉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1974년부터 1983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극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1988년 1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문화 연구에 끼친 윌리엄스의 영향은 엄청나다. 그의 연구 범위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는 문화 이론, 문화사, 텔레비전, 언론, 라디오와 광고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앨런 오코너(Alan O’Connor)의 참고 문헌 목록에 나오는 인쇄된 윌리엄스의 목록만도 39쪽에 이른다. 그의 기여는 그가 웨일스 노동계급 출신(그의 아버지는 철도 신호수였다)이라는 것과 또 학자로서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극과 교수였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더욱 놀랍다.
저서로는 ‘드라마와 공연 (Drama in Performance)’ (1954), ‘문화와 사회 (Culture and Society 1780 ∼ 1950)’ (1958), ‘장구한 혁명 (The Long Revolution)’ (1961), ‘입센에서 브레히트까지의 희곡 (Drama from Ibsen to Brecht)’ (1968), ‘시골과 도시 (Country and City)’ (1973), ‘주요 어휘들 (Key Words)’ (1976),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Marxism and Literature)’ (1977) 등이 있다.
‘장구한 혁명 (The Long Revolution)’에서 윌리엄스는 “문화의 정의에는 세 가지 일반적 범주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 “문화는 어떤 절대적 또는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인간이 완벽함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상태”다. 이 정의에 기반을 하는 문화 분석의 역할은 생활이나 작품 속에서 “영원한 질서를 구성하는 또는 보편적 인간의 상태와 연관을 갖는 가치들을 찾아내고 묘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널드와 리비스주의로부터 물려받은 정의이며, ‘문화와 사회’에서 그는 문화를 “현실적인 사회적 판단 과정 위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완충적이며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는 인간의 마지막 대법정”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정의는 ‘문서화된’ 기록들, 즉 기록된 텍스트와 실천 행위로 이루어진 문화다. 이 정의에서 문화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들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기록된 지적, 상상적 작업의 유기체”다. 여기서 문화 비평의 목적은 비판적 평가다. 이것은 ‘이상적인 것’을 다루는 분석과 유사한 형태를 띨 수 있으며, 결국 아널드가 말한 이른바 ‘인간 사고와 표현의 정수’를 찾아낼 때까지 비판을 통해 가려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문화를 해석적 묘사와 평가의 비판 대상으로 삼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도 수반할 수 있다. 끝으로 문화 분석은 문학적 평가의 기능보다는 좀 더 역사적인 면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문화 분석이 ‘역사적 기록’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그러하다.
세 번째로는 “문화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 문화는 특정한 삶의 방식에 대한 묘사”를 뜻한다. 이 마지막 정의가 문화주의의 출발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문화에 대한 ‘사회적’ 정의는 문화를 생각하는 세 가지 새로운 방식을 열어주었다. 첫째는 문화가 특정한 삶의 방식의 표현이라는 ‘인류학적’ 입장이며, 두 번째는 문화가 ‘어떤 의미와 가치의 표현’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문화 분석 작업이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특정한 문화에 내재되거나 표출된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일”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윌리엄스는 문화의 사회적 정의가 요구하는 분석이 “다른 정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전혀 ‘문화’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생활 방식의 갖가지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홀이 “전후 영국 지식인의 세계에서 맹아적 사건”으로 묘사한 ‘장구한 혁명’이라는 책은 결국 대중문화에 대한 반(反)리비스적 연구의 기반을 닦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개정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