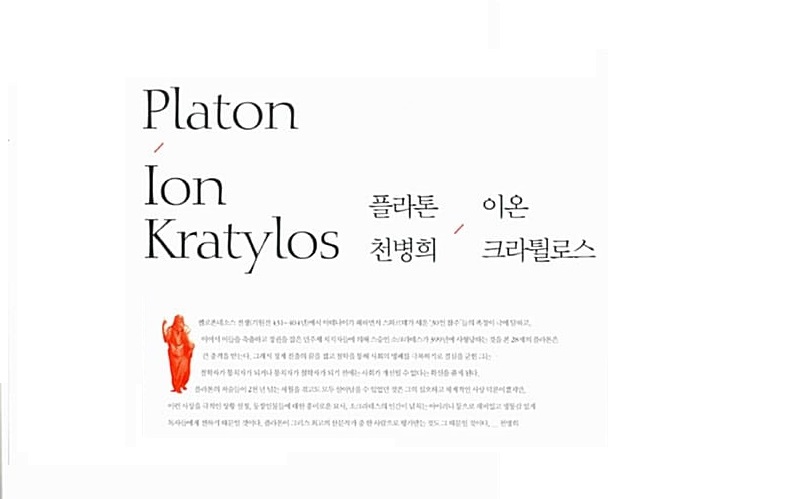서적소개
이온, 크라튈로스 (Ion, Kratylos)
플라톤 / 천병희 역 / 숲 / 2014.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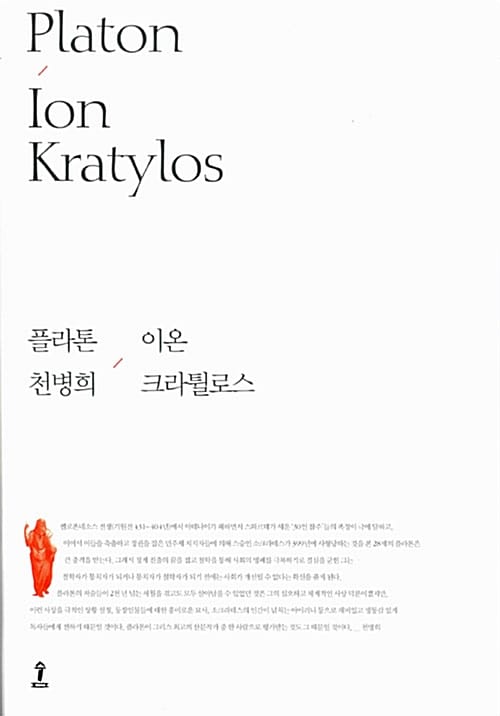
.원전으로 읽는 순수고전세계
플라톤이 그의 예술관을 피력한 대화편 ‘이온’과 그의 언어관을 피력한 ‘크라튈로스’를 그리스어로 원전번역하여 한 권으로 묶었다. ‘이온’은 국내에서는 처음 번역 소개된다.
‘이온’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음유시인 이온이 예술에 대한 능력을 주제로 삼아 논하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탐색하는 대화편이다.
‘크라튈로스’는 사물들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름은 그 대상의 본질과 상관없이 사회적 합의와 관습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헤르모게네스와 그와는 달리 사물은 자연의 본성에 따라 저마다 올바른 이름이 본래 따로 정해져 있으며, 그에 맞지 않다면 이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크라튈로스가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진행한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중재하거나 논박하며 사물의 이름에 관한 철학을 펼친다.
○ 목차
옮긴이 서문 4
주요 연대표 8
일러두기 10
이온Ion 11
크라튈로스Kratylos 43

○ 저자소개 : 플라톤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에 태어나 아테네가 그 전쟁에 패하는 현실을 보았다. 대내적으로는 여러 정변을 목격했고, 큰 기대를 가졌던 민주 정권 시기에는 그가 보기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정의로운 사람”인 소크라테스가 불경죄로 처형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한창나이에 가졌던 정치가의 꿈을 접고 아테네의 암울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이 철학자의 길이었다. 그는 현실과 무관한 이데아론으로 관념적인 사변의 세계에 빠져 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의 관심의 중심은 늘 현실에 있었다. 형이상학적인 이론들도 결국 현실을 근원적으로 통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의 정치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대화편으로는 《국가》와 《정치가》 및 《법률》을 꼽을 수 있다.
– 역자 : 천병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5년 동안 독문학과 고전문학을 수학했으며 북바덴 주정부가 시행하는 희랍어 검정시험(Graecum)과 라틴어 검정시험(Großes Latinum)에 합격했다. 지금은 단국대학교 인문학부 명예교수로, 그리스 문학과 라틴 문학을 원전에서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원전 번역으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 『로마의 축제들』, 아폴로도로스의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아이스퀼로스 비극 전집』,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전집』, 『메난드로스 희극』, 『그리스 로마 에세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투퀴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크세노폰의 『페르시아 원정기』, 플라톤전집,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시학』 등 다수가 있으며, 주요 저서로 『그리스 비극의 이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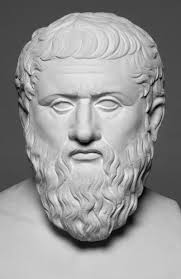
○ 출판사 서평
플라톤이 그의 예술관을 피력한 대화편 ‘이온’과 그의 언어관을 피력한 ‘크라튈로스’를 그리스어로 원전번역하여 한 권으로 묶었다. ‘이온’은 국내에서는 처음 번역 소개된다.
‘이온’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음유시인 이온이 예술에 대한 능력을 주제로 삼아 논하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탐색하는 대화편이다.
호메로스의 시에 정통한 음유시인 이온은 누가 다른 시인에 관해 논하면 집중력이 부족해 이렇다 할 발언도 하지 못하고 졸기만 한다. 반면 누가 호메로스를 언급하면 곧장 졸음이 가시고 정신이 집중되며 할 말이 많아진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시를 음송하는 힘은 전문기술(techne)을 습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석과 같은 어떤 신적인 힘, 즉 신적인 영감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시에 열중한 사람은 모두 제 정신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기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시인은 오로지 자석의 자력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시에 대한 영감을 부여받아 작시할 뿐이고, 시인이라는 존재는 자기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신에게 홀린, 신들의 대변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영감과 전문기술은 양립할 수 없으며, 시인들의 시가 가치 있다 해도 그들은 영감을 받아 작시(作詩)하는 만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신들린 상태에서 작시하는 것이라는 영감론(靈感論)을 주장한다. ‘이온’은 서양 최초의 예술론으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주어 ‘시학'(詩學)의 집필을 이끌었다.
그 돌(자석)은 무쇠 반지들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반지들에 힘을 나눠주어 반지들이 돌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지요. 그래서 이 반지들이 다른 반지들을 끌어당기니, 때로는 쇳조각과 반지들이 서로 매달린 채 긴 사슬을 이루지요. (중략) 하나의 힘이 다른 것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인간의 혼을 끌어당기는 것은 신이지요. — 본문 중에서
‘크라튈로스’는 사물들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름은 그 대상의 본질과 상관없이 사회적 합의와 관습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헤르모게네스와 그와는 달리 사물은 자연의 본성에 따라 저마다 올바른 이름이 본래 따로 정해져 있으며, 그에 맞지 않다면 이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크라튈로스가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진행한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중재하거나 논박하며 사물의 이름에 관한 철학을 펼친다.
먼저 소크라테스는 헤르모게네스와 대화하면서 사물들 자체는 분명히 자신들만의 확고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이름들이 아무렇게나 붙여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올바름을 지니고 있고, 이름들 자체가 이것을 증언하는 여러 이름들을 예로 들어 분석한다.
크라튈로스는 이름을 통해서 사물이 본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르친다고 말한다. 이름의 어떠함이 사물의 어떠함이라는 것을 알 때 사물도 알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맨 처음 이름들을 지은 사람이 사물들을 알고 이름 지었다고 주장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최초의 이름들이 아직 붙여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떤 이름들을 통해서 사물들을 배우거나 진리를 알아낼까? 하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부딪히면서 크라튈로스도 자신의 주장을 다시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물들 자체를 통해 배우고 탐구해야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동의하게 된다.
이름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 어떤 이름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닮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름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닮았다고 주장하니,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들 말고 다른 이름들에 의지할 수는 없네.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니, 우리는 분명 이름 말고 다른 뭔가를 찾아야 하네.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느 쪽이 참된 이름들인지 밝혀줄, 다시 말해 사물들의 진리를 밝혀줄 다른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말일세. —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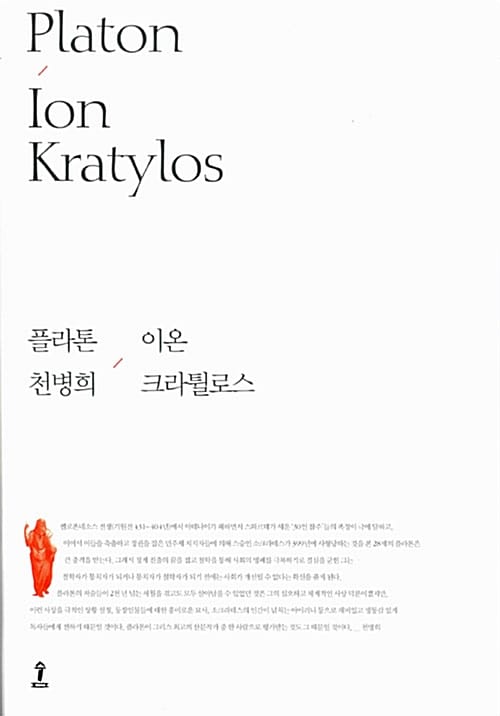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