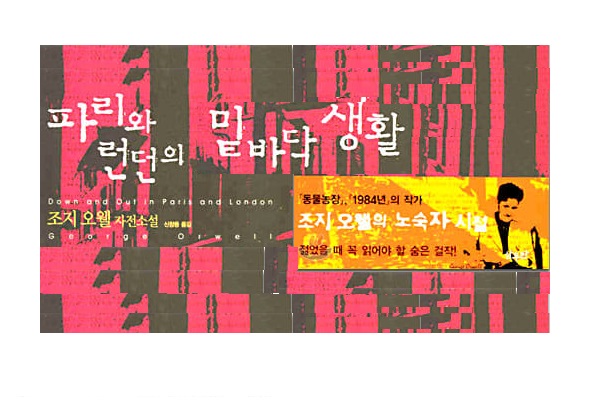서적소개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
조지 오웰 / 삼우반 / 2003.11
이 책은 오웰이 1928년부터 1932년까지 5년여 동안의 밑바닥 체험을 바탕으로 쓴 첫 작품이다. 1933년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으로 처음 출판된 이 작품은 ‘선데이 익스프레스’지에 ‘금주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아 당시 무명이었던 오웰이 작가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오웰은 파리 뒷골목의 싸구려 여인숙에서 머물며 경험했던 접시닦이 생활 등을 사실적이면서 유쾌하게 그리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당시의 억압 체제를 강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이 책을 소설이라 할 수 있을까. 르포문학이라 말하는 그런 것… 우리 나라의 80년대에는 르포문학이 성행하였다. 르포문학이 성행한 이유로 현실이 소설보더 더 소설적인 상황이었기에 그랬다는 얘기를 얼핏 읽은 적이 있다. 1920년대 말의 상황, 그 당시 상황도 그러했나 보다. 세계적인 경제 공항이 오고, 이에 따른 긴축의 책임이 하층 계급에 전가된 상황이 빚어내는 소설보다 더 소설적인 궁핍을 체험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내가 아는 조지 오웰은 反 자본주의, 反 스탈린주의로 요약하고 있었는데,,,, 몇 권의 조지 오웰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수정해야겠다는 느낌을 받는다. 조지 오웰이 끝까지 저항하고자 했던 것은 反 전제주의가 아니었을까 하고… 뭐가 되었던 직접 밑바닥 인생을 체험하고자 스스로 몸을 내던진 조지 오웰의 작가 정신 만큼은 기대 이상이다. 특정한 서사적 줄거리를 갖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읽는 내내 노동자, 하층민의 삶, 복지의 문제를 생각케 했다. IMF 시기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했지만 정작 허리띠를 졸라맨 이는 노동자 계급이었고, 그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며 위기로 빠뜨렸던,, 물론 지금도 그러하지만… 지금의 작태와 어찌 한 치의 변화도 없을까 싶어 역사의 더딘 변화에 씁쓸함을 느낀다. 제국주의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하층의 삶이 이 지경이었다면 식민지 민중의 삶은 말해 무엇할까.
○ 목차
1부 파리에서(1~23)
2부 런던에서(24~38)
옮기고 나서

○ 저자소개 : 조지 오웰(George Orwell, 본명: Eric Arthur Blair)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Eric Arther Blair. 1903년 6월 25일, 인도의 벵골 주 모티하리에서 하급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8세 때 사립예비학교에 들어갔으나, 이곳에서 상류층 아이들과의 심한 차별을 맛보며 우울한 소년시절을 보냈고, 장학생으로 들어간 이튼교에서의 학창시절 역시 계급 차이를 뼈저리게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1922년부터 5년간 미얀마에서 대영제국 경찰로 근무했으나 점차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껴 직장을 그만두고 파리로 건너가 작가수업을 쌓았다. 유럽으로 돌아와 파리와 런던에서 부랑자 생활을 하고 잠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거쳐 영국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조사 활동에 참여했다. 이때를 토대로 한 소설이 1933년의 첫 소설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생활』과 1935년『버마 시절』이다.
전체주의를 혐오한 그는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했는데, 그 체험을 기록한 1936년『카탈로니아 찬가』는 뛰어난 보도 문학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에는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을 우화로 그린 『동물농장』으로 일약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해 그는 아내를 잃고 자신도 지병인 폐결핵의 악화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그 와중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하여 전체주의의 종말을 기묘하게 묘사한 디스토피아 소설 『1984년』을 출간했다. 『1984년』은 전제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 놓인 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다가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 그 과정과 양상, 그리고 배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작품의 무대인 오세아니아는 전체주의의 극한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나라이다. 오세아니아의 정치 통제 기구인 당은 허구적 인물인 빅 브라더를 내세워 독재 권력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정치 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텔레스크린, 사상경찰, 마이크로폰, 헬리콥터 등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감시한다. 당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과 동시에 당원들의 사상적인 통제를 위해 과거의 사실을 끊임없이 날조하고, 새로운 언어인 신어를 창조하여 생각과 행동을 속박함은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까지 통제한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이런 당의 통제에 반발을 느끼고 저항을 꾀하지만, 오히려 함정에 빠져 사상경찰에 체포되고, 혹독한 고문 끝에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 ‘골드스타인’을 만났다고 자백하고, 결국 당이 원하는 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락한다.

『1984년』은 오웰을 20세기 최고의 영향력 있는 작가로 만들었다. 하지만 날로 악화되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작품을 발표한 이듬해인 1950년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조지 오웰은 지난 1999년 영국 방송 BBC가 조사한 ‘지난 1천 년간 최고의 작가’ 부문에서 셰익스피어, 제인 오스틴에 이어 3위에 선정되었다. 게다가 영문학에서는 ‘오웰주의’, ‘오웰주의자’라는 뜻의 Orwellism이나 Orwellian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을 정도이니, 이 정도면 그가 서양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주로 당대의 문제였던 계급 의식을 풍자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였으며, 또 일찍이 스탈린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거기서 다시 현대사회의 바닥에 깔려 있는 악몽과 같은 전체주의의 풍토를 작품에 정착시켰다. 그는 ‘나는 왜 쓰는가’라는 글에서, 글을 쓰는 이유를 “전체주의에 반대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자신의 글 중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쓴 글들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역자: 신창용

○ 출판사 서평
책에 소개되어 있는 조지오웰은 명무사립학교 이튼 스쿨을 졸업한 사람으로 처음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주 고급스러운 생활을 하였을것 같은 사람으로 느끼기 쉽다.
그러나 그는 파리에서 접시닦이를 하고 런던에서 부랑자 생활을 경험한 그야말로 밑바닥생활을 경험한 자였다.
파리에서 그의 생활은 그는 러시아 친구 보리스와 함께 일자리를 구하고 호텔 접시닦이로서 생활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는데 그 부분이 특히 재미있었고 작가의 예상치 못한 유머감각도 훌륭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일부러 혹은 불가피하게 파리와 런던에서 밑바닥 생활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작가는 밑바닥 생활 또한 나름 한 번쯤은 겪어도 무방한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았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생활을 매우 단조롭다고 표현하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반복되는 노동자의 생활은 짜증나기 보다는 오히려 반복되고 심지어는 지루할 수 있는 삶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삶에 적용해보자면 오히려 고소득의 직장인들의 삶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들 또한 반복되는 업무를 하고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나 고소득 직장인이나 업무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이나 성취감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노동자나 부랑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도 생기게 되었다. 이 책을 계기로 노동자나 빈민의 삶 또한 그들 각각의 생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또한 그들을 차별없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 언론소개
[화제의 책]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
‘동물농장’과 ‘1984년’의 작가로 유명한 조지 오웰의 첫 작품
노숙자와 부랑인, 접시닦이 등 사회 최하층 사람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이 작품은 오웰이 1928년부터 1932년까지 5년여 동안의 노숙자 시절의 밑바닥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소설로 그의 첫 작품이자 출세작이기도하다.
1933년 본명인 에릭 블레어 대신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으로 첫 출판된 이 작품은 ‘선데이 익스프레스’지에 금주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으면서 당시 무명의 오웰을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이 작품은 그가 파리 뒷골목의 싸구려 여인숙에서 머물며 경험했던 접시닦이 생활, 그리고 런던의 부랑자 생활 등을 사실적이면서도 유쾌하게 그리고 있으며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당시의 억압체제를 강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IMF이후 양산된 실직자들과 노숙자들이 최근 경기불황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고 사회 안정망은 여전히 미비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30년대 서유럽 사회의 밑바닥 계층을 다룬 이 작품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잖은 감동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_ 전자신문 (2003.12.12)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