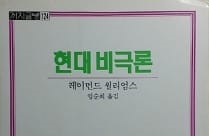서적소개
현대비극론
레이먼드 윌리엄스 / 까치 / 1997.3.7

비극개념의 역사성과 사회성, 현대 비극사상의 문제점, 비극개념의 변천을 살피고 입센에서 브레히트까지 실제 극작품과 소설작품들을 분석했다.
○ 목차
1. 비극의 개념
2. 현대 비극문화
<1> 자유주의 비극의 혁명, 입센과 밀러까지
<2> 스트린드 베리, 오닐, 텐시윌리엄스
<3> 톨스토이와 로렌스
<4> 체호프, 피란델로, 이오네스코, 베케트
<5> 엘리엇과 파스테르나크
<6> 카뮈와 사르트르
<7> 브레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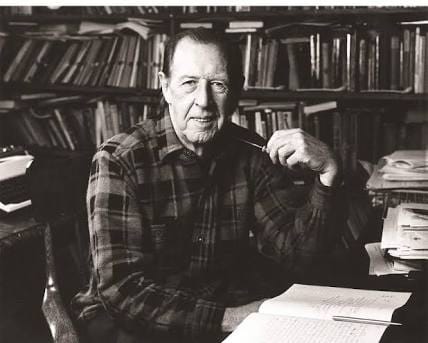
○ 저자소개 : 레이먼드 윌리엄스 (Raymond Williams)
1921년에 태어나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1974년부터 1983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극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1988년 1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문화 연구에 끼친 윌리엄스의 영향은 엄청나다. 그는 문화 이론, 문화사, 텔레비전, 언론, 라디오와 광고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앨런 오코너(Alan O’Connor)의 책의 참고문헌에 나오는 인쇄된 윌리엄스의 저작 목록만도 39쪽에 이른다.
그의 기여는 그가 웨일스 노동계급 출신(그의 아버지는 철도 신호수였다)이라는 것과 또 학자로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극과 교수였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더욱 놀랍다.
저서로는 『드라마와 공연 (Drama in Performance)』(1954), 『문화와 사회 (Culture and Society) 1780 ∼ 1950』 (1958), 『장구한 혁명 (The Long Revolution)』(1961), 『입센에서 브레히트까지의 희곡 (Drama from Ibsen to Brecht)』 (1968), 『시골과 도시 (Country and City)』 (1973), 『주요 어휘들 (Key Words)』(1976),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Marxism and Literature)』(1977) 등이 있다.

○ 출판사 서평
‘현대비극론’의 제1부는 비극개념의 역사성과 사회성, 현대비극사상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비극개념의 제안을 다루고 있다.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근대 자유주의 비극에 이르기까지 비극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파악하면서, 윌리엄스는 비극개념을 탈역사화, 보편화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제2부는 입센에서 브레히트까지의 실제 극작품과, 톨스토이에서 카뮈, 사르트르에 이르는 소설작품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자유주의 비극의 전형적인 주인공인 비극적 영웅이 어떻게 현대비극에서 희생자로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추적하면서, 현대에 사적 비극의 형식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 역사적 조건을 논한다.
○ 희·비극의 기원과 역사
비극(悲劇, 영: Tragedy, 고 그: τραγῳδία)은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재(題材)로 하고 주인공의 파멸, 패배, 죽음따위의 불행한 결말을 갖는 극 형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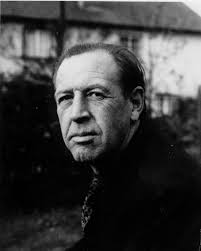
– 고대의 비극
고대 그리스에서의 희극 및 비극 등의 기원은 기원전 2,000년에 크레타 섬이나 미케네 등을 중심으로 개화한 에게 해 문화의 농경제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봄이면 풍요를 기원하고 가을에는 결실을 감사하는 해마다의 연중행사에서 연극적인 시도가 생겨났음은 다른 모든 문화에서도 볼 수 있는 바이다.
즉, 고대의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도 자연의 영위나 신의 배려가 자기들 인간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각지의 위정자나 농민들이 일체가 되어 제신에게 바치는 기도·무용·설화 등이 후세에 연극을 육성시키는 모태(母胎)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리스인의 전승에 의하면 가장 오랜 ‘오르케스타라’는 공장(工匠) 다이다로스에 의해서 아리아드네(후에 디오니소스의 아내)를 위해 크레타섬 크노소스에 만들어졌다고 하며, 또한 인간의 얼굴을 본뜬 상당히 사실적인 가면(假面)은 슐레이만이 미케네의 왕궁 분묘에서 발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의 고전기(古典期) 아테네에서 완성된 희극·비극에서도 기도나 무용, 설화나 배우의 가면 사용, 또는 극장 내에서의 제단이나 극장이 자리잡은 성역 등, 연극을 내외에서 지탱하고 있는 형식적인 여러 요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도 매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제사적 기원을 짐작할 수 있다.
제사에서 움튼 연극의 싹은 미케네 문명의 붕괴나 그 뒤에 엄습한 소위 암흑시대에도 여전히 생장을 거듭했을 것이다. 그 후 호메로스의 영웅 서사시가 삶에 깃들인 극적인 기복(起伏)에 표현을 주었고, 또한 각지의 서정시인들이 제사에서의 기도나 길흉의 이야기 등을 중핵(中核)으로 하여 고도로 문학적인 합창시(合唱詩)를 만들게 된 뒤부터 신이나 영웅을 본뜬 제사적인 영위도 또한 새로운 생명과 그 표현에 치중한다.
후세에 와서 비극의 발생사(發生史)를 돌아본 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詩學)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로부터는 1편의 비극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며, 또한 비극은 디튀람보스(說話敍情詩)의 지휘자로부터 생겨났다고 말한 바 있거니와, 이것을 바꿔 말하면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영웅 아킬레스로 하여금 집념으로 시작되고 체념으로 끝나는 비극의 내면적 구조를 분명히 하였으며, 서정시의 독창자들에서 필요한 표현형식을 개척하며, 앞으로 다가올 극작가들의 선구가 되었다고 하겠다.
초기의 극작 시도는 기원전 6세기를 통하여 코린토스, 시큐온 등 펠로폰네소스의 문화적 중심지나 남이탈리아의 시칠리아 등 각지에서 활발하였으며, 특히 아티카(Attica)의 마을 이카리아 출신의 테스피스의 이름이 아티카 비극의 시조로서 전해지고 있다. 그 활약연대는 솔론 시대(B.C. 590년경)라고도 하고, 페이시스트라투스 시대(B.C. 530년경)라고도 한다. 그리고 솔론의 시에는 후에 아이스킬로스 비극의 모랄을 형성하는 망집(妄執)과 파멸의 인과라고 일찍부터 불리고 있었다. 또한 페이시스트라투스의 시대에는 처음으로 아크로폴리스의 남쪽 벼랑에 극장의 초석이 깔려 있었음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무튼 기원전 6세기의 연극적인 시도는 주신 디오니소스를 중심으로 한 마을축제 여흥의 전통에 약간의 문학적·연기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었으리라. 관객들이 자리잡은 좌석도 목제의 초라한 벤치로, 오래되면 부서질 염려도 있었다.
당시 여러 마을이나 수도 아테네에서 융성해진 서사시의 경연이나 여러 가지 합창시의 경연 가운데에서 대두한 비극·희극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다른 여러 장르에는 없는 휴포크리테스(배우)의 등장이라 하겠다. 비극의 경우에는 합창대에서 천으로 만든 가면을 쓴 배우가 나타나, 이야기의 주역이 될 신이나 영웅, 미녀 또는 중대한 일을 예지하는 사자(使者) 등의 역할을 맡으며 합창대와 대사를 주고받고는 서로 노래를 맞춰보기도 한다.
현존하는 바큐리데스의 작품 <테세우스>는 기원전 5세기 중엽의 작품으로서 테스피스 등이 연출했던 초기 극시(劇詩)의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초기의 희극은 처음보다 즉흥적인 아마추어 연극의 색채가 짙었기 때문인지 배우의 수가 제한되지 않았던 모양이나 비극의 배우는 작가이기도 하고 연출가 또는 작곡가이기도 하여, 연기뿐만 아니라 독창의 기술도 갖고 있어야만 했다. 말하자면, 좌장(座長)으로서의 재능이 테스파스 등의 창시자에게는 필요했던 것이다.
아무튼 비극배우의 출현으로 관객의 흥미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초점을 발견한 것만은 분명하며, 또한 작가=배우의 입장에서도 이 새로운 가능성의 개발에 온갖 힘을 기울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클라이맥스를, 갈등을, 인간을 어떻게 해서 신화전설로부터 파악해 내어 재연할 수 있느냐’는 것이야말로 비극의 창시기로부터 완성기에 이르기까지의 약 1세기 간에 걸쳐 작가와 연기자가 몇 세대를 두고 직면했던 문제이다.
아테네에서의 희극과·비극의 상연은 또한 레나이온 극장에서도 열렸으며 여기서도 기원전 440년경부터 디오니소스 극장에서와 거의 같은 제작제도가 민주주의 국가와 부유시민들의 협력으로 유지되었던 모양이다. 이와 같은 제작체제가 희극과 비극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부정할 수 없다. 여러 신구 가치의 공존과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는 이 사회가 연극적 표현에서 추구한 것은 주역의 독백연기가 자아내는 도취가 아니라 각각의 입장을 지킨 ‘주역들’의 주장이 자아내는 긴장과 해결이었다. 그리스 비극이 대시인인 아이스킬로스를 통하여 두 인간의 대화극(對話劇)으로 변용을 보인 근본적 이유를 거기에서 볼 수 있다. 이리하여 드라마가 만들어내는 주장과 주장의 갈등은 아이스킬로스의 비극에서는 다시 고차원(高次元)의 예지, 즉 신의 간섭을 기다리며 해결에 이른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오면 두 인간이 자아낸 대립을 신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즉 제3의 배우의 등용으로써 무대 위에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옮겨진다. 다시 말해서 소포클레스(Sophokles)에 의한 3자대화(三者對話)의 극적 완성이 그 성과인 것이다. 대화의 탄생에서 3인 대화의 완성으로 그리스 비극은 형태와 내용의 완성을 이룩하나 이 사이의 대화 기교란 놀랄만큼 정교하며, 특히 주목할 점은 치밀한 대화가 새겨내는 개개 인물의 성격 발견이라고 하겠다. 이리하여 오이디푸스나 안티고네, 또는 히폴리토스 안에서도 우리는 그 인물이 아니고는 발견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의 짜임새가 그대로 드러난 인간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 중세의 비극 : 현대비극론에 의하면
중세의 비극들은 흔히 하나의 일반적 법칙이 작용된 본보기들을 모아 놓은 것이며, 그것들의 중심어는 ‘운명’이다.
운명에 대한 논쟁,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숙명, 운수, 우연, 섭리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개념들에 대한 논쟁은 고전세계로부터 중세세계까지 오랜 세기동안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운명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임의적인 것이었고, 인간 세계 밖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중세의 감정구조로서 이러한 운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시의 기독교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바로 중세적 감정구조의 근원이다.
신에게 우연이란 없으며,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예정해 두고 있는 기독교적 사유 체계 아래에서는 그러므로 개인은 운명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의 비극 개념에서부터 중세의 비극개념에 이르기까지 신분이 강조되는 것을 볼 때, 외견상의 비극개념의 연속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일반적 상황을 계속 언급하는 연속성과는 달리, 이 외견상의 연속성은 사실은 역행적인 연속성이다.
그리스 비극에서 극적 액션은 지배층 가계들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 가계들은 그것들이 과거의 전설시대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신들과 인간들의 중간인 ‘영웅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럴 때 신분과 영웅적인 위대성은, 액션에 일반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공적이면서도 형이상학적인 조건이었다.
– 근•현대의 희비극(喜悲劇)
희비극(喜悲劇)은 비극과 희극을 융합시킨 작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셰익스피어의 시대부터 19세기에 걸친 영문학은 해피 엔딩을 수반한 비극을 포함한 연극을 의미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