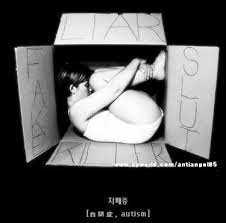자폐증, 자기 세계에 갇힌 아이들과 함께 걸어 나가기
유아기 3세 이전 치료가 중요!
– 자폐증상은 대부분 만 3세 이전에 나타나
– 만 3세가 넘어 자폐증상과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도 자폐증이라 보기 어려워
 4월 2일은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ay)
4월 2일은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ay)
매년 4월 2일은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ay)이다. 이날은 유엔(UN)이 자폐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 진단과 적절한 개입 및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7년 12월 18일 UN총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선언되었다. 증가하는 자폐증 발생률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가 바탕이 되는 이 결의안은 UN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건강관련 날 3일중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수천만명이 영향받는 전반적 발달장애인 자폐증에 대한 인식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결의안이 격려하는 것은 참여한 모든 국가에서 자폐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조기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은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자폐증(自閉症)이란?
자폐증은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이해능력에 저하를 일으키는 신경발달 장애를 뜻한다. 이 증상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정서적인 원인이 아닌 유전적 발달 장애로 추측하고 있다.
자폐증이라는 뜻의 영어 ‘autism’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자신’을 뜻하는 ‘αυτος’(autos)에서 유래된 말로, 오이겐 블로일러(Eugen Bleuler)라는 정신과 의사가 1912년에 ‘미국 정신 이상 잡지’에 게재한 글에 처음 쓰였다.
이 병을 명확히 분류한 사람은 존 홉킨스 병원의 레오 칸너 박사이다. 그는 194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두드러진 공통적 행동을 가진 11명의 유아 환자들을 기술했고, 이들의 증상을 조기 영아 자폐증이라고 이름 붙였다.
비슷한 시기에, 한스 아스퍼거라는 오스트리아 과학자가 다른 종류의 자폐증을 발견하였다. 이 증상은 현재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스퍼거의 업적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하여 널리 알려지지 못했고 그의 논문은 50년 가까이 지나서야 영어로 번역되었다.
현재 이 두 증후군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IV-TR)에서 다섯 가지의 전반적 발달장애 중 두 가지로 분류한다.
분류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급하는 자폐증은 전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혹은 ‘자폐 범주성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라고 부르며, 이 장애는 학계에서 3가지 정도로 나뉘어 논의된다. 첫째로는 레오 카너가 정의한 아동을 부르는 ‘자폐증, 카너 증후군’(Autism; Kanner’s Syndrome), 둘째로는 한스 아스퍼거가 논의한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s Syndrome),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번트 증후군’(Savant Syndrome)을 포함한 고기능성 자폐증(High Functional Autism)이다. 다만 서번트 증후군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장애는 아니며, 고기능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이 서로 구분이 가능한 정신질환인지의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
환자 개개인의 자폐증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고 의사들은 어떠한 증상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때가 많다. 이러한 원인은 대부분 자폐증 환자들의 감각 기관이 일반인의 기관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개개인의 감각 차이가 다 달라 일정한 치료 방식이 모든 자폐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폐증은 잘만 관찰하면 비교적 쉽게 장애 유무를 알아낼 수 있다. 중증의 자폐증은 일반 아동과 현저한 성장발달의 차이를 보인다.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경증의 자폐증도 부모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아내기가 어렵지 않다.
자폐증상은 대부분 만 3세 이전에 나타난다. 자폐증상과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도 만 3세가 넘어서는 나타나지 않으면 자폐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사회성의 결핍: 성장하는 내내 자폐증 아동은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갓난아기 때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아기는 때가 되면 자기을 안아주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말은 못하지만 의사소통을 하려고 눈빛과 몸짓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자폐아는 눈도 맞추지 않고, 때가 되어도 옹알이를 하지 않는다. 또 부모나 형제, 친구와 함께 어울리지를 않는다. 혼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거나, 놀이를 할 때도 혼자 한다. 부모가 앉아주면 뿌리치거나 어정쩡하게 안겨 있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② 무표정: 정상적인 아이는 표정이 살아 있다. 좋으면 활짝 웃고, 싫으면 찡그리거나 울음으로써 의사를 표시한다. 그러나 자폐아는 얼굴에 표정이 없다. 따라서 주위사람이 그 아이의 감정을 읽지 못한다.
③ 부모의 목소리에 무반응: 대부분의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면 표정이 달라진다. 그러나 자폐아는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가만히 자신의 할 일에 열중하고 있거나 무표정으로 일관한다. 이런 이유로 아이가 귀머거리라고 생각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④ 말을 제대로 못함: 대부분 생후 18-24개월 경이 되면 간단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폐아들은 만 3세가 지나도 말을 못하며, 엄마 아빠 등 아주 간단한 단어 몇 개만 겨우 구사할 수 있다. 만 5세가 되어도 3세 정도 수준의 언어 구사를 하며,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기차가 간다”라고 말을 했으면, 계속 “간다, 간다”는 말을 무의미하게 반복한다. 또 주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
⑤ 특정 물건에 집착: 특별한 색, 특별한 장난감, 특별한 장소 등을 꼭 집어서 그것만 좋아한다. 집에 가더라도 한 길로만 가려고 하며, 특정한 인형만 너덜너덜 해지도록 들고 다닌다. 또 보도블럭의 특정한 선을 따라서 가려고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불안해 한다.
⑥ 특정 분야에서는 천재: 흔히 자폐아를 ‘바보천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자폐아들이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보이기 때문이다.
⑦ 괴성을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 자폐아는 사회성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주위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 자기 뜻대로 안되었을 때나,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그대로 바닥에서 뒹굴고, 울면서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른다. 주변 사람을 때리거나 할퀴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의 팔을 물거나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의 자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⑧ 반복적인 행동: 몸을 앞뒤로 지속적으로 흔들거나, 손을 이상하게 뒤틀리듯이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을 ‘상동증’이라고 하는데, 자폐아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뇌의 전두엽 이상으로 발생한다.
자폐증의 주요원인
1943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정신과 주임교수였던 레오 카너는 유아기 자폐증 원인을 ‘애정이 없는 엄마’라고 규정지었고, 얼마 전까지 그것이 자폐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엄마의 육아태도는 반응성 애착장애 등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자폐증의 원인은 아니라는 의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폐증의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의학적인 질환: 10-15%의 자폐증 환자가 의학적인 질환이 원인이 되어 자폐증상이 나타난다. X염색체 이상, 선천성 대사질환, 간질, 감염성 질환(헤르페스 뇌염, 선천성 풍진)등이 대표적인 의학적 질환이다. 일상적으로 자폐아의 25~30%가 간질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유전적 요인: X염색체에 존재하는 FMR-1이라 불리는 유전인자의 이상으로 자폐증이 발생되기도 한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폐증의 2.5-5%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외 염색체 9, 15, 16번 등과 연관된 유전질환으로서 정신지체를 동반하는 자폐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폐아의 형제, 자매들 중에는 약 12-20% 정도가 가벼운 형태의 인지기능 장애나 사회성 부족 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일란성 쌍생아 중 한쪽 아이가 자폐인 경우, 다른 한쪽 아이는 90% 이상이 심하지 않은 정도의 인지기능과 사회성 등에 문제점을 보인다. 자폐아가 있는 가정에서 다른 자녀가 자폐증에 걸릴 확률은 5%이상이고, 자폐아의 직계가족에서 정서장애인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사회공포증도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뇌의 이상: 1980년대 후반부터 소뇌의 이상으로 자폐증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현재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뇌의 전두엽, 측두엽 부분의 이상이 자폐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④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자가면역기능 이상이 초래되어 뇌의 영항을 주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자폐증으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자폐증의 치료
자폐증 치료의 의미는 더 심화시키지 않으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폐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특수교육을 받으면 5-10%는 정상인과 비슷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25%는 부분적인 독립생활이 가능하다. 치료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되도록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① 언어치료: 자폐증 주요 증상 중의 하나가 언어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어치료사가 언어치료적 환경을 만들어주며, 부모에게도 교육을 시켜 가정에서도 언어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작업치료: 자폐아는 감각전달기능의 이상으로 소리, 빛, 시각적 자극, 촉각 등에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반대로 너무 무감각하게 반응한다. 정상적인 감각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감각통합훈련 등의 치료를 한다.
③ 놀이치료: 자폐아는 사회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놀이치료를 통해 사회성 결핍을 치료한다.
④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그림 그리기, 만들기, 치료를 위한 음악 듣기 등을 통해 치료한다.
⑤ 정신약물치료: 자폐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은 없다. 그러나 공격적인 행동이나 자해행위 등의 조적이 안되거나 집착증, 반복적인 강박증 등의 행동은 그대로 놔두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자폐아들은 어릴 때는 과다행동, 자극에 대한 민감 등이 두드러지고, 커가면서 공격성과 자해행동이 심해진다.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우울증이나 강박증상이 생긴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지능지수가 비교적 높은 경우에 나타난다. 자폐아 75%가 IQ 70이하인 정신지체를 동반한다. 나머지 25%는 비교적 인지기능이 높아서 자신이 다른 아이와 틀리다는 것을 느끼며, 이러한 인식이 우울증과 강박증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들이 중독, 습관성 등 약물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로 치료를 거부한다. 그러면서 별 효과가 없는 비싼 한약이나 민간약재를 복용시키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좋은 약물들이 개발되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에듀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