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6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의 서양 고전 음악 작곡가 “음악의 신동”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1756 ~ 1791) 출생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독: Wolfgang Amadeus Mozart, 1756년 1월 27일 ~ 1791년 12월 5일)는 오스트리아의 서양 고전 음악 작곡가이다.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본명: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출생: 1756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사망: 1791년 12월 5일 (35세), 오스트리아 빈
.국적: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직업: 작곡가, 피아니스트, 오르가니스트 / 장르: 서양 고전 음악
.악기: 피아노, 하프시코드, 바이올린 등
.활동 시기: 1761년 ~ 1791년
.배우자: 콘스탄체 모차르트
.부모: 부) 레오폴트 모차르트, 모) 안나 마리아 모차르트
.형제: 누나) 마리아 안나 모차르트, 장남) 카를 토마스 모차르트, 차남) 프란츠 크사퍼 볼프강 모차르트
.종교: 로마 가톨릭교회

○ 생애 및 활동
궁정 음악가였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에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고, 그 후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아들로 잘 알려진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에게 작곡법과 지휘를 배웠다.
그는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명으로 여겨지며 3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교향곡, 오페라, 협주곡, 소나타를 작곡했다.
오늘날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널리 존경받고 있다.

– 출생과 성장
1756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출생 직후 가톨릭 성당에서 세례명은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 볼프강구스 테오필루스 모차르트 (라: Johannes Chrysostomus Wolfgangus Theophilus Mozart)였다. 흔히 알려진 중간 성명인 아마데우스 (독: Amadeus)는 세례명 중간 성명의 그리스어 어원 테오필루스 (Theophilus)를 라틴어로 바꾼 것이다.
아버지인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 궁정 관현악단의 음악 감독이었는데, 볼프강의 누나인 나네를을 어려서부터 가르쳤다.
전한 바에 따르면, 볼프강은 세 살 때부터 누나를 보고 스스로 건반을 다루고 연주하는 법을 터득했다고 한다.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어린 아들의 재주를 알아보았고, 볼프강에게 직접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쳤다.
나네를 뮤직북에 쓴 레오폴트의 기록에 따르면, 어린 볼프강은 네 살 때 여러 곡을 배웠으며 다섯 살 때 이미 작곡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어린 모차르트의 작곡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서 그를 시험하기도 하였지만, 모차르트는 그 사람들에게 뛰어난 작곡 실력과 재능을 보였고, 사람들은 비로소 모차르트를 믿기 시작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아버지 레오폴트의 교육열은 대단하였는데, 특히 6세 때 뮌헨으로 데려가면서 유럽 각지로 연주 여행을 보내 여러 작곡가와 교류하고 배우게 하였다.
1763-1766까지 독일 여러 도시는 물론 파리, 런던 등을 돌며 많은 작곡가와 교류한 서유럽 일주는 모차르트에게 부담과 동시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1764년에서 1765년 사이 영국 런던에서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에게 작곡 등 배우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후 모차르트는 수차례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음악을 공부하였는데, 마르티니에게서 음악이론을 배운 것을 비롯해 다양한 교향곡과 오페라를 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어머니 안나 마리아 모차르트와 함께 한 여행에서 만하임, 파리 등을 다니며 여러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어릴 때부터 여러 대도시와 궁정에서 연주를 보인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에 머물며 궁정음악가로 활동하였었으나 그의 자유분방한 성격은 궁정과 여러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대주교와의 불화를 계기로 1781년 빈으로 떠나 이후 죽을 때까지 이곳에 머무른다.

그곳에서 콘스탄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 모차르트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782년 결혼을 성사시켰다.
일부 문헌에 따르면,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생활하던 1784년에 루트비히 판 베토벤과도 만났다.
그는 어려운 집안사정에도 자신을 찾아온 베토벤을 반갑게 맞이하였는데, 이 때 베토벤의 나이는 불과 14세였다.
모차르트는 베토벤이 자신의 곡을 즉흥적으로 또 다른 작품으로 훌륭히 소화하자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교육비를 일절 거절하고 베토벤을 가르치는데 전념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베토벤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자 모차르트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빈을 갑작스럽게 떠났다.
만난 지 불과 한 달만의 일로 이것이 두 거장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베토벤이 다시 오스트리아 빈에 찾아온 것은 1792년의 일로 그 때는 모차르트가 죽은지 1년이 지난 후였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전거는 오토 얀이 저술한 모차르트의 전기가 유일하므로, 오늘날에는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만났다는 일화에 대한 신뢰성은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초안을 하지 않는 천재”라고 미화되어 있지만, 사실 자필 악보에는 완성 · 미완성 곡을 포함하여 초안 및 수정의 흔적이 꽤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종종 스케치와 초안을 만들었지만, 베토벤과는 달리, 그의 아내가 그의 죽음 후에 그것들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보존되지 않았다.

– 죽음
모차르트의 죽음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수많은 전설을 비롯하여 학설이 많다.
낭만적인 주장으로는 모차르트의 건강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의 모습과 작품들 역시 다가오는 죽음과 함께 쇠퇴하였다는 것이 있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해가 그에게 성공적이었으며, 그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충격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의 죽음이 급작스러웠다고 주장한다.
그의 죽음의 원인 또한 추측이 무성하다. 기록에는 그가 “무수히 난 좁쌀만한 발열” (“hitziges Frieselfieber”)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대의학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사인에 대한 학설 중에는 선모충병, 중독, 류머티스열, 덜 익힌 돼지고기에 의한 식중독 등이 있다. 환자의 피를 뽑았던 당시의 의술도 모차르트의 죽음을 앞당기는 데에 이바지했다고 본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1791년 12월 5일 오전 0시 55분경에 사망핶다.
아내 콘스탄체는 모차르트가 완성하지 못한 작품 레퀴엠의 완성을 여러 제자에게 맡겼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하다가 결국 프란츠 크사버 쥐스마이어 (Franz Xaver Süssmayr)가 완성했다.
모차르트가 가난과 무관심 속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흔하나, 그에게는 나름 만족할 만한 수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 예컨대 모차르트는 체코 프라하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꾸준한 작곡 의뢰를 받기도 했다.
그가 말년에 전성기 때만큼의 명성을 누리지는 못했던 근거로 돈을 꿔 달라고 쓴 편지가 들리기도 하지만 또 통설에 의하면 이는 단순히 수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차르트의 방탕함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실례로 모차르트가 입은 옷은 보석들로 치장된 화려한 의상이었으며 도박으로 돈을 낭비하기도 했다고 한다.
모차르트는 죽은 후 빈 외곽의 성, 마르크스 묘지에 묻혔다. New Groove에 따르면 그가 여러 사람과 함께 묻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가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빈의 중산층의 일반적 장례 풍습대로였다.
묘비가 나무였던 것 또한 당시 오스트리아 빈 중산층의 흔한 장례 풍습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당시 빈에서는 화려한 장례가 엄격히 금지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장례식 날 비가 오고, 천둥이 쳤다고 하나 동 출처에 따르면 사실은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이었다고 한다.
현재 모차르트의 무덤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것은 성 마르크스 묘지가 더 많은 묘지를 수용하기 위해 이장을 거듭하였기 때문이다. 아내 콘스탄체 모차르트는 남편이 죽은 후 추모 음악회, 미발표 작품의 출판 등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였다.
1809년 그녀는 덴마크 출신의 외교관이던 게오르크 니콜라우스 폰 니센 (Georg Nikolaus von Nissen)과 재혼했다. 그들은 덴마크로 이주했다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돌아와 여생을 마감했다.
콘스탄체와 새 남편은 모두 모차르트에 대한 전기를 남겼다.

○ 음악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여러 장르의 많은 음악 작품을 남겼다.
그의 많은 작품 가운데 특히 오페라, 피아노 협주곡, 교향곡, 그리고 현악 사중주와 현악 오중주 작품들이 유명하다. 모차르트는 또 피아노 솔로와, 여러 형태의 실내악, 미사곡 및 여러 종교 음악, 무곡들, 디베르티멘토 등도 작곡했다. (“K.” 쾨헬 번호/교향곡(1번-41번), 피아노 협주곡(1번-27번, 일부 초기 작품은 제외)
– 교향곡
모차르트는 1764년부터 1788년까지 24년의 기간 동안 여러 교향곡을 작곡했다. 가장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모차르트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41개보다 훨씬 많은 총 68곡의 완전한 교향곡을 작곡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마지막 세 교향곡이라고 하면 교향곡 번호 39번, 40번과 41번을 지칭한다. 일부 교향곡(K. 297, 385, 550)은 초판 이후 모차르트에 의해 수정되기도 했다. 이탈리아 서곡 형식 (세악장 : 알레그로 – 안단테 – 알레그로) 일부만 미뉴에트 포함
교향곡 1번 E flat 장조, K. 16
교향곡 2번 B flat 장조, K. 17
교향곡 3번 E flat 장조, K. 18
교향곡 4번 D 장조, K. 19
교향곡 5번 B flat 장조, K. 22
교향곡 6번 F 장조, K. 43
교향곡 7번 D 장조, K. 45
교향곡 8번 D 장조, K. 48
교향곡 9번 C 장조, K. 73 (1773)
교향곡 10번 G 장조, K. 74
교향곡 11번 D 장조, K. 95
교향곡 12번 G 장조, K. 110
교향곡 13번 F 장조, K. 112
교향곡 14번 A 장조, K. 114
.잘츠부르크 시기의 교향곡 (1772년-1781년)
이 교향곡들은 보통 “초기” (1772년-1773년)나 “후기” (1773년-1775년) 교향곡으로 나뉘거나, 가끔은 “독일식” (미뉴에트를 포함) 또는 “이탈리아식” (미뉴에트 없음)으로 나뉜다. 이 곡들은 모차르트의 생전에 출판된 적이 없다. 이탈리아 서곡 형식의 세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 디베르티멘토 세 작품 (K. 136-138)들은 비록 “교향곡”은 아니지만 “잘츠부르크 교향곡”으로 불리기도 한다.
교향곡 15번 G 장조, K. 124 (1772년)
교향곡 16번 C 장조, K. 128 (1772년)
교향곡 17번 G 장조, K. 129 (1772년)
교향곡 18번 F 장조, K. 130 (1772년)
교향곡 19번 E flat 장조, K. 132 (1772년)
교향곡 20번 D 장조, K. 133 (1772년)
교향곡 21번 A 장조, K. 134 (1772년)
교향곡 22번 C 장조, K. 162 (1773년)
교향곡 23번 D 장조, K. 181 (1773년)
교향곡 24번 B flat 장조, K. 182 (1773년)
교향곡 25번 g 단조, K. 183 (173d B) (1773년)
같은 g 단조인 40번 교향곡에 비교해서 “작은 g 단조 교향곡”으로도 불린다.
교향곡 26번 E flat 장조, K. 184 (1773년)
교향곡 27번 G 장조, K. 199 (1773년)
교향곡 28번 C 장조, K. 200 (1774년)
교향곡 29번 A 장조, K. 201 (1774년)
교향곡 30번 D 장조, K. 202 (1774년)
.후기 교향곡 (1781년-1791년)
교향곡 31번 D 장조 “파리”, K. 297 (1778년) : 모차르트는 그의 능력에 어울리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1778년에 파리에 도착한다. 비록 그 목적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는 소위 “파리 교향곡”을 작곡하게 된다.
교향곡 32번 “이탈리아 형식의 서곡” G 장조, K. 318 (1779년)
교향곡 33번 B flat 장조, K. 319 (1779년)
교향곡 34번 C 장조, K. 338 (1780년)
교향곡 35번 “하프너” D 장조, K. 385 (1782년) ; 모차르트가 결국 빈으로 이사한 후에 작곡한 곡이다. 원래는 하프너 家(“하프너 세레나데, K.249″를 의뢰했었음)를 위한 세레나데로 쓰여진 곡이었다. 미뉴에트와 마치 한 악장을 뺌으로서 교향곡 형식으로 만들었다.
교향곡 36번 “린츠” C 장조, K. 425 (1783년) : 모차르트가 린츠에 방문했을 때 작곡한 곡이다.
교향곡 37번 G 장조, K. 444 (1784년) : 오랫동안 모차르트 교향곡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후대의 학자들은 이 곡이 실제로는 미하엘 하이든이 작곡했고, 모차르트는 서주부만 작곡한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 이 곡은 미하엘 하이든 교향곡 25번으로 분류된다.
교향곡 38번 “프라하” D 장조, K. 504 (1786년) : 프라하에서의 행복한 시절을 보낸 후 빈에서 작곡한 곡이다. 이전의 모차르트 교향곡보다 개념적으로 진보했으며, 연주하기 어려운 곡이다.
교향곡 39번 E flat 장조, K. 543 (1788년) : 40번과 41번 교향곡과 더불어 “후기 3대 교향곡”으로 불린다. 이 세 교향곡은 모차르트의 생전에 출판되지는 못했었지만, 하나의 작품(opus)으로 출판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한 곡 또는 그 이상이 1789년 라이프치크에서 연주되었을 것이다. 세 곡 가운데 이 39번 교향곡이 가장 덜 알려졌고, 덜 연주된다.
교향곡 40번 g 단조, K. 550 (1788년) : 같은 g 단조인 25번 교향곡에 비교해서 “큰 g 단조 교향곡”으로도 불린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널리 연주되는 곡이다. 두 번째 개정판에서 클라리넷이 추가되는 등, 관악기의 우아한 편성이 주목된다. 모차르트가 10살 때 작곡했다고 하지만 가짜일 수 있는 교향곡 a 단조 “Odense”(K.16a)를 제외하면 25번 교향곡과 이 40번 교향곡만이 모차르트가 작곡한 단조 교향곡의 전부이다.
교향곡 41번 “쥬피터” C 장조, K. 551 (1788년) : 첫 번째 악장에서의 트럼펫과 팀파니의 두드러진 사용이 특징이다. 마지막 악장의 네 음표로 이뤄진 동기는 모차르트에 의해 자주 사용되었다. 마지막 악장은 소나타 형식을 따라 다섯개의 기본적인 주제가 대위법으로 전개되는 “코다”로 마무리된다. “쥬피터”라는 별칭은 모차르트가 붙인 것이 아니며 영국의 요한 페터 살로몬이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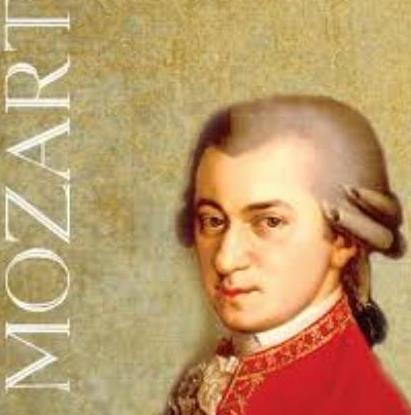
– 협주곡
모차르트는 여러 악기들을 위한 많은 협주곡들을 작곡했다.
.피아노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1번 F 장조, K. 37
피아노 협주곡 2번 B flat 장조, K. 39
피아노 협주곡 3번 D 장조, K. 40
피아노 협주곡 4번 G 장조, K. 41
피아노 협주곡 5번 D 장조, K. 175
피아노 협주곡 6번 B flat 장조, K. 238
세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7번 “로드론” F 장조, K. 242
피아노 협주곡 8번 “뤼초우” C 장조, K. 246
피아노 협주곡 9번 “주놈” E flat 장조, K. 271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10번 E flat 장조, K.365
피아노 협주곡 11번 F 장조, K. 413/387a
피아노 협주곡 12번 A 장조, K. 414/385p
피아노 협주곡 13번 C 장조, K. 415/387b
피아노 협주곡 14번 E flat 장조, K. 449
피아노 협주곡 15번 B flat 장조, K. 450
피아노 협주곡 16번 D 장조, K. 451
피아노 협주곡 17번 G 장조, K. 453
피아노 협주곡 18번 B flat 장조, K. 456
피아노 협주곡 19번 F 장조, K. 459
피아노 협주곡 20번 d 단조, K. 466
피아노 협주곡 21번 C 장조, K. 467
피아노 협주곡 22번 E flat 장조, K. 482
피아노 협주곡 23번 A 장조, K. 488
피아노 협주곡 24번 c 단조, K. 491
피아노 협주곡 25번 C 장조, K. 503
피아노 협주곡 26번 “대관식” D 장조, K. 537
피아노 협주곡 27번 B flat 장조, K. 595
.바이올린 협주곡
멜로디의 아름다움과, 비록 모차르트가 후대의 다른 음악가들(베토벤이나 브람스 등)만큼 바이올린의 가능성을 모두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악기의 표현적이고 기교적인 특성을 기술적으로 잘 사용한 점이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들의 특징이다. 다섯 곡 모두 모차르트가 아버지를 따라서 유럽을 여행하던 십대 후반 시절에 작곡한 것들이다. (알프레드 아인스타인은 바이올린 협주곡이라고 이름붙은 작품들보다도 세레나데의 바이올린 협주곡같은 부분들이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한다).
바이올린 협주곡 1번 B flat 장조, K. 207 (1775년)
바이올린 협주곡 2번 D 장조, K. 211 (1775년)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 장조, K. 216 (1775년)
바이올린 협주곡 4번 D 장조, K. 218 (1775년)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 장조, K. 219 (1775년)
.호른 협주곡
호른 협주곡은 호른 주자와 오케스트라간의 세련되고 유머스러운 대화가 특징이다. 많은 호른 협주곡의 서명에는 헌정 대상에 대한 농담이 들어 있다.
호른 협주곡 1번 D 장조, K. 412 (1792년)
두 번째 악장은 모차르트의 사후에 그의 제자인 프란츠 크사버 쥐스마이어(Franz Xaver Süssmayr)에 의해 완성되었다.
호른 협주곡 2번 E flat 장조, K. 417
호른 협주곡 3번 E flat 장조, K. 447
호른 협주곡 4번 E flat 장조, K. 495 (1786년)
.그 외의 협주곡
바순 협주곡 B flat 장조, K. 191 (1774년)
플룻,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C 장조, K. 299 (1778년) : 사뭇 다른 두 악기의 조화는 매우 독창적이다.
오보에 협주곡 C 장조, K. 314 : 플룻 협주곡으로 알려져 왔지만, 원래는 거의 확실하게 오보에 협주곡이다.
바이올린,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E flat 장조, K. 364 (1779년) : 비올라 부분이 특히 뛰어나다.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과 바순을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E flat 장조, K. 297b, Anh.9 (후에는 Anh. C 14.01) (1791년) : 모차르트의 곡인지 아직까지 불분명(그의 서명이 없음)하다.
클라리넷 협주곡 A 장조, K. 622 (1791년) : 모차르트 말년의 마지막 협주곡으로써, 그의 친구 안톤 슈타들러를 위해 작곡한 클라리넷 협주곡이다(의뢰 했다는 말도 있음). 특히 2악장은 모짜르트 작품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꼽히는 명곡이다.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1번 G 장조, K. 313 (1778년)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2번 D 장조, K. 314 (1778년)
플루트 안단테 C 장조, K. 315 (1778년)
–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바이올린,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E flat 장조, K. 364 (1779년)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과 바순을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E flat 장조, K. 297b, Anh.9 (후에는 Anh. C 14.01) (1791년)

– 피아노 솔로곡
모차르트의 초년 시기의 작곡 시도는 피아노 소나타와 그 밖의 피아노 곡들로 시작되는데, 이는 그가 음악을 배우면서 사용한 악기가 피아노였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피아노 곡들은 모차르트 스스로(또는 능숙한 피아노 연주자였던 그의 누나)가 연주하기 위해 작곡하였다. 1782년부터 1786년까지 그는 소나타, 변주곡, 환상곡, 모음곡, 푸가, 론도 등을 포함해 20곡의 솔로 및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을 작곡했다.
난네를의 뮤직 북
안단테 C 장조, K. 1a
알레그로 C 장조, K. 1b
알레그로 F 장조, K. 1c
미뉴에트 F 장조, K. 1d
미뉴에트 G 장조, K. 1e
미뉴에트 C 장조, K. 1f
미뉴에트 F 장조, K. 2
알레그로 B flat 장조, K. 3
미뉴에트 F 장조, K. 4
미뉴에트 F 장조, K. 5
알레그로 C 장조, K. 5a
안단테 B flat 장조, K. 5b
피아노 소나타 1번 C 장조, K. 279 (뮌헨, 1774년 여름)
피아노 소나타 2번 F 장조, K. 280 (뮌헨, 1774년 여름)
피아노 소나타 3번 B-flat 장조, K. 281 (뮌헨, 1774년 여름)
피아노 소나타 4번 E-flat 장조, K. 282 (뮌헨, 1774년 여름)
피아노 소나타 5번 G 장조, K. 283 (뮌헨, 1774년 여름)
피아노 소나타 6번 D 장조, K. 284 (뮌헨, 1775년 2월-3월)
피아노 소나타 7번 C 장조, K. 309 (만하임, 1777년 11월 8일)
피아노 소나타 8번 a 단조, K. 310 (파리, 1778년 여름. 일부 목록에는 8번과 9번이 바뀌어 있음.)
피아노 소나타 9번 D 장조, K. 311 (만하임, 1777년 11월. 일부 목록에는 8번과 9번이 바뀌어 있음.)
피아노 소나타 10번 C 장조, K. 330 (1778년 여름)
피아노 소나타 11번 “터키행진곡” A 장조, K. 331 (1778년 여름)
피아노 소나타 12번 F 장조, K. 332 (1778년 여름)
피아노 소나타 13번 B flat 장조, K. 333 (1778년 여름)
피아노 소나타 14번 C 단조, K. 457 (빈, 1784년 10월 14일)
피아노 소나타 15번 F 장조, K. 533 (빈, 1788년 1월 3일)
피아노 소나타 16번 C 장조, K. 545 (소위 “쉽거나” 혹은 “단순한” 소나타, 빈, 1788년 6월 26일)
피아노 소나타 17번 F 장조, K. 547a (빈, 1788년 여름)
피아노 소나타 18번 B flat 장조, K. 570 (빈, 1789년 2월)
피아노 소나타 19번 D 장조, K. 576 (빈, 1789년 7월)
환상곡과 푸가 1번 C 장조, K. 394 (빈, 1782년)
환상곡 2번 C 단조, K. 396 (빈, 1782년)
환상곡 3번 D 단조, K. 397 (빈, 1782년)
환상곡 4번 C 단조, K. 475 (빈, 1785년 5월 20일)
– 실내악
.바이올린 곡
모차르트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곡들(16곡의 소나타와 여러 단편곡, 그리고 두 개의 변주곡 모음)도 작곡했는데, 특히 성년 시기에 작곡한 곡들에서 피아노는 그저 다른 독주 악기의 보조에 머무르지 않고 대화를 만들어 간다.
두 대의 바이올린이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현악 2중주
.현악 사중주
현악 사중주 “밀라노, K. 80 과 K. 155-160 (1770년-1773년) : 이 시기의 작품(세 악장으로 구성)들은 이후의 보다 완전한 사중주 작품들의 전조격에 해당한다.
현악 사중주 1번 G 장조, K. 80/73f (1770년)
현악 사중주 2번 D 장조, K. 155/134a (1772년)
현악 사중주 3번 G 장조, K. 156/134b (1772년)
현악 사중주 4번 C 장조, K. 157 (1772년-1773년)
현악 사중주 5번 F 장조, K. 158 (1772년-1773년)
현악 사중주 6번 B-flat 장조, K. 159 (1773년)
현악 사중주 7번 E-flat 장조, K. 160/159a (1773년)
빈 사중주, K. 168-173 (1773년) : 더 발전된 양식의 작품들이 만들어진 시기이다. 빈에서 모차르트는 요제프 하이든의 사중주 작품 Op. 17과 Op. 20을 듣고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모차르트는 아래의 작품들에서 그를 따라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직은 하이든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악 사중주 8번 F 장조, K. 168 (1773년)
현악 사중주 9번 A 장조, K. 169 (1773년)
현악 사중주 10번 C 장조, K. 170 (1773년)
현악 사중주 11번 E-flat 장조, K. 171 (1773년)
현악 사중주 12번 B-flat 장조, K. 172 (1773년)
현악 사중주 13번 d 단조, K. 173 (1773년)
하이든 사중주 K. 387, 421, 428, 458, 464, 465, Op. 10 (1782년-1785년) : 모차르트는 빈으로 돌아오고 하이든을 개인적으로 만나 그와 친분을 맺은 뒤인 1780년대 초기에 다시 4중주를 작곡하기 시작했다. 하이든이 당시 작곡했던 여섯 개의 4중주 곡들(Op. 33)은 모차르트가 다시 4중주 곡들을 쓰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4중주 곡들은 종종 4중주 장르의 정점에 놓여 있다고 여겨진다.
현악 사중주 14번 G 장조, K. 387 (1782년)
현악 사중주 15번 d 단조, K. 421/417b (1783년)
현악 사중주 16번 E-flat 장조, K. 428/421b (1783년)
현악 사중주 17번 B-flat 장조 (“사냥”), K. 458 (1784년)
현악 사중주 18번 A 장조, K. 464 (1785년)
현악 사중주 19번 C 장조 (“불협화음”), K. 465 (1785년)
현악 사중주 20번 D 장조 (“호프마이스터”), K. 499 (1786년) : 이 작품은 프로이센 사중주와 더불어 프란츠 안톤 호프마이스터에 의해 출판되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마지막 세 사중주 곡들은 프로이센의 왕인 프리드리히 2세에게 헌정되었으며, (왕이 직접 연주한 악기인) 첼로 파트의 칸타빌레적인 특징과 부드러운 선율, 여러 악기들간의 조화로 주목받는다.
프로이센 사중주 K. 575, 589, 590 (1789년-1790년)
현악 사중주 21번 D 장조, K. 575 (1789년)
현악 사중주 22번 B-flat 장조, K. 589 (1790년)
현악 사중주 23번 F 장조, K. 590 (1790년)
.현악 오중주
두 대의 바이올린, 두 대의 비올라 그리고 첼로를 위한 모차르트의 현악 오중주 곡들(K. 174, 406, 515, 516, 593, 614)은 그 수는 비록 사중주보다 적지만 그 가운데에는 사중주곡보다 더욱 뛰어난 평가를 받는 곡들도 있다.
현악 오중주 B-flat 장조, K. 174
현악 오중주 C 장조, K. 515 : 이 작품으로부터 교향곡 41번(“쥬피터”)의 웅장함이 유래하게 된다. 이 곡의 첫 번째 악장은 모차르트의 모든 작품 가운데서 가장 긴 악장 중의 하나이며, 극한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띠는 발전부를 갖고 있다.
현악 오중주 g 단조, K. 516 : 모차트르의 대표곡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같은 조성의 교향곡 40번과 비슷한 격정적이고 비극적인 감성을 떠올리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곡의 마지막 악장이 환희에 찬 G 장조로 끝나는 것이 곡 전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현악 오중주 c 단조, K. 406 (516b) : 이 작품은 이전에 작곡된 관악 세레나데 “나흐트 무지크”(밤의 음악, K. 388)을 현악 오중주로 편곡한 것이다.
현악 오중주 D 장조, K. 593
현악 오중주 E-flat 장조, K. 614
.기타 실내악곡
플룻을 위한 4중주(플룻,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K. 285, 285a, 285b, 298(1777년-1787년)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4중주(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바순) K. 452(1784년)
클라리넷 오중주 K. 581 (1789년)
– 세레나데, 디베르티멘토와 기타 작품들
기악 앙상블을 위한 작품에는 “디베르티멘토”, “노투르나”, “세레나데”, “카사치오네”, “행진곡”, “무곡”과 “교향곡” 등이 포함된다.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에는 현악 앙상블을 위한 것들(초기의 디베르티멘토 K.136-138 등)과 관악 앙상블을 위한 것들, 그리고 현악과 관악의 여러 조합을 위한 것들이 있다. “그랑 파르티타 (세레나타) K.361″는 가장 대표적인 관악기를 위한 모차르트의 곡이다. 두 대의 오보에, 두 대의 클라리넷, 두 대의 바셋 호른, 네 대의 헌팅 호른, 두 대의 바순과 더블 베이스로 연주된다. 모차르트는 “미뉴에토”, “콩트르당스”와 “알망드” 등 오케스트라를 위한 많은 무곡을 작곡했다.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현악 사중주와 베이스를 위한 세레나데 K. 525)
12대의 관악기와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세레나데(관악 세레나데 10번 B flat 장조 K. 361)
디베르티멘토들(예를 들어 디베르티멘토 C 장조 K. 188 등)
디베르티멘토들, K. 136-138(1772년) : 현악 오중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이탈리아의 “서곡” 형식으로 되어 있다.
두 대의 호른과 현악을 위한 디베르티멘토들, 음악의 유희(Ein Musikalischer Spaß,) K. 522
– 종교 음악
.미사곡
대관식 미사(Krönungsmesse) C 장조, K.317
대 미사(Große Messe) c 단조, K.427
레퀴엠(Requiem) d 단조, K.626 : 이 곡은 모차르트의 유작이며, 그의 조수였던 프란츠 크사버 쥐스마이어가 완성했다.
.기타 종교 음악
환호하라, 기뻐하라(Exsultate, Jubilate), K.165
Ave verum Corpus, K.618
– 성악곡
다음은 모차르트의 성악곡 모차르트의 성악곡인 미사, 오라토리오, 칸타타, 레퀴엠, 아리아, 아리에타 등을 모은 목록이다.
K1, K6, 작품, 작품(한글명), 날짜, 장소
21, 19c, Aria for Tenor “Va, dal furor portata”. 테너를 위한 아리아 “분노로 나타내라”, 1765년, 런던
35, 35, Die Schuldigkeit des ersten Gebots, 제 1계율의 책무, 1767년초, 잘츠부르크
42, 35a, Cantata for soloists, choir & orchestraGrabmusik, 칸타타 장례음악, 1767년, 잘츠부르크
49, 47b, Missa brevis in G, 짧은 미사 G 장조, 1768년 10월 ~ 11월, 빈
65, 61a, Missa brevis in D minor, 짧은 미사 d 단조 , 1769년 1월 14일, 잘츠부르크
66, 66, Missa in C, “Dominicus” , 미사곡 C 장조 “Dominicus”, 1769년 10월, 잘츠부르크
77, 73e, Recitative and Aria for Soprano “Misero me!…Misero pargoletto”, 소프라노를 위한 레차타티보와 아리아 “불행한 나!…가엾은 아기”, 1770년 3월, 밀라노
83, 73p, Aria for Soprano “Se tutti i mali miei”,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 “모든 악이 나때문이라면”, 1770년 4월 ~ 5월, 로마
119, 382h, Aria for Soprano “Der Liebe himmlisches Gefuhl”,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 “사랑스런 봄이 벌써 활짝 웃네”, 1782년 이전, 빈?
139, 47a, Missa solemnis in C minor “Waisenhaus”, 장엄미사 c 단조 “Waisenhaus”, 1768년 가을, 빈
140, Anh.C1.12, Missa brevis in G, 짧은 미사 G 장조, 1773년 이전, 잘츠부르크?
152, 210a, Song for voice & piano (spurious, by Myslivecek) “Ridente la calma”,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노래 “고요함은 미소짓고”, 1775년
165, 158a, Motet in F for Soprano “Exsultate, jubilate”, 소프라노를 위한 모테트 F 장조 “환호하라, 기뻐하라”, 1773년 1월, 밀라노
167, 167, Missa in C “Trinitatis”, 미사 C 장조 “Trinitatis”, 1773년 6월, 잘츠부르크
192, 186f, Missa brevis in F’, 짧은 미사 B 장조 , 1774년 6월 24일, 잘츠부르크
194, 186h, Missa brevis in D’, 짧은 미사 D 장조, 1774년 8월 8일, 잘츠부르크
209, 209, Aria for Tenor “Si mostra la sorte”, 테너를 위한 아리아 “운명이 보여주도다”, 1775년 5월 19일, 잘츠부르크
217, 217, Aria for Soprano “Voi avete un cor fedele”,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 “당신은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1775년 10월 26일, 잘츠부르크
220, 196b, Missa brevis in C “Spatzen”, 짧은 미사 C 장조 “Spatzen”, 1775년 ~ 1776년
255, 255, Recitative and Aria for Alto “Ombra felice”, 알토를 위한 레차타티보와 아리아 “평화의 그림자”, 1776년 9월, 잘츠부르크
257, 257, Missa in C “Credo”, 미사 C 장조 “Credo”, 1776년 11월, 잘츠부르크
258, 258, Missa brevis in C “Spaur”, 짧은 미사 C 장조 “Spaur”, 1775년 12월, 잘츠부르크
259, 259, Missa brevis in C “Organ Solo”, 짧은 미사 C 장조 “Organ Solo”, 1775년 12월 또는 1776년, 잘츠부르크
262, 246a, Missa longa in C’, 롱가 미사 C 장조, 1775년 6월 또는 7월, 잘츠부르크
272, 272, Recitative and Aria for Soprano “Ah, lo previdi, Ah! T’invola agl’occhi miei”, 소프라노를 위한 레차타티보와 아리아 “제 예상대로군요. 내 눈 앞에서 사라지세요”, 1777년 8월, 잘츠부르크
275, 272b, Missa brevis in B flat, 짧은 미사 B flat 장조, 1777년 말, 잘츠부르크
276, 321b, Regina Coeli in C, 천국의 여왕 C 장조, 1779년 이전, 잘츠부르크?
294, 294, Recitative and Aria for Soprano “Alcandro, lo confesso”, 소프라노를 위한 레차타티보와 아리아 “나는 모르네 이 따뜻한 애정이 어디서 오는지”, 1778년 2월 24일, 만하임
295, 295, Aria for Tenor “Se al labbro mio non credi”, 테너를 위한 아리아 “그대 만약 나의 입술을 믿지 못한다면”, 1778년 2월 27일, 만하임
-, 295a, Recitative and Aria for Soprano “Basta, vincesti … Ah, non lasciarmi”, 소프라노를 위한 레차타티보와 아리아 “그만, 당신이 이겼어요…아, 저를 떠나지 마세요”, 1778년 2월 27일, 만하임
307, 284d, Arietta in C “Oiseaux, si tous les ans”, 아리에타 C 장조 “새들아, 만약 해마다”, 1777년 겨울 ~ 1778년, 만하임
308, 295b, Arietta “Dans un bois solitaire”, 아리에타 “숲 속에서”, 1777년 겨울 ~ 1778년, 만하임
316, 300b, Recitative and Aria for Soprano “Popoli di Tessaglia”, 소프라노를 위한 레차타티보와 아리아 “테살리아의 사람들이여! 나는 영원의 신에게 요청하지 않으리”, 1778년 7월, 파리
317, 317, Missa in C “Coronation”, 미사 C 장조 “대관식”, 1779년 3월 23일, 잘츠부르크
321, 321, Vesperae de Dominica in C, 주일의 저녁기도 C 장조, 1779년, 잘츠부르크
337, 337, Missa solemnis in C, 장엄미사 C 장조, 1780년 3월, 잘츠부르크
339, 339, “Laudate Dominum” from Vesperae solennes de confessore in C, “주님을 찬미하라” 구도자를 위한 기도 中 5번, 1780년, 잘츠부르크
341, 368a, Kyrie in D minor, 기도 음악 d 단조, 1780년 11월 이전 ~ 1781년 3월, 뮌헨?
349, 367a, Song Die Zufriedenheit, 노래 만족, 1780년 겨울 ~ 1781년, 뮌헨
351, 367b, Song “Komm, liebe Zither”, 노래 “오라, 사랑하는 지터”, 1780년 겨울 ~ 1781년, 뮌헨
368, 368, Recitative and Aria for Soprano “Ma che vi fece…Sperai vicino il lido”, 소프라노를 위한 레차타티보와 아리아 “별들아, 가엾은 데르체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느냐…근처 바닷가에서 빌었다”, 1779년 ~ 1780년, 잘츠부르크
374, 374, Recitative and Aria for Soprano “A questo seno deh vieni”, 소프라노를 위한 레차타티보와 아리아 “사랑하는 이여, 이 가슴으로 오세요”, 1781년 4월, 빈
383, 383, Aria for Soprano “Nehmt meinen Dank, ihr holden Gonner!”,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 “친절한 은인이여, 나의 감사를 받아주오”, 1782년 4월 10일, 빈
391, 340b, Song “An die Einsamkeit” (Sei du mein Trost), 노래 고독 (당신은 나의 위로), 1781년 ~ 1782년, 빈
416, 416, Scena and Rondo for Soprano “Mia speranza adorata…Ah, non sai qual pena”, 소프라노를 위한 독창곡과 론도 “나의 사랑스런 희망..아, 당신은 그 고통을 몰라요”, 1783년 1월 8일, 빈
418, 418, Aria for Soprano “Vorrei spiegarvi, oh Dio”,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 “오 신이여, 제 얘기를 들어 보소서”, 1783년 6월 20일, 빈
419, 419, Aria for Soprano “No, no, che non sei capace”,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 “아니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1783년 6월, 빈
420, 420, Aria for Tenor “Per pieta, non ricercate”, 테너를 위한 아리아 “자비의 이름으로 나를 찾지마오”, 1783년 6월 21일, 빈
427, 417a, Missa in C minor “Great Missa”, 미사 C 단조 “대미사”, 1782년 6월 ~ 1783년 10월, 빈
431, 425b, Recitative and Aria for Tenor “Misero! O Sogno…aura Che Intorni Spiri”, 테너를 위한 레차타티보와 아리아 “불행한 나! 꿈인가, 생시 이런가”, 1783년 12월, 빈?
433, 416c, Aria for bass & orchestra “Warnung: Männer suchen stets zu naschen”, 베이스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리아 “경고: 남자들은 한눈팔기를 좋아해”, 1783, 빈?
436, 436, Notturno for Two Sopranos and Bass “Ecco quel fiero”, 두 명의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위한 노투르노 “작별”, 1783년 이전 ~ 1786년, 빈?
469, 469, Oratorio Davidde penitente, 오라토리오 다윗의 회개, 1785년 3월, 빈
472, 472, Song “Der Zauberer”, 노래 마법사, 1785년 5월 7일, 빈
473, 473, Song “Die Zufriedenheit”, 노래 만족, 1785년 5월 7일, 빈
476, 476, Song “Das Veilchen”, 노래 제비꽃, 1785년 6월 8일, 빈
505, 505, Scena and Rondo for Soprano, “Ch’io mi scordi di te?…Non temer, amato bene”, 소프라노를 위한 독창곡과 론도 “어찌 그대를 잊으리… 두려워 말아요, 사랑하는 이여”, 1786년 12월 26일, 빈
517, 517, Song “Die Alte”, 노래 노파, 1787년 5월 18일, 빈
519, 519, Song “Das Lied der Trennung”, 노래 이별의 노래, 1787년 5월 23일, 빈
520, 520, Song ‘Als Luise die Briefe”, 노래 루이제가 불성실한 애인의 편지를 태웠을 때, 1787년 5월 25일, 빈
523, 523, Song “Abendempfindung an Laura”, 노래 라우라에게 부치는 저녁의 추억, 1787년 6월 24일, 빈
528, 528, Scena for Soprano “Bella mia fiamma”, 소프라노를 위한 독창곡 “내 사랑이여, 안녕!”, 1787년 11월 3일, 프라하
530, 530, Song “Das Traumbild”, 노래 꿈, 1787년 11월 6일, 프라하
539, 539, Song “Ein deutsches Kriegslied”, 노래 나도 황제가 되면 좋겠네, 1788년 3월 5일, 빈
549, 549, Canzonetta for two Sopranos and Bass “Piu non si trovano”, 두 명의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위한 칸초네타 “누구 한 사람 찾아 볼 수 없다네”, 1788년 7월 16일, 빈?
577, 577, Rondo for Soprano “Al desio di chi ch’adora”, 소프라노를 위한 론도 “Al desio di chi ch’adora” 1789년 7월, 빈
578, 578, Aria for Soprano “Alma grande e nobil core”,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 “위대한 혼과 고상한 마음은”, 1789년 8월, 빈
579, 579, Aria for Soprano “Un moto di gioia mi sento”,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 “내 마음에 춤출듯한 환희감이”, 1789년 8월, 빈
582, 582, Aria for Soprano “Chi sa, chi sa, qual sia”,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 “누가 내 연인의 괴로움을 아는가?”, 1789년 10월, 빈
583, 583, Aria for Soprano “Vado, ma dove? — oh Dei!”,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 “신이여, 저는 갑니다. 하지만 어디로?”, 1789년 10월, 빈
596, 596, Song “Sehnsucht nach dem Fruhling”, 노래 “봄을 기다리며”, 1791년 1월 14일, 빈
597, 597, Song “Im Frulingsanfang”, 노래 봄, 1791년 1월 14일, 빈
598, 598, Song “Das Kinderspiel”, 노래 어린이 놀이, 1791년 1월 14일, 빈
618, 618, Motet in D “Ave verum Corpus”, 모테트 D 장조 “오, 거룩한 성체여”, 1791년 6월 17일, 바덴
Anh.245, 621a, Aria for Bass “Io ti lascio, o cara, addio”, 베이스를 위한 아리아 “당신, 혹은 내 사랑을 떠나며, 안녕”, 1791년 9월 이전, 프라하?
626, 626, Requiem in D minor, 레퀴엠 d 단조, 1791년 말, 빈

– 오페라
제 1 계율의 책무 (Die Schuldigkeit des ersten Gebotes), K. 35 (1767년) : 모차르트가 처음 작곡한 오페라, 또는 종교 악극이다.
아폴로와 히야킨투스(Apollo et Hyacinthus), K. 38 (1767년)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Bastien et Bastienne), K. 50 (1768년)
보아라 바보 아가씨(La finta semplice), K. 51 (1768년) :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모차르트가 오페라 부파 요소를 처음으로 도입한 작품이다.
폰토 왕 미트리다테(Mitridate re del Ponto), K. 87 (1770년) : 최초의 이탈리아어 오페라 네 작품 ‘폰토의 왕 미트리다테’, ‘알바의 아스카니오’, ‘시피오네의 꿈’, ‘루치오 실라’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작품들에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오페라 세리아의 틀 속에서 작곡되었다.
루지에로(Ruggiero), (1771년)
알바의 아스카니오(Ascanio in Alba), K. 111 (1771년)
베툴리아 리베라타(Betulia Liberata), 오라토리오, K. 118 (1771년) :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의 주제로 작곡되었다.
시피오네의 꿈(Il sogno di Scipione), K. 126 (1772년)
루치오 실라(Lucio Silla), K. 135 (1772년)
이집트 왕 타모스(Thamos, König in Ägypten’), (1773년, 1775년)
가짜 여자 정원사(La finta giardiniera), K. 196 (1774년 – 1775년) : 이 작품으로 모차르트는 다시 오페라 부파 장르로 돌아온다. 대본에는 조악함이 남아 있지만, 등장 인물들은 더 이상 도식적이지 않고, 더욱 현실적인 인물로 나오며, 음악은 그들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 준다.
양치기 왕(Il rè pastore), K. 208 (1775년)
차이데(Zaide), K. 344 (1779년)
이도메네오(Idomeneo), K. 366 (1780년)
후궁으로부터의 유괴(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 K.384 (1782년) : 징슈필 장르의 작품을 처음 쓴 지 몇 년 만에 이 작품을 통해 다시 징슈필 장르로 돌아왔으며 , 나중에는 마술피리도 작곡한다.
카이로의 거위(L’oca del Cairo), K. 422 (1783년)
속은 신랑(Lo spose deluso), K. 430
극장 지배인(Der Schauspieldirektor), K. 486 (1786년)
피가로의 결혼(Le Nozze di Figaro), K. 492 (1786년) : 모차르트의 유명 3대 오페라 (돈 죠반니의 경우 비극적인 요소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오페라 부파임) 중의 첫 작품이다. 피에르 보마르셰의 희극인 《피가로의 결혼》에 기초한 로렌초 다 폰테의 대본을 기반으로 작곡되었다.
돈 죠반니(Don Giovanni), K. 527 (1787년) :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와 함께 다 폰테의 대본을 기반으로 한 세 작품에 속한다.
코지 판 투테(Così fan tutte), K.588 (1789년)
마술피리(또는 마적(魔笛), Die Zauberflöte), K. 620 (1791년) : 엠마뉴엘 슈카데너의 대본을 기본으로 해 작곡된 이 작품은 처음의 공연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징슈필 장르를 확고히 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 이 작품은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았다.
티토 황제의 자비(La Clemenza di Tito), K. 621 (1791년)
○ 평가
“나는 항상 나를 모차르트의 가장 위대한 숭배자로 여겨 왔으며, 내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앞으로 100년 동안 다시는 그런 재능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요제프 하이든, 모차르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모차르트여! 이 멋진 나은 세상의 모습을 당신이 주셨나이까? 가볍고, 밝고, 좋은 날들이 내 평생 동안 내게 머무를 것입니다. 멀리서와 마찬가지로 모차르트 음악의 마법의 음표는 여전히 우아한 방식으로 내게 떠오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서로 연결되는 안락함과 우아함으로서 이토록 즉흥적이고 명확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이다. 만약 우리가 모차르트의 음악의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의 순수성을 글로 담아내보려고 하자.”- 요하네스 브람스
“모차르트는 음악 창작에 있어 전 영역을 아우르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내 부족한 머리로 이 (피아노) 건반에 손을 대는 것일 뿐이다.”- 쇼팽
“모차르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다. 베토벤은 단순히 음악을 창조하였지만, 모차르트의 음악은 순수함과 미를 지녔는데, 그것은 우주에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어떤 부분의 내적 미학이 숨겨져 왔다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같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모차르트는 매우 장대한 규모의 창의력을 보여서 사람들은 사실상 그가 그 자신을 계속해서 위대한 걸작에 내던졌다고 말하곤 한다.”-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아라우
“모차르트의 음악은 특히나 연주하기 어렵다. 그의 감탄할 만한 명쾌함은 그 음악이 매우 청백함을 입증한다. 그의 연주에서 약간의 실수만 해도 그것은 백지위의 검은 점 처럼 두드러진다. 때문에 그의 곡은 음 하나하나가 정확히 연주되어야 한다.”- 가브리엘 포레
“모차르트의 엄청난 천재성은 그를 역대 모든 예술가들중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게 했다.”- 리하르트 바그너
“모든 음악적 야망은 모차르트 앞에서 절망이 된다.”- 샤를 구노
“모차르트는 위대한 거장들 중에서 가장 범접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아르투르 슈나벨
“모차르트의 음악은 천사들을 지상으로 내려오도록 유혹할 만큼 매우 아름답다.”- 클루게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모차르트가 당신에게 해결책을 준다.”- 페루초 부소니
“인간 내면의 영혼과 그 에너지의 깊이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바흐, 베토벤, 바그너의 곡들에 감탄할 만 하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신성한 본능이다.”- 그리그
“베토벤은 일주일에 두 번, 하이든은 네 번, 그리고 모차르트는 매일 연습한다!”- 로시니
“우리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자주 들을수록 그의 음악이 더 새로워 보이지 않는가?”- 슈만
“모차르트는 음악적 예수 그리스도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영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미의 정점이다.”- 차이콥스키
“모차르트는 정의되기 이전에 어떤 행복이다.”- 아서 밀러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차르트를 가장 좋아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모차르트 음악은 아이러니한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음악은 기쁜데 슬픈 감정이 있고, 슬픈 음악인데 기쁜 감정이 느껴지고. 저는 사실 이게 예술의 끝이라고 보거든요. 열려 있는 해석이 가능한.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완벽미’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의 음악이예요.”- 피아니스트 손열음




참고 = 위키백과, 나무위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