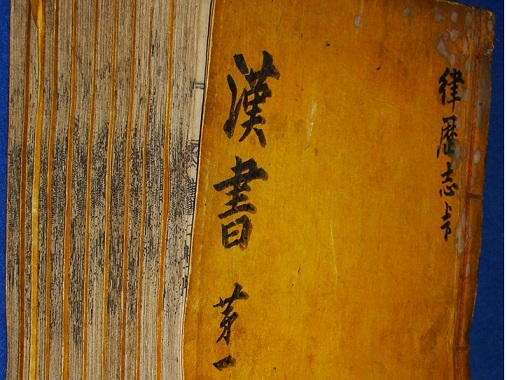반고의 한서 (漢書) – 본기 (本紀)
11. 애제기(哀帝記)
반고의 한서-본기의 열한 번째 기록.
애제기 (哀帝記)는 한 효애황제 유흔 (漢 孝哀皇帝 劉欣, 기원전 27년~ 기원전 1년)의 기록으로 전한의 13대 황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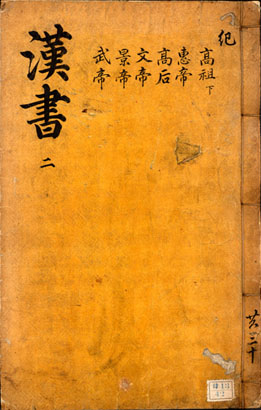
– 전한 애제 (哀帝)
.휘: 유흔 (劉欣)
.시호: 효애황제
.매장지: 의릉 (義陵)
.부모: 부) 정도공왕, 모) 정희
.배우자: 부황후 / 두소의
* 전한 황제
.재위: 기원전 7년 ~ 기원전 1년
.전임: 전한 성제 / .후임: 전한 평제
○ 애제기 (哀帝記)
효애황제 (孝哀皇帝)는 원제 (元帝)의 서손 (庶孫)으로 정도공왕 (定陶共王)의 아들이다. 모친은 정희 (丁姬)이다. 3살 때 후사로 세워져 왕이 되었는데, 장성하자 문사 (文辭)와 법률을 좋아하였다. 원연 (元延) 4년 (BC 9) 입조할 때, 부 (傅), 상 (相), 중위 (中尉) 이 세 관리가 모두 따라왔다. 이때 성제의 막내 아우인 중산효왕 (中山孝王=정도공왕의 동생) 또한 내조했는데, 부 혼자만 따라왔다. 상이 괴이하게 여겨 정도왕 (定陶王)에게 물어보니, 대답하길 “영 (令)에, 제후왕이 입조할 때 그 나라의 2천석 관리는 따라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 상, 중위는 모두 나라의 2천석 관리니, 그래서 다 따라온 것입니다.”라 했다. 상이 『시경』을 암송하게 하였는데, 다 익혀서 능히 그 뜻을 설명하였다. 다른 날 중산왕에게 “부 혼자만 따라온 것은 어는 법령에 있는가?”라 물으니, 능히 대답하지 못했다 『상서』를 외게 하였지만, 도중에 잊어먹었다. 음식을 하사하자, 먼저 먹고 나중에 배부르자, 일어섰는데 버선끈이 풀렸다. 성제가 이로 말미암아 (중산왕을) 능력없다고 여기고, 정도왕을 어질고 현명하게 보아 누차 그 재능을 칭찬했다. 이 때 (정도)왕의 조모인 부태후 (傅太后)가 왕을 따라 내조하여서, 사사로이 상이 총애하는 조소의 (趙昭儀) 및 황제의 외숙인 표기장군 (票騎將軍) 곡양후(曲陽侯) 왕근(王根)에게 뇌물을 주었다. 소의 및 왕근이 상에게 자식이 없음을 보고, 또한 스스로 장구한 계책을 세우는데 참여하고자, 모두 번갈아 정도왕을 칭찬하며, 황제에게 후사로 삼으라고 권하였다. 성제 또한 그 재주를 아름답게 여겨 그를 위해 원복(元服=冠)을 더하여 보내주니, 이때 나이 17세였다. 다음 해 집금오 (執金五) 임굉 (任宏)을 시켜 대홍려 (大鴻臚) 직을 맡게 하고, 부절을 가지고 정도왕을 불러 세워 황태자로 삼았다. (정도왕이) 사례하며 이르길 “신이 다행히 아비의 뒤를 이어 번방을 지켜 제후왕이 될 수 있었지만, 재질이 부족해 태자궁에 임시로도 충원될 수 없습니다. 폐하의 성덕은 관대하고 인자하시고, 조종을 공손히 잇고 신령을 받들어 순응하니, 의당 복록을 받으시고
자손이 무성할 것입니다. 신은 또한 국저 (國邸)에 머물며, 아침저녁으로 자문을 받들며 기거하여, 성스런 후사가 있기를 기다려 귀국해 번방을 지키기 원합니다.”라 했다. 이 주청을 글로 써내어 천자에게 알렸다. 그후 몇 달 쯤, 초효왕 (楚孝王)의 손자 유경 (劉景)을 세워 정도왕으로 삼아 정도공왕의 제사를 받들게 했으니, 태자에게 오로지 훗날의 도리만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였다.
수화 (綏和) 2년 (BC 7) 3월, 성제가 붕어했다.
4월 병오일, 태자가 황제위에 올랐다. 황태후를 높여 태황태후 (太皇太后)라 하고, 황후를 황태후 (皇太后)라 했다. 천하에 대사령을 내렸다. 종실의 왕자로 아직 적(籍)에 올라 있는 자에겐 각 말 4필씩, 관리와 백성들에겐 작을, 1백호 마다 소와 술을, 삼로(三老)와 효제 역전 (孝弟 力田)에겐 전지 (田地)를, 환과고독 (鰥寡孤獨)에겐 비단을 하사했다. 태황태후가 조칙을 내려 정도공왕을 높여 공황 (恭皇)이라 했다.
5월 병술일, 황후 부씨 (傅氏)를 세웠다. 조칙을 내려 이르길 “『춘추』에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귀하다’고 하였으니, 정도태후 (定陶太后)를 높여 공황태후 (恭皇太后)라 하고, 정희를 높여 공황후 (恭皇后)라 하고, 각각 좌우 첨사 (詹事)를 두고, 식읍을 장신궁 (長信宮), 중궁(中宮)과 같이 하라.”고 했다. 부태후의 부친을 추존해 숭조후 (崇祖侯)라 하고, 정태후의 부친을 포덕후 (褒德侯)라 했다. 외숙인 정명(丁明)을 봉해 양안후 (陽安侯)로, 외숙의 아들인 정만 (丁滿)을 봉해 평주후 (平周侯)로 삼았다. 정만의 부친 정충 (丁忠)의 시호를 추존해 평주회후 (平周懷侯)로 삼고, 황후의 부친 부안(傅安)은 공향후 (孔鄕侯)로, 황태후의 동생 시중 광록대부 조흠 (趙欽)을 신성후 (新成侯)로 삼았다.
6월, 조칙을 내려 이르길 “정 (鄭)나라의 음악은 음탕하여 악 (樂)을 어지렵혀서, 성왕이 버렸던 것이니, 그 악부 (樂府) 파하라.”고 했다.
곡양후 왕근은 이전에 대사마 (大司馬)로써 사직의 대책을 세웠기에 2천호를 더 봉해주었다. 태복 (太僕) 안양후 (安陽侯) 왕순(王舜)은 보필하여 인도함에 옛 은혜가 있었으니, 5백호를 더 봉하고, 또 승상 공광 (孔光), 대사공 (大司空) 범향후 (氾鄕侯) 하무 (何武)에겐 각각 1천호를 더 봉해주었다.
조칙을 내려 이르길 “하간왕 (河間王) 유량 (劉良)은 태후의 상을 3년이나 하여, 종실 예의의 모범을 보였으니, 1천호를 더 봉하여라.” 고 했다.
또 조칙을 내려 이르길 “절도를 세워 삼가하고, 사치하며 음란함을 막는 것을 정치의 우선으로 삼아서, 많은 왕들이 그 도를 바꾸지 않았다. 제후왕, 열후, 공주, 2천석 관리 및 부호민 (富豪)한 백성들이 많은 노비를 가지며, 그들의 전택은 끝이 없고,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어,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거듭 곤궁해져 풍족치 않다. 그 한계와 서열을 의논하라.” 고 했다. 유사가 조목조목 주청하길 “여러 왕들과 열후는 자신의 봉국중에 명전(名田)을 얻고, 장안에 있는 열후 및 공주는 다른 현과 도에 명전이 있고, 관내후(關內侯)와 이민(吏民)들도 명전을 가지면 모두 30경(頃)을 넘을 수 없게 하십시오. 제후왕은 노비 2백명, 열후와 공주는 1백명, 관내후와 이민들은 30명을 넘지 말게 하십시오. 나이가 60세 이상 10세 이하는 그 수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장사치들은 모두 명전을 얻지 못하고 관리도 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범하는 자는 법률로 논죄하게 하십시오. 여러 명전이나 노비를 가진 것이 자신의 품격에 지나치면, 모둔 현관 (縣官)에 몰수하십시오. 제 (齊)나라의 삼복관 (三腹官)과 여러 관에서 기 (綺)나 수 (繡) 비단을 짜지만, 만들기 어렵고 여공(女工)들의 산물을 해치니, 모두 다 금지하시고, 이미 짠 것이라도 (현관에) 보내지 말게 하십시오. 임자령(任子令) 및 비방, 저사 (詆詐)의 법을 없애십시오. 액정 (掖庭) 궁인으로 나이가 30세 이하면, (궁에서) 내보내서 시집가게 하십시오. 관노비로 나이가 50 이상은 면해주어 서인으로 삼으십시오. 군국에서 이름난 짐승을 헌상할 수 없도록 금하십시오. 3백석 이하 관리의 봉록을 더해주십시오. 관리 중 남을 해치거나 (殘賊) 몹시 포학한 (苦虐) 자를 살펴, 때에 맞춰 물러나게 하십시오. 유사가 지난 일을 사면해 천거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박사 제자의 부모가 죽으면, 휴가 (寧)주어 3년상을 하게 하십시오.”라 했다.
가을, 곡양후 왕근, 성도후 왕황 (王況)이 모두 죄를 지어, 왕근은 제 봉국으로 보내고, 왕황은 파면해 서인으로 삼아 고향 군으로 돌아가게 했다.
조칙을 내려 이르길 “짐이 종묘의 중함을 이어서 전전긍긍하며 천심 (天心)을 잃을까 두렵다. 유사이 일월(日月)이 빛을 잃고, 오성 (五星)은 그 운행을 잃었으며, 군국에서는 자주 지진이 일어났다. 이전에 하남 (河南)과 영천 (潁川)군에서 물이 홍수가 나서 흘러 백성들을 죽이고 가옥을 무너뜨렸다. 짐이 부덕해 백성들이 그 허물을 받고 있으니, 짐이 매우 걱정스럽다. 이미 광록대부를 보내 순행하며, 명적을 들어 죽은 자에게는 관을 살 돈을 하사하되 1인당 3천전을 하사하도록 했다. 수해로 손해를 입은 현읍 및 다른 군국 중 재해가 10분의 4를 손해본 곳이나, 백성들의 재산이 10만전이 되지 못하는 자에게 영을 내려 모두 금년의 조부를 내지 말게 하라.” 고 했다.

건평 (建平) 원년 (BC 6) 봄 정월,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시중 기도위 (騎都尉) 신성후 조흠과 성양후 조흔 (趙訢)에게 죄가 있어, 파면하여 서인으로 삼았다.
태황태후가 외가 왕씨의 전지 중에 무덤자리가 아닌 것을 모두 빈민들에게 주도록 조칙을 내렸다.
2월, 조칙을 내려 이르길 “무릇 듣자 하니, 성왕이 다스림에 현자를 얻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고 한다. 대사마, 열후, 장군, 중 (中) 2천석 관리, 주목 (州牧), 군태수, 상 (相)과 같이 효제역전이나 능히 직언하고 정사에 통달했으나 측아 (側陋)한 곳에 있어도, 이끌어 벼슬시켜 가히 백성들에 친하게 할 만한 자를 각각 1명씩 천거하라.”고 했다.
5월, 제후왕, 공주, 열후, 승상, 장군, 중2천석 관리, 중도관 (中都官)의 낭리 (郎吏)에게 금과 돈, 비단을 각자 차등있게 하사했다.
겨울, 중산효왕의 태후 원 (媛), 아우 선향후 (宣鄕侯) 풍참 (馮參)에게 죄가 있으니, 모두 자살했다.
건평 2년 (BC 5) 봄 3월, 대사공을 파하고, 어사대부 관직을 회복시켰다.
여름 4월, 조칙을 내려 이르길 “한가 (漢家)의 제도는 천지를 미루어 친하게 하며, 존귀한 자를 드러내어 높인다. 정도공황 (定陶恭皇)의 호칭에 다시 정도라고 칭한 것은 알맞지 않다. 공황태후를 높여 제태태후 (帝太太后)라 하고 영신궁 (永信宮)이라 칭하며, 공황후를 제태후라 하고 중안궁 (中安宮)이라 칭하라. 경사 (京師)에 공황묘를 세우라. 천하의 죄수들을 사면하라.”고 했다.
주목(州牧)을 파하고, 자사 (刺史)를 회복시켰다.
6월 경신일, 제태후 정씨가 붕어했다. 상이 이르길 “짐이 들으니 부부는 한 몸이라 한다. 『시경』에 이르길 ‘살면서 다른 집에 살아도, 죽어서는 같은 묘에 묻힌다’고 했다. 옛날 계무자 (季武子)가 능침 (陵寢)을 만들었는데, 두씨(杜氏)의 빈소(殯所)는 서쪽 계단 아래에 있기에, 합장하길 청하니 이를 허락했다. 부장 (附葬)의 예는 주나에서부터 일어났다. ‘문물이 융성하도다. 나는 주나라를 따르리다 (郁郁乎文哉, 我從周).’ 효자는 죽은 자를 섬김에 생존할 때 섬기는 것처럼 한다. 제태후를 위해 공황의 원묘에 능을 세우라.”고 했다. 마침내 정도에 장사지냈다. 진류와 제음 (濟陰)군에 가까운 군국의 5만명을 내어 복토 (復土)에 착공했다.
대조 (待詔) 하하량 (夏賀良) 등이 적정자 (赤精子)의 참문 (讖文)으로, 한가 (漢家)의 역운 (曆運)은 중간에 쇠퇴하니, 마땅히 다시 천명을 받아야 하니, 의당 개원하여 그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칙을 내려 이르길 “한이 흥기한지 2백년인데, 역대에 수차 개원하였다. 황천 (皇天)이 재질없는 자에게 보우 (保佑)를 내리시니, 한나라가 다시 천명의 부절을 잡아 얻게 되었으나, 짐이 부덕하여 (온 힘을) 다하여도 감히 (그 천명에) 통하지 않는다. 다시 하늘의 대명을 받고자 하려면, 반드시 천하와 더불어 스스로 새로워져야 하니, 천하에 대사령을 내려라. 건평 2년을 태초원장 (太初元將) 원년으로 삼으라. 존호는 진성유태평황제 (陳 聖劉太平皇帝)라 하라. 누각 (漏刻)은 120각을 법도로 하라.”고 했다.
7월, 위성(渭城)의 서북쪽 벌판 위쪽의 영릉정부 (永陵亭部)를 초릉 (初陵)으로 삼았다. 군국의 백성들을 사민(徙民)하지 말게 하여 편안히 살 수 있게 하였다.
8월, 조칙을 내려 이르길 “대조 하하량 등이 개원하고 존호를 바꾸고 누각을 더 늘리면, 나라를 영원히 편안케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짐이 잘못해 하하량의 일을 들어, 해내가 복을 얻기를 바랬으나, 아름다운 응보는 없었다. 그의 말은 모두 경전에 어긋나고 옛일에 위배되어, 시의 (時宜)에 합당하지 않다. 6월 갑자일의 제서 (制書) 중 사면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없애라. 하량 등은 도에 어긋나고 백성들을 현혹시켰으니, 유사에 보내라.” 고 했다. 모두 죄를 자복 (自服)했다.
승상 주박 (朱博), 어사대부 조현 (趙玄), 공향후 (孔鄕侯) 부안 (傅晏)에게 죄가 있었다. 주박은 자살하고, 조현은 사죄에서 2등을 감하여 논죄하게 하였으며, 부안은 식읍 4분의 1을 삭탈했다. 이 말이 『주박전』에 있다.
건평 3년(BC 4) 봄 정월, 광덕이왕 (廣德夷王)의 아우인 광한 (廣漢)을 세워 광평왕 (廣平王)으로 삼았다.
계묘일, 제태태후가 거처하는 계궁(桂宮)의 정전 (正殿)에 불이 났다.
3월 기유일, 승상 당 (當)이 훙어했다. 혜성이 하고 (河鼓) 자리에 나타났다.
여름 6월, 노경왕 (魯頃王)의 아들 오향후 (吾鄕侯) 유민 (劉閔)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겨울 11월 임자일, 감천의 태치와 분음 (汾陰)의 후토사 (后土祠)를 복원하고, 남북의 교(郊)를파했다.
동평왕 (東平王) 유운 (劉雲), 유운의 후비인 알 (謁), 안성공후 (安成恭侯)의 부인 방(放)에게 모두 죄가 있었다. 유운은 자살하고, 알과 방은 기시 (棄市)되었다.
건평 4년(BC 3) 봄, 크게 가물었다. 관동의 백성들이 서왕모(西王母)의 주(籌)를 전하며 행하고, 군국을 지나서, 서쪽으로 관에 들어와 경사에 이르렀다. 백성들이 또한 모여 서왕모에 제사지내고, 혹은 불을 들고 집위에 올라가,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니, 서로 놀라 두려워했다..
2월, 제태태후의 사촌동생이 부상(傅商)을 봉해 여창후(汝昌侯)로, 태후의 조카인 시중 정업(鄭業)을 양신후(陽信侯)로 삼았다.
3월, 시중 부마도위 동현(董賢), 광록대부 식부궁(息夫躬), 남양태수 손총(孫寵) 모두가 동평왕을 고발한 것으로 열후에 봉했다. 이 말이 『동현전』에 있다.
여름 5월, 중2천석 관리에서 6백석 및 천하의 남자(男子)에게 작을 하사했다.
가을 8월, 공황원(恭皇園)의 북문에서 불이 났다.
겨울, 장군과 중2천석 관리에게 조칙을 내려 병법에 밝고 큰 책모가 있는 자를 천거하게 했다.
원수(元壽) 원년(BC 2) 봄 정월 신축 초하룻날, 일식이 있었다. “짐이 종묘를 얻어 보존하게 되었지만, 명민(明敏)하지 않아, 밤에 잠들면서 걱정하느라 애써, 잠시라도 편안히 쉬지 못하고 있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뭇백성들이 풍족치 못함을 생각하나, 그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누차 공경들에게 조칙을 내려 정력을 다해 다스리길 바랬다. 지금에 이르러 유사가 법을 집행하고 그 중정(中正)함을 얻지 못하고, 혹은 폭학(暴虐)함을 숭상하고 세력을 빌어 명성이나 얻으려 하니, 온량하고 관유(寬柔)한 이는 멸망하는데 빠진다. 이 때문에 잔적(殘賊)들은 두루 자라고, 화목함은 날로 쇠미해지고, 백성들은 걱정하고 원망하니, 이 몸을 둘 곳이 없다. 이에 정월 초하룻날 일식이 일어나니, 그 허물은 멀지 않고 나 한사람에게 있다. 공경대부들은 각자 온 마음을 다해 뭇 관리를 힘써 통솔하고, 인자한 사람에게 돈독히 맡기며, 잔적들을 멀리 쫓아 내어 백성들은 편안히 하라. 짐의 허물을 진언하되, 꺼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장군, 열후, 중2천석과 더불어 현량방정하고 능히 직언할 수 있는 자를 각각 1명씩 천거하라. 천하에 대사령을 내려라.”
정사일, 황태태후 부씨(傅氏)가 붕어했다.
3월, 승상 왕가(王嘉)에게 죄가 있어, 하옥시키니 죽었다.
가을 9월, 대사마 표기장군 정명(丁明)이 파면되었다.
효원묘(孝元廟)의 전문(殿門)에 있는 동으로 된 거북과 뱀의 문고리 머리에서 소리가 났다.
원수 2년(BC 1년) 봄 정월, 흉노의 선우(單于)와 오손(烏孫)의 대곤미(大昆彌)가 내조했다.
2월, 귀국하였으나, 선우는 기뻐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말이 『흉노전』에 있다.
여름 4월 임진일, 어두워지며 일식이 있었다.
5월, 삼공의 관을 바르게 해 직무를 나눴다. 대사마 위장군(衛將軍) 동현은 대사마로, 승상 공광은 대사도(大司徒)로 삼고, 어사대부 팽선(彭宣)은 대사공(大司空)으로 삼아 장평후(長平侯)에 봉했다. 사직(司直)과 사례(司隷) (관직)를 바르게 하고, 사구(司寇) 직을 만들었으나, 그 직사(職事)는 정해지지 않았다.
6월 무오일, 황제가 미앙궁에서 붕어했다.
가을 9월 임인일, 의릉(義陵)에 장사지냈다.
찬(贊)하여 이르길 “효애황제는 본래 번왕(藩王)이었다가 태자궁에 충원되게 이르렀는데, 문사(文辭)는 널리 명인하여 어릴 때부터 이름을 날렸다. 효성제때 세록(世祿)이 왕실에서 없어지고, 권세가 밖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이 때문에 조정에 임하여 누차 대신들을 주살하여 무제와 선제의 법을 본받고자 했다. 고아한 성품이 성색(聲色)은 좋아하지 않으나, 때때로 변사(卞射)와 무희(武戱)를 관람하였다. 즉위하자 중병이 들어 말년에 점차 심해져 나라를 향유함이 오래지 않았으니, 슬프도다!

* 참고할 내용
– 전한 애제
.재위: 기원전 7년 ~ 기원전 1년
.전임: 전한 성제
.후임: 전한 평제
.휘: 유흔(劉欣)
.시호: 효애황제
.매장지: 의릉(義陵)
.부친: 정도공왕
.모친: 정희
.배우자: 부황후 / 두소의
전한의 13대 황제. 시호는 효애황제(孝哀皇帝). 애제가 재위한 당시는 조정의 실권은 외척에게 넘어가고, 자신은 동현이라는 미소년과 동성애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 동현의 누나 소의 동씨(昭儀 董氏) 또한 애제의 후궁이었다.
○ 전한 애제(哀帝)
원제의 손자이자 성제의 조카. 그의 아버지는 유강으로 성제의 이복동생이자 원제의 차남으로 소의 부씨 소생이었다. 유강은 이복형 성제와 후계자 경쟁을 벌이다 탈락해 정도왕이 된다. 원래 유강은 조비연을 사랑했었는데 반대에 부딪혀 이뤄지지 못했다. 그 후, 유강은 그리움으로 상사병을 얻었고 장안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유흔은 부친이 사망하자 정도왕을 세습했는데 백부 성제가 후사가 없어 후계자로 낙점되었다. 애제의 할머니 소의 부씨는 효원황후와 경쟁관계에 있었으나, 손자를 위해 우선 고개를 숙였고, 성제의 총비이자 성제의 무자식의 원인이었던 조비연 자매에게 뇌물을 쓰면서 회유했다.
그러나 애제 집권 후, 소의 부씨와 애제의 어머니 정씨의 친척들이 효원황후의 집안을 밀어내고 권력을 독점한다. 부소의는 제태태후(帝太太后), 정씨는 제태후(帝太后)라는 중국사상 유일무이한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 왕망도 이때는 은거하여 지내다 명성을 얻어 말기에 임용되게 된다.
집권 초기에는 검약을 실천하면서 당시 심각해지던 토지겸병을 비롯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실의 벽에 부딪힌 후 실망하고, 미남자 동현에게 군 고위직인 대사마직을 내리고 총애하였다. 이는 군부와 신료들의 반발을 부르게 된다.
그렇게 재위 7년간 정치를 돌보지 않다가 병사하였다. 이후 풍씨와 부씨는 몰락하고, 애제 사후 곧장 효원황후가 옥새를 인수한 후 왕망에게 권력을 주게 된다. 동현은 부부동반 자살하고 옥루에 쌓인 시신마저 파헤쳐지게 된다. 애제의 황후인 효애황후 부씨와 조비연 역시 자살했으며 조합덕은 성제 사후 의혹을 받아 자살했다.
일화로, 애제가 동현과 낮잠을 자다 먼저 깨니, 동현이 자신의 소매를 깔고 자고 있었다. 이에 칼을 가져오게 해 소매를 자르고 일어나 동현이 깨지 않게 하였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단수’이다.
– 가족 관계
.황후 : 효애황후 부씨(孝哀皇后 傅氏) – 자진함
.후궁 : 소의 동씨(昭儀 董氏) – 동현의 누나이다.
.남첩 : 동현(董賢) – 소의 동씨의 동생이다. 애제가 사랑하던 미남자
– 연호
건평(建平) 기원전 6년 ~ 기원전 3년
태초원장(太初元將) 기원전 5년
원수(元壽) 기원전 2년 ~ 기원전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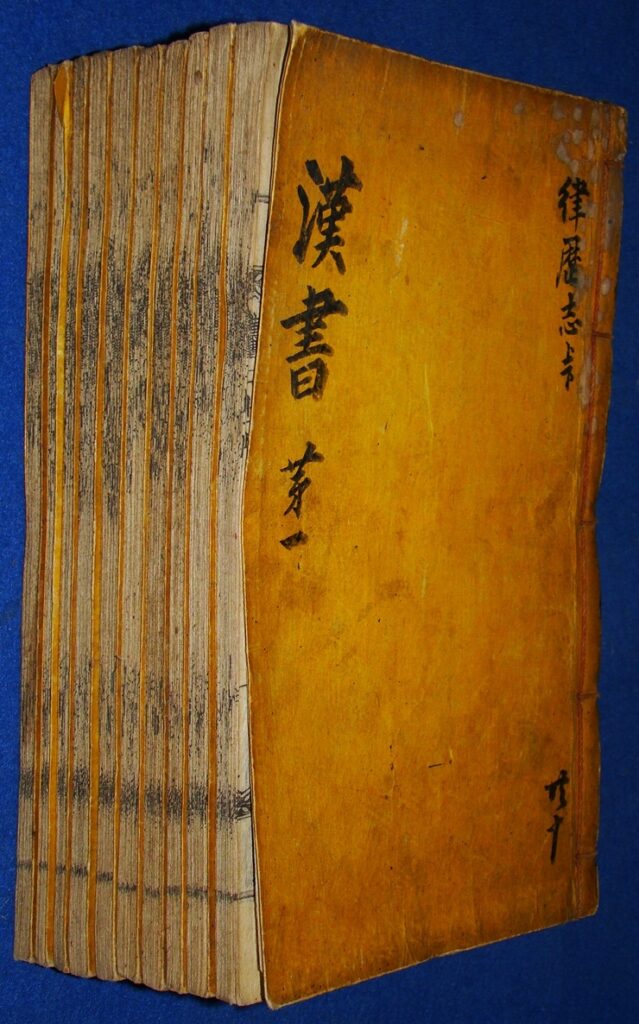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